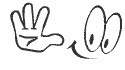매국(賣國)의 선봉이 된
개화(開化) 관료- 이완용(李完用)
⊙ 대원군의 측근이던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 출세 코스 밟아
⊙ 육영공원 나온 후 주미 서리공사, 참찬관 등 역임하며 서구 문물에 눈떠… 독립협회 위원장 지내
⊙ 이완용, “천도(天道), 인사(人事)가 때에 따라 변역(變易)하지 않으면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변명
장철균
1950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 제9회 외무고시, 주라오스 대사·주스위스 대사 / 현 서희외교포럼 대표,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출간
글 | 장철균 서희외교포럼 대표·전 스위스 대사
 |
|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에 찬성해 ‘매국노’가 된 이완용. |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완용에 대한 변론도 없지 않다. 이미 몰락한 조선의 망국 책임을 그에게만 물을 수 있는가? 이완용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이완용의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독립협회 회장 역임 등 그의 ‘애국적’ 행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하다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대대로 양자를 입양한 집안에 양자로 입양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에서 잔반(殘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0세 때인 1867년에 일가인 중추부 판사 이호준(李鎬俊)에게 입양됐다. 이호준은 이조참의, 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한 정계의 거물로 이조판서를 지낸 민 왕후의 친척 민응현의 사위였으며 흥선대원군과는 정치적 동지였다. 이완용이 이런 명문 가문에 양자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서자(庶子)와 딸만 있었던 이호준은 서자인 이윤용(李允用)을 대원군의 서녀(庶女)와 결혼시켜 왕실과 이중삼중의 연을 맺어 핵심 권력층에 자리 잡게 된다. 이호준의 가계(家系)는 350년 전부터 후사(後嗣) 문제로 입양을 시작한 이후 여덟 번이나 양자를 들였다. 이완용을 입양한 이호준 자신도 어렸을 때 입양 온 양자였다.
이완용은 입양된 후 정익호에게 사사(師事)하였고, 이용희에게 서예를 익혀 후일 당대 명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양부 이호준의 후원으로 과거를 준비하던 이완용은 25세가 되는 1882년 왕실에서 특별히 실시한 증광시(增廣試) 별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했다. 이 증광시는 임오군란으로 피란 갔던 민 왕후가 청군(淸軍)의 도움으로 환궁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이완용은 갑과(甲科)나 을과(乙科)가 아니라 병과로 합격한 데 불과했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8, 9품을 거치지 않고, 정7품 규장각 대교(待敎)에 임명됐다. 이 자리는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이는 양부 이호준이 청국에 끌려간 대원군과 손을 끊고 발 빠르게 민씨 정권으로 말을 갈아탔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속출세
 |
| 대한제국의 주미 공사관 건물. 1889년 박정양 초대 주미 공사가 임차해 16년간 사용됐다. |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던 이호준은 이완용을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료교육기관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입학시켜 영어와 신문물을 배우도록 했다. 그 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정3품)에 보임돼 왕세자 순종(純宗)의 사부(師傅)가 되었는데 그가 정3품 당상관에 오르기까지는 불과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갑신정변 실패 후 밀려나간 급진개혁 세력의 자리를 이호준의 후광으로 이완용이 차지한 셈이다.
30세가 되는 1887년, 이완용은 주미전권공사로 부임하는 박정양(朴定陽)을 따라 참찬관(參贊官)으로 미국에 부임했다가 병이 나서 7개월여 만에 귀국하고 만다. 귀국 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참의, 외무참의 등 요직을 지냈다.
미국에 부임한 박정양 전권공사는 청에 약속한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지키지 않고 독자외교를 펼치다 청국의 압력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완용은 1888년 다시 주미 참찬관으로 부임해 2년여 서리(署理) 공사로서 공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로 치면 워싱턴에서 주미 대사대리를 한 셈이다.
1890년 귀국한 이완용은 성균관 대사성과 형조참판, 공조참판, 우부승지(右副承旨), 내무참의(內務參議) 등 차관급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성균관 대사성 재임 시에는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근대적 교사 양성사업 계획을 지휘했으며 성균관에 서양 학문 이수 과목을 신설했다.
이완용의 행보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대원군이 하야하고 친정(親政)을 시작한 고종은 쇄국을 버리고 개방정책으로 선회했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을 이용해 균세(均勢)외교를 추진하자 이완용은 이호준의 후견을 업어 서재필(徐載弼) 등이 주도하는 ‘정동파(貞洞派)’에 접근하면서 친미(親美) 행보를 걷게 된다.
친미 행보로 이완용은 1894년 김홍집(金弘集) 내각에서 외무협판이 되었다. 이때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 등 급진개혁 세력이 일본의 비호 아래 조선으로 돌아왔다. 친청(親淸) 수구파 정권은 붕괴했다. 이완용 부자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호준은 친일정권에 부응하는 한편 고종과 민비 측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다리를 걸쳤다. 이완용은 1895년 박영효가 주도하는 친일내각에 학부대신(學部大臣) 겸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입각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유하자 만주에 이해가 큰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연합해 개입했다. ‘삼국간섭(三國干涉)’이다.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러시아의 힘을 목격한 민비는 러시아를 일본의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시켜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 전략을 추진했다.
위기를 느낀 박영효는 고종과 민비를 러시아와 차단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려다 왕후시해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다시 일본 망명길에 올랐다. 민씨 정권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Veber.K.I)와 손을 잡고 제3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완용은 이 내각에도 입각했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켜 민비를 시해했다. 이완용 부자도 목숨이 위험했지만 미국 공사관 서기관 알렌(H.N.Allen·安連)의 도움으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 주도
 |
| 이완용이 학부대신 시절 문을 연 법어(프랑스어)학교. 맨 왼쪽이 프랑스인 교사 마르텔이다. |
파천이 성공하자 친러내각이 들어섰다. 파천에 공을 세운 이완용은 박정양 내각의 외부대신 겸 학부대신으로 중용되었다. 1년 뒤 1897년, 조선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러시아는 각종 이권 획득에 만족지 않고 사사건건 내정에도 개입했다. 러시아의 간섭이 도를 넘자 고종은 외부대신 이완용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미국 쪽에 줄을 대고 각종 이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이완용은 서재필, 윤치호(尹致昊) 등이 주도하는 친미 성향의 독립협회를 지원해 초대 협회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독립문 정초식(定礎式)에서 그는 “조선이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6년 11월 24일)
독립협회는 미국식 참정권을 주장하고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해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분노한 러시아의 견제를 받은 이완용은 1897년 외직인 평양관찰사로 좌천됐다. 1898년 11월 17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그는 이 시절 “유람하러 나서면서 기생 4명에 나졸을 합해 100여 명이 움직였으며 돈 4000냥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원성이 높았다.
이 사례는 그가 개인적으로 영특했지만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 주미 공사관에 있을 때부터 수십 년간 그를 지켜봐 왔던 윤치호는 그의 일기(1896년 1월 21일자)에 “나는 이완용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의 특권의식, 야비한 교활함과 음흉함, 그와 같거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일 만큼 복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는 평을 남겼다. 그는 이완용이 학부대신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적도 일기에 남겼다.
을사늑약
 |
| 을사늑약을 강요하러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 |
이 와중에 1901년 2월 의정부 참정(參政·정1품)이던 이호준이 노환으로 쓰러졌다. 고종은 이호준의 후계인 이완용을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으로 불러올렸다. 이호준은 얼마 안 가 81세를 일기로 사망했고 이완용은 곧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보호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수구파의 좌장 자리에 올랐다.
이완용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전적으로 양부 이호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국권 침탈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04년 9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완용이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은 친일이었다. 1905년 일본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방한해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했다. 이완용은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이완용의 조카이자 이완용의 비서직으로 있던 김명수(金明秀)는 1927년 펴낸 《일당기사(一堂紀事)》에서 “이 말을 들은 이토는 하세가와를 대동해 궁궐로 들어가 마구잡이로 보호조약을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 어전회의에 참석한 여덟 대신 중에 다섯 명은 찬성, 세 명은 반대했다. 처음부터 찬성을 외친 대신은 이완용과 이지용(李址鎔) 둘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사늑약 후 친일 행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됐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1907년에는 대한제국 총리대신직에 올랐다.
고종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李儁), 이상설(李相卨) 등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과 을사늑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해 보려 했으나 좌절됐다. 이완용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이토를 도와 고종을 퇴위시키고 내정권마저 일본에 넘겨주는 정미(丁未)7조약을 체결했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이완용은 황제를 향해 칼을 빼들고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고함까지 질렀다고 한다. 반일 단체인 동우회(同友會) 회원들은 이완용의 자택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전국 각지에서 이완용 화형식이 격렬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완용은 군대 해산에 앞장서는 등 친일 행보를 계속했다. 그 공로로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동화장(旭日桐花章)을 받았다.
그는 자식이 없었던 순종의 황태자로 고종의 막내아들 영친왕을 내세웠다. 막후에서 실질적 권력을 쥐려 했던 고종의 노욕을 이용한 이완용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에서 물러나면서 사법권을 넘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이 일을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맡겼다. 내각 내에서도 반대가 빗발쳤지만 그는 일본과 단독으로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서명해 버렸다.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勲位菊花大綬章)을 받았다. 조선인으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조선 왕족 3명을 제외하면 이완용이 유일하다.
통감부, “그물도 안 쳤는데 물고기가 뛰어들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이토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이완용은 추도회에 참석해 “이토 공은 나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가 제창한 극동평화론(極東平和論)의 뜻을 지지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안중근 의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해 12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李在明) 의사가 이완용을 습격했다. 이완용은 칼에 세 군데를 찔렸지만 목숨을 건졌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합방(合邦)을 앞당기기 위해 이완용과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宋秉畯)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완용은 핵심 측근 이인직(李人稙)을 통해 “현 내각이 와해되어도 이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일본에 합병을 먼저 제의했다. 송병준과 친일 경쟁을 하던 그가 선수를 친 것이다. 통감부마저도 “그물도 안 쳤는데 물고기가 뛰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합병조약문에서 이완용은 “국호 한국과 황실의 왕 칭호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국호는 조선으로 변경했지만 순종에게 ‘이왕(李王)’, 고종에게 ‘이태왕(李太王)’이라는 칭호를 주고 한국 황실을 일본 황족에 준해 예우하기로 약속했다.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어전회의를 열어 한일병합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감부 관사로 찾아가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와 조약문에 서명했다. 조약체결 후 이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백작(伯爵)의 작위와 퇴직금 1458원 33전, 총독부의 은사(恩賜)공채금 15만 원을 받았다.
3·1운동 당시 ‘경고문’ 발표
1912년 이완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에 올랐다. 일제하에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다. 이완용은 ‘일선융화(日鮮融化)’를 내세우며, 한국 황족과 일본 황족 간의 혼인을 권장하는 동화정책에도 앞장섰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가 그를 찾아가 독립선언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오히려 당시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편지를 보내 탄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완용은 1919년 3월 28일에 쓴 친필 편지에서 “수습방책은 내선인동화(內鮮人同化)에 있습니다. … 먼저 조선인들에게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라고 건의했다.
더 나아가 이완용은 조선 민중을 상대로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몰각한 망동으로서 이를 자각하지 못하면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한일합방은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다. 일본과 조선은 한 뿌리로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고문까지 발표했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백작에서 후작으로 올려주었다. 1923년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 고문이 되었다. 1924년에는 그의 아들 이항구(李恒九)도 남작(男爵)이 돼 보기 드문 부자귀족(父子貴族)이 되었다. 이완용은 일제에 협력한 공으로 막대한 부(富)도 누렸다.
이완용은 1926년 폐병으로 69세에 삶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일본인, 조선인 합쳐 50명의 장례위원이 엄수했고 장례 행렬의 규모는 고종 황제 장례 행렬을 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고 한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도 친일파 박중양(朴重陽)은 이완용을 ‘역사의 희생자’라며 변호했다. 그는 “폭풍노도와 같은 대세에 항거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고 국난을 당하여 분사(憤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상계의 자극은 될지언정 부국제민(扶國濟民)의 방도는 아니다. 하물며 관직을 사퇴하고 도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의 행동일 뿐이다”라면서 “누구라도 이완용과 동일한 경우의 처지가 된다면 이완용 이상의 선처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고 변호했다. 근래에 나온 ‘애국과 매국의 두 얼굴’이라는 부제(副題)가 달린 《이완용평전》은 “지금까지 우리는 탐욕스럽고 패륜적이며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이라는 ‘그럴듯한 매국노 이완용 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삿대질을 하면서 망국과 매국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수의 《일당기사》에는 이완용의 인생관이 기록되어 있다. “나(이완용)는 당시 미국과의 교제가 점차 긴요한 까닭에 신설된 육영공원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 갑오경장 후 아관파천 사건으로 노당(露黨)의 호칭을 얻었고 그 후에는 … 일파(日派) 칭호를 얻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무릇 천도(天道)에 춘하추동이 있으니 이를 변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 역시 변역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망국의 책임을 이완용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고종의 정치력 부족, 민비와 대원군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척사 세력과 개혁 세력의 투쟁과 분화, 조선사회의 경직성과 부실한 근대화 개혁 등등 구한말 조선에 망국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이완용이 총리대신으로서 ‘자진해서’ 일제에 협조하여 망국에 마침표를 찍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완용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신이 고백한 ‘천도와 변역’ 그리고 이러한 인생관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적은 정치적 변신을 거듭했던 양아버지 이호준으로부터의 학습효과와 자기최면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월간조선 2016년 10월호 / 글=장철균 서희외교포럼대표·전 스위스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