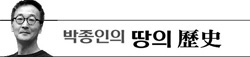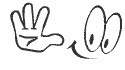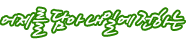[박종인의 땅의 歷史]
"문득 알게 되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님을"
입력 : 2018.05.16 04:00 | 수정 : 2018.05.16 11:28
각성한 선비 김창숙과 파리 장서 사건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기독교… 천도교… 불교
조선 500년 지배한 유림은 한 명도 없어
통곡하던 선비 김창숙 "나라 망친 유림 주제에…" 비난받고 대오각성
전국 유림 연합해 독립청원서 작성, 파리 만국회의 송달
안동·서울 선비들 만주로 집단 망명… 독립운동 매진
'갑질 유림'에서 국가 공동체에 눈뜬 '제대로 된 선비' 변신
고등계 형사 자살하다
1919년 5월 14일 밤 만주 봉천 출장길에서 돌아온 종로경찰서 조선인 고등계 형사 신승희가 남대문역에서 체포됐다. 씌워진 혐의는 수뢰죄였다. 경성 헌병분대에서 이틀간 진행된 심문에서 신승희는 천도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신승희는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므로 용서해 주기 바란다"며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5월 16일 신승희가 유치장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경성 헌병분대 피고인 신승희 조서)
신승희, 일명 신철은 천도교로부터 돈을 받고 '3·1 독립운동 거사 계획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9년 5월 22일 자) 한 달 열흘 뒤 '신한민보' 기사 제목은 '양심(良心) 재판을 받고 자살해'였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한민보 6월 24일 자)
천도교 쪽 자료에 따르면 신승희는 기미독립선언서 인쇄가 한창인 2월 27일 밤 천도교 산하 인쇄소 보성사를 덮쳐 선언서 한 장을 손에 넣었다. 혼비백산한 사장 이종일이 신승희를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에게 데려갔다. 손병희가 "그래도 조선의 아들이니, 며칠만 눈감아 달라"며 5000원을 보자기에 싸서 내밀었다. 쌀 1111가마 값이다.(천도교 홈페이지) 마흔 살 먹은, 10년 경력 조선인 경찰 신승희는 월급이 40여 원이었고 재산은 열한 칸짜리 집을 포함해 1000원 정도였다.(신승희 조서) 신승희는 입을 다물었다. 독립선언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그리고 두 달 뒤 수사 과정에서 신승희가 자살한 것이다.
각성한 사람들, 각성한 역사
돈에 눈이 돌아갔거나, 아니면 신승희는 각성(覺醒)을 했는지도 모른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깨달을 각(覺), 깰 성(醒). 그제서야 고등계 형사이기에 앞서 조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중년 사내는 자살을 택했다. 3·1운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오각성을 하고 이뤄낸 역사였다. 동시에 세상을 헛되게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든 역사이기도 했다. 그 각성한 사람들 이야기다. 김창숙(金昌淑·1879~1962)도 그런 사람이었다. 마흔 먹은 사내 김창숙은 기미년 3월 1일 경성 한복판에서 낭패를 당했다. 김창숙은 유림(儒林)이다.

유림 김창숙, 낭패 당하다
김창숙은 선비다. 경북 성주의 거유(巨儒), 한주 이진상(李震相·1818~1886)을 잇는 한주학파 선비다. 3월 1일 오후 1시 김창숙은 동료들과 함께 탑골공원에 있었다.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보니 33인 민족대표 명단에 유림이 한 사람도 없었다. 33인은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이다.
조선 500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유림이 없었다. 이에 김창숙이 동료를 붙들고 방성통곡을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유림임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힐난했다.
"이놈도 모양을 보니 아마도 유림인가 보다. 이놈아, 통곡은 왜 하느냐. 나라를 망칠 때는 너희 놈들이 온갖 죄악을 다 지어놓고 오늘날 민족적 독립운동에는 한 놈도 끼이지 않았으니, 이놈아, 이러고도 다시 유림이라 오만하게 자부하려느냐. 이놈아, 통곡은 무슨 통곡이냐." (벽옹일대기, '기미유림단사건에 관한 추억의 감상') 국가보훈처 서동일 박사에 따르면, 이 회고는 "유림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이었는지" (김창숙의) '심산유고'에는 빠져 있다.
대오각성의 순간이었다. 김창숙이 이리 회고한다. "나라가 망한 원인을 따져보면 유교가 먼저 망하자 나라도 따라서 망한 것이다. 광복 운동을 선도하는 데 삼교의 대표가 주동을 하고 소위 유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유교를 꾸짖어 '오활한 선비, 썩은 선비와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김기승, '심산 김창숙의 사상적 변화와 민족운동' 재인용)
유림 갑(甲)의 시대, 조선
내시와 불교 발호로 고려가 망했다. 조선은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고 불교를 억압했다. 지난 시대 권력을 휘두르던 승려들이 천민으로 격하됐다. 권력은 사대부가 독점했다. 상놈(商)은 천민(工)이 만드는 물품을 팔았고, 농부(農)는 선비(士)가 먹을 것을 생산했다.
광해군 12년 노비에게 무과 응시 자격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임진왜란 직후 노동력이 부족하던 때였다. 그런데 사헌부가 반대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대저 노비와 주인 구분은 곧 군신의 의리입니다. 구분이 없으면 의리가 없어지고 삼강이 없어지게 되는데, 삼강이 없으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誠可痛也. 夫奴主之分 卽君臣之義也. 無此分則無此義 而三綱滅矣 國無三綱 何以爲國)?"(1620년 '광해군일기' 12년 1월 11일) 신분제는 조선을 지탱하는 근본 체계였다. 가끔 세종 같은 성군(聖君)이 양민과 천민을 중용했으나, 가끔이었다.
1792년 3월 정조가 안동 도산서원 선비들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서원 앞 강변에서 열렸다. 안동 유림은 이 특권을 기리는 비각을 세웠다. 1970년대 안동댐으로 비각이 수몰되려 하자 유림은 10m 높이 언덕을 쌓고 비각을 수직 이동시켰다. 조선 왕조 유림 자부심이 21세기 낙동강을 바라본다. 그들이 창조한 성리학의 세계는 이상적이었고 풍요로웠다.

가끔 혹은 자주,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갑(甲)이었다. 퇴계 이황은 어릴 적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공부했다. 신라 명필 김생과 학자 최치원이 공부했다는 전설도 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에게 청량산은 성산(聖山)이었다. 산중 사찰 청량사에는 최치원이 공부한 치원암 터가 있다. 그 암벽에 관찰사 이조원과 영주 백(佰) 한용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 1850년 경술년 음력 8월이다. 그들이 산행하는 모습을 짐작해본다.
'술에 취해 누우니 포도탕을 올리고 시 쓸 두루마리를 올리고 상을 깔아주고 등을 켜주었다(醉困隱几而臥 舊面奇‘上人’進葡萄湯 新見熙‘上人’進詩軸 薦床者 少‘上座’也 開燈者).'(권호문, '유청량산록 (遊淸凉山錄)')
원문에 나오는 '上人'과 '上座'는 모두, '승려'다. 선비들이 고려를 멸망시킨 명분, 지배자의 갑질을 그들은 그렇게 흉내 내고 있었다. 조선 개국부터 500년 되도록 지배구조는 변함없었다.
망국(亡國), 그리고 각성하는 유림
1895년 왕비 민씨가 일본인에게 살해됐다. 단발령이 떨어졌다. 유림은 의병을 일으켰다. 적은 단발령을 강제한 친일 내각이고 국모를 죽인 일본이었다. 을미 의병은 국왕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 해산을 명하며 사그라들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유림이 또 거병을 했다. 을미, 을사 두 의병은 구한말 조선 땅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대규모 무력 항전이었다. 목적은 조선 왕조 혹은 대한제국 수호였다.
나라가 망했다. 총독부는 1910년 10월 '양반, 유생의 기로(耆老·원로)' 3159명에게 15원부터 120원까지 천황 은사금을 지급했다.(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이 꼬라지를 목격한 제대로 된 선비 하나가 이렇게 기록했다. "온 나라의 양반들이 많이 뛸 듯이 좋아하며 따랐다."('벽옹칠십삼년회상기')
그가 바로 기미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통곡한 선비 김창숙이다.
파리장서와 각성한 유림
3·1만세운동 주도 세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시기를 놓쳐 서명을 하지 못한 김창숙이었다. 이제 군주나 왕조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국가와 사회였다. 외세로부터 독립해야 할 존재는 왕조와 유학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었다.
그리하여 김창숙과 동지들이 내놓은 계획이 '파리장서(巴里長書)'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파리평화회의에 유림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자는 계획이다. 서명한 유림은 모두 137명이다. 김창숙은 고향 봉화 바래미마을로 잠입해 문중과 함께 초안을 작성한 뒤 중국 상해로 떠났다. 상해에서 청원서를 각국어로 번역해 파리로 보냈다. 4월 12일 이 사실이 발각돼 유림들이 대거 옥고를 치렀다. 청원서는 만국회의장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른바 1차 유림단 사건이다. 왕조와 유학에 목매고 살던 유림들이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벌인 역사적인 행동이었다.
임청각 사당이 텅 빈 이유
김창숙은 중국으로 망명했다. 만주에는 안동 선비 이상룡 가족, 서울 선비 이회영 형제들이 집단 망명해 활동 중이었다. 1925년 김창숙은 조선에 돌아와 몽골지역 독립군 기지 건설 자금을 모았다. 고향 바래미마을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추렴을 했다. 기지 건설은 실패했다. 대신 군자금은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폭파 의거에 사용됐다. 모금에 동참한 선비들은 또 옥고를 치렀다. 2차 유림단 사건이다. '선비' 김창숙은 상해임시정부 부의장을 지냈다. 해방 후 성균관을 재건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했다. 김창숙은 일제강점기 고문으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의 호는 벽옹(躄翁)이다. 뜻은 '앉은뱅이 늙은이'다.
'선비' 이상룡은 임정 초대 국무령을 지냈다. 이상룡이 살던 안동 임청각(보물 182호)에는 군자정(君子亭)이 있다. 이상룡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