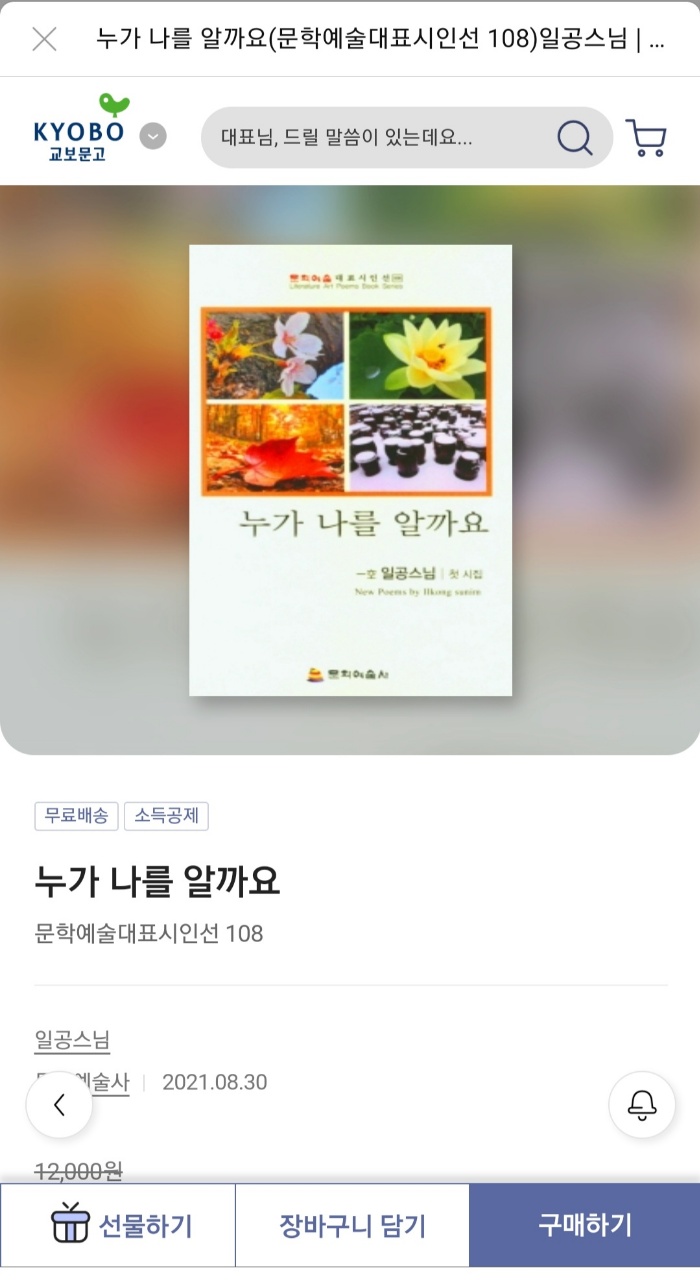바람으로 맞는 사랑과 그리움
[평설] 일공스님 시집 『누가 나를 알까요』 시세계
_류재엽<문학평론가>
시집 『누가 나를 알까요』는 최성기(법명 일공) 시인의 첫 번째 작품집이다. 출가자로서 예순의 나이에 이르러 첫 시집을 내는 기쁨이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시인은 그 기쁨을 "심보에 첫 시집을 낼 때 마음을 담아 보았다"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납의衲衣를 입은 시인의 시집에는 정각正覺으로 향해 나악는 다짐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작품을 읽다 보니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교감과 단순한 자연 완상玩賞에 그치는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자연사랑의 시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집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을 중심으로 엮었다. 이로 미루어 이번 시집이 계절의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4계절은 단순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의 연계만은 아니다. 이 시집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정서를 벗어나서 생명의 반복 생성과 소멸, 그리고 생명 순환을 말하는 윤회사상과도 관계가 깊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홍만선은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저서 『산림경제』에서 농촌의 사계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봄은 청명하고 화평하고 따뜻하고 초록이 되살아나 꽃을 피우고 백 가지 새들이 모여들어 화창하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여름에는 북창가에서 바람을 쏘이거나 냇물에 발을 담그거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뒹굴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가을은 모든 산에 단풍이 눈이 부시고 밤에는 달 밝은 벌레 소리 흥겨우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겨울에는 남쪽 처마 밑에 등을 기대고 볕을 쪼여도 좋고 따뜻한 화로를 끼도 앉아도 좋고 창 너머로 은세계를 이룬 세계를 구경할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농촌 4계절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한다. 이는 최성기 시인이 이번 시집에서 다루고 있는 4계절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평론가 프라이(N. Frye)는 저서 『비평의 해부』에서 우주의 주기적 변화를 출생, 성장, 결실, 쇠락 후 다시 출생하는 반복의 형식으로 문학의 원형을 이야기 한다. 우주의 질서는 계속 반복되면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에도 계절의 특색은 도드라지게 마련이고, 우리의 감성 역시 반복되는 계절을 닮는다. 그래서인지 봄꽃은 화사해 보이는데, 가을꽃은 쓸쓸한 기운이 서려 있음을 느낀다.
시집에 실린 작품 대부분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창작하였다. 시인은 시집의 서문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글을 쓰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의 교감이요, 자연과의 대화에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시인은 자연세서 작품의 제재를 가져 오되, 자연을 피상적으로 상대한 것이 아닌, 시인은 끊임없이 자연과의 진실한 대화를 모색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얗게
눈雪이 내립니다
눈眼이부시도록
하얀 당신이 내려옵니다
그리웁게
눈꽃雪花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남을 위해
- 「마음의 꽃」 전문
제1부의 '봄'의 첫 작품이다. 지금 내리는 눈의 춘설이 분명하다. 그런데 봄을 알리는 춘살은 다만 봄이라는 계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의 '만남'을 준비한다, 생성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하늘과 화자와의 약속이다. 약속은 그리움을 동반한다. 그래서 시인은 "오는 봄/먼저 맞으려다/늘 그리움이 앞서/그대 가슴에 눈꽃을 피웠네"(「오는 봄」 에서)라고 노래한다.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 오고, 봄은 화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그리움이 찾아온다는 하나의 알림이다. 우주 생성은 봄꽃의 출생에서 오고 그것은 시인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자리 잡는다. 봄이 되어 돋아나는 새싹은 시인게게 "갓 태어난 애기 웃는 모습"(「보내시구려」에서) 인식된다.
봄이란
겨우내 헐벗어 버린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개울 건너
겨울잠 깨어난 바람 소리
보리싹 파란 물오르고
목련은 솜털을 벗으려
청명한 하늘을 본다
봄 오는 소리가
어린아이 옹알거림 속에 물들고
살포시 내려앉은
그리움 님의 매화향기를 닮았네
봄은
바람 따라 날아든
반가운 님의 소식
산아래 흐르는
계곡물 위에 떠 있는
갈잎 아래에 있다.
- 「봄」 부분
이 작품에는 '바람'이라는 시어가 세 번 나온다. 바람은 기압 차이에서 오는 공기의 흐름이다. 그 바람은 미풍微風일 수도 있고 태풍颱風일 수도 있으며 열풍熱風인가 하면 한풍寒風일 수도 있다. 바람은 대상을 움직인다. 물체이건 마음이건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걸 흔들면서 지나간다. 바람이 흔들고 지나간 자리에는 평안과 적요寂寥가 사라진다. 바람은 세상일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화자는 봄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반가운 님의 소식'이라고 규정한다. 시인 김남조는 「나무와 바람」이란믄 작품에서 "바람은 우리 애기 울음소리/그 속에 스민 듯한 바람"이라고 봄바람을 정의했다. 그러나 봄바람은 아름답고 고운 존재만은 아니다.
봄꽃으로 오시나요
아지랑이로
보고파 날 찾아왔나요
아아
흩어져 버리면 꿈이라지만
무지개 같은 봄비라지만
그댈 만난 이번 생은
감미로워요
문득
스치는 바람이라도
당신의 향기려니
문득 스치는 그 향기라도
당신이 왔다 갔느니 생각할래요
아아
떠남은 안돼
아직은 미완성
그게 사랑이야
그게 그대와 나의 사랑
- 「
곷길에서」 부분
화자는 봄은 꽃으로 온다고 말한다. '무지개 같은 봄비'로 치환되거나 '스치는 향기'처럼 내 주위를 감돈다. 그러나 사랑는 '흩어져 버린 꿈길'과 같아서 아직 '미완성'일 수 밖에 없다. 대장경에 "꽃향기에 거슬려 부는 바람은 모든 탐욕과 고통과 죄악을 뜻한다. 그리고 빠른 바람은 번뇌를 일으킨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 번뇌는 화자로 하여금 "아아 떠남은 안돼"라고 울부짖게 만든다.
봄은 생명의 경이와 자연의 신비를 울러일으키는 계절이다. 조그마한 화단에서 솟아나오는 새싹을 보면, 우리는 새 생명에 관한 사색을 얻는다. 그것은 마치 무럭무럭 자라느는 아기의 맑은 눈동자와 군더더기 없는 웃음을 보면서 알게 되는 생명의 신비감과 마찬가지다. 하이네(H. Heine)는 "물결은 반작이며 흘러간다/봄은 즐거운 사랑의 계절//꽃은 피어나고 향기는 피어오르고···"라고 봄을 예찬하였다.
- 상기 내용은 일공스님의 시집 제1집 『누가 나를 알까요』 시세계 평론을 문학박사 류재엽 문학평론가가 『문학예술』 2021 겨울호 계간지에기고한 글을 옮겨 올린 것입니다. 다음엔(평론 #2) '여름'에 관련된 평론하신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