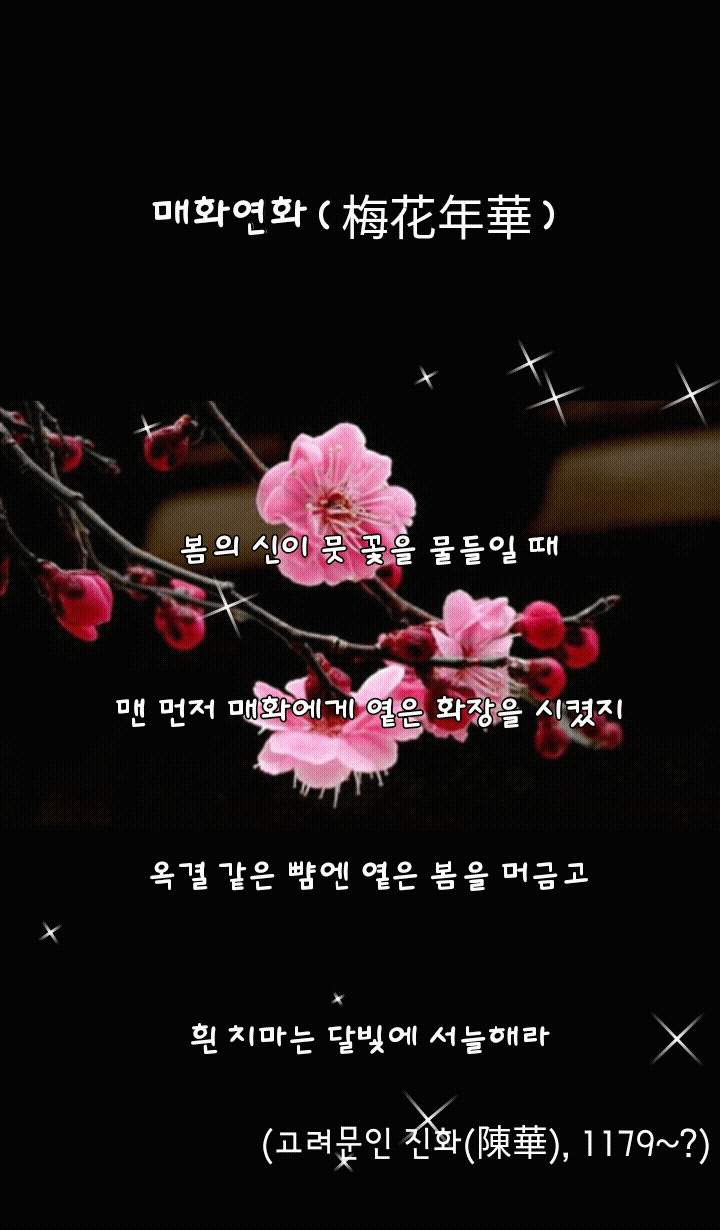매화연화(梅花年華)
바람이 온종일 칭얼댔다. 휘잉! 우당탕! 문을 거칠게 여닫으며 씩씩댔다. 아니, 윗집에 자식 주렁주렁한 흥부네라도 이사 왔나? 와∼와∼ 우르르 쿵쾅쿵쾅!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천방지축 시도 때도 없이 지리산가리산 몰려다녔다. “넌 쥐구멍에서 뭐하고 있니?” 오목눈이, 멧새가 톡! 톡! 톡! 창문을 부리로 쪼아 댔다. 박새, 딱새, 굴뚝새, 어치, 딱따구리, 직박구리가 “어휴 이 책벌레야, 한번 나와 봐! 온 천지에 혁명이 오고 있어!”라며 날개깃으로 유리창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렇다. 바야흐로 스물네 번의 꽃바람[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이 뭉게뭉게 일고 있었다. 소한부터 곡우까지 넉 달 동안 닷새마다 불어오는 바람. 그중에서도 첫 번째 바람씨가 싹이 트고 있었다. 바로 매화꽃 바람이었다. 이제 머지않아 그 정갈한 매화꽃 이파리가 단아하게 벙글 것이다.
매화연화(梅花年華)
매화연화(梅花年華)
봄의 신이 뭇 꽃을 물들일 때
맨 먼저 매화에게 옅은 화장을 시켰지
옥결 같은 뺨엔 옅은 봄을 머금고
흰 치마는 달빛에 서늘해라
(고려문인 진화(陳華), 1179~?)
3월 하순, 부리나케 지리산 자락의 ‘산청 3매’부터 찾아 나섰다. 날씨가 제법 맵찼다. 하지만 박달나무가 얼어 터지거나 여우가 눈물을 짜낼 만큼은 아니었다. 바람은 한결 살가워졌다. ‘호남 3매(순천 선암사 선암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흑매)’는 아껴두었다가 찬찬히 두고두고 볼 참이었다.
우선 산청 3매로 매화 허기부터 달래야 했다.
화엄사 흑매나 선암사 선암매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도 보고 누워서도 보면서, 사방팔방으로 황소 되새김질하듯 톺아볼 요량이었다.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내 가슴, 너무 뻐근하다 못해 빠개질 것만 같았다.
매화는 화괴(花魁), 즉 ‘꽃의 우두머리’이다. ‘선비의 꽃’이다. 청아하고 속기(俗氣)가 없다. 평생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 선비의 삶은 가시밭길. 춥고 배고프다. 그렇다고 어찌 뜻마저 저버릴쏘냐. 한 치의 벌레에게도 오 푼어치의 결기는 있다. 추위가 한바탕 뼛속 깊이 사무치지 않고서는 어찌 매화의 그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매화에도 품격이 있다. 벌떼처럼 핀 매화는 ‘양계장 닭’이나 마찬가지다. 섬진강변 농원매화는 매실을 따기 위하여 ‘대량 양식’하는 꽃이다. 꽃이 가지에 덕지덕지 붙는다. ‘매화나무’라기보다는 ‘매실나무’다. 고고한 맛이 덜하다. 향기도 오래가지 않는다. 우르르 피었다가, 바람 한번 건 듯 불면 땅바닥에 넉장거리로 패대기쳐지듯 우수수 떨어진다. 벚꽃 닮았다.
토종 조선 매화는 꽃이 작다. 꽃도 띄엄띄엄 성글게 돋는다. 향이 은은하고 오래간다. 만고풍상의 구불구불 늙고 검은 가지에서 어느 날 차갑고 맑은 꽃이 화르르 돋아난다. 조선 매화에도 등급이 있다. 어린 것보다 늙은 것이 귀하다. 살찐 것보다 마른 것을 더 친다. 매화뿌리가 만수산 드렁칡처럼 서로 얽혀야 좋다.
매화 둥치는 껍질이 트고 구불구불 틀어져야 한다. 나무껍질은 검고 푸른 이끼가 수염처럼 늘어져 있어야 으뜸이다. 늘어진 이끼는 바람이 살랑거리면 마치 푸른 실이 너울거리는 것 같다. 나무껍질은 비늘주름이 많은 게 최고다. 나뭇가지는 듬성듬성해야 운치가 있다.
아뿔싸! 산청 3매 중 정당매는 거무튀튀한 마들가리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3개의 원줄기는 말라죽었지만, 그래도 수십 대 손자뻘의 1개 줄기에서 어렵게 꽃망울을 밀어 올리곤 했다. 올봄엔 그것마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과연 꽃을 피우긴 피우려나. 홑꽃 백매지만 엷게 붉은빛을 띤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정당매는 강회백(姜淮伯, 1357~1402)이 젊은 날 단속사에서 공부할 때 심었다는 매화다. 강회백은 고려 시대 정당문학(政堂文學)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랐던 문인. 강회백의 손자가 조선 초기 문신 강희안(1418~1465)이다.
정당매로부터 가까운 산청 단성면 남사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마을은 온통 구불구불 돌담길로 운치가 있고 고즈넉했다. 그곳엔 고려 말 문신 원정(元正) 하즙(1303~1380)이 심은 원정매가 있다. 마침맞게 화사하게 꽃등불을 매달고 있었다. 주인장은 마실 나갔는지 없고, 빈집 호젓한 앞마당에 벌들만 잉잉대며 꽃술에 코를 박고 있었다. 원줄기는 말라 죽었으나 밑둥치 옆에서 가지가 나와 연분홍 겹꽃을 피웠다. 원정공이 읊은 노래비도 있다.
집 앞에 일찍 심은 한 그루 매화 舍北曾栽獨樹梅
한겨울 꽃망울 나를 위해 열었네 臘天芳艶爲吾開
밝은 창에 글 읽으며 향 피우고 앉았으니 明窓讀易焚香坐
한 점 티끌도 오는 것이 없어라 未有塵埃一點來
산청 3매 중에선 역시 남명매가 으뜸이었다. ‘칼 찬 선비’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2)선생이 61세 때(1562년) 산천재 앞뜰에 심은 것이다. 연한 분홍빛을 띤 흰색 겹꽃이 황홀하다 못해 슬며시 혈압이 올랐다. 꽃은 점점 뽀얀 유백색으로 바뀐다. 문득 남명선생의 질책이 아프게 등짝을 때렸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 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한다.[近見學者 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조선 매화꽃은 다소곳이 오므린 것이 귀하고 활짝 벌어진 것은 덜 친다. ‘매화는 반개, 벚꽃은 만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법정 스님, 1932~ 2010) 매화 향기는 화룡점정이다. 진한 것보다 맑고 은은한 게 으뜸이다. 이른바 ‘암향(暗香)’이다. 동터 오는 여명의 향기가 가장 은은하고 그윽하다.
조선 선비들은 달밤에 보는 매화, 월매(月梅)를 으뜸으로 쳤다. 달빛에 어린 매화는 몽환적이다. 맑고 푸르고 써늘하다.
‘홍매보다 백매가 좋고, 겹꽃보다는 홑꽃이 더 고상하다. 백매 중에서도 꽃받침이 녹색인 홑녹매가 으뜸이다’(다산 정약용, 1762~1836)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퇴계 이황(1501~1570) 선생은 매화 화분을 앞에 놓고 “너도 한잔, 나도 한잔”하며 술벗을 했다. 말년에 병들어 눕게 되자 “매형(梅兄)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매화 화분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했다. 그는 섣달 초순 어느 아침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하고 눈을 감았다.
우리고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건 조선 매화꽃이다. ‘오래된 미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향은 자손만대 대대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묵묵히 그 꽃을 피워야만 한다.
고전 번역이 바로 그렇다. 그것은 ‘물속의 달을 긷는 것’이다. 밤새 아무리 달을 긷고 길어도 끝내 달을 물속에서 떠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향기는 매화의 암향처럼 우리의 얼을 말갛게 씻어 준다.
조선 매화는 숨어 있다. 오래된 서원이나 정자에 수백 년 동안 홀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깊은 산속에 저만치 홀로 핀 늙고 수척한 조선 매화 한 그루.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었다 진다. 그 은은한 향기 냇물 따라 십리 밖까지 퍼진다. 벌 나비가 날아든다. 밤엔 달빛과 별빛이 꽃잎 위에 내려앉는다.
글쓴이 : 김화성
•언론인. 전 동아일보 부국장. 스포츠 전문기자. 혼불문학상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