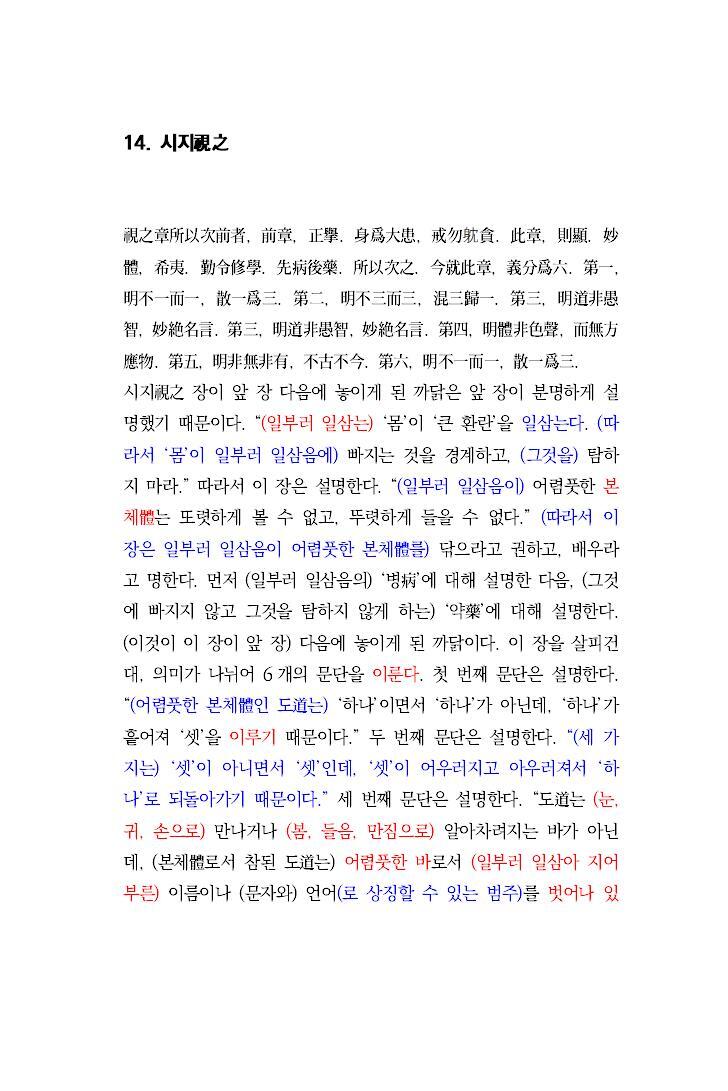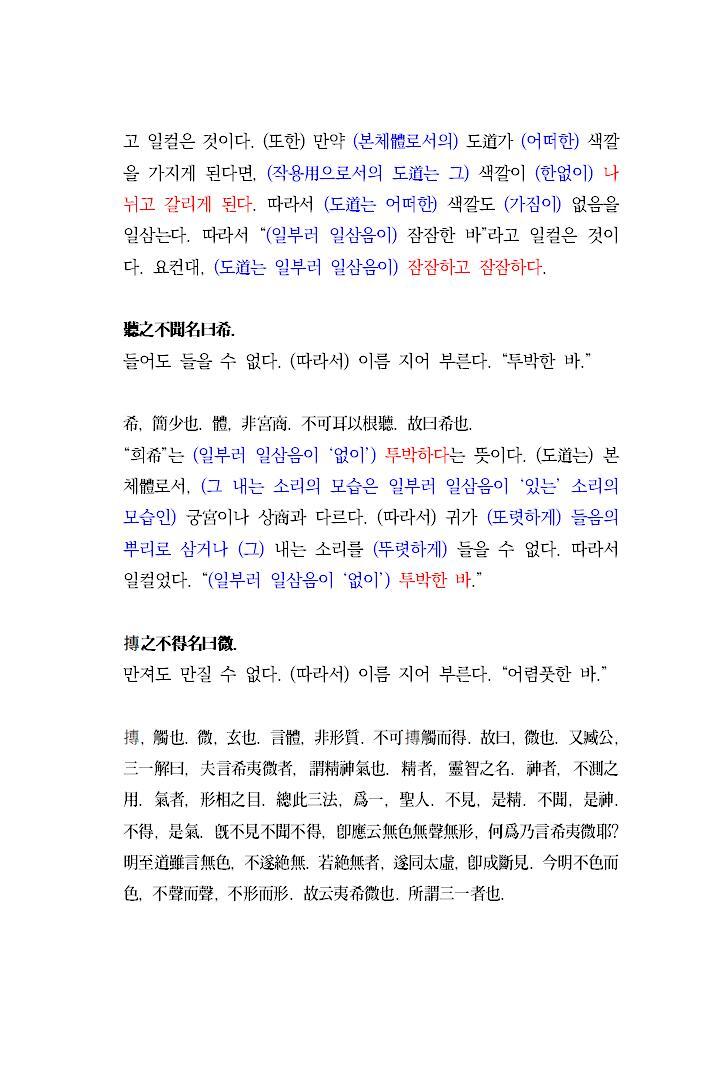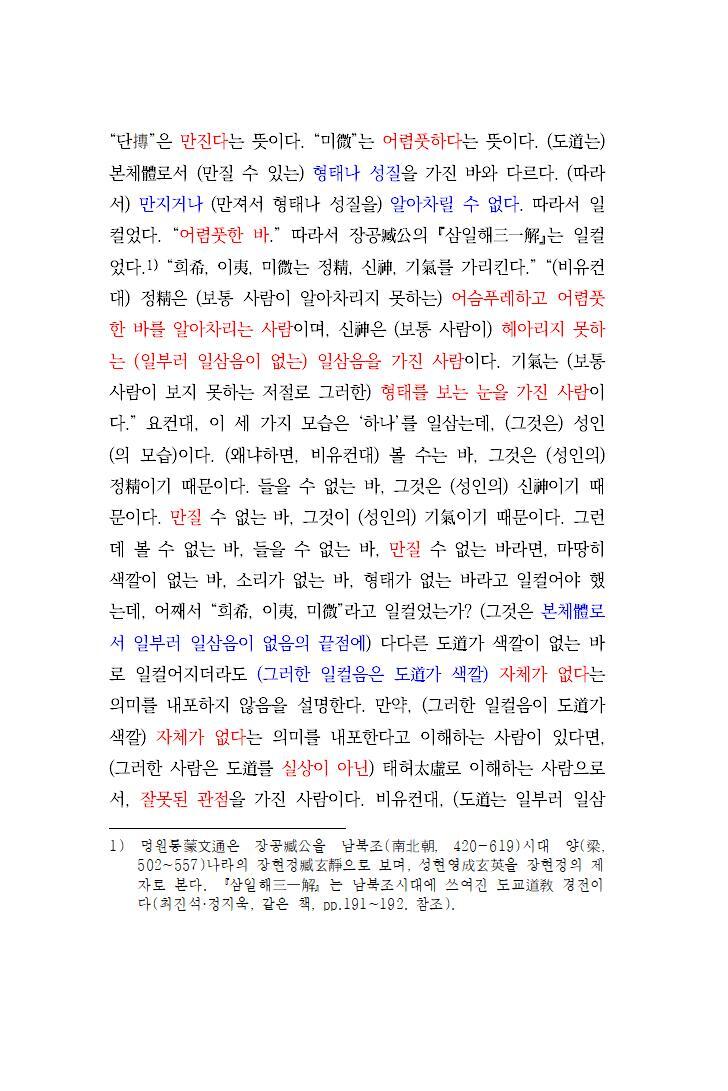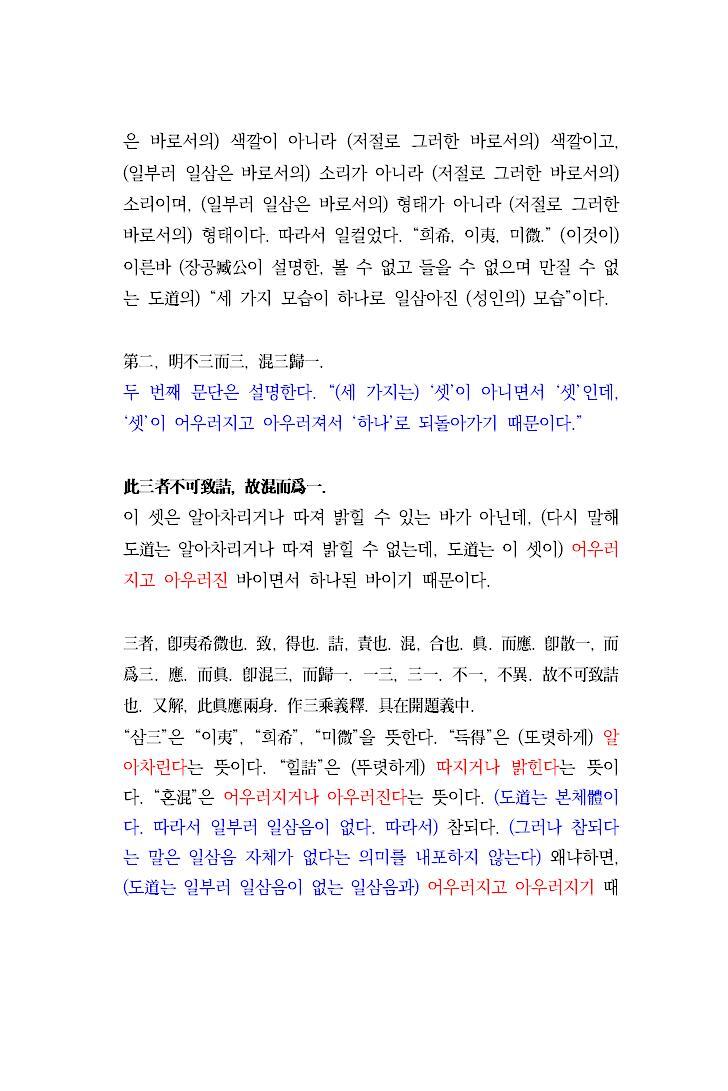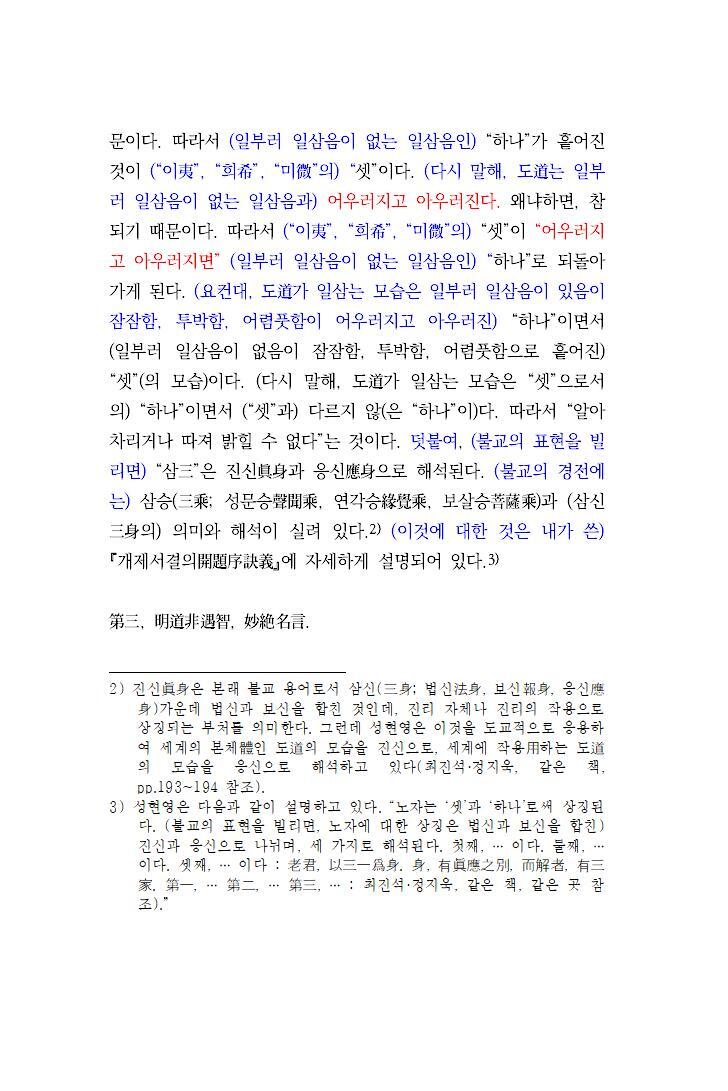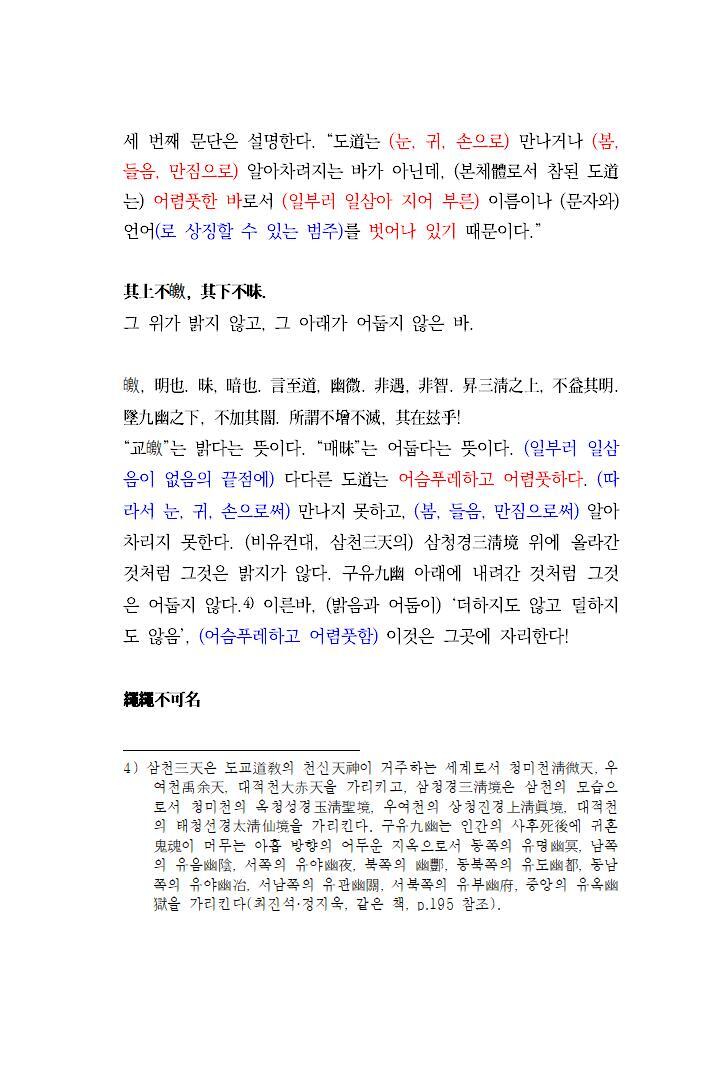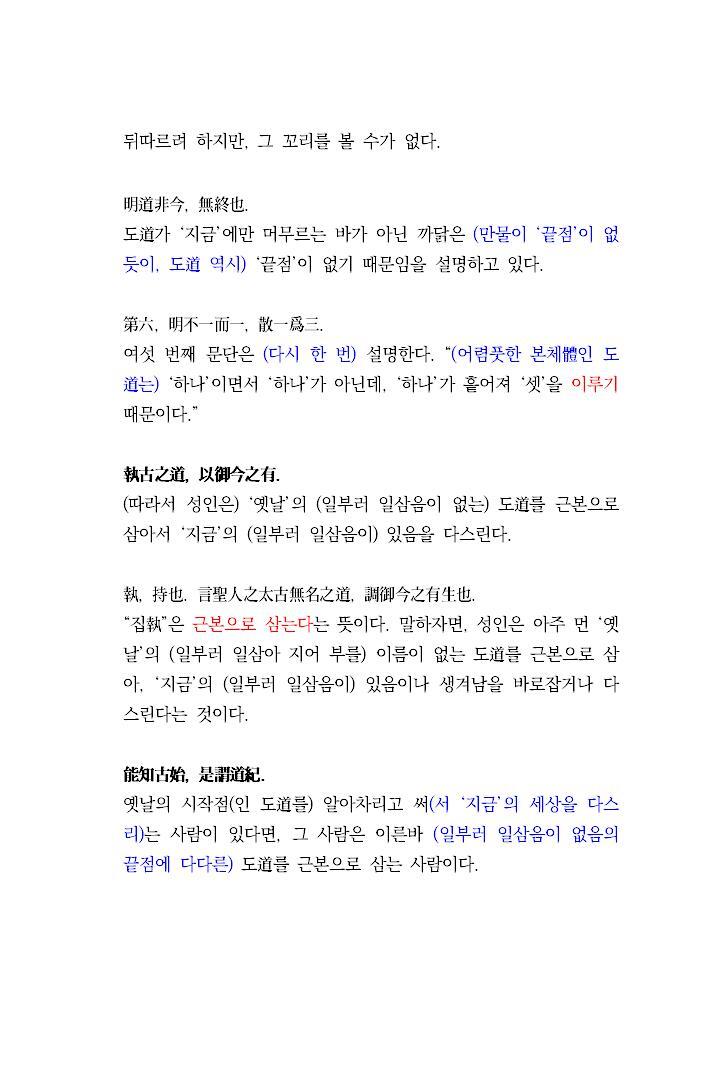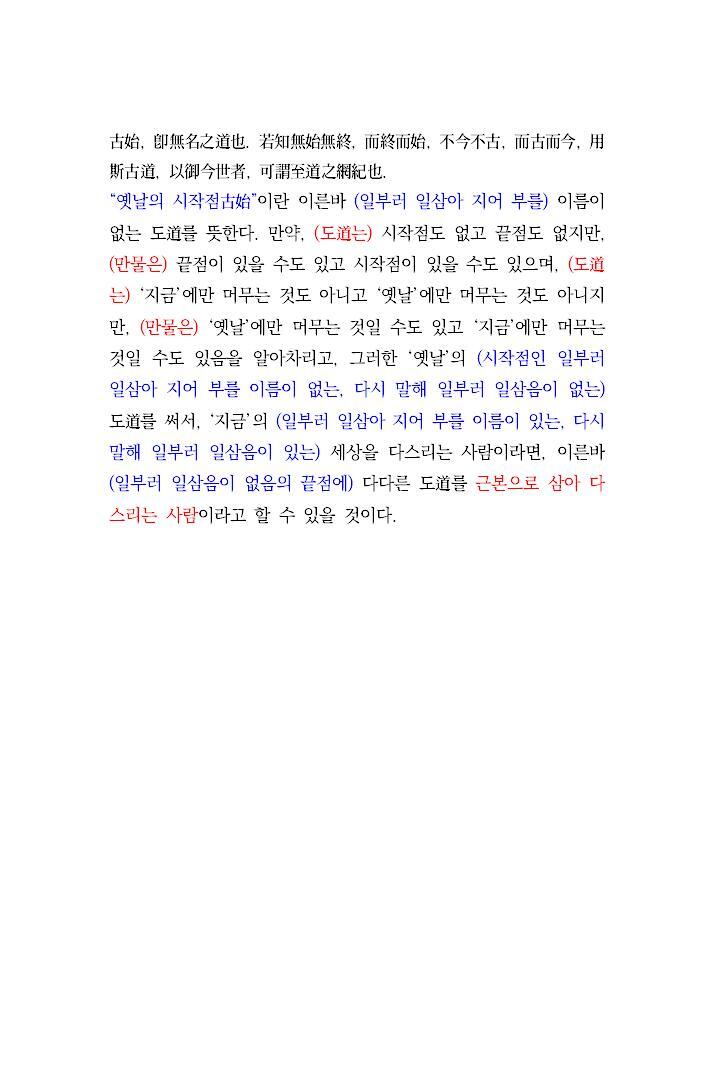14. 시지視之
視之章所以次前者, 前章, 正擧. 身爲大患, 戒勿躭貪. 此章, 則顯. 妙體, 希夷. 勤令修學. 先病後藥. 所以次之. 今就此章, 義分爲六. 第一, 明不一而一, 散一爲三. 第二, 明不三而三, 混三歸一. 第三, 明道非愚智, 妙絶名言. 第三, 明道非愚智, 妙絶名言. 第四, 明體非色聲, 而無方應物. 第五, 明非無非有, 不古不今. 第六, 明不一而一, 散一爲三.
시지視之 장이 앞 장 다음에 놓이게 된 까닭은 앞 장이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일부러 일삼는) ‘몸’이 ‘큰 환란’을 일삼는다. (따라서 ‘몸’이 일부러 일삼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탐하지 마라.” 따라서 이 장은 설명한다. “(일부러 일삼음이) 어렴풋한 본체體는 또렷하게 볼 수 없고, 뚜렷하게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은 일부러 일삼음이 어렴풋한 본체體를) 닦으라고 권하고, 배우라고 명한다. 먼저 (일부러 일삼음의) ‘병病’에 대해 설명한 다음,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탐하지 않게 하는) ‘약藥’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이 이 장이 앞 장) 다음에 놓이게 된 까닭이다. 이 장을 살피건대, 의미가 나뉘어 6개의 문단을 이룬다. 첫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어렴풋한 본체體인 도道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흩어져 ‘셋’을 이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세 가지는) ‘셋’이 아니면서 ‘셋’인데, ‘셋’이 어우러지고 아우러져서 ‘하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눈, 귀, 손으로) 만나거나 (봄, 들음, 만짐으로) 알아차려지는 바가 아닌데, (본체體로서 참된 도道는) 어렴풋한 바로서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른) 이름이나 (문자와) 언어(로 상징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본체體로서 (일부러 일삼은) 색깔과 소리와 다르다. (일부러 일삼은) 모습이 없이 만물과 어우러지고 아우러지는 바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일삼음 자체가) 없는 바도 아니며,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바도 아닌데, (따라서 만물이 ‘옛날’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며, ‘지금’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듯이, 도道 역시) ‘옛날’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며, ‘지금’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어렴풋한 본체體인 도道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흩어져 ‘셋’을 이루기 때문이다.”
第一, 明不一而一, 散一爲三.
첫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어렴풋한 본체體인 도道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흩어져 ‘셋’을 이루기 때문이다.”
視之不見名曰夷.
보아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름 지어 부른다. “잠잠한 바.”
夷, 平也. 言至道, 微妙. 體, 非五色. 不可以眼識求. 故視之不見. 若其有色, 色則參差. 只爲無色. 故夷. 然平等也.
“이夷”는 (일부러 일삼음이) 잠잠하다는 뜻이다.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는 (그 일삼음이)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하다. (비유컨대, 도道는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한) 본체體로서 (일부러 일삼은) 오색과 다르다. (따라서 오색처럼) 눈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거나 (뚜렷하게)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보아도 볼 수 없다”라고 일컬은 것이다. (또한) 만약 (본체體로서의) 도道가 (어떠한) 색깔을 가지게 된다면, (작용用으로서의 도道는 그) 색깔이 (한없이) 나뉘고 갈리게 된다. 따라서 (도道는 어떠한) 색깔도 (가짐이) 없음을 일삼는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음이) 잠잠한 바”라고 일컬은 것이다. 요컨대,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잠잠하고 잠잠하다.
聽之不聞名曰希.
들어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이름 지어 부른다. “투박한 바.”
希, 簡少也. 體, 非宮商. 不可耳以根聽. 故曰希也.
“희希”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이’) 투박하다는 뜻이다. (도道는) 본체體로서, (그 내는 소리의 모습은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소리의 모습인) 궁宮이나 상商과 다르다. (따라서) 귀가 (또렷하게) 들음의 뿌리로 삼거나 (그) 내는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일컬었다. “(일부러 일삼음이 ‘없이’) 투박한 바.”
摶之不得名曰微.
만져도 만질 수 없다. (따라서) 이름 지어 부른다. “어렴풋한 바.”
摶, 觸也. 微, 玄也. 言體, 非形質. 不可摶觸而得. 故曰, 微也. 又臧公, 三一解曰, 夫言希夷微者, 謂精神氣也. 精者, 靈智之名. 神者, 不測之用. 氣者, 形相之目. 總此三法, 爲一, 聖人. 不見, 是精. 不聞, 是神. 不得, 是氣. 旣不見不聞不得, 卽應云無色無聲無形, 何爲乃言希夷微耶? 明至道雖言無色, 不遂絶無. 若絶無者, 遂同太虛, 卽成斷見. 今明不色而色, 不聲而聲, 不形而形. 故云夷希微也. 所謂三一者也.
“단摶”은 만진다는 뜻이다. “미微”는 어렴풋하다는 뜻이다. (도道는) 본체體로서 (만질 수 있는) 형태나 성질을 가진 바와 다르다. (따라서) 만지거나 (만져서 형태나 성질을) 알아차릴 수 없다. 따라서 일컬었다. “어렴풋한 바.” 따라서 장공臧公의 『삼일해三一解』는 일컬었다. “희希, 이夷, 미微는 정精, 신神, 기氣를 가리킨다.” “(비유컨대) 정精은 (보통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한 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며, 신神은 (보통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을 가진 사람이다. 기氣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저절로 그러한) 형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요컨대, 이 세 가지 모습은 ‘하나’를 일삼는데, (그것은) 성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볼 수는 바, 그것은 (성인의) 정精이기 때문이다. 들을 수 없는 바, 그것은 (성인의) 신神이기 때문이다. 만질 수 없는 바, 그것이 (성인의) 기氣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볼 수 없는 바, 들을 수 없는 바, 만질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색깔이 없는 바, 소리가 없는 바, 형태가 없는 바라고 일컬어야 했는데, 어째서 “희希, 이夷, 미微”라고 일컬었는가? (그것은 본체體로서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가 색깔이 없는 바로 일컬어지더라도 (그러한 일컬음은 도道가 색깔) 자체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만약, (그러한 일컬음이 도道가 색깔) 자체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도道를 실상이 아닌) 태허太虛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비유컨대, (도道는 일부러 일삼은 바로서의) 색깔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바로서의) 색깔이고, (일부러 일삼은 바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바로서의) 소리이며, (일부러 일삼은 바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바로서의) 형태이다. 따라서 일컬었다. “희希, 이夷, 미微.” (이것이) 이른바 (장공臧公이 설명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만질 수 없는 도道의) “세 가지 모습이 하나로 일삼아진 (성인의) 모습”이다.
第二, 明不三而三, 混三歸一.
두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세 가지는) ‘셋’이 아니면서 ‘셋’인데, ‘셋’이 어우러지고 아우러져서 ‘하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此三者不可致詰, 故混而爲一.
이 셋은 알아차리거나 따져 밝힐 수 있는 바가 아닌데, (다시 말해 도道는 알아차리거나 따져 밝힐 수 없는데, 도道는 이 셋이) 어우러지고 아우러진 바이면서 하나된 바이기 때문이다.
三者, 卽夷希微也. 致, 得也. 詰, 責也. 混, 合也. 眞. 而應. 卽散一, 而爲三. 應. 而眞. 卽混三, 而歸一. 一三, 三一. 不一, 不異. 故不可致詰也. 又解, 此眞應兩身. 作三乘義釋. 具在開題義中.
“삼三”은 “이夷”, “희希”, “미微”을 뜻한다. “득得”은 (또렷하게)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힐詰”은 (뚜렷하게) 따지거나 밝힌다는 뜻이다. “혼混”은 어우러지거나 아우러진다는 뜻이다. (도道는 본체體이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음이 없다. 따라서) 참되다. (그러나 참되다는 말은 일삼음 자체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과) 어우러지고 아우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인) “하나”가 흩어진 것이 (“이夷”, “희希”, “미微”의) “셋”이다. (다시 말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과) 어우러지고 아우러진다. 왜냐하면, 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夷”, “희希”, “미微”의) “셋”이 “어우러지고 아우러지면”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인) “하나”로 되돌아가게 된다. (요컨대, 도道가 일삼는 모습은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잠잠함, 투박함, 어렴풋함이 어우러지고 아우러진) “하나”이면서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잠잠함, 투박함, 어렴풋함으로 흩어진) “셋”(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도道가 일삼는 모습은 “셋”으로서의) “하나”이면서 (“셋”과) 다르지 않(은 “하나”이)다. 따라서 “알아차리거나 따져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삼三”은 진신眞身과 응신應身으로 해석된다. (불교의 경전에는) 삼승(三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과 (삼신三身의) 의미와 해석이 실려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쓴) 『개제서결의開題序訣義』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第三, 明道非遇智, 妙絶名言.
세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눈, 귀, 손으로) 만나거나 (봄, 들음, 만짐으로) 알아차려지는 바가 아닌데, (본체體로서 참된 도道는) 어렴풋한 바로서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른) 이름이나 (문자와) 언어(로 상징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其上不皦, 其下不昧.
그 위가 밝지 않고, 그 아래가 어둡지 않은 바.
皦, 明也. 昧, 暗也. 言至道, 幽微. 非遇, 非智. 昇三淸之上, 不益其明. 墜九幽之下, 不加其闇. 所謂不增不滅, 其在玆乎!
“교皦”는 밝다는 뜻이다. “매昧”는 어둡다는 뜻이다.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는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하다. (따라서 눈, 귀, 손으로써) 만나지 못하고, (봄, 들음, 만짐으로써) 알아차리지 못한다. (비유컨대, 삼천三天의) 삼청경三淸境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것은 밝지가 않다. 구유九幽 아래에 내려간 것처럼 그것은 어둡지 않다. 이른바, (밝음과 어둠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음’,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함) 이것은 그곳에 자리한다!
繩繩不可名
바르고 곧아서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바
繩繩, 正直也. 猶繩墨之義也. 言聖人, 旣能自正, 後能正他. 故云繩繩. 不可執名求理. 故不可名也. 又解, 繩繩, 運動之貌也. 言至道, 運轉天地. 陶鑄生靈. 而視聽, 莫尋. 故不可名也.
“승승繩繩”은 바르고 곧다는 뜻이다. 비유컨대, (바르고 곧은) 먹줄을 뜻한다. 말하자면, 성인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다음에 타인을 바르게 한다. 따라서 일컬었다. “바르고 곧다.” (그런데 성인은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른) 이름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름 지어 불릴 수 있는) 이치를 (일부러 일삼아) 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인의 일삼는 모습을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승승繩繩”은 (도道가) 일삼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하고, 만물을 살아가게 한다. 그런데 눈이나 귀의) 봄이나 들음은 (그러한 도道의 일삼는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復歸於無物.
만물됨이 없음으로 되돌아간 바.
復歸者, 還源也. 無物者, 妙本也. 夫應機降迹, 卽可視可聞. 復本歸根, 卽無名無相. 故言復歸於無物也.
“복귀復歸”는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무물無物”은 어렴풋한 본체를 뜻한다. 이른바, 기미와 어우러지고 일부러 일삼음과 아우러진 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과 근원으로 되돌아간 것은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고, (보고 들을) 모습이 없다. 따라서 일컬었다. “만물됨이 없음으로 되돌아간 바.”
第四, 明體, 非色聲. 而無方應物.
네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본체體로서 (일부러 일삼은) 색깔과 소리와 다르다. (일부러 일삼은) 모습이 없이 만물과 어우러지고 아우러지는 바이기 때문이다.”
是無狀之狀, 無物之狀.
그것은 (일부러 일삼음의) 모습 없는 모습이며,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만물됨 없는 모습이다.
狀, 貌. 形象. 妙本, 希夷. 故稱無狀無物. 迹能生化. 故云之狀之象.
“상狀”은 모습을 뜻한다. (다시 말해, “상狀”은) 형태와 상태를 포괄한다. (도道는) 어렴풋한 본체本로서 (일부러 일삼음이) “잠잠하고”, “투박하다.” 따라서 일컬었다. “(일부러 일삼음의) 모습이 없고, 만물됨이 없다.” (그러나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것이지, 일삼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도道의 일삼음의) 흔적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 따라서 일컬었다. “그것은 (일삼음의) 모습이고, 그것은 (일삼음의) 형태(이며, 상태)이다.”
是謂惚恍.
그것은 모습을 규정할 수 없다.
惚恍, 不定貌也. 妙本, 非有. 應迹, 非無. 非有, 非無. 而無, 而有. 有無不定. 故言惚恍.
“홀황惚恍”은 (일삼음의) 모습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道는) 어렴풋한 본체本로서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도道는 만물의 생겨남이나 자라남과) 어우러지고 아우러지는 (일삼음의) 흔적을 가지는 바로서 (일삼음 자체가) ‘없는 바’도 아니다. (다시 말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바’도 아니고, (일삼음 자체가) ‘없는 바’도 아니다. (다시 말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바’이자, (일부러 일삼음의 없음이)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과 (일삼음 자체가) ‘없음’은 (도道의 일삼는 모습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일컬었다. “(일삼음의) 모습을 규정할 수 없다.”
第五, 明非無非有, 不古不今.
다섯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는 일삼음 자체가) 없는 바도 아니며,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바도 아닌데, (따라서 만물이 ‘옛날’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며, ‘지금’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듯이, 도道 역시) ‘옛날’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며, ‘지금’에만 머무는 바도 아니다.”
迎不見其首.
맞이하려 하지만, 그 머리를 볼 수가 없다.
明道非古, 無始也.
도道가 ‘옛날’에만 머무는 바가 아닌 까닭은 (만물이 ‘시작점’이 없듯이, 도道 역시) ‘시작점’이 없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隨不見其後.
뒤따르려 하지만, 그 꼬리를 볼 수가 없다.
明道非今, 無終也.
도道가 ‘지금’에만 머무르는 바가 아닌 까닭은 (만물이 ‘끝점’이 없듯이, 도道 역시) ‘끝점’이 없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第六, 明不一而一, 散一爲三.
여섯 번째 문단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어렴풋한 본체體인 도道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흩어져 ‘셋’을 이루기 때문이다.”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따라서 성인은) ‘옛날’의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도道를 근본으로 삼아서 ‘지금’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다스린다.
執, 持也. 言聖人之太古無名之道, 調御今之有生也.
“집執”은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성인은 아주 먼 ‘옛날’의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는 도道를 근본으로 삼아, ‘지금’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나 생겨남을 바로잡거나 다스린다는 것이다.
能知古始, 是謂道紀.
옛날의 시작점(인 도道를) 알아차리고 써(서 ‘지금’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른바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를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다.
古始, 卽無名之道也. 若知無始無終, 而終而始, 不今不古, 而古而今, 用斯古道, 以御今世者, 可謂至道之網紀也.
“옛날의 시작점古始”이란 이른바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는 도道를 뜻한다. 만약, (도道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지만, (만물은) 끝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작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도道는) ‘지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지만, (만물은) ‘옛날’에만 머무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에만 머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옛날’의 (시작점인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는, 다시 말해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도道를 써서, ‘지금’의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있는, 다시 말해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른 도道를 근본으로 삼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