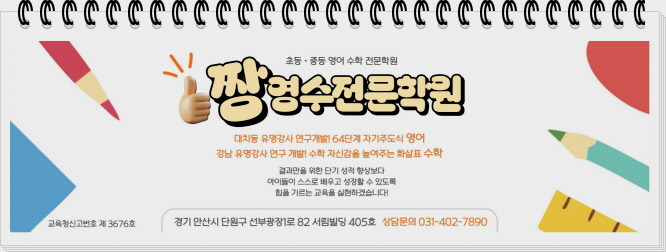“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오늘도 아이 밥은 챙겼는데
내 밥은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로 “나중에”라는 말은
늘 나에게 먼저 옵니다.
몸이 아파서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데
아이 밥그릇부터 식탁에 올려놓고
국물만 몇 모금 마시고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한테 치이고
일에 치여 ‘그냥 어디든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아이 숙제를 봐야 하는 저녁도 있습니다.
눈은 감기고 머리는 멍한데
“엄마, 책 읽어줘” 한마디에 소파에 눕지도 못하고
다시 불을 켜는 밤.
아이 체온이 조금만 높아도
내 몸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약부터 찾게 되는 순간.
내 하루는 아무도 묻지 않는데
아이 하루는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야
화장실 문 닫고 비로소 숨을 한 번 쉽니다.
이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책임인지
가끔은 헷갈립니다.
부모라는 건, 그리고 엄마라는 건.
대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 앞에서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 같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무 책임지려고 자기부터 닳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하루인데도 말이죠.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과로 남지 않아도 의미로는 남는 하루.
오늘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인간적인 어른의 하루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