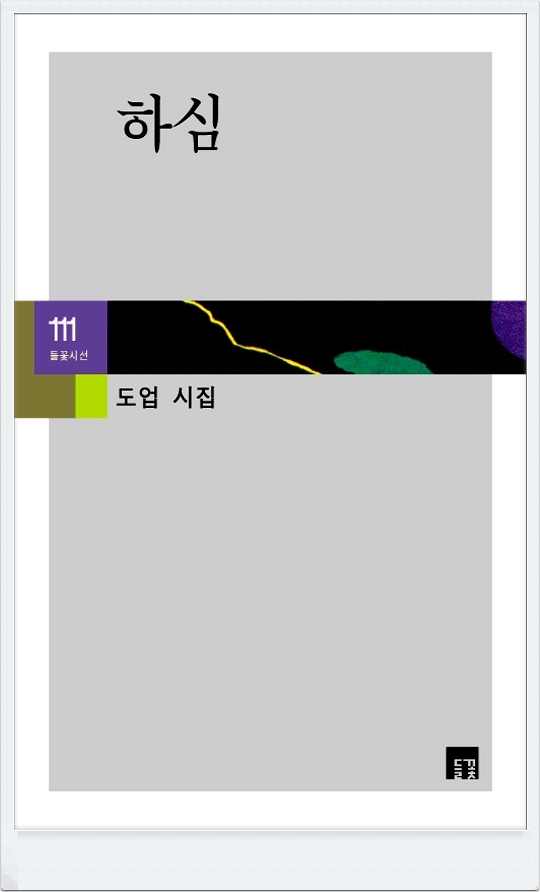도업 시집
하심下心
_시집 개요
제목: 하심
지은이: 도업
작품 수: 73편
면수: 156면
출판사: 도서출판 들꽃
自序
어제는 종일토록 새하얀 눈이 내렸다. 그 눈은 새벽까지 이어져 급기야 바람까지 동반하고 이 지상을, 시리도록 차가운 한 겨울 밤을 하얀 눈의 나라로 만들어 놓아 버렸다. 우주는 어느덧 눈 그친 새벽하늘 아래로 설경이 만발한 한 폭의 동양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섣달그믐 달이 조명으로 환히 비추고 있다. 나는 그 웅대한 장관에 그만 얼어붙어버렸다. 그러나 눈에 덮인 삼라만상은 내시선과 寒雪에 아랑곳 않고 다소곳 앉아,
겹겹쌓인 하얀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뭇 생명의 노래 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며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현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에서 은밀한 예지의 빛, 초월적 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건 아닐까? 바른 출가로 이끌어주시고 항상 출가수행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노스님과 은사스님! 고맙습니다. 또한 이 몸의 생장점인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편 한편의 시(詩)가 탄생하게끔 영감을 준 삼라만상의 우주와 유정(有情)무정(無情)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도업스님의 자서 중에서
1. 도업스님 시에 대하여- 유한근 문학평론가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시학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을 버려라 한다. 특히 선(禪)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방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으로 직지인심(直持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禪心)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호체계의 상징성과 비유성을 차용하여 선시(禪詩)만을 인정할 뿐 문학 그 자체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선시는 본질적으로 문학을 배제하면서 고도로 절제되고 압축된 상징, 비유시로서 혹은 깨달음의 詩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문자를, 오도송을 일갈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詩)를 논함은 선(禪)을 논함 같이 선도(禪道)는 묘오(妙悟)에 있고 詩도 또한 묘오에 있다”는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시학은 우리 동양시학의 전형이다. 시와 선의 바탕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발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문학론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나 시(詩)가 인간의 사고 체계나 사상체계에 의해서 표출되기보다는 직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비롯됨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하고 도업 스님의 시(詩)를 문학적 입장에서 일별하여 그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설 혹은 그 세계를 탐색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 시집의 맨 처음 자리에 있는 시 <겨울 환절기>를 보겠다.
세월의 길 위에
적송 한 그루 심어 놓았더니
해와 별, 벗 삼을 줄 몰랐더이다.
헐벗은 바람 눈꽃 떨구고
겨울나무 사이로 발버둥 칠 줄
그땐 몰랐더이다.
구름 꺾여 묶인 자리
돌아볼 생각도 없이
시린 지저귐으로 노래할 줄
나는 몰랐더이다.
슬픈 대로 휘몰리는 바람
잿빛구름 장막에 가려진 하얀 햇살
뜨거운 손 버거워 할 줄
미처 몰랐더이다.
형상 잃은 그 세월
이제 다소곳 내려앉아
겨울비에 스스로 묻힐거외다.
-시 <겨울환절기> 전문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인 시인은 ‘나’이지만, 위의 시에서는 ‘적송 한 그루’를 시인 자신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자기화, 즉 ‘적송’을 시인 자신으로 은유하여 쓴 시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해와 별을 벗 삼는 적송, 겨울나무 사이에서 벌거벗은 나무, “구름 꺾여 묶인 자리/돌아볼 생각도 없이” 시리게 노래하는 나무, 슬픔에 춥게 뜨거운 손 버거워하는 나무 ․ 형상 잃은 세월, 겨울비에 스스로 몸을 묻는 나무 등, 나무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 자신은 겨울나무와도 같다는 인식,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시 <겨울 환절기>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시인의 내면적 모습은 비극적이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다. 불교는 비언어적 마음을 바탕으로 성취된다. 본체는 언어 이전의 것이며 비언어적인 것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선(禪)은 비언어화의 시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학, 시(詩)는 언어화를 통한 침묵의 깨우침, 언어화 과정을 통한 비언어화 상태의 심적인 깨달음에 이르려 한다. 시(詩), 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며 깨달음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와 시(詩)는 정체성과 동질성을 갖는다. 깨달음의 공간이 불교(佛敎)와 시(詩)가 가닿으려는 궁극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佛敎)와 시(詩)는 하나다. 선(禪)과 시(詩)를 하나의 공간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스님 시인이다. 특히, 우리가 승려시인의 시(詩)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승려시인이 여타의 시인과는 특별하듯, 도업 스님의 시(詩)는 참신하고 열린 감각과 첨예한 직관과 예단, 그리고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한국시의 은유 구조와 상징체계로 새 지평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 유한근 문학평론가의 작품해설 중에서
2. 도업스님 시에 대하여- 김호성 교수
도업(道業) 스님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이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떠올렸다. 물론 이 시인의 경우를 푸네스의 경우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단순한 기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푸네스가 명민한 기억으로 어제 일을 다 기억해냈다고 한다면, 시인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온전히 깨어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달마대사와 같이 두 눈 부릅뜨고, 24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24시간의 시간들을 찰나찰나 멈춰 세워놓고, 한 찰나 한 찰나를 예리한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이 말이다. 마치 치즈의 슬라이스처럼, 시인 안에서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절단(切斷)되어 있다.
그의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단면도(斷面圖)이다. 제1부와 제2부에 아름다운 시들이 집중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부의 제목은 겨울 환절기이고, 제2부의 제목은 사계이다. 모두 시간을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는 시 역시 적지 않다. 몇 가지 사례만 찾아보기로 하자.
서늘한 가을날
어둠의 입이 황혼의 엷은
빛을 삼킬 때에
나는 시름없이 문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내를 따라 굽이 친
모랫길이 어둠의 품에 안겨서
사라진 자취를 남기고
게으른 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네모진 작은 못의 연잎 위에
발자취 소리를 내는
실없는 바람이 나를 조롱할 때
아득한 생각의 벼랑 끝에서
지금도 이제나 저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 「백일홍」 전문
여기서 우리는 만해가 『님의 침묵』에서 토해놓은 목소리가 겹쳐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무상을 자각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럿인데, ‘님’을 찾는 길로 나아가는 방향 역시 그 중 하나다. 불교사상 안에서는 바로 죽음을 가장 강렬하게 의식하는 정토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아미타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구도자는 여성의 목소리로 ‘님’을 노래할 수 있다. 님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물론, 「백일홍」에서 시인이 말하는 ‘당신’이 반드시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아미타불을 향해 나아가는 정토신앙과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죽음을 예리하게 의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님’을 노래할 때 ‘여성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자 할 뿐인 것이다.
이제 시인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찾아서 노래를 계속해 갈지 궁금하다. 그것은 또 다른 시집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시인이 시간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그 시간의 무상이 낳은 자연이나 인생사의 변화를 해설하고 증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상 속에서, 바로 그렇기에 무상을 초극(超克)하는 성숙과 희망의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는 점, 무상하기에 더욱더 ‘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시인은 시간의 해석학자(解釋學者)이면서, 무상의 미학자(美學者)로 등극하였다. 철학이 자기철학이어야 하는 것처럼 시 역시 자기시(自己詩)여야 한다면, 시인 도업스님은 자기시를 쓴 시인, 또한 시쓰기를 통하여 구도의 길을 걸어간 시인이라 말해서 좋을 것이다.
-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작품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