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대인의 무기력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소설이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삶의 지혜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그저 이야기 줄거리로만 읽으면 잠깐의 시간이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기에는 이 소설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는 결정을 하고 더러는 그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한다. 물론 그보다 많은 것들은 결정도 없이 그저 흘려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리라. 그럴 때쯤 드는 생각이 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누구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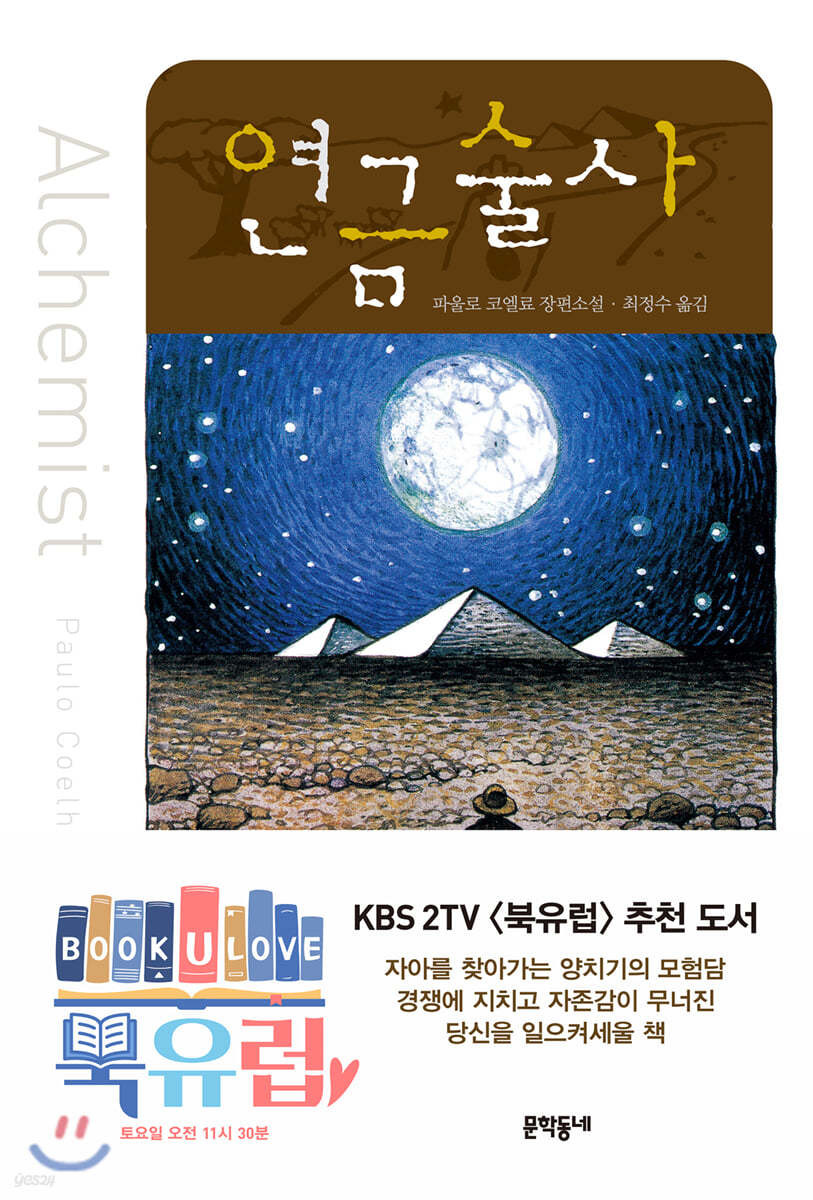
그게 아니라면 결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힌트 같은 것이라도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연금술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어떤 일 주변에는 늘 표지로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운다. 다만 우리는 그 표지를 읽어낼 혜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온통 나의 잘못을 부인한다. 그러한 부인의 근저에는 바쁘다는 핑계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꽃은 아무리 바빠도 제때에 피어난다. 꽃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그 바쁘다는 핑계가 ‘우주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표지’를 봐도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그런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통렬히 질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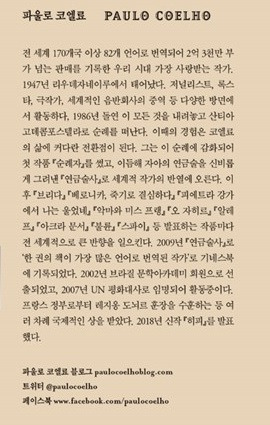
삶의 목표를 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여타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고도의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보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목적의식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소설에서는 ‘보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인공 산티아고로 하여금 에둘러 ‘자아의 신화’를 좇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보다 충실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소설의 핵심 키워드
이 소설 속에는 소설을 구성하는 몇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 연금술, 표지, 자아의 신화, 철학자의 돌, 불로장생 약, 위대한 업, 우주의 언어 등이다. 저자의 후기에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연금술에 심취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시절 동화 속에서나 보던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서도 심취해 있어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역시 소설가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는 모양이다. 저자는 그 중에서 ‘불로장생’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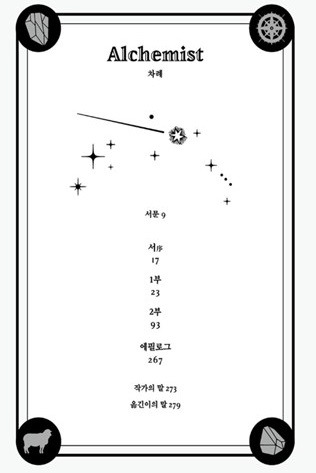
저자는 연금술을 배우면서 ‘상징의 언어란 만물의 정기, 또는 구스타프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소설은 온갖 상징으로 가득해서 두께가 두껍지도 않지만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그 중 이야기를 끌어가는 키워드는 자아의 신화인데, 우리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을 말한다. 우리가 늘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이루는 경우란 그리 흔치 않다. 쉽게 잊어버리거나 좌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꿈의 희미하게 그려졌다는 의미일 것이고, 좌절한다는 것은 목표가 흔들리거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그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주의 언어’로 그것을 일깨워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언어를 읽어내지 못하니 당연히 주변 어딘가에 있을 ‘표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저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말로 구실을 삼지만 바로 그 점을 저자가 강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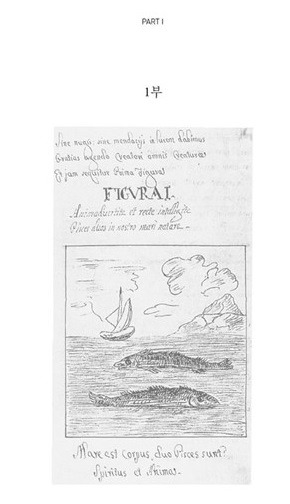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으로 내몰리고 마침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소망 자체를 잊고 산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30쪽)
다.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
소설은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보물을 찾아 먼 여정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초행길이었지만 그는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어떤 표지가 그의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수중의 돈을 다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페인에서 탕헤르(나는 모로코를 여행할 때 탕헤르에 하루를 머문 적이 있다)에 도착하기 무섭게 그는 수중의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 하는 수 없이 크리스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행경비를 마련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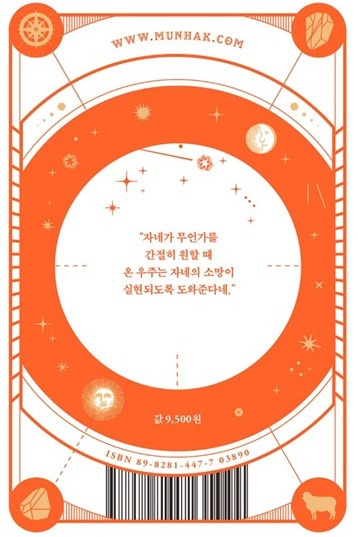
마침내 돈이 모이자 그는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 틈에 끼여 본격적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막 여행을 시작했다. 대상들 틈에 낀 일행 중에는 영국인도 있었다. 그는 연금술을 배우기 위해 사막에 살고 있다는 연금술사를 찾아 길을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오아시스에 이르러서도 연금술사를 찾지 못하자 그는 여행을 포기했다. 그 즈음에 사막의 연금술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산티아고가 피라미드에 도착할 때까지 그와 여행을 동행한다. 그 덕분에 몇 번의 어려운 고비도 무사히 넘겼다.
연금술사를 통해 ‘우주의 언어’에도 차츰 익숙해졌고 마침내 사막과 바람과 태양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와 세상 만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다만 인간만이 독자적 의식의 발달로 그로부터 이탈했을 뿐이다.
‘우주의 언어’는 사실 삼라만상과의 교감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대 문명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사막을 지나면서 몇 번의 위험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모두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언제나 그를 든든히 지켜주고 길을 밝혀주는 연금술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연금술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가 보이는 모래언덕에 도착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자아의 신화를 믿게 되고, 늙은 왕, 크리스털 상인, 영국인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났음을 신께 감사했다.
그는 격한 감정에 울음을 터뜨렸고, 그 눈물이 사막을 적셨다. 그리고 그곳으로 풍뎅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그는 그것이 표지라고 여겼고, 그 자리를 파냈다. 모래는 흘러내려 다시 파내기를 거듭했지만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군인 한 무리가 와서 그의 금을 빼앗아 갔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가면서 산티아고에게 자신도 이년 전 여기서 구덩이를 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산티아고가 이곳까지 오는 여정과 꼭 반대로 그도 꿈을 따라 여행을 했고 낡은 교회의 무화과나무 아래를 팠다고 했다.
그리고 보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했다. 산티아고는 비로소 깨달았다. 산티아고는 고개를 들어 피라미드를 바라보았다. 허상의 정점이었을 것이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보물을 찾아 여기에 이르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허상이었다.
그는 다시 안달루시아의 평원으로 돌아왔고 낡은 교회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물을 발견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늘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내 곁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먼 곳을 헤맨다.

라. 어린 왕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동화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이 책 ‘연금술사’로 2009년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변역된 작가’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이 책에 매료되었다는 말이다. 이 소설은 다소 주술적이다. 헤리포터의 모험 이야기 같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다소 몽환적이라 어린 왕자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지구에 와서 불시착한 비행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지만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거기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주옥같은 글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연금술사’는 청년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짧은 이야기지만 쉽게 책장이 넘겨지지 않는다. 이야기 속에 수도 없는 은유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수도 없이 내 삶을 반추하게 하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보물섬 같은 류의 모험동화나 소설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읽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야말로 또 한편의 어른 동화 같은 소설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단순화시켜 살아가는 주인공 속에서 언뜻 ‘자연인’을 연상케 하기도 해서 또한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