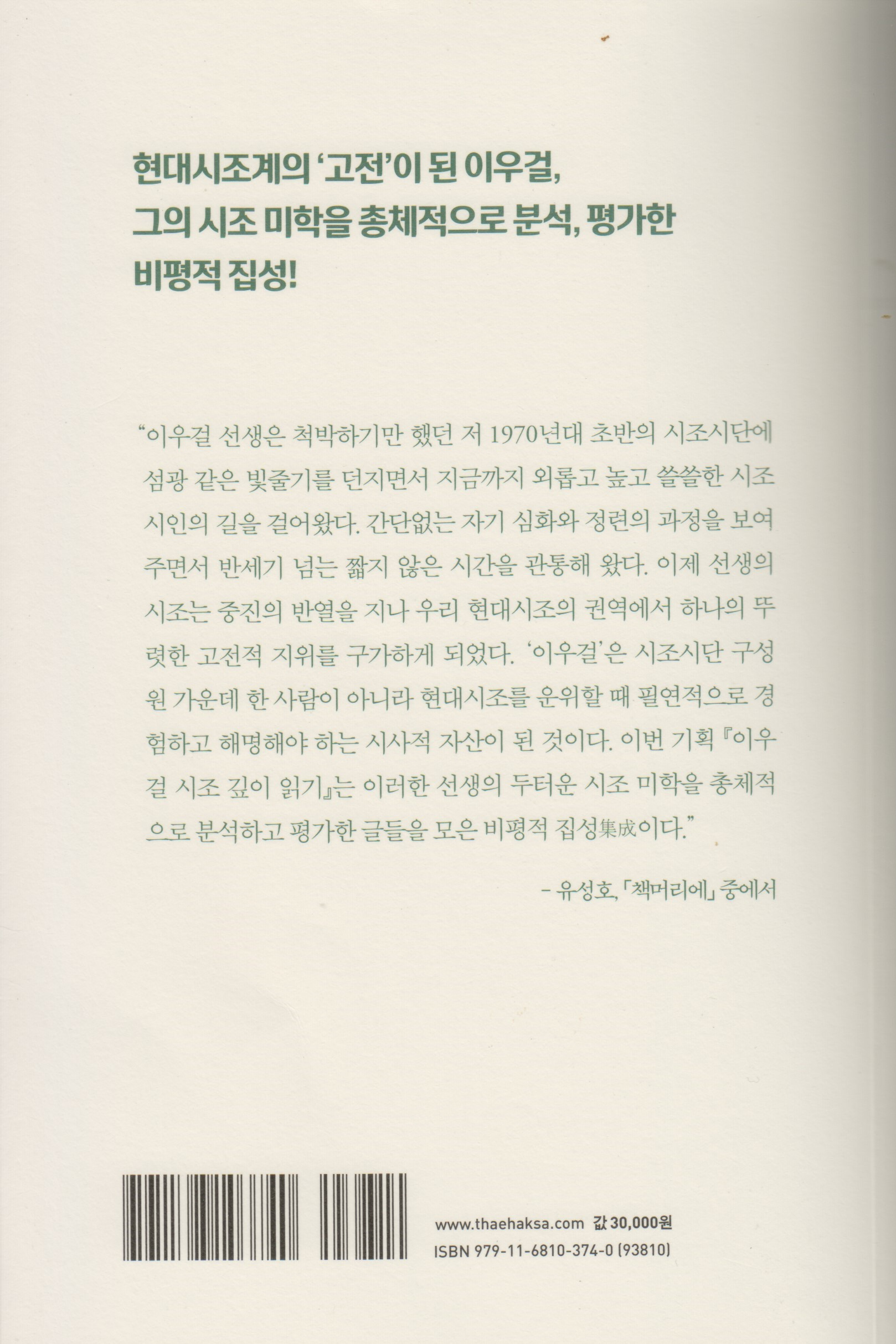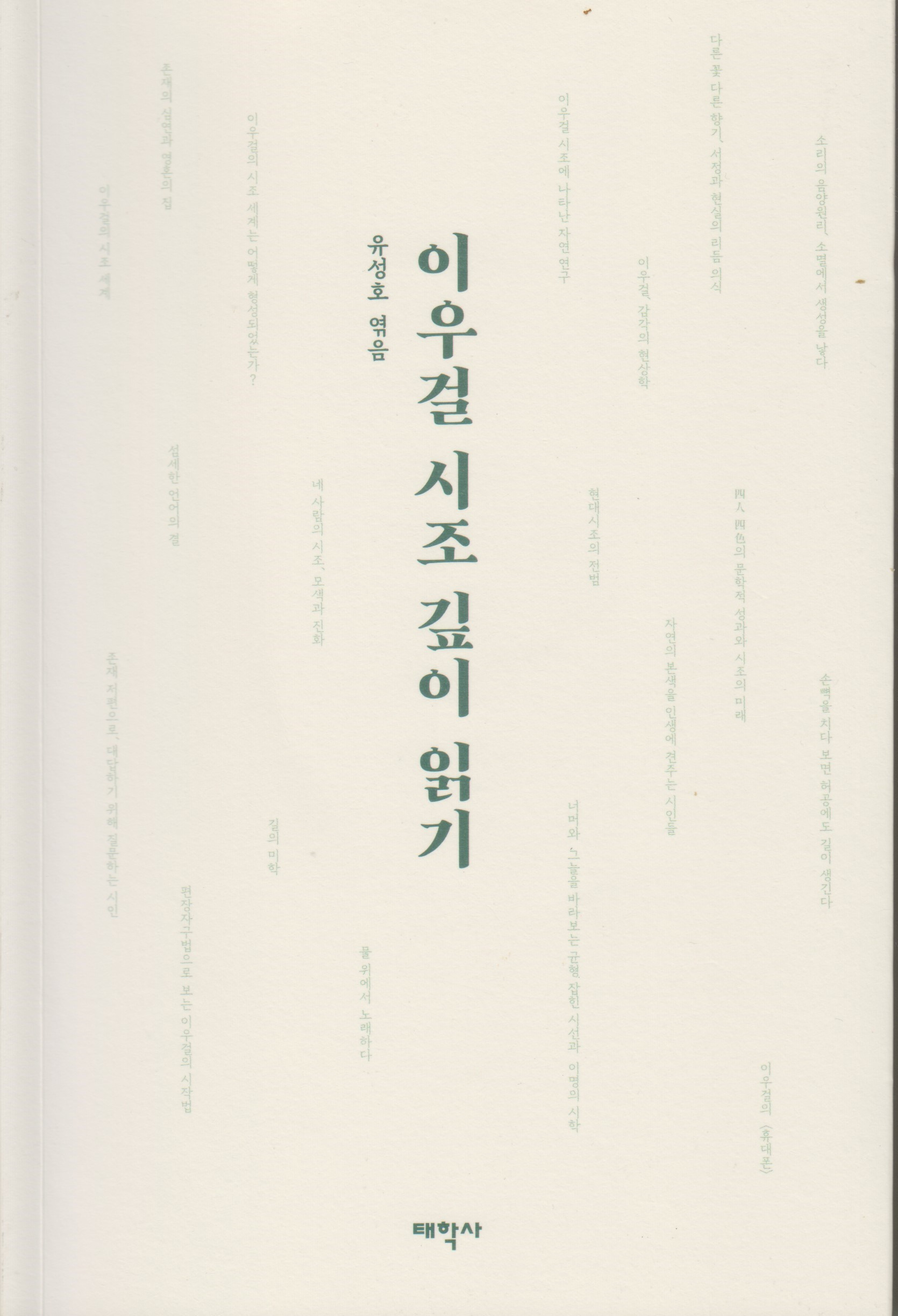
자연의 본색을 인생에 견주는 시인들
- 이우걸 시조집『이명』
유종인
부조리한 징후에 대한 응시와 창조적 예감이 갈마드는 시조집『이명』은 생의 낙수落穗를 소슬히 집어 드는 시인의 애수가 은은하게 번져 '봄비'처럼 젖어 든다. 시인에게 『이명』은 별세계와 기존세계의 격절과 습합習合을 동시적으로 환기하는 일종의 다향성多響性의 조짐으로 울린다.
이우걸 시인이 "내 작품의 수공업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나의 「노트북 시대」)라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시인에게 수공업 시대는 고답古踏의 것이 아니라 존재의 순명順命과 척을 지지 않는 자연의 일부였다는 자각을 똥기어 주기에 저주함이 없다. 더군다나 관습적이고 재래적인 의미의 ‘수공업’에의 종언終焉은 실상 화자에게 새로운 인생론적인 전환과 시적 전망을 유도하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전언의 뉘앙스도 서렸다.
자연과 문명의 가치를 대척적인 것으로 놓고 보던 편협한 시각과는 별개로 시인의 자연은 자신의 인생 전반을 그윽하고 늡늡하게 관류貫流하는 실존의 유의미한 매개이자 의미망意味網으로 늘 곁을 주는 대상이자 아우라(aura)이다. 회고하듯 여기에 합류하고 작금의 심신을 드리우던 실제와 인식의 매개인 자연은, 그대로 시인이 그간의 자신의 인생 편력을 조망하는 흐름(stream)의 관점으로서의 풍물화된 자연을 도법道法하듯 현시한다.
사변을 만나고, 기아에 허덕이고, 독재를 만나고, 시위에 휩싸이고
내 생이 스친 역들은
늘 그런 화염이었다
그러다 돌아보니 내가 안보였다
다른 짐은 그대로인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맞은편 신호등 앞에
한 노인이 서있었다.
-「자화상」부분
삶과 시대의 도처에서 만난 불가피함들의 실체와 거기에 반응하는 실존의 에스프리(esprit)와 멜랑콜리는 이우걸의 「자화상」에 ‘화염’의 잔영처럼 드리워져 소슬하다. 이 잔영殘影은 단순한 반영의 여줄가리를 넘어 시인이 살았고 또 살아갈 인생이라는 자연은 현시하는 시詩의 인드라망(indra’s Net)으로 이번 시집 도처에 소슬한 찬란과 늠연한 여수旅愁처럼 번져 있다. 아늑함과 분명함이 하나로 어울리고 “스친 역” 같은 지난 삶의 과정이 당장의 "신호등 앞에" 마주 "서 있"음처럼 교감하는 지점에서 시인의 자연은 경과經過와 도래到來가 한통속이 되는 자연의 동시성同時性을 시조로 진설한다. 이 여여如如함은 인생이라는 통속을 자연의 속성으로 갈마들고 환치해 보여 주는 시인의 혜안을 통해 수수하면서도 끌밋하게 시조적 율격을 탄다.
울음은 울어서 그 울음을 이기려는 것
그래서 얼마쯤을 울고 나면 잦아지지만
새벽이 지났는데도 그칠 줄을 모르네
-「귀뚜라미 바다」부분
시인의 '울음'은 언뜻 내재적이고 '이명耳鳴'은 외재적外在的인 성격을 띠지만 이는 도식적인 분별이고 실상은 그 안팎이나 표리의 관계를 넘어서는 지점에 실존의 우수憂愁가 오히려 낭랑해진다. 즉 “울음은 울어서 그 울음을 이기려는” 행위처럼 귀울음인 이명도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을 망라하는 실존적인 현황 그 자체를 돌올하게 하는 시의 부표(buoy)로서의 표지標識인 셈이다. 이런 "신음소리를 닮"은 여인들의 울음은 자연의 숨탄것인 '귀뚜라미'의 울음과 비등해지고 그걸 통해 자연과 인간과 풍물이 하나의 시적 율조律調 속에 비등해지는 경지가 시인에게는 실존의 근황이지 싶다. 이런 시인의 현재는 '사방이 나만 눈 뜨면 / 늘 이렇게 소랍스럽다"(「물」)는 인상적이고 적실한 언술 속에 시의 일상은 새삼 살만하게 출렁인다. 이렇듯 "물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물이 불이고 불이 죽음이라는" 일상적 깨달음은 노담老聃의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고담高談이 아니더라도 늘 시인의 정신을 똥기는 방편이다. 시적 촉수를 귀뚜라미처럼 성인의 귀처럼 그윽이 늘여도 현실의 시인은
설은 밥알 같은, 떫은 풋감 같은
그런 과거사를 귀는 알고 있다
그것이 울음이 되어
스스로를 닫으려 한다
ㅡ「이명4」부분
부재하는 그러나 실상처럼 공명하는 "울음이 되어" "스스로를 닫으려"는 고통과 은연중에 자폐적인 현실이 되기도 한다. 이는 '귀는 알고 있다'라는 말을 귀는 앓고 있는 것으로 중첩되게 인식하는 측면도 거느린다. 이런 귀울음의 전차前次들은 그러나 정서적 폐쇄병동의 장애물만이 아니라 시의 자연물(natural obict)로 자연스레 합성하는 계기를 추동한다. 곧 불민한 현실의 장애들은 시조의 울음과 울림으로 변주되는 시인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인생의 현황이자 여건이 된다.
병든 지구를 업은 하늘이 노랗다
밥새 뒤척여도 묘안이 없었을까
그중에 인간이 제일 해결 못 할 과제었을까
-「어느 날 아침」전문
그런 의미에서 관록과 시조적 연륜이 수승한 이우결 시인의 시조는 도통한 발언이 아니라 여전히 세사世事의 일상의 불편과 아픔과 풍물의 아름다움을 섬려纖麗하게 직시하는 현장의 정서적 역사적 발언이다. 거기에 더하여 모든 숨탄것들이 반목과 어울림을 반복하는 지구 땅 별의 오늘을 “묘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대승적大乘的인 고민의 목록을 거느렸다. 어쩌면 시인에게 시조란 “인간이 제일 해결 못 할 과제”라는 의문과 회의와 긍정 속에 시의 귀울음을 트는 아름다운 아픔, 아니 아픈 아름다움을 번져가는 “서로 얼굴을 / 비춰 보는”(「공감」) 세상의 중개자이다. 시인의 「이명」은 그 불민한 세상에 시조의 징검돌을 놓는 오래된 새로움의 습습한 정서와 그윽한 율려律呂의 도드라짐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