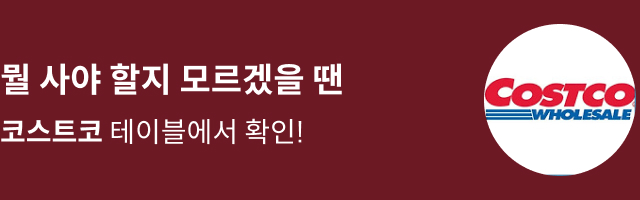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모란꽃>(구효서)
다이제스트: 권도윤
모란꽃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모란꽃은 펄 벅의 소설이다. 시골집에 그 책이 있었다. 교과서 외에 유일했던 책. 표지뿐 아니라 앞뒤로 서너 페이지쯤 뜯겨나간 책이었다. 방구석에ㅡ 아버지의 때전 목침과 함께 뒹굴던 것. 집은 좁고 식구는 많아 이리저리 발길에 채어 뜯기고 찢긴 거겠지. 딸 여섯, 아들 하나였으니.첫째 둘째 언니는 고향 섬을 떠나 가까운 순천에 살고, 나머지들은 모두 서울에 올라와 한 구(區)에 옹기중기 모여 있다. 나와 세 동생은 한집에 모여 칼국수를 끓여 먹었다.“아이 참, 그 책 제목, 말이야. 얼른.”“느린 주제에 성질만 급하긴......”첫째동생이 말했다.“난 몰라.”“책이 너무 좀 그래서.... 내가 표지도 새로 만들고 제목도 그럭저럭 예쁘게 써서 냈거든, 그래서 알아. 모란꽃이야.”둘째동생이 말했다.끝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들이 돌아가고 난 뒤였다.“그 책, 건넌방 아버지 목, 침 곁이나 시렁 위에 있, 곧 했잖아. 표지, 다 떨어진 거.”오빠는 응, 응,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그 방에 무슨 시렁이 있었냐? 시렁은 작은방에 있었어.”라고 말했다.“그 책 제목이 뭐, 였는지 아느냐니까 시렁은, 웬......”시렁 얘기가 책 때문에 나왔듯이, 책 얘기는 토주 때문에 나온 거였다.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시골집은 폐가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겨울 새 주인에게 팔렸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다. 기반공사를 해야 하니 토주를 치워 달랬다나. 공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치울 일이지 어째서 우리한테 치우라지? 하는 식구는 없었다. 겁났기 때문이다.시골집 장독대 곁의 그것. 물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닌 그걸 토주라 불렀다. 영락없는, 막힌 아궁이였다. 작은 아궁이 입구를 널판으로 막아놓은 것.아무도 그걸 열 수 없었다. 열기는커녕 건드리지도 못했다. 누가 만든 건지 아버지도 몰랐다. 언제 어째서 만들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함부로 손대거나 훼손하면 큰일난다는 게 무서웠을 뿐이다.아주 오래된 건 분명했다. 오래된 만큼. 잘못 건드리면 재앙도 클 것 같았다. 무언가가 그 안에, 수백 년 동안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토주를 업신여겨 화를 입었다는 얘기는, 다 모으면, 국가교과서보다 두꺼울 것이다. 수십수백 년 전 얘기부터 몇 년 며칠 전 얘기까지 망라되어 있으니까. 마을에 닥쳤던 모든 불행은 결국 토주때문이란 것. 어르신들의 그 어떤 당부나 호통보다 말없는 토주의 위력이 훨씬 셌다.되는 일이 없다고, 술 먹고 토주에 발길질 했던 재학이네 아버지는 수로에 빠져 죽었다. 장독대 갈 때마다 토주를 바라보며 시부렁거렸던 효숙이네 엄마는 육손이를 내리 둘이나 낳았다. 토주에 쌀뜨물을 잘못 끼얹어 시름시름 앓게 된 처녀이야기도 그렇고 마을에는 토주 때문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화장대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모란꽃. 빛바랜 청회색 하드커버. 표지엔 제목이 없었다. 딸애의 영어 과외선생한테 부탁해 구해 온 책이었다.시골집에 있던 책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면서, 화장대 위의 책이 낯설었다. 그 책이 아닐 수 없는데, 아닌 것만 같았다. 책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시렁은 무슨. 일거에 뭔가를, 본때 있게 평정해버려야겠다는 심사로 책을 주문할 걸까. 어쩌면 어떤 실체와 맞닥뜨리고 싶었을 것이다.지금까지 살아오며 내뱉은 푸념과 허텅지거리, 시샘과 원망 들의 썩은 물웅덩이였다. 일없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그치지도 않고, 뭐 하나 분명치도 않은 느낌과 경험 들이. 까닭 없이 오가는 바람처럼 배회하다 중얼거리며 가라앉은 티끌과 먼지들이었다.누군가가 토주를 치워야 한다면 내가 치우겠다고. 경희와 통화하던 중 나도 모르게 해버린 말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소문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기대나 호기심도 없었다. 가고 싶다,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예감도 욕구도 아닌, 이끌림 같은 거였을까.고향 섬을 찾을 때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건물들도 더 낮아졌다. 손을 뻗으면 석면 슬레이트 추녀에 닿았다.그러다 모란꽃을 보고 차를 멈추었다. 폐가 뒤뜰에 수북이 피어 있었다. 모란밭이라 할만 했다. 검푸른 잎이 무성했고 줄기는 굵고 거칠었다. 한눈에 보아도 그곳에서 백수십년을 피고 지고 자라고 뻗으며 얼크러진 것 같았다. 꽃밭을 처음 보다니. 나는 대체 무얼 보고 느끼며 자랐던가 새삼 아연해졌다.형제들마다 제목이며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는 책. 책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인 셈이었고, 내용을 조금씩 달리 알고 있다 해도 그것 모두 모란꽃이었다.무너진 집터 한쪽 끝에 토주가 있었다. 저게 그거였나 싶게 작고 초라했다. 지팡이만한 나무막대기를 주워 토주를 열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널판지는 그 안쪽에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그 별것 아닌 널빤지를 한 손에 들고,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닷바람을 한껏 들이켜고 천천히 내뱉었다. 널빤지는 제법 무거웠다.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내려놓았다.나는 이 얘길 쓰기로 했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글더미에 티끌과 먼지를 더하는, 또 한 번 무심한 짓의 반복일지라도. 이 속절없는 일에 당초부터 무슨 이유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않은가. 버릇처럼 숨처럼 그래온 것뿐이니까.Copyrightⓒ 유용선 All rights reserved.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