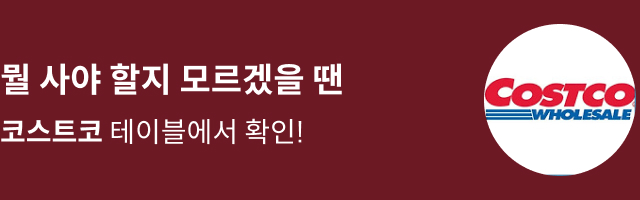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사랑을 믿다>(권여선)
다이제스트: 김지은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서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지난 2월 늦은 저녁이었다. 혼자 이 술집에 들른 나는 자리를 잡고 술을 시켰다. 그 후로 이 집은 단골 술집이 되었다.요즘 내가 기다리는 인물은 나는 남몰래 좋아하지만, 그쪽은 이제 나를 잊었을 한 여자이다.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의외로 손쉽게 여겨지는 때가 오기도 한다. 기막힌 건 그런 일이 또 찾아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사실이다. 대비할 수도 없다. 사랑을 믿는다는 해괴한 경험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니까.하지만 가장 기막힌 경우는 내가 그런 고통을 안겨 주고 유유히 빠져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녀의 사랑을.그녀는 암컷 영양처럼 우아하고 민첩하고 영리했고, 항상 아담하면서도 고독해 보이는 도자기의 윤곽선을 떠올리게 한다. 묘한 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삼 년 전 실연을 당했을 즈음의, 그녀를 삼 년 만에 만났을 때의, 삼 층짜리 건물에 얽힌,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이야기다.그녀는 예약해둔 술집까지 십오 분 가량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괜찮지?”나는 물론 괜찮다고 했다.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을 때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지난 주에 큰고모님께서 돌아가셨어.”내가 오, 그래? 하는데 그녀가 피식 웃었다.그녀가 안내한 술집은 몹시 좁고 기차처럼 길었다.“내 마음대로 시켰는데 괜찮지?”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실연당한 친구 덕에 이 집을 알게 됐지.”나는 실연의 유대만큼 아리따운 유대를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녀의 친구가 무척 가깝게 느껴졌다.친구는 다그치듯 물었다.“넌 그때 어땠어?”내 어리둥절한 표정에 그녀는 말했다.“내가 일 년 먼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머릿속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고작 “오, 그래?”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너는 그때 어떻게 했지?”“내 경우는 운이 좋았지.”그녀는 큰고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조르지 않았다면, 혹시 그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을 떠났을지 모른다는 망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큰고모님 댁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큰고모님 댁은 전체가 사 층 건물로 큰고모님 부부만이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 층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딸인 그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찬찬히 살펴두기를 바라고 있었다.직접 가보니 삼 층이었다. 철학관 간판을 달고 있는 옥탑방이 얹혀 있었는데 계산에 넣은 것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보따리를 끌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초인종 옆에 옥상 쪽 철학관을 표시하는 작고 빨간 플라스틱 딱지가 붙어있었다. 그녀는 열려 있는 문을 당겼다. 주름진 회색 커튼이 앞을 가로막았다. 회색 커튼을 젖히기 직전 그녀의 가슴속에 낯설고 두려운 느낌이 몰려왔다.왼편 소파에 웅크린 세 명이 여자가 노골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녀는 세 여자가 자신이 큰고모님을 방문한 의도해 대해 무슨 의도를 채고 그녀를 떠보는 게 아닐까, 어쩌면 상가 임대료나 사업상의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여자들 같은 생각도 들었다. 저의를 탐색하는 것 같아 그녀는 말을 아끼기로 했다.현관문이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큰고모부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볍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철학관 오셨으면 한 층 더 올라가시오.”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세 여자들을 따라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왔다.그때 뵈었던 큰고모부님이 일 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난달에 큰고모님이 돌아가셨다. 자연사였다. 그리고 삼 층 건물은 그녀에게 상속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낡은 삼 층 건물의 어둑한 실내에서 그녀가 낯선 여인들을 통해 본 것은 그녀의 미래가 그리는 능선이었을까. 삼 년 전 그녀는 이미 오후를 사는 사람의 나른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지금의 내 대낮같은 기다림을 알아보지 못한다.헤어지기 전 그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다.“괜찮지?”“괜찮네.”술집에 대한 품평이었지만 실연의 고통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괜찮다는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정말 괜찮아졌다. 이제 모든 것은 소소한 과거사가 되었다.돌이켜보면 엄청난 위로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사랑이 보잘 것 없다면 위로도 보잘 것 없어야 마땅하다. 그 보잘 것 없음이 우리를 바꾼다. 그 시린 진리를 침묵처럼 받아들이면 된다.Copyrightⓒ 독서학교 All rights reserved.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