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선(聽蟬)
매미소리를 듣다
聽 : 들을 청(耳/16)
蟬 : 매미 선(虫/12)
퇴계 선생이 주자(朱子)의 편지를 간추려 '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란 책을 엮었다.
책에 실린 주자(朱子)가 여백공(呂伯恭)에게 답장한 편지는 서두가 이랬다. '수일 이래로 매미 소리가 더욱 맑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그대의 높은 풍도를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남언경(南彦經)과 이담(李湛) 등이 퇴계에게 따져 물었다. 요점을 간추린다고 해놓고 공부에 요긴하지도 않은 이런 표현은 왜 남겨 두었느냐고.
퇴계가 대답했다. '생각하기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통해 두 사람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단지 의리의 무거움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빼면 사우(師友) 간의 도리가 이처럼 중요한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나는 여름날 나무 그늘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자와 여백공 두 분 선생의 풍모를 그리워하곤 한다.'
나무의 높은 가지에서 우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주자는 여백공의 높은 인격을 그렸다. 퇴계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마음을 떠올렸다.
남언경과 이담은 공부하는 사람의 엄정함을 들어 편지 서두의 의례적 인사말을 왜 삭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 표현에서 읽은 것이 달랐다. 퇴계에게 매미 소리는 높은 인격을 사모하는 촉매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다.
의리의 무거움만 알아 깊은 정을 배제하는 데서 독선(獨善)이 싹튼다. 뼈대가 중요하지만 살이 없으면 죽은 해골이다. 살을 다 발라 뼈만 남겨놓고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인간의 체취가 사라진다.
명분만 붙들고 사람 사이의 살가운 마음이 없어지고 보니 세상은 제 주장만 앞세우는 살벌한 싸움터로 변한다. 퇴계 선생의 이 말씀이 더욱 고마운 까닭이다.
윤증(尹拯)도 이 뜻을 새겨, 그의 '청선(聽蟬)'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며칠 새 매미 소리 귀에 가득 해맑아, 고개 돌려 높은 풍도 그리워하게 하네(數日蟬聲淸滿耳, 令人回首溯高風).'
매미 울음소리가 도처에 낭자하다. 새벽 아파트 베란다 창에 한 마리가 붙어 울면 온 식구 잠이 다 깬다. 학교 숲길은 종일 아이들 합창대회 연습장 같다.
이언진(李彦眞)의 '저녁 볕 들창에 환하고, 매미 소리 나무에 가득타(斜陽明窓 蟬聲滿樹)'란 구절을 써 붙인다. 무더위에 찌들었던 마음이 환하게 펴진다.
○ 聽蟬(청선; 매미소리를 듣고)
/ 令壽閤徐氏(영수합서씨)
捲簾高閣聽鳴蟬,
鳴在淸溪綠樹邊.
발 걷으니 누각에서 매미 우는 소리 들리고, 그 소리는 맑은 개울 푸른 숲 근처에 있구나.
雨後一聲山色碧,
西風人倚夕陽天.
비온 뒤 한 울음소리에 산색이 푸
르고, 가을 바람은 해 지는 하늘에 기대었네.
○ 聽蟬(청선; 매미소리를 듣다)
/ 春圃 鄭悳和(춘포정덕화)
一起城西一起東,
林堂淸日水樓空.
한번은 소리가 서쪽에서 일어나더니 한번은 동쪽에서 일어나니, 임당에 날이 게이고 수루가 비었을 때라.
泠泠若怨吟淸露,
彗彗如嬌送晩風.
영영한 소리는 원망하는 것 같이 맑은 이슬에서 읊으고, 혜혜한 소리는 이름답게 늦은 바람을 타고 보내더라.
堤柳速遲經夏慣,
井梧斷續幾秋同.
뚝버들에 빨리 혹은 더디게 여름을 지낸 버릇이 있고, 우물가 오동나무에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몇가을이나 같이 하였던고.
只愁曲曲叮嚀韻,
遙入懷人午枕中.
다만 굽이 굽이 정녕한 소리가 멀리 생각하는 사람의, 낮잠자는 벼개에 들어갈가 걱정된다.

매미이야기
이른 아침부터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듣는다. 매미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땅속에서 유충으로 7년 내외를 지내고 성충인 매미가 되었다가 겨우 열흘 남짓 이슬과 나무진만 먹고 산 다음 일생을 마감한다고 하니, 그런 애잔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과연 매미는 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길고 오랜 세월을 견디고 나서야 매미로 우화(羽化)된 감격을 표현하는 환희의 송가일 수도 있고, 짝을 부르는 사랑의 노래일 수도 있는데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의 기준으로 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흔히 새가 운다고 하지만 그 역시 우는 것인지 노래하거나 대화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매미를 주제로 한 글 가운데는 고려 때 문장가인 이규보(李奎報)의 그 유명한 방선부(放蟬賦)가 전해 오는데 대강 이렇다.
매미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처량한 소리를 내지르기에 듣다 못하여 날아 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그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거미나 매미나 다 같은 미물이다. 거미가 그대에게 무슨 해를 끼쳤으며, 매미는 또 그대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기에 매미를 살려주어 거미를 굶주리게 하는가? 살아간 매미는 자네를 고맙게 여길지 몰라도 먹이를 빼앗긴 거미는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다면 매미를 놓아 보낸 일을 두고 누가 자네를 어질다고 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거미는 본래부터 욕심이 많고, 매미는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 항상 배가 부르기만을 바라는 거미의 욕심은 만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슬만 마시고도 만족해 하는 저 매미를 두고 욕심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저 탐욕스런 거미가 이러한 매미를 위협하는 것을 차마 그냥 볼 수가 없기에 구해 주었다'
그러면서 향기를 쫓는 나비나 비린내를 찾는 쉬파리였다면 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미줄에 걸리지 않을 숲으로 가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혼탁한 세상에서 위험스럽게 살지 말라는 깊은 뜻도 담겨 있다.
매미소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주서절요(朱書節要)를 편찬할 때 주자(朱子)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요 며칠 매미소리가 더욱 맑으니, 들을 때마다 그대의 높은 풍모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네'라는 구절을 발췌해서 실었는데, 이로부터 매미소리를 듣는 것이 벗을 생각함을 뜻하는 고사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더위를 이기는 여덟 가지를 들어 소서팔사(消暑八事)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는 동림청선(東林聽蟬) 즉,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가 들어있다.
서양에서도 매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미국 이민 초기에 프랭크린은, '매미 정신없이는 미국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일하는 근로정신을 매미 정신이라고 했다.
또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음흉한 마음을 품고 매미의 노래 소리를 아무리 극찬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해서 빈틈없는 지조를 상징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임금이 쓰던 모자를 익선관(翼蟬冠)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미 날개가 뒷머리에서 머리 위로 두 장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또 신하가 쓰는 모자인 오사모(烏紗帽)는 매미 날개 모양이 뒷머리 양 옆으로 펼쳐져 있다. 군신(君臣)의 모자에 모두 매미 날개 모양을 본 뜬 이유는 문(文), 청(淸), 염(廉), 검(儉), 신(信) 등 오덕(五德)을 갖추었다는 매미를 닮아 맑고 깨끗한 정사를 펼치고, 욕심을 갖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성과 이른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법률안(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 법)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면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의 청렴도도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덕목으로, 왕조시대의 임금도 곤충인 매미의 깨끗함을 본받고자 모자에 그 날개를 형상화하여 달았으니 그 의미가 각별하다.
매미 종류가 다양하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는데다 밤에도 불빛이 밝아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울어대는 매미소리가 때로는 소음으로 들리고 공해라며 미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소리가 커지고 우는 시간이 길어짐은 사회가 더 혼탁하고 있음을 비춰주는 거울로 여기고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깨우치기 위한 경종으로 듣는다면 뭐 그쯤 참으면서 듣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매미가 그려진 부채로 더위를 덜어내며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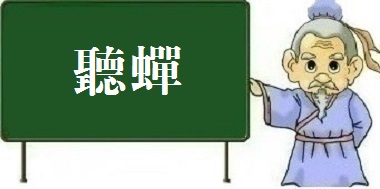
▶️ 聽(들을 청)은 ❶형성문자로 聴(청)의 본자(本字), 听(청)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귀 이(耳; 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呈(정, 청)의 생략형과 나머지 글자 덕(세우다)으로 이루어졌다.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귀를 기울여 듣다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聽자는 ‘듣다’나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聽자는 耳(귀 이)자와 壬(천간 임)자, 悳(덕 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耳자에 두 개의 口(입 구)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口자는 생략되었고 대신 눈과 심장을 그린 悳자와 壬자가 더해지면서 ‘보고(直) 듣고(耳) 느끼는(心) 사람(壬)’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획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에서 ‘듣고 용서하고 살핀다.’까지 모두 표현하려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聽(청)은 ①듣다 ②들어 주다 ③판결하다 ④결정하다 ⑤다스리다 ⑥받아 들이다, 허락하다 ⑦용서하다 ⑧살피다, 밝히다 ⑨기다리다 ⑩따르다, 순종하다 ⑪엿보다, 염탐하다 ⑫맡기다 ⑬마을 ⑭관청(官廳) ⑮염탐꾼, 간첩(間諜) ⑯이목(耳目)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소리를 듣는 감각을 청각(聽覺), 방송이나 진술 따위를 자세히 들음을 청취(聽取), 강연이나 설교 등을 듣는 군중을 청중(聽衆), 퍼져 돌아다니는 소문 또는 설교나 연설 따위를 들음을 청문(聽聞), 강의를 들음을 청강(聽講), 귀로 소리를 듣는 힘을 청력(聽力), 명령을 들음을 청령(聽令), 송사를 자세히 듣고 심리함을 청리(聽理), 듣고 봄을 청시(聽視), 소리가 귀에 들리는 범위를 청야(聽野),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좇음을 청종(聽從), 죄의 고백을 들음을 청죄(聽罪), 몰래 엿들음을 도청(盜聽), 눈으로 봄과 귀로 들음을 시청(視聽),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을 경청(敬聽),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들음을 경청(傾聽), 듣기 기관의 장애로 듣는 힘이 낮아지거나 없어진 상태를 난청(難聽), 듣지 아니함이나 청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아니함을 불청(不聽), 참여하여 들음을 참청(參聽), 소문을 들음 또는 그 소문을 풍청(風聽), 공손한 태도로 조심성 있게 들음을 근청(謹聽),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들리지 않음을 청이불문(聽而不聞), 듣고도 못 들은 체함을 청약불문(聽若不聞),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을 도청도설(道聽塗說), 거문고 소리가 하도 묘하여 물고기마저 떠올라와 듣는다는 뜻으로 재주가 뛰어남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을 유어출청(遊魚出聽),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는 뜻으로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을 비유하는 말을 이시목청(耳視目聽),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겸청즉명(兼聽則明), 남의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것을 이르는 말을 세이공청(洗耳恭聽),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남을 꾸짖지 않음을 내시반청(內視反聽), 여러 사람을 거쳐 전해 오는 말을 들음을 전지전청(傳之傳聽) 등에 쓰인다.
▶️ 蟬(매미 선/날 선, 땅 이름 제)은 형성문자로 蝉(선, 제)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벌레 훼(虫; 뱀이 웅크린 모양, 벌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單(선)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蟬(선, 제)은 ①매미(매밋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날다 ③뻗다, 펴지다 ④잇다, 연속하다 ⑤겁내다, 두려워하다 ⑥아름답다 ⑦애처롭다 그리고 ⓐ땅의 이름(제)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매미의 울음소리를 선음(蟬吟), 매미가 탈바꿈할 때에 벗은 허물을 선퇴(蟬退), 매미의 허물을 선각(蟬殼), 높은 벼슬아치의 관 앞에 대는 장식으로 금으로 만든 매미를 붙이는 것을 선당(蟬璫), 매미가 욺을 선명(蟬鳴), 매미의 우는 소리를 선성(蟬聲), 말매미를 선충(蟬蟲), 금석에 새긴 매미 모양의 무의를 선문(蟬紋),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선탈(蟬脫), 매미가 시끄럽게 운다는 선조(蟬噪), 매미가 떠들썩하게 울고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는 뜻으로 논의나 문장이 졸려함을 이르는 말 또는 여럿이 모여 시끄럽게 떠듦을 이르는 말을 선조와명(蟬噪蛙鳴), 봄철 개구리와 가을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무용한 언론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와추선(春蛙秋蟬), 버마재비가 매미를 엿본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뒤에서 닥치는 재해를 생각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당랑규선(螳螂窺蟬), 개구리와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뜻으로 서투른 문장이나 쓸데없는 의논을 조롱해 이르는 말을 와명선조(蛙鳴蟬噪), 매미가 허물을 벗다는 뜻으로 껍질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허세를 꾸며 벗어남을 이르는 말을 금선탈각(金蟬脫殼)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