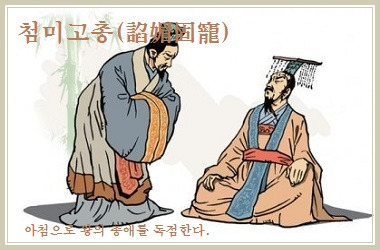
첨미고총(諂媚固寵)
아첨으로 임금의 총애를 독점해 정권을 보전하려 한다는 말이다.
諂 : 아첨할 첨(言/8)
媚 : 아첨할 미(女/9)
固 : 굳을 고(囗/5)
寵 : 괼 총(宀/16)
출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첨미(諂媚)는 아첨하는 것, 고총(固寵)은 임금의 총애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력을 보존하려는 권신의 모습을 뜻한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26년 계사(1593) 12월1일 기사이다. 전 인성 부원군 정철의 졸기(前寅城府院君 鄭澈卒)에 이 성어가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略)
신흠(申欽)은 논하기를, “정철은 평소 지닌 풍조(風調)가 쇄락(灑落)하고 자성(資性)이 청랑(淸朗)하며, 집에 있을 때에는 효제(孝悌)하고 조정에 벼슬할 때에는 결백하였으니, 마땅히 옛 사람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였다.
한때 정철을 논한 자가 간적(奸賊)으로 칭하자, 풍문이 퍼져 모든 사람이 뇌동하여 정철을 정말 소인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평소 정철을 아는 자들도 여론에 현혹되어 그가 정말 소인인가 하고 의심하는 자까지 있었다.
그러나 자고로 소인이라 칭할 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는 고총(固寵)이요, 둘째는 첨미(諂媚)요, 셋째는 부회(附會)인 것이다(然自古稱小人者有三焉, 一曰固寵也, 二曰諂媚也, 三曰附會也).
정철이 적소(謫所)로부터 소환되어 언젠가 빈청(賓廳)에 앉아 있을 때 참판(參判) 구사맹(具思孟)과 지중추(知中樞) 신잡(申磼)이 동좌했었는데, 별감(別監) 한 사람이 안에서 주찬(酒饌)을 가지고 나와 말을 꾸며 이야기하기를, “안에서 모든 재상들이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기실은 구사맹과 신잡이 모두 궁금(宮禁)과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귀인(貴人)이 다른 손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사로이 보내온 것이었다. 이성중(李誠中)이 그 자리에 있다가 소반과 젓가락을 가져와 음식을 정승 앞에 나눠 드리도록 하자, 정철이 말하기를, “이 음식은 구 참판과 신 지사가 먹어야 마땅하니, 대신이 참여해선 안 된다” 하고는 곧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 말이 대내에 들리자 정철이 그 이튿날 체찰사(體察使)로 나가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첨미, 고총을 하지 않았다는 밝은 증거라 하겠다. 소인이 과연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卽起出, 其言聞于內, 翌日出爲體察使。 此其不諂媚、固寵之明驗也, 小人果如是乎?).
이발(李潑)과 이산해(李山海)는 한때 권세를 장악했던 자들로서 정철은 그들의 친구였으니, 정철의 재주로서 조금만 비위를 맞추었더라면 어찌 낭패를 당하여 곤고하게 되어 종신토록 굶주린 신세가 되기까지야 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기꺼이 굽히려 하지 않았다. 이는 바로 그가 부회(附會)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소인이 과연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단지 결백성이 지나쳐 의심이 많고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평생 단점이었다. 만일 그를 강호 산림의 사이에 두었더라면 잘 처신했을 것인데, 지위가 삼사(三司)의 끝까지 오르고 몸이 장상(將相)을 겸하였으니, 그에 맞는 벼슬이 아니었다.
정철은 중년 이후로 주색에 병들어 자신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데다가 탐사(貪邪)한 사람을 미워하여 술이 취하면 곧 면전에서 꾸짖으면서 권귀(權貴)를 가리지 않았다. 편벽된 의논을 극력 고집하면서 믿는 것은 척리(戚里)의 진부한 사람이었고, 왕명을 받아 역옥(逆獄)을 다스릴 때 당색(黨色)의 원수를 많이 체포하였으니, 그가 한세상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족히 괴이할 게 없다. 그의 처신은 정말 지혜롭지 못했다 하겠다.
(下略)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耳目口心書[三]
교묘하게 속이고 아첨하며, 일생 동안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 비록 꾸미는 데 익숙하여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가려진 것이 매우 얇으므로 가리면 가릴수록 나타나니, 고생스럽기만 할 뿐이다(假有巧詐諂媚, 一生騙人, 雖慣於粉餙, 自謂便利, 然其障蔽於人者, 甚薄狹, 隨遮隨現, 極勞苦哉).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마장전(馬駔傳)
따라서 아첨을 전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 몸을 정제(整齊)하고 얼굴을 다듬고 말을 얌전스레 하고 명예와 이익에 담담하며 상대와 사귀려는 마음이 없는 척함으로써 저절로 아첨을 하는 것이 상첨(上諂)이다(故導諛有術. 飭躬修容, 發言愷悌, 澹泊名利, 無意交遊, 以自獻媚, 此上諂也).
다음으로 바른 말을 간곡하게 하여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인 다음 그 틈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 중첨(中諂)이다(其次讜言款款, 以顯其情, 善事其間, 以通其意, 此中諂也).
말굽이 닳도록 조석(朝夕)으로 문안(問安)하며 돗자리가 떨어지도록 뭉개 앉아, 상대방의 입술을 쳐다보며 얼굴빛을 살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좋다 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마다 다 칭송한다면, 처음 들을 때에야 좋아하겠지만 오래 들으면 도리어 싫증이 난다. 싫증이 나면 비루하게 여기게 되어, 마침내는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이는 하첨(下諂)이다(穿馬蹄, 弊薦席, 仰唇吻, 俟顔色, 所言則善之, 所行則美之, 初聞則喜, 久則反厭. 厭則鄙之, 乃疑其玩己也. 此下諂也).
윤기(尹愭) 무명자집(無名子集)
시(詩) 영사 118(其百十八)
意氣雄豪轢古今
焚書新請契宸襟
彼斯豈必眞非古
直是逢君固寵心
호걸스런 의기는 고금을 압도하는데/
분서를 청하는 글 올려 황제의 마음을 샀네/
저 이사가 참으로 옛날을 그르다 여겼으랴/
임금의 비위 맞추어 총애를 굳히려 하였을 뿐.

첨미고총(諂媚固寵)
아첨으로 왕의 총애를 독점한다. 첨미(諂媚)는 아첨을 하는 것이다. 고총(固寵)은 임금의 총애를 독점해 정권을 보전하려 한다는 뜻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고총(固寵)이 나온다. "소인이 고총(固寵)하리라 하여 임금을 한가로이 해서는 안된다 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小人固寵權 曰不可 令閑 此意願毋忘)."
송강(松江) 정철(鄭澈)에 대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평가는 각박하다. "말한 대로 탁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맑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격탁양청(激濁揚淸) 만 힘썼으므로 명망은 높았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돼 있다.
계속 인용한다. "한때 정철을 논한 자가 간사한 도적이라고 칭하자 모든 사람이 정철을 정말 소인으로 여겼다. 평소 정철을 아는 자들도 정말 소인인가 의심하는 자까지 있었다. 자고로 소인이라 칭할 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는 고총(固寵)이요, 둘째는 첨미(諂媚)요, 셋째는 부회(附會: 억지로 끌어 대어 이치에 맞게 하는 것)다."
그러나 소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발과 이산해는 한때 권세를 장악했던 자들로서 정철은 그들의 친구였으니 조금만 비위를 맞추었더라면 어찌 낭패를 당해 곤고하게 되어 종신토록 굶주린 신세가 되기까지야 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한번도 기꺼이 굽히려 하지 않았다. (중략) 소인이 과연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단지 결백성이 지나쳐 의심이 많고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없었으니, 이것이 평생 단점이었다."
술 이야기도 나온다. "중년 이후 주색에 병들어 자신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데다 나쁜 것을 탐하는 사람을 미워하여 술이 취하면 곧 면전에서 꾸짖으면서 권력자나 귀한 사람도 가리지 않았다. (중략) 왕명을 받아 옥사를 다스릴 때 다른 당의 원수를 많이 체포하였으니 그가 한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괴이할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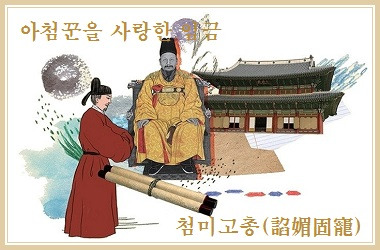
아첨꾼을 사랑한 임금
고려시대 권력자의 불안과 무능에 기생한 '폐행(嬖幸)'들 '무소불위' 폭정으로 나라도, 국왕도 망친 역사.
'폐(嬖)'란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이다. '행(幸)'은 '행(倖)'과 같은 글자로 아첨한다는 뜻이다. 그냥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유난을 떤다는 말이다.
두 글자를 합쳐 '폐행(嬖幸)'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특별히,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임금의 총애는 출세와 권력을 보장했다. 그래서 폐행이 생겨났지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는 부패하고 백성의 삶은 곤란해졌다.
중국의 환관, 고려의 폐행
'폐행전(嬖幸傳)'에는 모두 36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윤수열전(尹秀列傳) '을 보면, 윤수는 매 사냥을 좋아하는 충렬왕의 기호를 잘 맞춰 폐행이 되었고, 그의 아들 윤길보는 격구(擊毬)를 잘해서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다.
고려사(高麗史)는 고려시대 폐행(嬖幸)들을 모아 열전을 만들고 '폐행전(嬖幸傳)'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자고로 소인배들은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엿보아 영합하고 조장하였다. 때로는 아첨으로, 때로는 놀이와 여자로, 때로는 매사냥과 개사냥으로, 때로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해서, 때로는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때로는 기예와 술수로써 그렇게 하였다. 모두 임금이 좋아하는 바를 좇아서 그 비위를 맞추고자 하였다. 고려는 나라가 오래되었으므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폐행(嬖幸)도 또한 많았다. 이제 옛 기록에 근거하여 폐행전을 짓는다."
폐행전(嬖幸傳)에는 모두 36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중 대부분은 고려 후기 사람들이다. 고려사를 지은 사람들은 고려 후기에 폐행이 많아져서 정치가 혼란해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자신들이 세운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폐행전(嬖幸傳)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항변할 수만은 없는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다. 고려가 폐행 때문에 망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가까운 자리는 본래 환관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궁중에서 임금의 수발을 들면서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임금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이들의 무기였다. 환관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총애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十常侍)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 역사에는 십상시 말고도 환관 권력자가 많았다. 진시황 사후 어린 황제를 세우고 권력을 휘두른,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주인공 조고(趙高)는 진나라의 환관이었다. 당나라에서는 현종 때 고력사(高力士)가 환관정치의 문을 열었다. 그는 관리들이 황제에게 올린 글을 중간에서 열어보고 걸러냈다.
명나라에는 희대의 환관 위충현(魏忠賢)이 있었다. 그는 황제 직속 정보기관인 '동창'의 책임자가 되어 황제 다음가는 2인자로 군림했는데, 자신이 나타나면 누구나 엎드려 '구천세'를 부르게 했을 정도다 (황제에게는 만세를 불렀다). 명나라 말에는 환관이 모두 7만 명이나 되어 관료보다 많았다고 하니, 비단 청나라가 아니었어도 이 나라는 곧 망했을 것이다.
반면 우리 역사에서는 권력을 잡은 환관이 한 사람도 없다. 환관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한 결과였다. 고려는 환관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승진도 7품까지로 제한했으며, 조선은 환관을 천대하고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했다.
그 대신 고려에서는 폐행이 출현했다. 열전에 올라 있는 최초의 폐행은 제7대 목종 때의 유행간(庾行簡)이다. 그는 남색(男色)으로 총애를 받았는데, 왕명을 내릴 때마다 그에게 먼저 물어봤으므로 사람들이 왕처럼 대우했다고 한다. 그는 문무 관리들에게 턱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지시할 정도로 위세를 부리다가 결국 목종이 시해되자 함께 죽음을 당했다.
몽골제국 간섭과 측근 정치 발호
고려의 폐행은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유난히 많이 출현했다. 당시 고려는 30년에 걸친 항전 끝에 나라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몽골제국의 정치적 간섭은 피할 수 없었다. 고려 국왕이 몽골에 의해 폐위되는 일이 벌어졌고, 국왕은 늘 폐위의 불안을 안고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의 국왕들은 자신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할 사람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폐행이 자라날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몽골어 통역관, 응방(鷹坊)의 매 사육사, 고려 국왕과 혼인한 몽골 공주의 시종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폐행으로 등장했다. 모두 몽골과 외교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통역관은 물론이고, 매 사육사는 매를 사육해서 몽골에 진상했으며, 몽골 공주의 시종들은 몽골의 실력자들과 다리 놓는 역할을 했다. 모두 국왕의 사적인 외교였다.
이 밖에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정치 환관도 다시 출현해서 폐행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폐행이 동시에 등장해서 세력을 이룬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측근 정치라 할 만한 정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측근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권력이 폐행들에게 집중되면서 부패한다는 점이었다. 우선 자신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 인사 규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도 다반사였다. 감찰 관리들을 제멋대로 능욕하고 왕에게 모함하여 쫓아냈으니,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이렇게 되자 관리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고 소인배들은 폐행에게 아부하여 관직을 구하는 것이 풍조가 되었다. 그러니 유능하고 청렴한 관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 피해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가되어 권세가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과도한 수탈에 견디지 못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최충헌의 최준문, 우왕의 이인임
밖에서는 외세의 간섭이 강하게 미쳐오고, 안에서는 폐행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관료사회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에 이른, 그래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국왕이 폐행을 중용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의 원인은 국왕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총애하는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의 정치를 맡겼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였다.
권력이 사유화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 예로, 단연 무신정권을 꼽을 수 있다. 최충헌 집권기에 그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말로 하기 민망하여 사료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최충헌의 여종 동화는 미인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많이 통정했고, 최충헌과도 통정했다. 하루는 최충헌이 장난 삼아 '너는 누구를 지아비로 삼겠느냐?'라고 물으니, 흥해의 공생(貢生)이던 최준문이라고 대답했다. 최충헌이 즉시 최준문을 불러다가 가노로 삼고 대정(隊正)에 임명했다. 최준문은 대장군까지 승진했는데, 나날이 최충헌의 신임이 두터워졌으므로 최충헌에게 청탁할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청탁했다. 그는 최충헌의 집 옆에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최충헌의 오른팔이 되었다.
최충헌이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자가 되자 수많은 사람이 그의 오른팔이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최준문은 진정한 오른팔이었다(그는 최충헌이 죽자 바로 최우에게 죽음을 당했다). 최준문이 최충헌의 신임을 얻는 과정은 엽기적이었지만, 당시 관료들이 최충헌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 그에게 청탁했으므로 그 덕에 권세를 부렸다. 최충헌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지위였다. 그 청탁이란 대개 관직이었을 것이니, 이렇게 해서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을 상관으로 인정해야 했던 문무 관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고려시대에 권력이 사유화된 또 하나의 시기는 단연 고려 말 우왕 때였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출생의 석연치 않음 때문에 늘 불안해 했다. 게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인임이 정치를 좌우했으므로, 왕은 할 일 없이 노는 게 일이었다.
왕이 정치에 무관심하자 이인임은 자기 친·인척들로 조정을 채우는가 하면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관리들이 권력자의 집을 찾아다니며 관직을 구걸하는 행위를 '분경(奔競)'이라고 하는데, 우왕 때 '분경이 풍속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성행했다. 분경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이인임이 있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려 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은 권력이 국왕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국왕이 존재하는 한 폐행은 언제나 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 권력을 최소화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재상이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언관(言官)의 기능을 강화하여 깨끗한 정치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의 꿈이 이루어져 조선은 오랫동안 환관은 물론 폐행이 출현하지 않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
폐행이 성할 때
폐행은 언제나 국왕이 무능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할 때 출현했다. 그래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국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둘렀고, 그들의 폭정은 나라를 망치고 국왕도 망쳤다. 실제 중국에서는 환관이 발호할 때마다 왕조가 멸망했다.
고려에서도 폐행이 성할 때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결국 고려가 망한 것도 권력의 사유화 때문이었다. 그런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쓰이지 못하며, 뜻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도 정치는 공공의 것이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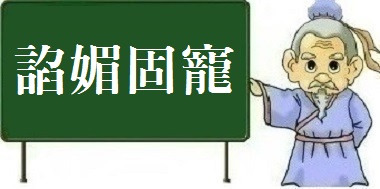
▶️ 諂(아첨할 첨)은 형성문자로 谄(첨)은 간자(簡字), 謟(첨), 讇(첨)은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臽(함, 첨)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諂(첨)은 ①아첨(阿諂)하다 ②아양을 떨다 ③비위를 맞추다 ④알랑거리다 ⑤사특(邪慝)하다(요사스럽고 간특하다) ⑥아첨(阿諂)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첨할 미(媚), 아첨할 유(諛)이다. 용례로는 알랑거리며 아첨하는 것을 첨유(諂諛), 몹시 아첨함을 첨녕(諂佞), 아첨하고 업신여김을 첨독(諂瀆), 아첨하며 붙좇음을 첨부(諂附), 아첨하는 말을 첨언(諂言), 자기의 지조를 굽히어 아첨함을 첨곡(諂曲), 아첨하여 웃음을 첨소(諂笑), 아첨하여 아양을 떪을 첨미(諂媚), 남의 마음에 들려고 간사를 부려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리는 짓을 아첨(阿諂), 올바르지 못하고 아첨함을 사첨(邪諂), 아첨하는 버릇을 첨유지풍(諂諛之風), 겉으로는 알랑거리며 아첨하나 속으로는 해치려 한다는 말을 외첨내소(外諂內疎) 등에 쓰인다.
▶️ 媚(아첨할 미/예쁠 미)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계집 녀(女; 여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眉(미)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媚(미)는 ①아첨(阿諂)하다 ②예쁘다 ③아양을 떨다 ④아름답다 ⑤사랑하다 ⑥요염(妖艶)하다 ⑦좇다 ⑧아첨(阿諂) ⑨아양 ⑩요괴(妖怪) ⑪천천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첨할 유(諛), 아첨할 첨(諂)이다. 용례로는 남의 귀염이나 사랑을 받으려고 아양을 부리며 곱게 웃는 웃음을 미소(媚笑), 아양을 부리는 태도를 미태(媚態), 도적에게 아첨함을 미도(媚盜), 부처에게 아첨함을 미불(媚佛),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고 칭찬함을 미예(媚譽), 적에게 아첨함을 미적(媚敵),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첨함을 미총(媚寵), 성욕을 생기게 하는 약을 미약(媚藥), 아름다운 미목으로 아양 부리는 행동 또는 그런 태도를 지어 보임을 미무(媚嫵),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알랑거림을 아미(阿媚), 요염하게 아양을 부림을 요미(妖媚), 귀여워해 주기를 바람을 구미(求媚),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을 납미(納媚), 남의 환심을 사려고 스스로 아첨함을 자미(自媚), 남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양을 부림을 영미(逞媚), 산수의 경치가 맑고 아름다움을 명미(明媚),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온갖 아름다운 태도를 백미(百媚), 경치나 필적 따위가 선명하고 우아함을 선미(鮮媚), 연약하고 예쁨을 유미(柔媚), 부드럽고 예쁨을 연미(軟媚), 상냥하고 아담한 자태를 박미(薄媚),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며 아첨함을 사미(邪媚), 맵시를 내고 애교를 부림을 자미(姿媚), 아리따운 태도로 아양을 부리는 일을 교미(嬌媚), 부드럽고 아름다움을 완미(婉媚), 이성을 꾀어 내기 위하여 그리워하는 태도를 나타냄을 정미(呈媚), 아첨하여 아양을 떪을 첨미(諂媚), 아랫사람에게서 뜯은 재물로 웃사람에게 아첨한다는 말을 박하미상(剝下媚上), 가지가지의 아리따운 태도로 아양을 부리는 일을 만교천미(萬嬌千媚), 산수의 경치가 너무나 맑고 아름다움을 풍광명미(風光明媚) 등에 쓰인다.
▶️ 固(굳을 고)는 형성문자로 怘(고)는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큰입구 몸(囗; 에워싼 모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古(고)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古(고; 오래다, 옛날로부터의 습관, 그것을 그대로 지키다, 굳다)와 성벽을 둘러싸서(口; 에워싸는 일) 굳게 지킨다는 뜻이 합(合)하여 굳다를 뜻한다. 공격에 대비하여 사방을 경비하다, 굳다, 완고하여 융통성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固(고)는 ①굳다, 단단하다 ②굳어지다, 굳히다 ③완고(頑固)하다, 고루(固陋)하다 ④우기다(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 ⑤독점(獨占)하다 ⑥가두다, 감금(監禁)하다 ⑦진압(鎭壓)하다, 안정시키다 ⑧평온(平穩)하다, 편안하다 ⑨스러지다, 쇠퇴(衰退)하다 ⑩버려지다 ⑪경비(警備), 방비(防備), 수비(守備) ⑫고질병(痼疾病) ⑬거듭, 여러 번, 굳이 ⑭굳게, 단단히, 확고히 ⑮반드시, 틀림없이 ⑯진실로, 참으로 ⑰항상(恒常), 오로지, 한결같이 ⑱처음부터, 원래, 본디 ⑲이미 ⑳이에, 도리어 ㉑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굳을 견(堅), 굳을 경(硬), 굳을 확(確), 굳을 확(碻), 굳을 공(鞏)이다. 용례로는 자기의 의견만 굳게 내세움을 고집(固執), 본디부터 있음을 고유(固有), 한 곳에 움직이지 않게 붙박는 것을 고정(固定), 굳이 사양함을 고사(固辭), 굳게 지킴을 고수(固守), 완고하고 식견이 없음을 고루(固陋),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진 물체를 고체(固體), 굳게 붙음으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을 고착(固着), 튼튼한 성을 고성(固城), 뜻을 굳게 먹음 혹은 그 뜻을 고의(固意), 굳게 지님을 고지(固持), 곤궁한 것을 잘 겪어냄을 고궁(固窮), 바탕이 단단하며 일정한 꼴을 지닌 형체를 고형(固形), 굳어지거나 굳어지게 함을 고화(固化), 튼튼하고 굳음을 확고(確固), 굳세고 단단함을 견고(堅固), 굳고 튼튼함을 공고(鞏固), 엉겨 뭉쳐 딱딱하게 됨을 응고(凝固), 굳세고 튼튼함을 강고(强固), 성질이 완강하고 고루함을 완고(頑固), 완전하고 튼튼함을 완고(完固), 말라서 굳어짐을 건고(乾固), 깨뜨릴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굳음을 뇌고(牢固), 뜻이 독실하고 굳음을 독고(篤固), 어리석고 고집이 셈을 몽고(蒙固), 곤궁을 달게 여기고 학문에 힘쓴다는 말을 고궁독서(固窮讀書), 내 마음의 기둥 곧 신념을 굳게 가지는 일이라는 말을 고아심주(固我心柱), 고집이 세어 조금도 변통성이 없음 또는 그 사람을 고집불통(固執不通),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을 확고부동(確固不動),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세고 튼튼하다는 말을 강고무비(强固無比), 일의 되어 가는 형세가 본래 그러하다는 말을 사세고연(事勢固然),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을 확고불발(確固不拔), 완고하여 사물을 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을 완미고루(頑迷固陋), 사세가 그렇지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을 세소고연(勢所固然), 이치가 본디 그러하다는 말을 이소고연(理所固然),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을 근고지영(根固枝榮) 등에 쓰인다.
▶️ 寵(사랑할 총, 현 이름 룡/용)은 형성문자로 宠(총)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龍(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寵(총, 룡/용)은 총애(寵愛)의 뜻으로 ①사랑하다 ②괴다(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③교만(驕慢)하다 ④높이다 ⑤굄(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함) ⑥영화(榮華) ⑦영예(榮譽) ⑧은혜(恩惠) ⑨첩(妾: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⑩성(姓)의 하나, 그리고 ⓐ현(縣)의 이름(룡)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사랑할 폐(嬖)이다. 용례로는 남달리 귀엽게 여겨 사랑함을 총애(寵愛),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총아(寵兒),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를 총신(寵臣), 임금이 특별히 사랑하여 돌봄을 총권(寵眷), 임금이 특별히 사랑하여 가까이 함을 총닐(寵昵), 임금의 총애와 은택을 총택(寵澤), 총애를 받는 영광을 총광(寵光), 가톨릭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을 총교(寵敎), 총애하여 기름을 총양(寵養), 특별한 귀여움으로 받는 대우를 총우(寵遇), 다른 사람의 정성어린 초대를 총초(寵招), 특별히 돌보고 사랑함을 총고(寵顧), 마음에 들어 사랑함 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총폐(寵嬖), 총애를 받는 아름다운 여자를 총희(寵姬),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은총(恩寵),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첨함을 미총(媚寵), 총애를 받으려고 함을 고총(沽寵), 특별한 은총을 이총(異寵), 남이 모르게 임금의 사랑을 차지함을 절총(竊寵), 임금의 총애를 지니어 쇠퇴하지 아니함을 고총(固寵), 지극한 사랑을 받음을 득총(得寵), 남을 높이어 그의 첩을 이르는 말을 영총(令寵), 총애를 주는 사람을 높여서 그에게서 받는 총애를 말함을 존총(尊寵),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더욱 조심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을 총증항극(寵增抗極), 비빈妃嬪 중에서 한 사람이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을 전방지총(專房之寵), 임금의 총애를 믿고 물러가야 할 때에 물러가지 않고 벼슬자리만 헛되이 차지함을 가리키는 말을 회총시위(懷寵尸位), 군주의 특별한 총애를 일컫는 말을 계비지총(繫臂之寵)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