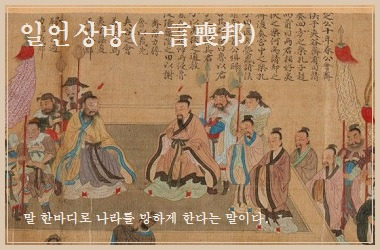
일언상방(一言喪邦)
말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다.
一 : 한 일(一/0)
言 : 말씀 언(言/0)
喪 : 잃을 상(口/9)
邦 : 나라 방(阝/4)
출전 : 논어(論語) 자로(子路)
定公問 : 一言而可以興邦, 有諸.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까?"
孔子對曰 :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한마디 말에 대해 그처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금이 되는 것이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임금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曰 : 一言而喪邦, 有諸.
정공이 말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까?"
孔子對曰 :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한마디 말로 이처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임금노릇 하는데 다른 즐거움이 없고, 오직 말을 하면 나를 거스르는 자가 없는 것이다'고 합니다. 만일 말하는 것이 선해서 아무도 감히 거스르지 않는다면 또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말하는 것이 선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감히 어기지 않는다면, 그 선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范氏曰 : 言不善而莫之違, 則忠言不至於耳. 君日驕而臣日諂, 未有不喪邦者也.
범씨(范氏; 범조우)가 말했다. "임금의 말이 선하지 않은데도 아무도 어기는 이가 않는다면, 충성스러운 말이 임금의 귀에 이르지 않는다. 임금은 날로 교만해지고 신하는 날로 아첨할 것이니,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謝氏曰 : 知為君之難, 則必敬謹以持之. 惟其言而莫予違, 則讒諂面諛之人至矣. 邦未必遽興喪也, 而興喪之源分於此. 然此非識微之君子, 何足以知之.
사씨(謝氏; 사량좌)가 말했다. "임금 노릇이 어려움을 알면, 반드시 경건(敬)과 삼가(謹)함으로써 그를 지닐 것이며, 오직 자기(임금) 말을 하면 아무도 어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아무도 나를 어기지 못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 참소하고 아첨하며 면전에서 아부하는 자들이 몰려든다. 나라가 반드시 갑자기 흥하거나 망하지는 않지만, 흥하고 잃음의 근원은 여기서 나누어 질 것이다. 이는 미묘한 이치를 인식한 군자(君子)가 아니고서야 어찌 누가 충분히 알 수 있겠는가?"
이 장은 임금 노릇하는 도리를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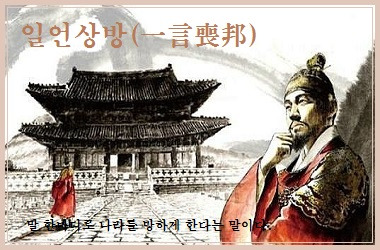
일언상방(一言喪邦)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말에는 그 마음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현들이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은 마음에 담고 있는 말도 있고 입 밖으로 나온 말도 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회성을 띠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논어에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임금으로 보았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일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번 입 밖으로 의사를 표출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요 의지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정공(定公)의 '한 마디 말'에 관한 질문에 마음의 차원에서 대답을 하였다.
임금의 마음에 들어있는 한마디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데 그것은 곧 마음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한마디란 '위군난(爲君難)'이요 나라를 망치는 한마디는 '막여위(莫予違)'이다.
임금 노룻이 어려운 것이라는 뜻의 '위군난(爲君難)'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내 말에 어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의 '막여위(莫予違)'는 나만 생각하는 독재의 마음이다. '막여위(莫予違)'를 품고 정치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일언상방(一言喪邦)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다
금강경에 따르면 누구든 나름대로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我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인 여래(如來)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이든 어떤 형식이든 아상이 있는 것이 중생(衆生)의 속성이라고 하였다.
나 아(我)자를 파자하면 손 수(手)와 창 과(戈)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이 나다. 나라는 실체가 없어도 중생은 나라는 나름대로 상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내 몸에 상처가 나면 고통을 느끼는 것도 나라고 느끼는 내 몸의 경계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그것은 내 고통이다. 그래서 자아를 지키기 위해 그 영역에 집착하다 보면 그 힘이 강해지는 데 그것을 아집(我執)이라 한다.
아집(我執)이 강할수록 자신의 일이라 생각되면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집이 강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정치 영역에서의 최고지도자이다. 아상과 아집은 자연스레 독선(獨善)으로 이어져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공자는 정공(定公)의 질문에 '나를 어기지 않는 것이 임금 노릇의 참맛이다'는 이 말 한마디는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하여, 지도자의 독재와 독선을 경계하였다. 지도자의 귀에 국민의 말이 안 들리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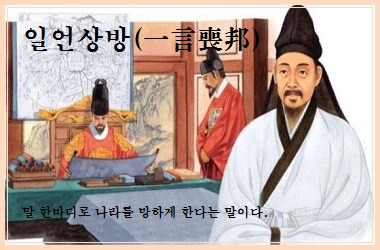
일언상방(一言喪邦)
1574년 3월에 선조가 불사(佛事)에 쓰기 위해 의영고(義盈庫)에 황랍(黃蠟) 500근을 바치게 했다. 양사(兩司)에서 이유를 묻자, 임금은 내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너희가 알 것 없다고 했다.
이이(李珥)가 어찌 이다지 노하시느냐고 하자, 어떤 놈이 그 따위 말을 했느냐며 국문하여 말의 출처를 캐겠다고 벌컥 역정을 냈다.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해서 안 될 말까지 했다.
계속 발설자를 잡아오라고 닦달하자, 신하의 간언에 위엄을 세워 입을 재갈 물리려고만 하시니 임금의 덕이 날로 교만해지고, 폐해는 바로잡을 기약이 없어 걱정이 엉뚱한 곳에서 생길 것이라고 다시 간했다.
임금이 고집을 꺾지 않자 "전하께서 이리하심은 신 등을 가볍게 보시어 벼락 같은 위력으로 꺾어 바른말이 들어올 길을 막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되면 전하의 총명이 날로 가려질 테니 '말 한마디로 나라를 잃는다(一言喪邦)'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앞뒤로 다섯 번을 간했어도 임금은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면서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나왔다. 이이는 임금의 태도에 실망하여 물러날 뜻을 품었다. '연려실기술'에 나온다.
글 속의 '일언상방(一言喪邦)'은 논어 '자로(子路)'에서 보인다. 정공(定公)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자의 대답이 이랬다. "말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임금 되는 것은 즐겁지가 않지만,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즐겁다.' 그 말이 옳아서 어기지 않는다면 훌륭하겠지요. 하지만 옳지 않은데도 어기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것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임금의 위엄은 아무도 거역 못 하고 그대로 따르는 데서 서는 것이 아니다. 바른말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는 데서 우뚝해진다.
임금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그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임금은 날로 교만해지고 신하는 갈수록 아첨하게 되어 나라를 잃고 마는 것이 실로 잠깐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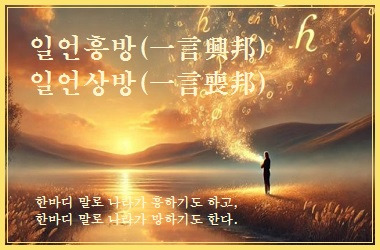
일언흥방(一言興邦) 일언상방(一言喪邦)
한마디 말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자로(子路) 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말은 본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자, 때론 날카로운 칼이 되어 관계와 삶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말의 신중함을 군자의 덕목 중 하나로 꼽았던 공자의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빠른 말', '거친 말', '섣부른 말'에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소중한 인간관계를 상처 입히거나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말은 때때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노자 도덕경 27장에는 '선언무하적(善言無瑕讁)'이 나옵니다. '잘하는 말은 흠과 허물이 없다, 능숙하게 하는 말은 결점이 없다, 참되게 말하면 흠잡을 티가 없다, 정말로 잘하는 말에는 흠이나 티가 없다, 훌륭한 말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함을 뜻하고,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조화로운 말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따스한 말, 위로의 언어일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지만, 우리 삶에 빗대면 남을 알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대를 어떻게 다치게 하는지, 내면의 아픔이 어떤 말에 의해 발생하는지 알 때 비로소 말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깨닫고 그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살리는 진정한 '언어의 주인'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은 다름 아닌 '침묵'과 '경청' 속에서 탄생합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듯, 한마디 말은 우리의 인생 또한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전해주는 말의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의 무게와 그 깊이를 헤아려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비로소 말은 삶을 살리는 진정한 '언어의 빛'이 됩니다.

말의 무게는 마음의 깊이로 가늠된다
오늘 하루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하루였습니다.
말이 가진 힘의 깊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주 잊고는 합니다. 때로는 친밀함 속에서 내뱉는 농담이,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이 없는 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의 아픔과 반성
어제 내가 했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때가 되어서야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오지만, 이미 상처는 남아버렸죠.
오늘 하루는 그 말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말의 힘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함이 주는 선물
말은 신중함이 담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말이란 잊혀지기 쉽지만, 그 말이 주는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의 가슴에 자리한다"고 했습니다.
말 한 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말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다짐과 진심
오늘의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 더 신중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말 한 마디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을 담아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따뜻한 말과 배려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나는 오늘 하루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내일은 더 좋은 말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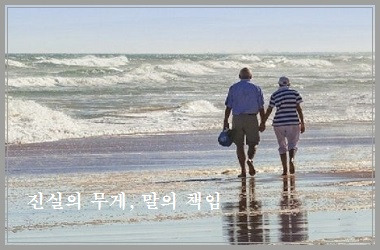
진실의 무게, 말의 책임
말은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말은 우리가 속삭일 때나 외칠 때나 변함없이 그 무게를 가진다. 그 무게는 우리의 진심, 신뢰, 그리고 책임에서 비롯된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다. 따라서 말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며, 신뢰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뿐이다.
말은 진실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꾸며진 말과 진실된 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꾸며진 말은 순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진정성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진심이 담긴 말은 더 깊은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은 신뢰를 통해 전달된다. 신뢰란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토대이며,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메아리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말이란 꾸밈없이,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이 힘은 바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진정한 말이다.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심이 의심 없이 드러날 때 생긴다. 신뢰가 쌓이면 말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우리의 책임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하기 전, 그 말이 가질 영향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자,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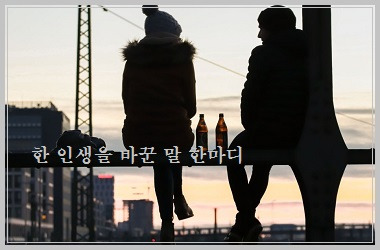
한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말에도 품격(品格)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특히 말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여러 가지 희망과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인처럼 그 CEO도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지하도를 건너갔습니다. 지하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CEO는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서 왔던 길을 돌아 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제가 1달러를 드렸는데 연필을 못 받았군요. 연필을 주셔야지요."
걸인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를 주고 지저분한 연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연필들 좀 봅시다. 이 연필 한 자루가 좋겠군요. 사장님!" 그러자 거지는 또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이란 말을 들은 걸인은 갑자기 자신의 자아(自我)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나는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지!'
그 CEO의 말에 걸인은 갑자기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달리 보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에게 '난 거지가 아니야.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하며 스스로에게 각인(刻印)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난 거지야,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굴며, 거지처럼 표징 짓고 살아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거지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걸인이 아닌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품격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첫째, 이청득심(以聽得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잘 들어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평소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이야기에 진전은 없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는 내가 마음속 깊은 생각을 꺼내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傾聽)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둘째, 과언무환(寡言無患)입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의 무게가 꼭 달변가(達辯家)의 말이 아닌,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심이 담긴 말들이 더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짧고 굵게 핵심을 집어내는 것이, 더 전달력 있고, 말의 무게를 늘릴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언위심성(言爲心聲)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속어(卑俗語)를 적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은 외모 뿐만아니라, 짧은 10분 대화에서 언행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넷째, 대언담담(大言潭潭)입니다.
큰 말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스스로의 편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위 '꼰대'로 보이기 쉽습니다. 조언과 지적을 해야 할 때는 정확히, 따뜻하게, 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지적은 충분한 지식과 깊은 내공(內功)이 바탕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시화복문(口是禍福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잘못 쓰면 화문(禍門)이지마는 잘 쓰면 복문(福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업(業) 중에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이 있습니다. 구업에는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의 4가지 업이 있지요. 그만큼 업 가운에 입으로 업을 짓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말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목숨을 걸어야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을 통해 오는 재앙이 가장 가혹한 것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쉽게 나아도 말(言)에 찔린 상처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덕으로 일어서고 말로 망합니다. 어찌 우리가 혀를 조심하고 덕을 펴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말의 진중(鎭重)함과 가벼움
언어의 전달은 사람의 인격에 따라 그 깊이와 무게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신뢰함이 큽니다. 그러나 인격이 높지 않은 사람은 말에 무게가 없고 깊이가 없어서 그 사람자체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진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중함은 가볍게 흔들리지 않을 묵직하고 진지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요 믿어도 과히 틀리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진중함이 있는 사람과 친교관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개가 언행이 일치하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과는 친교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잭임을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중함이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형성은 이처럼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길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데 그 신뢰를 갖게 하는 모습은 바로 진중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헤어질 때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친교관계는 좌우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면 신뢰가 쌓이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다거나 거짓이었을 때는 신뢰는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와 상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대인관계의 파탄이 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신뢰를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곧 말에 따른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뢰가 결정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은 줄어들거나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는 말 같은 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행위로써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요 약속이나 신뢰를 강조한 말입니다.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중함이 있는 말로서 실행이 담보되는 말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중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벼운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하고 믿을 수 없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는 길은 말은 되도록 적게 하면서 생각은 깊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빗대어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쯤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것은 그만큼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하고 생각은 별로 깊이하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헤픈 사람이라면서 싫어하게 됩니다. 헤픈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만 가볍게 남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의 가벼움과 진중함은 인격이 말들어내는 몸의 진솔한 반응입니다. 자신이 존재해오는 동안 쌓아온 수양이 언행으로 배출해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마당입니다. 이 마당은 고스란히 인격의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곳입니다. 이 마당에 모인 수많은 눈동자들은 우리 모두를 인격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낱낱이 평가하면서 입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CCTV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날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 길을 마치고 저 세상에 이를 때 거기서 일생에 대한 평가(심판)를 받게 된다고 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이나 저승이나를 생각해 보노라면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언행입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언행과 하지 말아야할 언행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중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는 내용(모세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진중한 다짐이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한 토론들이 탈무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탈무드를 탄생시킨 것은 율법에 대한 진중함을 다루기 위한 토론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어의 가벼움은 그냥 흘려보내도 무방한 말이지만 진중한 언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말입니다. 남들로부터 헤픈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언행에 있어서 진중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요 품격을 결정짓는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은 지키라고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은 신의를 잃게 되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물론 살다보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약속장소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갑작스런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든가 뜻하지 않은 애경사가 생겼을 때는 누구라도 이해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누구로부터도 용납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약속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요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약속을 해놓고도 부모들이나 형제자매들의 제지로 본의 아니게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언어에 진중함이 요구되어 지는 것입니다.

▶️ 一(한 일)은 ❶지사문자로 한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하나를 뜻한다. 一(일), 二(이), 三(삼)을 弌(일), 弍(이), 弎(삼)으로도 썼으나 주살익(弋; 줄 달린 화살)部는 안표인 막대기이며 한 자루, 두 자루라 세는 것이었다. ❷상형문자로 一자는 '하나'나 '첫째', '오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一자는 막대기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막대기 하나를 눕혀 숫자 '하나'라 했고 두 개는 '둘'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 한다. 그래서 一자는 숫자 '하나'를 뜻하지만 하나만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로지'나 '모든'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一자가 부수로 지정된 글자들은 숫자와는 관계없이 모양자만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一(일)은 (1)하나 (2)한-의 뜻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하나, 일 ②첫째, 첫번째 ③오로지 ④온, 전, 모든 ⑤하나의, 한결같은 ⑥다른, 또 하나의 ⑦잠시(暫時), 한번 ⑧좀, 약간(若干) ⑨만일(萬一) ⑩혹시(或時) ⑪어느 ⑫같다, 동일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한가지 공(共), 한가지 동(同),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무리 등(等)이다. 용례로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일부(一部), 한 모양이나 같은 모양을 일반(一般), 한번이나 우선 또는 잠깐을 일단(一旦), 하나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음을 고정(一定), 어긋남이 없이 한결같게 서로 맞음을 일치(一致), 어느 지역의 전부를 일대(一帶), 한데 묶음이나 한데 아우르는 일을 일괄(一括), 모든 것 또는 온갖 것을 일체(一切), 한 종류나 어떤 종류를 일종(一種), 한집안이나 한가족을 일가(一家), 하나로 연계된 것을 일련(一連), 모조리 쓸어버림이나 죄다 없애 버림을 일소(一掃),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란 뜻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일장춘몽(一場春夢),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 조그만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을 일촉즉발(一觸卽發),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맞추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을 일석이조(一石二鳥), 한 번 들어 둘을 얻음 또는 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이익을 보는 것을 이르는 말을 일거양득(一擧兩得),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을 일컫는 말을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으로 한결같은 참된 정성과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일컫는 말을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글자도 알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일자무식(一字無識),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는 뜻으로 노력함이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을 일확천금(一攫千金), 한 번 돌아보고도 성을 기울게 한다는 뜻으로 요염한 여자 곧 절세의 미인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일고경성(一顧傾城), 옷의 띠와 같은 물이라는 뜻으로 좁은 강이나 해협 또는 그와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접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일의대수(一衣帶水), 밥 지을 동안의 꿈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이르는 말을 일취지몽(一炊之夢), 화살 하나로 수리 두 마리를 떨어 뜨린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취함을 이르는 말을 일전쌍조(一箭雙鵰),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질서나 체계 따위가 잘 잡혀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일사불란(一絲不亂), 하루가 천 년 같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이르는 말을 일일천추(一日千秋), 그물을 한번 쳐서 물고기를 모조리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죄다 잡는다는 말을 일망타진(一網打盡), 생각과 성질과 처지 등이 어느 면에서 한 가지로 서로 통함이나 서로 비슷함을 일컫는 말을 일맥상통(一脈相通), 한 번 던져서 하늘이냐 땅이냐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으로 승부를 겨룸을 일컫는 말을 일척건곤(一擲乾坤), 강물이 쏟아져 단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조금도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 또는 문장이나 글이 명쾌함을 일컫는 말을 일사천리(一瀉千里), 하나로써 그것을 꿰뚫었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음 또는 막힘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감을 일컫는 말을 일이관지(一以貫之),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남이나 한편 기쁘고 한편 슬픔을 일컫는 말을 일희일비(一喜一悲),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을 일구이언(一口二言) 등에 쓰인다.
▶️ 言(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은 ❶회의문자로 辛(신)과 口(구)의 합자(合字)이다. 辛(신)은 쥘손이 있는 날붙이의 상형이고, 口(구)는 맹세의 문서의 뜻이다. 불신이 있을 때에는 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맹세로, 삼가 말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言자는 '말씀'이나 '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言자의 갑골문을 보면 口(입 구)자 위로 나팔과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두고 생황(笙簧)이라고 하는 악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고 나팔을 부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言자는 이렇게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부수로 쓰일 때는 '말하다'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갑골문에서의 言자는 '소리'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에 획을 하나 그은 音(소리 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言(언, 은)은 ①말씀, 말 ②견해(見解), 의견(意見) ③글 ④언론(言論) ⑤맹세(盟誓)의 말 ⑥호령(號令) ⑦하소연(딱한 사정 따위를 간곡히 호소함) ⑧건의(建議), 계책(計策) ⑨허물, 잘못 ⑩혐극(嫌隙: 서로 꺼리고 싫어하여 생긴 틈) ⑪이에 ⑫요컨대, 다시 말하면 ⑬여쭈다, 묻다 ⑭기재하다, 적어넣다 ⑮소송하다 ⑯이간하다(離間;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다) ⑰알리다 ⑱예측하다 ⑲말하다 ⑳조문하다, 위문하다 그리고 ⓐ화기애애 하다(은) ⓑ화기애애 하면서 삼가는 모양(은) ⓒ위엄(威嚴)이 있는 모양(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말씀 화(話), 말씀 설(說), 말씀 어(語), 말씀 담(談), 말씀 사(辭), 말씀 변(辯),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글월 문(文), 호반 무(武), 다닐 행(行)이다. 용례로는 말로나 글로써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일을 언론(言論), 어떤 일과 관련하여 말함을 언급(言及), 사람이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나 글자로 나타내는 수단을 언어(言語), 말과 행동을 언행(言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언중(言衆),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입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언사(言辭), 말로 한 약속을 언약(言約), 말을 잘 하는 재주를 언변(言辯), 입담 좋게 말을 잘 하는 재주를 언설(言舌), 말로써 옥신각신 함을 언쟁(言爭), 상대자가 한 말을 뒤에 자기가 할 말의 증거로 삼음을 언질(言質), 말과 글을 언문(言文),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표현 속에 만만치 않은 뜻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언중유골(言中有骨), 여러 말을 서로 주고 받음 또는 서로 변론하느라 말이 옥신각신 함을 이르는 말을 언거언래(言去言來), 서로 변론 하느라고 말이 옥신각신 함을 이르는 말을 언삼어사(言三語四), 말하고 웃는 것이 태연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근심이 있어도 평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침착함을 이르는 말을 언소자약(言笑自若), 말인즉 옳다는 뜻으로 말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뜻을 이르는 말을 언즉시야(言則是也), 말과 행동이 같음 또는 말한 대로 행동함을 언행일치(言行一致),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언어도단(言語道斷),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뜻으로 말만 꺼내 놓고 실행이 부족함을 이르는 말을 언과기실(言過其實), 말이 천리를 난다는 뜻으로 말이 몹시 빠르고도 멀리 전하여 퍼짐을 일컫는 말을 언비천리(言飛千里), 말 속에 울림이 있다는 뜻으로 말에 나타난 내용 이상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언중유향(言中有響),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는 뜻으로 들은 말을 귓속에 담아 두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언유재이(言猶在耳), 말 가운데 말이란 뜻으로 순한 듯 한 말속에 어떤 풍자나 암시가 들어 있다는 말을 언중유언(言中有言), 두 가지 값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에누리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언무이가(言無二價), 남의 인격이나 계책을 깊이 믿어서 그를 따라 하자는 대로 함을 이르는 말을 언청계용(言聽計用), 하는 말과 하는 짓이 서로 반대됨을 일컫는 말을 언행상반(言行相反), 말은 종종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언유소화(言有召禍), 태도만 침착할 뿐 아니라 말도 안정케 하며 쓸데없는 말을 삼감을 일컫는 말을 언사안정(言辭安定) 등에 쓰인다.
▶️ 喪(초상 상)은 ❶회의문자로 丧(상)은 통자(通字), 丧(상)은 간자(簡字)이다. 사람이 숨는다는 뜻을 가진 兦(망; 亡)과 나무 잎이 떨어져 없어지다의 뜻을 가진 (악; 哭)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다의 뜻이 전(轉)하여 물건을 잃다의 뜻이 있다. ❷회의문자로 喪자는 '잃다'나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喪자는 마치 衣(옷 의)자에 口(입 구)자가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喪자를 보면 桑(뽕나무 상)자 주위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뽕나무를 잘라 죽은 사람의 위패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喪자는 뽕나무 주위에 口자를 그려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었지만, 금문에서는 여기에 亡(망할 망)자가 더해지면서 '죽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喪(상)은 사람이 죽은 뒤, 그 친족이 고인(故人)에 대하여 추도(追悼) 근신(謹愼)하는 예(禮)의 뜻으로 ①잃다, 잃어버리다 ②상복(喪服)을 입다 ③죽다, 사망하다 ④상제(喪制) 노릇을 하다 ⑤망하다, 멸망하다 ⑥도망하다, 달아나다 ⑦잊어 버리다 ⑧허비하다 ⑨복(服: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 ⑩초상(初喪) ⑪시체(屍體) ⑫재해(災害)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잃을 실(失),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얻을 득(得)이다. 용례로는 종래 가지고 있던 기억이나 자신이나 권리나 신분 등을 잃어버림을 상실(喪失), 초상난 집을 상가(喪家), 잃어 버림이나 망하여 없어짐을 상망(喪亡), 아내의 상고를 당함을 상처(喪妻), 시체를 싣고 묘지까지 옮기는 제구를 상여(喪輿), 부모나 조부모의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을 상제(喪制),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던 예복을 상복(喪服), 주장이 되는 상제(대개 장자가 됨)를 상주(喪主), 상제의 몸으로 있는 동안을 상중(喪中), 상제로 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예절을 상례(喪禮),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하고 맥이 빠짐을 상심(喪心), 초상이 난 일이나 사람이 죽은 일을 상사(喪事), 남의 상사에 대하여 슬픈 뜻을 나타냄을 문상(問喪), 상가에 대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인사를 함 또는 그 인사 문상을 조상(弔喪),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동안을 초상(初喪), 얻음과 잃음을 득상(得喪), 부모의 상을 당하고 있음을 거상(居喪), 주검을 산소로 나르는 일을 행상(行喪), 초상집의 개라는 뜻으로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상가지구(喪家之狗),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비유한 말을 상명지통(喪明之痛), 넋을 잃고 실의에 빠짐을 일컫는 말을 상혼낙담(喪魂落膽) 등에 쓰인다.
▶️ 邦(나라 방)은 ❶형성문자로 邫(방)의 본자(本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우부방(阝=邑; 마을)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계(境界)를 뜻하는 글자 丯(봉, 방)으로 이루어졌다. 경계를 나타내는 우거진 수목(樹木)으로 이루어졌다. 경계 내(內)의 부족(部族)의 뜻이, 전(轉)하여 나라의 뜻으로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邦자는 '나라'나 '수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邦자는 丰(예쁠 봉)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초목이 무성하게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우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邦자를 보면 田(밭 전)자 위로 풀이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밭에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람들이 '터전을 잡은 곳'이라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田자 대신 邑자가 쓰이게 되었는데, 의미 역시 확대되어 '나라'나 '수도'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邦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한(漢)나라 때는 태조 유방(劉邦)의 이름과 겹치는 것을 피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國(나라 국)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邦(방)은 성(姓)의 하나 ①나라 ②서울, 수도(首都) ③제후(諸侯)의 봉토(封土) ④천하(天下) ⑤형(兄), 윗누이 ⑥제후를 봉하다 ⑦여지(輿地)를 주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나라 국(國)이다. 용례로는 나라의 정치를 방치(邦治),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사회를 방가(邦家),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사회나 나라를 방국(邦國), 서울에 가까운 땅으로 서울 근교를 방기(邦機), 나라와 나라가 사귀는 관계를 방교(邦交), 나라의 근본을 방본(邦本), 나랏말을 방어(邦語), 자기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를 방화(邦畫), 나라에서 금하는 일을 방금(邦禁), 나라의 풍속을 방속(邦俗), 나라의 형률을 방형(邦刑), 나라의 경계를 방경(邦境), 나라의 경사를 방경(邦慶), 나라의 길흉의 의식을 방례(邦禮), 나라의 사업을 방업(邦業), 자기 나라 사람을 방인(邦人), 다른 나라를 수방(殊邦), 동맹을 맺은 나라를 맹방(盟邦), 가까이 사귀는 나라를 우방(友邦), 나라를 합침을 합방(合邦), 모든 나라를 만방(萬邦), 우리 나라를 아방(我邦),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방(東邦), 각 나라 또는 여러 나라를 각방(各邦), 힘이 강한 나라를 강방(强邦),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일컫는 말을 부모지방(父母之邦), 예의를 숭상하며 잘 지키는 나라를 일컫는 말을 예의지방(禮儀之邦),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위방불입(危邦不入),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모로 노력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다난흥방(多難興邦)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