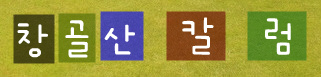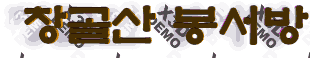|
본 메일은 님께서 카페가입시 동의 하였기에 발송되었으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카페 내정보에서 수정해 주세요 | |||||||
|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만찬양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주일날 예배 후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른다.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에만 가끔 다녔기 때문에 몰랐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주일날 점심식사를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가끔 무슨 특별한 날,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일 년에 네 차례 정도 교인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전주로 이사를 가서 한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갔다. 나는 원래 대형교회를 피하고 주로 개척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를 다녔다. 그 일로 인하여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1984년도에 옆 면소재지로 학교를 옮기면서 교회도 옮기게 되었는데 면소재지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하나, 합동 측 교회 하나 해서 장로교회가 두 개 있었다. 통합 측 교회는 큰 교회로서 역사가 오래된 기성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개척한 지 삼사년 된 합동 측 작은 교회였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통합 측 면소재지 교회였었다. 그러니 내가 새로 나갈 교회도 통합 측 교회일거라고 예측되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는 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 내 이름이 그 근방에서는 꽤나 유명짜했으니까.
나는 그 해 9월 1일자로 학교를 옮겼다. 9월 첫 주에 나는 작은 교회를 나갔다. 상가 2층에 월세로 임대를 한 손바닥만한 교회였다. 좁은 면적에 그나마 방을 하나 들여 목사님 식구들이 기거했다. 아이들이 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성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합하여 10여명 남짓이었다.
다음 날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이 큰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나에게 말했다. “어제 교회에서 안 보이데요? 헌금자 명단 호명할 때에 이름은 들었는데.” 나는 의아했다. 난 분명히 작은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누군가 내가 올 줄 알고 미리 내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해 주었던 모양이다. 누군지 전혀 짐작이 안 갔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나에게 점심을 먹여주었다. 나는 자취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취방에 가서 혼자 찬 밥 먹기가 싫어서 염치불구하고 밥을 얻어먹었던 것 같다. 목사님은 정말 가난했다. 가끔 학부형들이 가져다준 수박(그 지방의 특산물이 수박과 땅콩이었다.)을 목사님 댁에 갖다 주곤 했다. 엄청 맛있고 큰 수박이었다. 그 때는 땅콩도 굉장히 고소하고 달착지근해서 맛있었다. 지금은 그런 맛 나는 수박과 땅콩을 맛보지 못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로 땅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찬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 때부터 주일날 점심식사를 만찬교제라고 부른다. 3년 6개월 후에 전주로 이사를 갔다. 전주에서도 집 근처의 아주 작은 교회, 개척한 지 2~3년쯤 된 교회를 다녔다. 그 교회는 그 때에는 예배실 외의 다른 방이 없어서 주일날 점심 때 만찬교제를 하지 못했다. 1년쯤 후에 그 교회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한 후부터 만찬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다. 그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교우들은 지금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또는 친척보다 더 반갑다. 물론 우리는 그 때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불렀다.
2012년 3월 24일, 토요일이었다.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내게 물었다. “내일 식사 당번이 누구입니까?” “김권사님이죠.” “오늘 권사님 엄청 바쁘시겠네.” “내일 점심 식사 반찬이 눈에 선하네. 냉이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침, 봄동 배추 겉절이, 고사리나물 볶음, 파김치, 들깨탕, 동태찌개 등이 눈에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점심 식사를 차리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괴성을 질렀다.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은 까닭이었다. 그리고 나의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졌다. 10여년 함께 지내다보니 그분들 취향을 상당 부분 파악하게 되었다. 물론 그분들 또한 우리 부부 음식 취향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대주는 반찬으로 거의 먹고 산다. 내가 요리하는 것은 기껏해야 된장국 정도이다. 된장 또한 성도들이 준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12명의 좀 젊은 여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밥 당번을 한다. 40대 중반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이다. 일 년에 네 번 정도 차례가 돌아온다. 일 년에 네 번이니 대체로 한 계절에 한 번 꼴이다. 그러니 반찬은 각 사람당 계절 반찬이 정해져 있다. 시골이니 찌개감과 몇 가지의 재료만 장을 보고 나머지는 대개 텃밭에서 장만하는 것들이다. 부식비로 매 주 6만원씩 지급한다. 10년 전, 처음에는 3만원이었다. 해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아무리 동결할래야 동결할 수가 없다.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에 6만원으로 올렸다. 그래도 찌개감 사기도 빠듯하다고 한다. 우리 교회 주 멤버들인 노인 성도님들이 생선매운탕을 좋아하시므로 생선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산다. 주일날 점심 때 60~70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 날 점심 식사 시간, 모두들 감탄, 또 감탄이었다. 봄 냄새가 물씬 나는 밥상을 대하는 행복감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10가지가 넘는 반찬들. 어느 집사님은 여느 한정식 식당보다도 반찬이 더 풍성하다고 단언했다. 도시에서 살다가 이사 온 지 몇 달 안 되는 집사님이 말했다.“장로님, 오늘 누구의 생일인가요?” “내 생일.” 장로님과 김권사님은 부부이다.
“우리 집 생일상보다도 더 풍성해요. 봄나물이 총동원되었네요. 아, 이 나물 좀 봐. 정말 맛있네요. 봄 냄새가 향긋하게 나요. 봄이 왔다는 게 오늘 정말 실감이 나네요.”
독거노인들은 식사를 맛있게 드신다. 홀아비 신자들도 맛있게 드신다. 일주일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오늘 다 보충하고야 말겠다는 듯. 행복한 비명들. 우리들의 행복한 점심식사 시간.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만찬 교제 시간이었다. 남자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만족하여 집으로 간다. 맛있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풍성함을 안고. 그러나 여 성도들은 대부분 남아서 상을 치운 후 뜨끈뜨끈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50대부터 90대까지이다. 세대 충돌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식당 방은 와글와글, 두런두런, 실컷 입 운동, 혀 운동을 한다.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오후 3시.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을 30분 한다. 3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린다. 4시 20분경이면 일주일분의 행복을 안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간다.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좋아서 웃으며 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에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행복해서 환하게 웃으며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올 때나 집에 갈 때나 늘 환한 미소를 짓는다.
사족 같은 이야기 한 토막. 이웃교회에서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교회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이다. 어느 해에 도시에 살던 장로님 한 분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시골에서 멋지게 살려고 이사를 왔다. 장로님인지라 교회 생활도 열심(熱心)이 넘치셨다. 금방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여 성도들이 많아서 한 사람이 한 주 씩 식사 당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밥 먹는 수가 100여 명이다 보니 식사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거창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반찬은 반드시 3가지만 하기로. 그러나 시골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규칙에 얽매여 살던가. 몇 명은 잘 지켰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손이 좀 큰 어느 여 성도님의 차례가 되었다. 그 분은 규칙을 깜빡 잊고 그만 반찬을 4가지 준비했다.
점심시간, 칼같이 정확히 규칙적인 그 장로님이 대노하였다. 그 장로님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리라. “이 학생은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백언이 불여일행(百言 不如一行)이라고 했것다. 그가 한 가지 반찬을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그 날 밥을 먹은 모든 성도들은 소화불량에 걸렸다. 한 사람도 찍소리 못하고 밥만 우적우적 씹었다. 숨소리 하나 안 나고 밥 씹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이건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이다. 어쨌든, 분위기는 살벌했다. 무슨 군대 같았다. 결국 그 장로님, 얼마 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고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은 많이 다르다. 어린 시절에 <시골 쥐와 서울 쥐>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가끔 ‘나는 시골 쥐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번잡한 것도 싫고 시끄러운 것도 싫다. 특히 차바퀴 구르는 소리, 클랙슨 소리 등이 싫다. 매연은 더더군다나 견딜 수 없다. 바쁜 것도 싫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느림>의 인생철학에 동감했었다.
지금은 <느림>이 <빨리빨리>에 밀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분위기이다. 한국에서는 <느림>이 적응하지 못하는가 보다. 원체 다들 ‘빨리빨리’, ‘후딱후딱’이 몸에 익숙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시골의 80대, 90대 노인들의 삶이 느려서 좋다. 그다지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하루 세 끼 먹고 맘 편히 살면 족한 그런 삶이 내 취향이 아닐까 싶다. 남편이 가끔 말한다.“당신은 시골이 제격이야.”출처/창골산 봉서방 카페 (출처 및 필자 삭제시 복제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