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메일은 님께서 카페가입시 동의 하였기에 발송되었으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카페 내정보에서 수정해 주세요 | |||||||
|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말끝마다 인생은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시드는 한 포기의 풀과 같고 아침에 맺혔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수청리 축현 마을 골짜기에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심심하면 사자성어를 한자로 쓰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초로인생(草露人生)’이라는 것이었다.
2011년 12월의 어느 겨울 날, 남편과 나는 나무를 하러 갔다. 우리 교회에는 나무 난로가 있고 사택에는 나무 보일러가 있으므로 여가를 활용하여 부지런히 나무를 해야 한다. 겨울에서 봄까지 산에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난해에 간벌을 해놓아 산속에 방치돼 있는 통나무를 실어오는 것이다.
남편은 산속에 누워있는 통나무를 산 아래쪽으로 밀쳐내 트럭에 싣고 있었고 나는 주변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감독의 직책을 주곤 한다. 순창에서 목회를 하는 정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그 교회에 놀러 갔다. 산골마을이었다. 정목사님도 난방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우리 교회 나무 난로와 나무 보일러 얘기를 듣더니 즉시 자기도 설치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모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이유인즉슨, 나무 난로나 나무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면 그 나무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지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해요. 분명코 나더러 함께 하자고 할 거예요.”
정목사님은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 꼭 사모님에게 거들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엄두가 안 나니 그만 두겠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데 어떻게 연약한 사모님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며 혼자서도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정목사님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사모님에게는 정녕코 감독의 직책을 드려야지요.”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통나무를 싣고 있을 때 한 초로의 남자가 나무막대기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며 산길을 내려왔다. 나는 산지기 아저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야 산지기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산마다 산지기가 있어서 자기네 산에서 누가 행여나 나무를 가져가지 않나 하고 감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산속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도 힘들여 그것을 가져다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드물어 아무라도 거저 가져갈 수 있는 시대이다. 그는 나무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무를 갖다 뭐하는 겁니까?” “집에 나무 난로와 나무 보일러가 있어서요.” “아, 부럽습니다. 나무 난로가 있으면 얼마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까요.” “예, 저희는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보낸답니다. 운동 겸 조금만 수고를 하면 겨울 내내 난방비 하나 안 들고 따뜻하게 지내지요.” “생각 한 번 잘하셨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있는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다고 했다. 사실은 두 집인데 한 집은 군산에 본가가 있어 주말에만 온다는 것이었다. 자기 집을 한 번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무를 끝내고 그의 집을 들렀다. 남편의 옷이 더러워져 있으므로 잠시 마당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에게 기회가 오면 전도를 할 양으로 그를 만났고, 그는 사람이 그리워서 우리를 만나는 듯싶었다.
그는 젊어서 KBS방송국 자재과에서 근무하다가 50대 중반에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암으로 죽고 자녀들도 없어서 거치적거리는 것 없이 욕심도 없이 손수 채소를 가꾸어 무공해 반찬을 만들어 먹으며 살고 있었다. 주변 야산의 3000여 평 되는 땅을 일구어 나무도 심고 염소를 방목으로 50여 마리 키우고 있었다. 그는 청빈생활과 무욕의 삶을 즐기며 산다는 것이었다. 언제 한 번 다시 정식으로 놀러 오라고 말했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초로인생’ 같다고 얘기했다. 언젠가 시간을 내어 그의 집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기로 했다. 2012년 2월의 어느 날, 김 집사님과 함께 셋이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 2월인데도 산그늘에 햇빛이 안 비치는 언덕길에는 겨울 내내 내렸던 눈이 안 녹아 길이 엄청 미끄러웠다. 평지에는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날이어서 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너무 무서웠다. 차가 미끌리면서 휘청거렸다. 차가 계곡에 처박히면 어쩌나 하며 손잡이를 꽉 잡고 온 몸에 힘을 주었다. 워낙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겨우 그 집 대문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돌아갈 일이 걱정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니 지레 겁이 나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목사님은 양복을 말쑥하게 입고, 나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젊은 여 집사님을 대동하고 찾아가니 그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쨌든, 그곳에 펜션이 몇 채 있으므로 아마 손님으로 알고 반갑게 맞이한 모양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겉돌기에 내가 물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글쎄, 어디서 뵌 것도 같은데 통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두어 달 전에 저 앞산에서 나무하던 사람들이예요.” “아, 전혀 딴 모습이라 몰라 뵈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오시니 알아볼 수가 없네요. 참, 옷이 날개라더니, 전혀 딴 사람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면서 여기 저기 구경시켜 주었다. 그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草露人生’을 여기 저기 써 놓았다. 한 구석에는 자그마한 주막을 꾸며 놓고 메뉴도 걸어 두었다. 막걸리 - 3,000원, 파전 - 5,000원, 매실차 - 3,000원, 보리밥 - 5,000원.
“아니, 여기서 장사도 하세요?” “아니요. 재미로 써 놓은 거예요, 하하하.”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손수 담근 매실즙을 한 잔 대접해 주었다. 자기가 심어 가꾼 매실을 따서 담갔다고 했다. 자주 놀러오라고 했다. 그날은 전도를 하지 못했다. 그는 유교사상이 깊이 박힌 사람 같았다. 그 날은 전도의 접점을 찾지 못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이 참 많다. 외로운 자들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외롭지 않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출처/창골산 봉서방 카페 (출처 및 필자 삭제시 복제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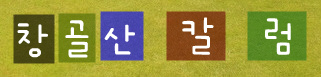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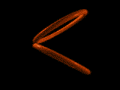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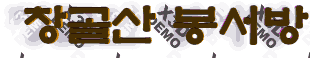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