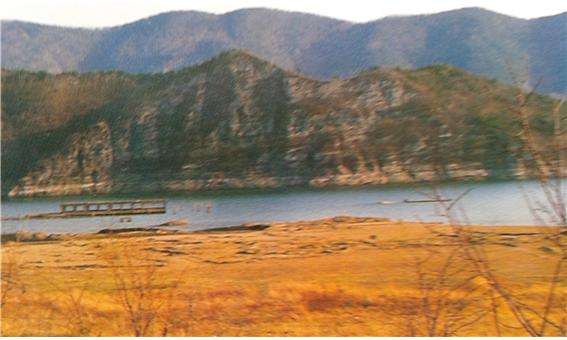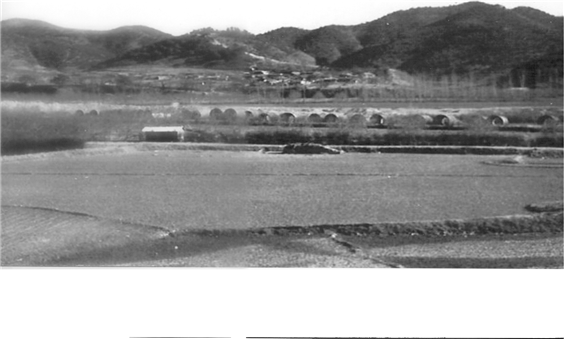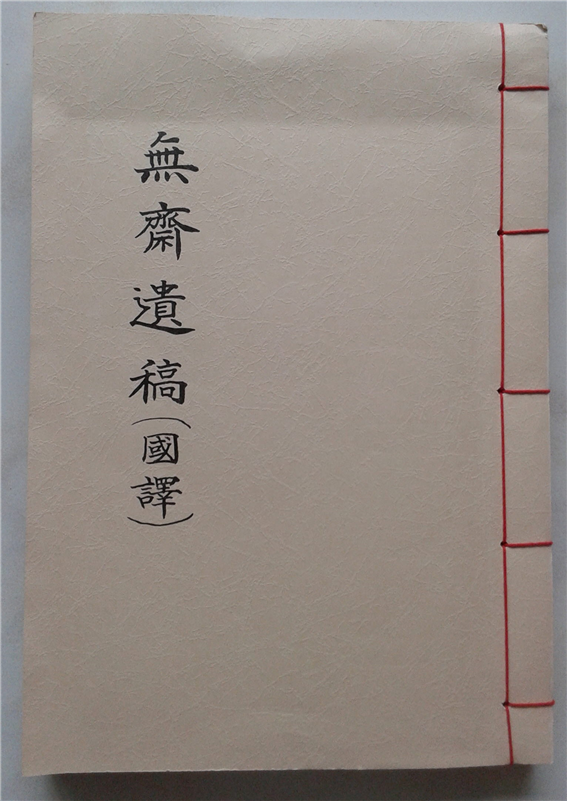삼휴공(三休公) 셋 아드님 유사(遺事)-무재공(無齋公)
삼휴공이 조부 호수공께서 자호정사를 지어 사우(士友)들과 교유했던 인구마을에 살림나 살았던 선고장(先故庄)에서 아들 삼형제와 딸 한분을 낳아 기르셨다. 장남 사과공(휘 시우), 차남에 귀연공(휘 시희), 삼남에 무재공(휘 시찬)이다. 아버지 삼휴공께서 돌아가실 때 삼형제분의 나이는 사과공이 20세, 귀연공은 11세, 무재공은 4세로 어렸다. 그러나 조상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유가(儒家)의 후예로 정진하여 무관 또는 유생으로 훌륭히 빛이 났다.
다음은 셋 분의 유사를 묘갈명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
三. 무재공(無齋公) 휘 정시찬(鄭時贊) 유사
네 살 때 아버지 삼휴공(三休公 넷살때 아버지 삼휴공께서 돌아가시고 또 4년 후인 여덟 살에 어머니께서
돌아갔으니 조실부모(早失父母) 하였다.외롭게 자란 공으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여 형제들과
같이 조용한 집에 조 조용한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낮과 밤으로 공부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집에는 집에는 장서(藏書)를 많이 하여 책을 돌려가면서 독파(讀破)하였다. 그리고 많은 유생들과
그리고 많은 유생(儒生)들과 주 주유(周遊) 하였으며, 만년(晩年)에는 형제간(兄弟間)에 떨어져있음을 한탄(恨歎)하여
서둘러서 귀향(歸鄕)하여 장 장전(章田)으로 가서 여울 위에 집 한 채를 짓고 그곳에서 만년(晩年)을 보내셨다.
무재공께서 우리 문중의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다.
인구마을이 수몰 후 나타난 모습이다.
삼휴공께서 살림을 자양(紫陽)의 인구마을에 난 것은 조부 호수공(湖叟公)께서
자호정사를 지어 은거(隱居)하신 땅이기에 호계가에 삼휴정을 짓고,
아들 장남 사과공, 차남 귀연공, 삼남 무재공을 성장시킨 곳이다.
위 사진은 수몰 직전의 언덕에 자리한 귀미마을의 모습이다.
이곳은 사과공이 관계(官界)를 떠나 인구마을에서 귀미마을로 옮겨
귀연공과 무재공 두 아우와 더불어 학문(學問)을 토론(討論)하고 담락(談樂)하게 지냈으며, 증조부 호수공께서 강학하시던 강호정이건너다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귀미마을은 삼휴고택과 삼휴정이 있었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수백 년간 살았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중간에 보이는 둥근관은 영천댐 건설공사의 자재들임)
이 삼휴고택은 삼휴공께서 인구마을에 살림나 살았는데, 아들인 사과공이 관직에서
퇴임하여 1655년에 인구마을에서 귀미마을로 옮겨 집을 지어
대를 이어 수백 년 간 주손(冑孫)이 살았던 집이다.
지금은 하천에 이건 되어 유형문화재 72호로 보전되고 있다.
삼휴정은 삼휴공이 학문연구와 당대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하던 곳으로
1635년에 인구마을에 삼휴공께서 건립한 삼휴정을 훗날 후손들이
귀미마을로 옮겨 오늘의 정자를 건립하였다.
1970년대에 유형문화재 75호로 지정되어 하천으로 이건 되었다.
무재공께서 무재공께서 청도에 살다가 만년(晩年)에는 형제간(兄弟間)에 떨어져 있음을
한 한탄(恨歎)하여 서둘러서 귀향(歸鄕)하여 장밭(章田)으로
가 가서 여울 위에 집 한 채를 짓고 대나무와 꽃나무를 심어
그곳에서 만년(晩年)을 보내었다.
위 사진 사진은 수몰 후에 들어난 인구의 윗마을인 장밭의 앞시내이다.
묘소(墓所)는 묘소(墓所) 자양면(紫陽面) 도일리(道日里) 대우령(大牛嶺) 기곡(基谷)에 있다.
다. 배위의 배위 묘소(墓所)는 자천리(慈川里) 어봉동(魚峯洞) 간좌(艮坐)에 있다.
국역본(國譯本) 무재유고(無齋遺稿)
을 을사(1725년)에 무재공의 유고 및 자료가 소실되어, 1775년에 증손 휘 일강(一鋼)께서
남은 자료를 찾아 유 유집을 발간되었는데, 2006년에 다시 보완하여 국역본을 재간하였다.
1715년에 증 증손 휘 일강(一鋼)께서 남은 자료를 찾아 유집을 발간되었는데,
2006년에 다시 보완하여 국역본을 재간하였다.
o무재공(無齋公) 유사(遺事)를 정리해보면
공 휘(諱)는 시찬(時贊19世)이요 자(字)는 우경(虞卿)이며,
무재(無齋)는 그 자호(自號)이다.
1.가계(家系) : 公은 迎日人으로 고려시대 명신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휘 습명(襲明)이 시조이다. 판서(判書) 휘 인언(仁彦 8世)께서 처음 永川에 사셨고, 판서(判書) 휘 광후(光厚 9世)와 사성(司成) 휘 종소(從韶 12世)는 벼슬을 하셨고, 노촌(魯村) 휘 윤양(允良 15世)께서는 퇴계선생(退溪先生)의 문하생이다.
증조부(曾祖父) 호수(湖叟) 휘 세아(世雅 16世)께서는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 되셨고, 강의공(剛義公)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조부(祖父) 휘 수번(守藩 17世)은, 벼슬로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냈다. 아버지는 휘 호신(好信 18世)는 호(號)가 삼휴정(三休亭)이며, 승훈랑(承訓郞)이요, 손모당(孫慕堂)과 장여헌문(張旅軒門)에서 성리학(性理學)을 배웠다.
어머니 성(成)씨는 관향이 창녕(昌寧)이고 도원도찰방(桃源道察訪) 휘 이직(以直)의 따님이며 립(立)의 손녀이다. 무재공은 삼휴공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2.생몰(生沒) : 인조(仁祖) 24년 병술(丙戌)(1646년) 1월 12일에 자양(紫陽) 본댁(本宅)에서 출생(出生)하니 타고난 성품이 온순(溫淳)하고 용자(容姿)가 준매(俊邁) 註1) 하여 보통 아이와는 달았다고 한다. 공은 숙종(肅宗)35년 기축(己丑)(1709년) 3월 6일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이 64세였다. 묘소(墓所)는 자양면(紫陽面) 도일동(道日洞) 대우령(大牛嶺) 기곡(基谷)에 있다. 배(配)는 밀양(密陽)박씨(朴氏) 오(傲)의 여(女)로 인조(仁祖)16년 무인(戊寅)(1638년) 12월 22일에 나시어 숙종(肅宗) 43년 정유(丁酉)(1717년) 4월 1일에 돌아가시니 향수(享壽) 팔십(八十)으로 묘소(墓所)는 자천리(慈川里) 어봉동(魚峯洞)간좌(艮坐)에 있다.
o註1) 준매(俊邁) : 재주와 지혜가 매우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3.면학(勉學) : 네 살 때 아버지이신 삼휴공(三休公)께서 돌아가시고 또 4년(四年) 후인 여덟 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린 나이에도 장례와 제사에 어른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중부(仲父)이신 해남공(海南公)께서 심(甚)히 기특(奇特) 하게 여기셨으며, 백부(伯父)이신 명계공(明溪公)에게 가서 수학(受學)하도록 하였다. 그르다 얼마 안 되어 명계공(明溪公)께서 돌아가시자 다시 중부(仲父) 해남공(海南公)께서 수양(收養)하여 가르쳤다. 그것은 외롭게 자란 공으로 하여금 일과공부(日課工)에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은 더욱 분발하여 형제들과 같이 조용한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낮과 밤으로 공부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해남공(海南公)께서 탄식(歎息)하시면서 삼휴가(三休家)에는 이 아이가 유업(遺業 )을 이으리라 하였다.
4.과거공부(科擧工夫)에 노력(努力) : 16세에 결혼(結婚)하여 출입(出入)을 넓히며 과거공부(科擧工夫)에도 힘쓰면서 필법(筆法)이 경건(勁健)註2)하여 과거장(科擧場)을 출입할 때 여러 부형(父兄)들의 시권(試券)을 반드시 써 주었으나 자신(自身)이 합격(合格)되고 불합(不合格)된 것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 번 응시(應試) 했으나 번번이 낙방(落榜)하니 웃으면서 “영도(榮道)에는 운(運)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집에는 장서(藏書)를 많이 하여 책을 돌려가면서 독파(讀破)하셨고, 그 중에서도 중용(中庸) 대학(大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서적을 가장 좋아하였다. “마음을 수습하고 몸을 살피는 데는 이 책들같이 간절한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재종형(再從兄)인 학암공(鶴岩公)에게도 취정(就正)註3)하고 종질(從姪) 함계공(涵溪公)과도 강마도의(講磨道義)註4)하였다.
o註2 경건(勁健) : 굳세고 튼튼하다.
o註3 취정(就正) : 도(道)를 닦은 사람에게 나아가 자기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바르게 함.
o註4 강마도의 (講磨道義) : 도의를 강론하고 연마함.
5.청도생활(淸道生活) : 공(公)은 밀양박씨(密陽朴氏)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신축(辛丑) (1661년)에는 가족들을 대리고 풍각리(豊角里)로 이거(移居)하였다. 처가(妻家)가 매우 부유(富裕)하여 옥토(沃土)를 많이 주어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생업(生業)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시(詩)와 술을 즐겼으며, 고향으로 돌아 올 때는 처가의 종손(宗孫)에게 그 전토(田土)를 모두 주었다고 한다.
6.유생(儒生)들과 주유(周遊) : 청도에서는 그 지방의 유생(儒生)들과 교유(交遊)하였고, 특(特)히 송와(松窩) 안명하(安命夏)와는 교분(交分)이 심(甚)히 두터웠다. 경진(庚辰)(1700년)에는 우도(右道)註6)에도 주유(周遊)하며 많은 명사(名士)들과 학론(學論)을 궁구(窮究)註7하고 지명(知名)을 넓혀 갔다.
o註5) 주유(周遊) : 두루 돌아다니면서 유람하는 것.
o註6) 우도(右道) : 경상도의 낙동강 서쪽지역.
o註7) 궁구(窮究) : 속속들이 깊이 연구함.
7.귀향(歸鄕) : 만년(晩年)에는 형제간(兄弟間)에 떨어져 있음을 한탄(恨歎)하여 서둘러서 귀향(歸鄕)하여 장전(章田)註8)으로 가서 여울 위에 집 한 채를 짓고 대나무와 꽃나무를 심어 그곳에서 만년(晩年)을 보내었다. 그는 집안이 쓸쓸하고 쌀 한가마니도 없이 가난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조금도 개의(介意)치 않고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온 종일 꿇어앉은 채로 글만 읽으면서 그 심오(深奧)註9 한 뜻을 탐구하여 황홀하게 마음속으로 깨우쳐 갔다. 만년(晩年)에는 주역(周易)을 좋아하여 그 굴신소장(屈伸消長)註10)하는 이치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고 한다.
o註8) 장전(章田) : 인구(仁邱)의 윗마을.
o註9) 심오(深奧) :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오묘하다.
o註10 굴신소장(屈伸消長) : 주역에 나오는 말로 팔, 다리를 굽혔다 폈고,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나다.
8.갈암 이선생(葛菴 李先生)과 관계 : 신사춘(辛巳)(1701년) 봄에는 청원(淸源)에 살고 있는 갈암이선생(葛菴李先生)을 찾아뵙고, 학문하는 방법을 묻자 선생은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받아들인 그 아량을 매우 높이 평가(評價)하였고, 그 후 선생이 작고하였을 때는 제문(祭文)을 지어 가지고 가셨다. 돌아오는 길에 갈암(葛菴)을 배종(陪從)註11)한 영해 유림(寧海 儒林)들과 토론(討論)도 하였다.
o註11) 배종(陪從)) :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 가는 일.
9.문풍(文風)을 크게 떨침 : 을유(乙酉)(1705년)에는 임고동주(臨皐洞主)가 되어 매월 초하루가 되면 여러 유생들을 모아 놓고 향음주례(鄕飮酒禮)註12)를 행(行)하였으므로 문풍(文風)이 크게 떨치셨다. 수시로 임암서원(立巖書院)에 모여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병와이공(甁窩李公)과도 교분(交分)이 두터웠는데 그가 말하기를 “정모(鄭某)는 산남(山南)의 결사(傑士)이다.”라 극찬(極讚)하였다.
o註12) 향음주례(鄕飮酒禮) : 예전에 온 고을의 유생들이 모여서 향약(鄕約)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던 일.
10.명승고적(名勝古蹟) 탐방 探訪) : 공의 성품이 이름난 산수를 좋아하여 경상도에 있는 명승고적(名勝古蹟)을 모두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횡계(橫溪)를 자주 가셨다. 그 후 두문병적(杜門屛迹)註13)하고 학문(學問)의 오묘(奧妙)註14)를 탐구(探究)하였다.
o註13) 두문병적(杜門屛迹) : 밖으로 출입을 아니 하려고 방문을 닫아 막고, 자취를 감추어 버림.
o註14) 오묘(奧妙) :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묘하다.
11.무재(無齋) 자호(自號) : 공은 일찍이 무재(無齋)로 편액(扁額)註15)을 하여 그 뜻을 해석하기를 “천하의 사물(事物)에 대한 이치는 무(無)한 가운데 유(有)한 것이다. 석씨(釋氏)註16)의 무(無)는 허무(虛無)하여 적막하지만 우리 유도(儒道)의 무(無)는 무(無)하면 감응(感應)하기 때문에 나의 재실(齋室) 이름으로 한것이다.“고 하여 훈수(塤叟)와 지수(篪叟) 양 선생이 그 의의(意義)를 서술(敍述)하여 기록하였다.
o註15) 편액(扁額) :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o註16) 석씨(釋氏) : 불가(佛家)>의 무(無)는 허무(虛無)하여 적막하지만 우리 유도(儒道)의 무(無)는 무(無)하면
감흥(感興)한다.
12.자손(子孫) : 1남(男) 2여(女)를 두었으니 남(男)은 석관(碩寬)이요 사위는 경주(慶州) 최남형(崔南衡)과 김해(金海) 김상정(金尙鼎)이다.
o 석관(碩寬) 子에 重文, 重武를 두었다.女는 金在重, 權榮湛에 시집갔다.
13.무재유고(無齋遺稿) 발간 : 乙未(1715년)에 증손 휘一鋼께서 을사사화(1545년)註17)에 소실로 무재공에 대한 유고 등이 없어져 최제달의 所藏인 경북지방을 유람시의 무재공의 시와 훈지록의 齋記와 제문 등을 모아 매산공의 교정 등을 통해 유집이 발간되었고, 2006년에 다시 11세손 省三이 보완하여 국역본을 중간하였다.
o註17)을사사화는 표면적으로는 윤씨 외척간의 싸움이었으나 사림파에 대한 훈구파의 공격이었다. 1498년(연산군4)이후 약 50년간 관료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대옥사(大獄事)는 을사사화로서 마지막이 되었다.
<참고문헌>1. 處士無齋鄭公墓碣文 - 族後孫 華植 撰
2. 無齋遺稿 -증손 一鋼, 11세손 省三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