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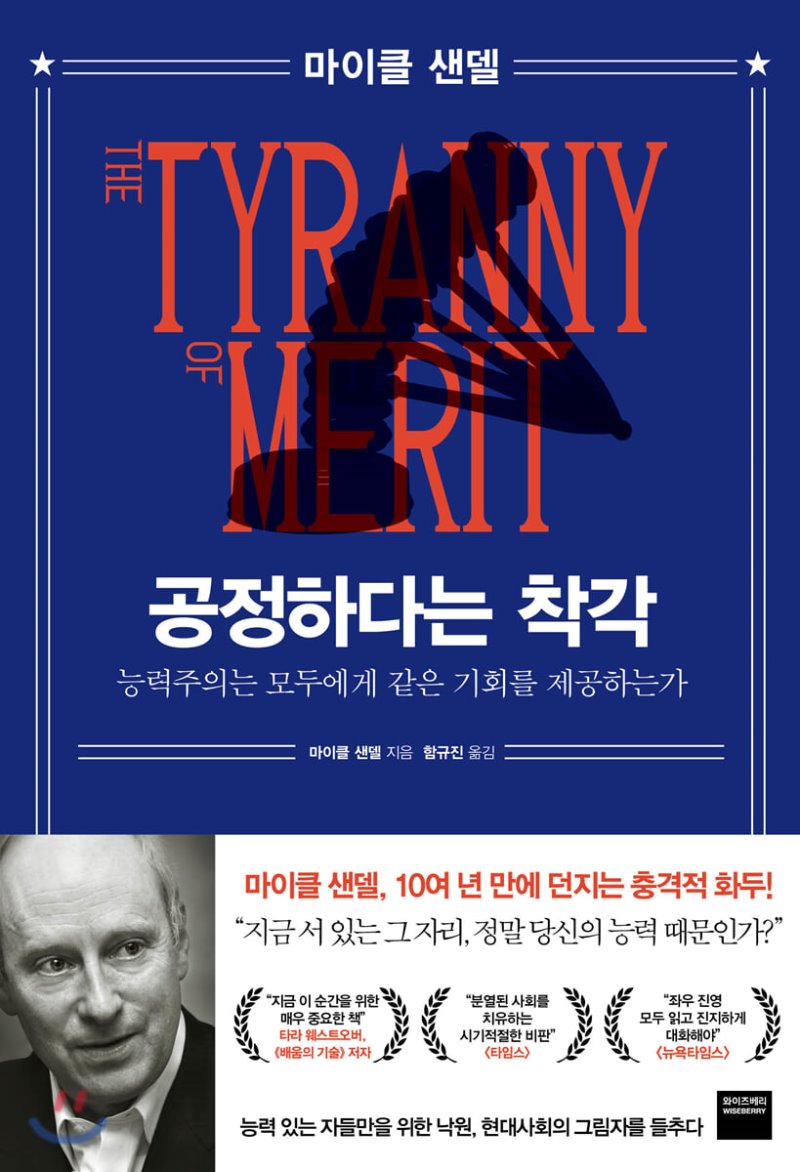
마이클 샌델 저/함규진 역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01일
| 원제 : Tyranny of Merit
목차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입시의 윤리 | 능력 지표 따내기
CHAPTER 1.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 능력주의 윤리 | 굴욕의 정치 | 기술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 포퓰리즘의 준동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 우주적 능력주의 | 구원과 자기 구제 |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 부와 건강 | 자유주의적 섭리론 | 역사의 옳은 편 | 도덕 세계의 궤적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 시장과 능력 | 자기 책임의 담론 |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 포퓰리즘의 반격 |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 보는 것과 믿는 것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무기가 된 대학 간판 |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 최고의 인재들 |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 학력 간 균열 | 기술관료적 담론 |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 기후변화 논란
CHAPTER 5. 성공의 윤리
기술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 시장과 능력 |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 쟁취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 성공에 대한 태도 | 운수와 선택 | 재능 계산하기 | 능력주의의 등장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능력주의 쿠데타 | 능력주의의 폭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다 | 코넌트의 능력주의 유산 | 돈 따라 가는 SAT 점수 |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는 이유 |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 인재 선별 작업과 사회적 명망 배분 | 상처 입은 승리자들 | 또 하나의 불타는 고리를 넘어라 | 오만과 굴욕 | 유능력자 제비뽑기 |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 명망의 위계질서 |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내주기
CHAPTER 7. 일의 존엄성
일의 존엄성 하락 | 절망 끝의 죽음 | 분노의 원인 |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 기여적 정의 |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 ‘열린 어젠다’의 오만 |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책 속으로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반드시 ‘정의’로 귀착될까?]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까지 새겨넣었다.
[나만큼은 능력으로 올라왔어]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능력은 ‘부’로 입증되기에 생명조차…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
최근의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은 도움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들은 레이건처럼 은연중에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런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을 만했다. 다만 불우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 환경 인종 성차별에는 반대하면서 저학력자에겐 편견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의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에 대해 쑥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계층 상승, 미국보다 중국이 쉽다고?]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돈 따라 가는 수능 점수]
SAT는 수학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다섯에 하나다. 가난한 집(연소득 2만 달러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오십에 하나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이다.
--- 본문 중에서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47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