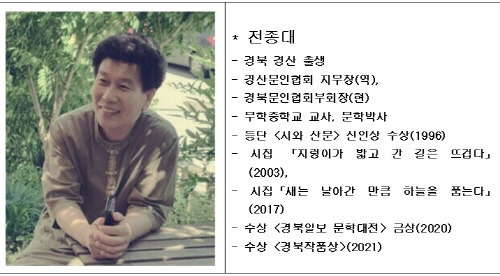<원시인의 시로 여는 세상>
민병도 「백지 앞에서」
- 경산인터넷뉴스 2025. 7. 21.

백지 앞에서
민병도
백지 앞에 붓을 들고
곰곰이 생각느니
무엇으로 이 깊디깊은
침묵을 깨울 것인가
깨어난 침묵이 장차
이 백지를 능가할까
『새벽 물소리』, 목언예원, 2025.
삶은 모두 백지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제 붓을 들고 그 백지 위에 자신의 삶을 그려나간다. 우리는 모두 그 텅 빈 백지에 색을 그려 넣는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응시하고는 ‘백지의 침묵’을 발견한다. 백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저 우주의 무한천공 같이 우주는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붓을 들고 그리는 순간 백지는 출렁거린다. 백지의 침묵을 두드려 깨운다. 그런데 시인은 두려워한다. 붓에 의해 ‘깨어난 침묵이 장차/이 백지를 능가할까’라고. 이 시조의 매력은 대반전을 가져온 마지막 종장의 이 구절에 있다. 노자식을 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인위人爲가 무위無爲를 어떻게 능가할까.
시조집 『새벽 물소리』의 ‘시인의 말’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시조에 등장하는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 말에 견주어 본다면 ’백지‘는 ’달‘ 자체이다. ’달‘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작업이 ’달의 침묵‘을 깨뜨려 우리 앞에 보여주지만, 정작 ’나타난 침묵‘은 본디 있었던 ‘달의 침묵’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안다. ‘달의 침묵’은 ‘백지의 침묵’이요, ‘백지의 침묵’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한가능성의 세계이다. 그 무한가능성의 백지에 붓을 드는 일이 시인의 일이지만, 그 백지의 정수에 도달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고 붓을 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예술가의 삶이다. 붓에서 재탄생하는 즉, ‘말이 상징하는 공간’이 시인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존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그 창조적 풍경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지’라고 고백한다. 시인의 한계성과 자존감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다.
달이 떴다. 캄캄한 우주 공간에 둥근 달이 떴다. 백지가 펼쳐졌다. 말 없는 침묵이 밤새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