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교도의 거인 존 오웬 (John Owen)
'강용원 교수의 글모음'에서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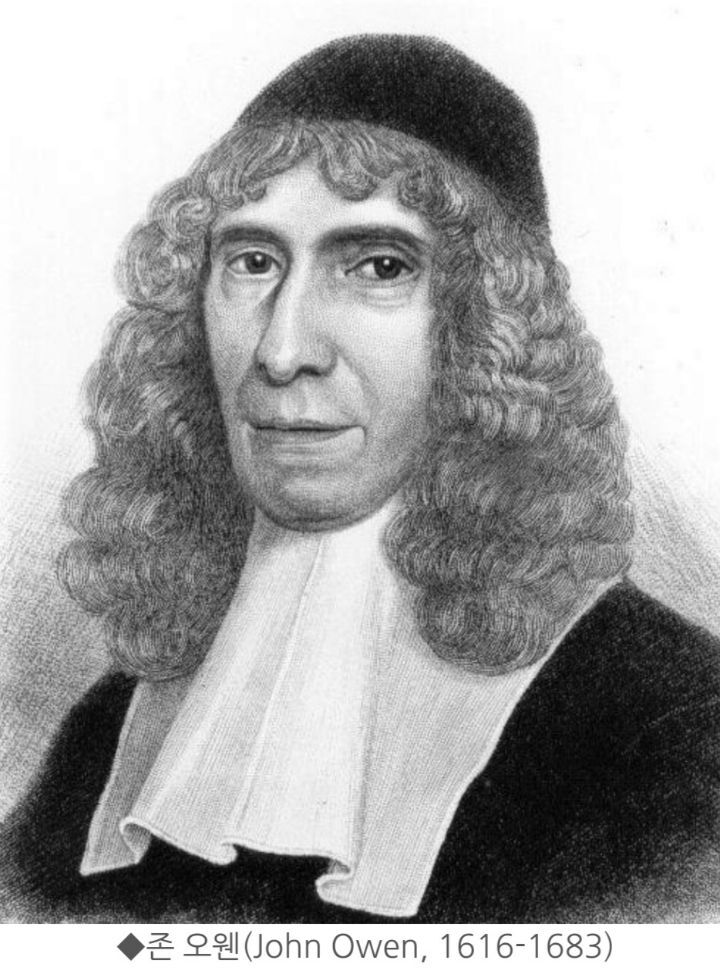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은 경건한 학자이며 지도자였고 작가였다. 그는 크롬웰(Oliver Cromwell)을 도와 공화정을 이끌고 왕정복고 이후 박해받던 청교도들을 지도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개신교 교리를 옹호하였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열망하고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켈트족의 후예였고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였다. 옥스퍼드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옥스퍼드의 퀸즈대학(Queen’s College)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2세에 옥스퍼드에 입학한 오웬은 16세에 학사학위를 19세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았다.
그는 1637년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의 성공회 정책에 반대하다가 대학에서 추방되었다. 1642년부터 에섹스(Essex)에 거주하던 중, 1647년에 한 교회(the parish of Fordham)의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였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그는 장로정치주의자였으나 존 코튼(John Cotten)의 영향을 받아 회중주의자가 되었다.(1) 그는 크롬웰의 종군목사로 활동(1649-1651)하였으며 이어서 옥스퍼드대학의 부총장에 부임하여 옥스퍼드를 청교도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1651-1660). 그는 1654년에 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658년에는 런던에서 모인 독립파모임인 사보이 총회(Savoy Conference)를 이끌었다. 그는 1660년 왕정복고로 옥스퍼드를 떠나 1683년 사망할 때까지 설교와 저술활동을 계속하였다.
오웬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성공회주의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항상 공정하고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만인구원설’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옹호하였다. 그는 보편 속죄론을 비판하면서 제한 속죄는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기능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였다.
오웬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하여 확신하였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목회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목사가 되려면 방언이나 예언의 특별한 은사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례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았고, 성찬을 은혜계약의 인장(印章)으로 이해했다. 또한 복음적인 교리, 생활, 예배로부터 떠나는 것이 배교라고 지적하였다.

오웬은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놀라운 지성을 소유한 그는 방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체계화하여 글로 옮기는 재능이 있었다. 평생 80여권의 책을 펴냈는데 그가 쓴 책 대부분은 지금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인을 이끄는 지도서가 되고 있다 16년에 걸쳐 완성한 역작 『히브리서주석』은 17세기 학문의 정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의 저서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글은 대중적인 문체의 백스터(Richard Baxter)나 번연(John Bunyan)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는 대중들의 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의 신학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오웬이 남긴 공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그에게 있어서 양식이며 버팀목이었다. 그의 학문 역시 그가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였다. 학문은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파고 들었다. 그는 자녀 11명을 두었으나 안타깝게도 10명은 어려서 죽었다. 오웬은 천식과 담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1683년 숨을 거두었다.
1721년에 로버트 애스티(Robert Asty)는 짧은 ‘회고록’(Memoir)에서 그를 잘 아는 한 사람이 오웬을 묘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다.
“인간으로서의 그는 키가 크고 용모는 위엄이 있으나 유머가 넘친다. 그는 태생에 걸맞게 신사의 면모와 몸가짐을 지녔다. 그는 매우 폭넓은 정신적 능력을 가졌으며, 준비된 창의성, 훌륭한 판단력,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진보된 타고난 지혜를 가졌다. 이러한 특징은 그를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성격은 상냥하고 예의바르며 친숙하고 사교적이어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와의 대화와 사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평소의 대화에서는 즐겁고 유쾌하였으며 친한 사람들에게는 농담도 잘 했으나 그에게는 또한 진지함과 냉철함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았는데 특히 분노에 관해서이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명예, 신용, 친구, 또는 재산으로 인해서 고무되지 않았고, 곤경과 어려움에 우울해 하지 않았다.”
----------
(1) 17세기의 회중정치사상은 오늘날의 장로정치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오늘날 회중교회가 교회의 자율과 교직자의 평등만을 강조하고 교회의 연합을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17세기의 회중교회는 교회연합과 노회와 대회제도를 인정했다. cf. 오덕교, 『종교개혁사』(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2),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