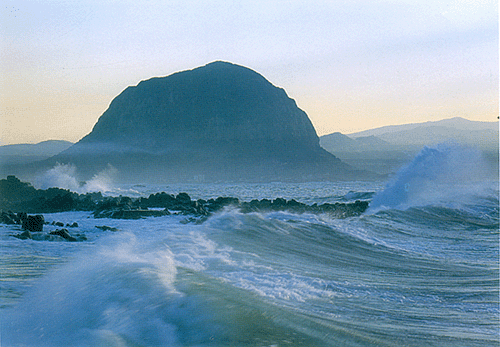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사춘기든 오춘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 보았을 질문이다.
해답은 쉽지 않고 어쩌면 어쩌면 평생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
살면서 이 질문 속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또다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나를 목도하고 진저리를 친다.
글쓰기이든 아니든 뭐든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뭐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하고 해낼 것이다.
내 안의 본능이 염력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날고뛰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늙어가며 긴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나를 본다.
며칠 전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인터넷을 열고 '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찾았더니...에게?
그게 뭐냐면 <괜찮아>였다. 피식하고 웃고 말았다.
다른 이에게 글로 용기를 줘야 할 사람이 도로 무슨 용기를 달래....?
밥벌이의 버거움'이라 하더니 나도 그런 걸 느낀다.
나이가 든 탓일까 최근에야 인생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안다.
그렇지만 어젯밤까지 난 내가 그토록 힘들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줄은.... 의식하지 못했다.
자다가 소리가 들려 눈을 떴더니 맙소사 내가 입으로 무슨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치 합창 연습을 하듯 끊어졌다 이어졌다.
<아ㅡㅡ 아ㅡ 아ㅡㅡ> 이렇게...
자려고 눈만 감으면 그 소리가 다시 나와 무서웠다.
깨어 있음과 잠의 연결고리에서 잠 안으로 연결고리가 뚝 끊어지는 순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잠 속으로 빠지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건 뭐지?
나에 대한 투시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꾹꾹 눌러 앉히고 살면 이런 소리가 날까?
그 생각을 하자, 내게 연민이 솟구쳤다. 심연 깊이 말할 수 없이
얼마나 앓고 앓았으면 무의식중에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인가.
병원에 누워 있는 그들 보다 나는 평탄한 삶을 산다고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나의 외적 인격과 내 안의 인격은 다르단 말인가.
그럼에도 어느 한구석에는 삶의 진리를 찾지 못해 신열을 앓고 있었구나.
사랑의 홍역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누구도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은 캄캄한 어둠이 덮쳐왔다.
습자지처럼 얇은 종이가 얼굴을 뒤덮고 그 위에 물을 뿌렸다.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며 누구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성 사랑엔 이기심만 따른다는 걸 알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진정으로 환한 깨달음은 언제 나를 찾아올 것인가.
답답하다. 그렇다고 어린애처럼 답답하다고 소리를 내지르며 울 수도 없다.
차분하게... 고요하게 숨을 쉰다.
그러다가도 느닷없이 삶이 내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저 뼛속까지 말라가는 느낌은 뭐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글만 쓸까?
그럼 다 괜찮아지려나.
그것도 아니야.
꽃잎의 유서를 쓸 때 그 500쪽 분량이나 되는 소설을 끝낼 수만 있다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
가수 연습생이 너무나 어려운 연습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수만 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다는 말처럼 나도 그랬어.
그러나 아니잖아.
정작 가수가 되어보면 연습생 때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게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나도 그와 같다.
꽃잎의 유서라는 제목의 소설이 너무 무거워 이것만 털어내면 몸이 가벼울 거라 믿었지.
드디어 탈고를 한 후, 나는 어떠했나?
더 나은 책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소박한 내게 꽃잎의 유서는 작은 작품은 아니었다.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는 극한 고통을 느끼며 써냈다.
그렇게 결국 6개월 만에 500쪽을 다 써냈다,
전문가들이 너무 빨리 썼다고들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써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다 끝났으나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주인공 진희가 그리웠다.
내 마음의 뿌리를 찾지 못해 빙빙 돌았다.
다시 그 같은 글을 쓰라면 뼛속까지 말라들어가는 고통을 다시 느낄 것이다.
머리칼은 그때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다.
그래도 쓰고 싶다.
마이크로칩은 큰 고통 없이 슬슬 나오는 대로 쓴 글이다.
일부 문인들이 마이크로칩이 좋다고 했다.
아 모르겠다, 일단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한다.
눈을 감으니 엉뚱하게 산비탈 초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셰퍼드 한 마리가 보인다.
가까이서 보니 못생겼다. 무슨 개가 저렇게 뚱뚱하단 말인가.
이리저리 킁킁대며 저돌적인 날뛰는 모습은 흡사 산돼지 같다.
셰퍼드는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다 아무 곳에나 돌진하다 넘어지곤 했다.
못생긴 게 영리하기라도 해야지....
했는데 셰퍼드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나에게 할 소리란다.
아냐,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너처럼 무지하지 않아. 그렇게 막무가내도 아니고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또한 뚱보하고는 거리가 멀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셰퍼드가 혀를 길에 내밀며 킬킬 웃었다.
누가 봐도 비웃음인데 참 가관이었다. 그 흐르는 침 하고는....
토하고 싶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홀가분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럼 나는 뭐지? 바보니? 너처럼 저돌적인 뚱보니?"
셰퍼드는 내 말에 한동안 큰 소리로 '으하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은 길고도 음흉했다.
"넌 네가 지혜로운지 알지? 너만큼 세상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다고....
넌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어리석게 보는지 모르겠니? 바보야 너만 모르고 있어.
그리고 넌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쁘지도 않아. 또 하나,
글이 밥이 안되니까 도망 가려는 거잖아... 아냐?"
그 말을 끝으로 셰퍼드는 거대한 멀티비전 속으로 사라지고 공터에 나만 남았다.
멀티비전 속에 내 모습이 나타날까 봐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무서웠다.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무서웠다,
너무 달려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숨통이 터지지 않아 괴로웠다.
잠에서 깨어나자 머리에 물기가 흥건했다.
더웠던 것일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뻘판에서 죽기 살기로 기어 나온 사람 같다.
그나마 빨리 깨어났으니 다행이다.
수건으로 머리칼을 닦고 선풍기를 틀어 몸을 말렸다.
웬 셰퍼드가 내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셰퍼드라니....
데굴데굴 구르고 뒤집어지는 것 같다.
무대 아래로...
토하고 싶도록 슬픈 영혼의 무늬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진짜하루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6.06 수검프님, 여기에 그대에게 편지를 쓴다.
어떤 종이든 통하면 되겠지요.
사부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때 잠깐 만나고 그리고 만나지 못했자나.
나, 사부 생각하면 한없이 쓸쓸하고 외로워,
그래도 허브님이 옆에 있어 다행이긴 한데.....
겨울목님도 그 추운 날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나를 부르더라
영상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어떤지도 모르겠구.... 그분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썼지.
이제 우린 뭔가 해야지.
나 안 도와 줄거야?
난 꽃잎의 유서 재출판 하고 마이크로칩 조선문학에 연재를 할 생각이에요.
나 안 도와 줄거야.
나 혼자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빨리 내게 전화 주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