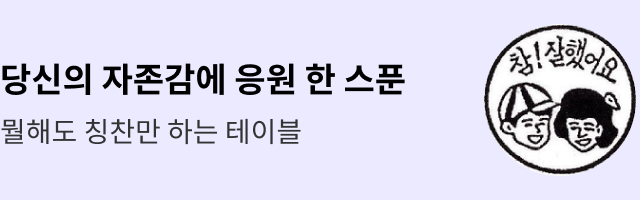나. 아비담마의 개요
우리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세계에 태어난 것, 그리고 그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들에서도 우리는 형색과 소리 등의 감각대상들을 경험했었다. 우리는 과거에 대상들에 집착했었고 지금 현재도 되풀이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깊이 뿌리박힌 성향이 되었다.
탐욕은 모든 마음순간마다 생기지는 않지만 탐욕스러운 성향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전달’된다. 생긴 각 마음은 모두 완전히 사라지지만, 성향은 다음 마음에 계승된다.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마음들의 끊임없는 연속들로 선하거나 불선한 성향들은 전달된다. 우리는 모두 탐욕을 축적해 왔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한 수저가 혀에 닿는 순간 맛에 대한 탐욕이 생길 기회이다. 인간계에는 감각대상들에 대해서 탐욕스러워할 기회가 많이 있다.
부처님 출현 전에도 감각대상들을 경험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안 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감각대상들에 대한 탐욕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선정의1* 단계까지 사마타 수행을2* 했다. 여러 단계의 선정 마음(Jhāna citta)들은, 감각접촉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범천계에서4* 재탄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범천계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맛을 즐길 조건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선정(禪定): (absorption), jhāna.
2* 사마타 수행: (tranquil meditation), 집중 명상, 고요 명상, samatha.
3* 색계 선한 마음, 무색계 선한 마음을 말한다.
4* 범천계(梵天界): 첨부 8. “세상” 중의 색계(12~27번) 세상과 무색계(28~31번) 세상을 말한다.
그러나 선정을 닦아도 집착은 근절되지 않는다. 집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재탄생하게 된다. 범천계에서의 수명이 끝나면 집착하게 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며, 집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지혜를 계발하지 않으면 집착을 더욱 축적하게 된다.
맛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각대상들을 즐길 수 있는 인간계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한다는 사실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의 결과를 생기게 하는 데 단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현상을 생기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들이 있으며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조건들은 실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교과서에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나마)들,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루빠)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조건 지어진 현상들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것이다. 정신과 물질이 생기는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는 ‘무아’의 의미를 더 많이 이해할 것이다. 가르침을 공부하고 숙고하는 것은, 사띠를 생기게 하고 실재들을 직접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며, 이는 언젠가는 자아에 대한 사견인 유신견의 근절로 인도할 것이다.
사띠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언제나 함께 생기는 아름다운(소바나) 마음부수(쩨따시까)이다. 사띠는 선법을 잊지 않는 것이며, 여러 수준의 사띠가 있다. 통찰지(위빳사나 지혜)가 계발되면 사띠는, 나타나는 정신이나 물질을 직접 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조건 지어진 현상들인5* 마음(찟따)과 마음부수(쩨따시까)와 물질(루빠)이다. 조건들 때문에 생긴 것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은 무상하다. 열반(닙바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므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5* 조건 지어진 현상들: saṅkhara dhammas, (conditioned phenomena).
마음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며,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의문은6*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인지하는 문(門. dvāra)이며, 대상들은 이 문들에 스스로 나타난다. 마음은 혼자 생기지 않고 항상 마음부수들과 함께 생긴다.7* 모든 마음부수들은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마음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다. 마음의 특성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8*
6* 의문(意門): 의문전향식이 일어나기 직전의 바왕가 마음 19가지.
7* 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부수가 일어나는지는 첨부 4. “마음-마음부수의 자세한 도표”
8* 첨부 9. “선심-불선심-무기 마음” 참조.
선심(善心, kusala citta)
불선심(不善心, akusala citta)
과보심(果報心, vipākacitta) 9*
작용 마음(唯作心, kiriyacitta) 10*
9* 과보심에는 선업의 과보인 것과 불선업의 과보인 것이 있다.
10* 작용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명칭이므로 간단하게 “작용 마음”이라고 하기로 한다. 원인이나 결과가 되지 않는 마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마음부수들은 함께 생기는 마음과 같은 종류에 속한다.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함께 생기는 마음부수인 ‘반드시들 sabba-citta-sādhāraṇa’은 일곱 가지 즉 접촉, 느낌, 인식(산냐),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마나시까라)이다.11* 네 가지 종류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기는 하지만, 모든 마음과 항상 함께 생기지는 않는 마음부수인 ‘때때로들 pakiṇṇaka’은 여섯 가지 즉 일으킨 생각(위딱까), 지속적 고찰(위짜라), 결심(아디목카), 정진(위리야), 희열(삐띠), 열의(찬다)이다. 나아가서 불선심이 생길 때에만 함께 생기는 불선 마음부수akusala cetasika 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마음이 생길 때에만 함께 생기는 아름다운 마음부수 sobhana cetasika 들이 있다.
11* 첨부 4. “마음-마음부수의 자세한 도표” 참조.
정신과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같은 물질적 토대를12* 가지며, 그것들은 같은 대상을 경험하고 함께 사라진다.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같은 의식계에13* 존재한다. 그것들은 감각대상들을 경험하는 욕계의 마음(여기에는 불선한 마음, 뿌리 없는 마음, 욕계 아름다운 마음이 있음)일 수도 있고, 색계나 무색계의 선정 마음일 수도 있고, 열반을 경험하는 출세간의 마음일 수도 있다.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서로 조건이 된다.
12* 정신과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 마음은 몸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되는 토대(physical base, vatthu)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물질이다. 예를 들면, 눈[眼根]이라는 물질은 눈 의식[眼識]의 토대이고, 귀, 코 등은 귀 의식[耳識], 코 의식[鼻識] 등의 토대이다.
13* 의식계(意識界, plane of consciousness): 마음의 특성에 따라 마음을 분류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및 출세간 마음 모두 네 가지를 말한다. 세상(plane of existence)는 인간계, 지옥, 천상계 등 존재가 태어난 장소를 말한다. 첨부 8. “세상” 참조.
물질은 홀로 생기지 않고 무리 지어서 생기며, 업, 마음, 온도나 음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14* 그러므로 홀로 생기는 실재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생기게 하는 다른 현상들에 의존한다.
14* 몸의 깔라빠들(groups of rūpas of the body)은 이 네 가지 요인 중의 한 가지에 의해서 생기고, 몸의 깔라빠가 아닌 것은 온도에 의해서만 생긴다. 첨부 10. “물질의 분류” 참조.
나아가서 단 하나의 원인(조건)만으로 생기는 실재는 없고, 함께 생기는 몇 개의 조건들이 동시에 생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치즈를 맛볼 때, 설식(舌識, 혀 의식)이 생기려면 몇 개의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설식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 과보심이다. 그것은 역시 업에서 생기는 혀라는 물질에 의해서도 조건 지어진다. 혀는 설식이 생기는 토대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설식이 맛을 경험하는 문(門, 드와라)이다. 맛이라는 물질은 설식의 대상이 되므로 설식의 조건 중의 하나이다. 모든 마음과 항상 함께 생기는 접촉(팟사)은, 설식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맛과 ‘접촉’한다. 접촉이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대상을 경험할 수 없다.
실재들이 모두 가지각색의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통증과 기쁨이 자아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들 자체의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기쁨과 통증의 많은 순간들이 있다. 생기는 현상들에 대한 조건들을 공부하면, 조건들을 통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정신은 물질의 조건이 되고 물질은 정신의 조건이 된다. 『청정도론』에 정신과 물질의 상호의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15*
15* XVIII, 32. (대림 스님 옮김, 『청정도론3』, 초기불전연구원, 2004, 191쪽) 참조.
“갈대 묶음 두 개가 서로 의지해서 서 있을 때, 각 묶음은 서로 다른 것의 버팀목이 되고, 한 개가 넘어질 때 다른 것도 넘어진다. 이처럼 오온(五蘊)을16* 가진 존재에서 정신과 물질은 상호의존하여 생긴다.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탱해준다. 죽음으로 하나가 무너질 때에는 다른 것도 무너진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6* 오온(五蘊): 다섯 가지 무더기. 우리의 삶의 조건 지어진 현상들은 오온(khandhas, aggregates)
즉 색온(물질의 무더기, 色蘊, rūpa-kkhandha), 수온(느낌의 무더기, 受蘊, vedanā-kkhandha), 상온(인식의 무더기, 想蘊, sañña-kkhandha, perception or remembrance), 행온[行蘊, 상카라(반응, 정신적 형성,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부수)의 무더기, saṅkhāra-kkhandha, formations) 및 식온(識蘊. 마음의 무더기, viññāṇa-kkhandha, consciousness)으로 분류된다.
정신과 물질은 쌍둥이
둘은 서로서로 의지한다.
서로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진다.
막대기로 북을 치면 북에 의지해서 소리가 날 때, 북과 소리는 다른 것이며, 북과 소리는 서로 섞이지 않으며, 북에는 소리가 없고 소리에는 북이 없다. 그와 같이 토대이고 문이고 대상인 물질에 의지하여 정신이 생길 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이며, 정신과 물질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북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생기듯이 물질 때문에 정신이 생긴다.”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것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신과 물질을 혼동하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자아가 아닌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이라고도 알게 될 것이다. 『청정도론』은 조건(빳짜야)을 이렇게 정의한다.17*
17* XVII, 68 (『청정도론3』, 57쪽) 참조.
“어떤 법이 다른 법이 생기거나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하다면, 전자는 후자의 조건이다. 특성을 설명하면 빳짜야는 도와준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다른 법이 생기거나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면, 전자를 후자의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조건, 원인, 이유, 근본, 근원, 기원 등은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리하여 조건 짓는 법(빳짜야 담마)과18* 조건 따라 생긴 법(빳짜윱빤나 담마)이19* 있다.
18* 조건 짓는 법: (conditioning phenomena), paccaya-dhamma.
19* 조건 따라 생긴 법: (conditioned phenomena), paccayuppanna-dhamma.
『빳타나』에는 아비담마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재가 선(꾸살라), 불선(아꾸살라), 그리고 무기(아뱌까따abyākata, avyākata)20*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무기에는 과보심(및 그 마음부수들), 작용 마음(및 그 마음부수들) 그리고 물질과 열반이 있다.
20* 무기(無記): (indeterminate).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 판단할 수 없는 것. 중립인 것.
빳타나는 24가지 조건들을21* 다루며,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다른 현상들의 조건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친다. 그렇게 많은 상세한 것들이 필요한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21* 첨부 6. “24가지 조건” 참조.
『넷띠빠까라낭』은22* 이렇게 말하고 있다.
22* 『도론(導論, The Guide, 넷띠빠까라낭, Netti-pakaraṇa)』, Part III, 16 Modes of Conveying, VII, Knowledge of the Disposition of Creatures' Faculties, §587): 주석가들을 위한 고대의 해설서인데, 붓다고사도 이것을 인용했다. B.C. 3세기에서 A.D. 5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전해졌다고 한다.
“세존께서는
뛰어난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법문하셨고,
보통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혹은 상세하게 법문하셨으며,
둔감한 사람에게는 상세하게 법문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상세히 가르치셨다. 빳타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조건 지어진 현상들이라는 진리를 가르친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이론을 단지 배우기만 한다면 아비담마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
『앗타살리니』에 이렇게 나와 있다.23*
23* 『Atthasālinī(法集論 주석서)』, Expositor I, Introductory Discourse, 24.
“아비담마를 잘못 배운 비구는
형이상학적인 추론에 마음을 지나치게 많이 기울이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 결과 산란하게 된다.”
우리는 빳타나에서 가르치는 조건을 공부하는 목적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조건 지어진 현상들이다.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고 자신을 되풀이해서 일깨워야 한다.
『청정도론』은24* “오온은 조건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뿌리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말한다. 오온은 조건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오온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괴로움(불만족, 둑카)이다.25* 계속해서 『청정도론』은, 오온은 재난이고, 재앙이고, 전염병이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친구인 척하는 적처럼 신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살인자와 같다고 말한다.
24* X, 19. (『청정도론3』, 228쪽).
25* 괴로움(둑카): dukkha, 불만족, 고(苦), unsatisfactoriness.
우리는 오온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기기를 원하고, 삶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번뇌들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않는 한 탄생할 때 오온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재탄생이라는 과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업(선행 혹은 악행)을 짓는다. 계속해서 불선업(아꾸살라 깜마)을 행함으로써 악처에서 재탄생하는 모험을 한다. 업은 축적돼서 나중에 과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수다원 이상의 성자(ariyan)들에게는 악처(惡處)에서 재탄생하는 조건들이 사라졌다.
업만이 아니라 번뇌들도 축적된다. 선심보다 훨씬 더 많은 불선심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풀이해서 번뇌들을 축적하고, 이것들이 슬픔의 원인이 된다. 과거의 조건에 의해 생긴 불선심은 나중에, 현재와 미래에, 불선심이 생기는 조건이 된다. 잠재된 불선한 성향들은 몸에 퍼져 있는 세균과 같아서,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 통찰지에 의해서 오온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한 번뇌들이 성장할 토양이 있는 것이고,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계속된다.
언젠가는 오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생기는 현상들의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빳타나에서 다루고 있는 24가지 조건들을 배우는 것은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