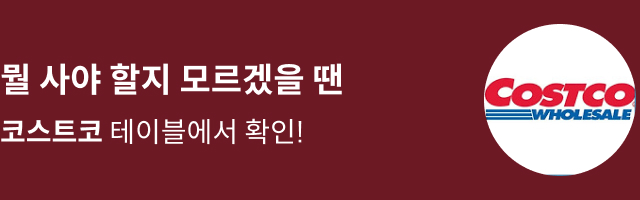감출 때 가장 빛나는 흰빛처럼 윤경예 시집
시작시인선 390
윤경예 지음 | 천년의시작 | 2021년 09월 15일 출간

윤경예 시인 시집 『감출 때 가장 빛나는 흰빛처럼』이 시작시인선 0390번으로 출간되었다. 시인은 전라남도 진도 출생으로 2018년 제1회 남구만신인문학상, 2020년 목포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집 『감출 때 가장 빛나는 흰빛처럼』에서 시인은 생명성의 축제를 통해 죽음의 필연성에 맞서는 면모를 보여 준다. 시집 어디에도 죽음과 생명에 대한 개념적 진술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인은 죽음과 생명의 큰 틀 안에 다양한 회화적 이미지를 흩뿌림으로써 세계의 움직이는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 낸다. 이처럼 시인의 시적 상상력에는 ‘죽음’과 ‘원시적 생명력’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있어, 하나의 유기체로서 호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시인이 볼 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생명과 죽음이고,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생명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다는 시인의 존재론적 인식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시인에게 죽음은 추상이나 개념 혹은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친 생명성 안에 들어 있으며, 죽음은 원시적 삶의 복판에 내던져진 지뢰 같은 것이 된다. 해설을 쓴 오민석(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시인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낼 뿐, 거기에 어떤 의미의 중심을 세우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 시인에게 죽음은 한계이고 절벽이며 사유의 모티브가 된다. 그것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므로 일종의 필연성이며, 궁극적으로 시인의 사유가 향하는 곳마다 죽음의 생생한 현실이 포착되기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죽음의 늪에서도 끊임없이 넘치는 야생의 힘을 찾는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삶에 대한 긍정이다.
저자소개

저자 : 윤경예
전라남도 진도 출생.
2018년 제1회 남구만신인문학상, 2020년 목포문학상 본상 수상.
목차
시인의 말
제1부
개기일식 13
마상청앵도 14
정원의 놀이 16
여자도汝自島 홍련 18
홍은13구역의 오후 20
유작 22
이 잡는 노승 24
좁교를 듣는 밤 26
깨를 볶는 집 28
빗소리와 흰 개 30
윤사월경 32
유리창 개구리 34
구인 광고 36
제2부
오후 세 시의 쏨장이 39
용접공에게 잠을 드릴게요 40
물소비 42
자목련 수선집 44
일각 46
눈 큰 소록小鹿 48
뿔이 붐비다 50
사과나무 전망 52
흰빛이 굴에 가까워질 때 54
왕버들의 몸에는 내성천이 흐른다 56
벽제동 산4-1번지 58
미황사 59
마지막 백야 60
언덕이 말하네 62
제3부
석류 67
오월 사리 혹은 풀치의 춤 68
둥근 밀약 70
단오 전날 72
공터의 비밀 병기 74
가을의 하오, 과전청와 76
좋은 배경 78
첫 문장 80
우리의 발목 82
흑싸리 84
끝물 86
새틴바우어새 88
거기 90
제4부
갈대가 운다 95
항구 96
늑대의 알리바이 98
여름밤이 흐른다 100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를 지나서 102
백일홍 104
기린분수 106
분재의 온도 108
올빼미와 나무와 여우 110
추두부를 먹는 밤 112
당랑권은 왈츠이고 탱고인데 114
빛 115
저 입술을 깨우지 마라 116
구름의 파종법 118
해설
오민석(문학평론가, 단국대학교 교수): 말 없는 선율처럼 120
책 속으로
마상청앵도
봄볕이 내 곁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였죠
봄은 텅텅 채워진 고백인가 봐요
저 고백이라는 꾀꼬리
산과 들과 강을 건너와 있었죠
수양버들 앞에서
황금빛을 닮은 노래를 슬몃슬몃 내보였죠
작은 울음이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그늘이 되었죠 산길이 흐르고 있었죠
나는 말고삐 잡은 종놈이지만
내가 이 세계로 그림자를 끌고 나오기 전
명상을 하고 헛것을 그리는 화가였을라나
그것도 아니라면
노래와 울음이 섞인 길을 짜는 직조공이였을라나
아니지, 내가 봄빛을 물기 많게 이어 붙이는
꾀꼬리였겠죠
아까부터 버들가지에 눈길을 묶어 둔 것은
내가 그리다 만 말굽이 그만 꺾였기 때문인데요
햐, 뭣도 모르는 것들이
저 꾀꼬리가 봄날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히이잉, 말도 콧방귀를 날려 보내는 대낮이었죠
그때 내 몸의 봄이라는 것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가는 말고삐라는 걸 알았죠
오늘은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선 것들이
길가의 무덤에서 아지랑이를 일으켜 세우네요
출판사 서평
혀의 언어로 완성되었으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 말을 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내가 신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쪽.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풍경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속할 필요조차 없는 세계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빛 너머에 있다고 믿는다. 하여 그리는 것도 지우는 것도 제대로 하라고 신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는 육체란 계절을 남겼으리라. 저기, 본연의 색을 버린 누군가 또 말을 걸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