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이부(不更二夫)
정절을 굳게 지키어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不 : 아니 불(一/3)
更 : 고칠 경(曰/3)
二 : 두 이(二/0)
夫 : 지아비 부(大/1)
가정은 최소공동체이다. 세상의 출발점이다. 가정은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처음으로 온전히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한 소년이 한 소녀를 사랑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신의 섭리를 뒤바꿀 수 있는 논리는 없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적지 않다.
명심보감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도리에 따르는 것은 가정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순종은 기정을 제대로 서게 하는 근본이다(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勤儉 治家之本 和順齊家之本).'
사리가 이러함에도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 이혼과 가정 해체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외고집과 폭행, 외도, 경제적 무능력 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사회에 '황혼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 젊어선 꾹 참고 살던 아내들이 인생말년에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부부의 자화상'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동거기간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는 1990년 6.6%로 가장 낮았으나 2010년 27.3%로 늘어났다.
반면 1990년 38.3%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은 지난해 25.0%로 줄어 황혼이혼이 지난해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질렀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가 이웃 연나라에 패하자 항복하라는 연나라의 권유를 물리치고 자살한 충신이자 문사인 왕촉(王?)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맞지 않는다(忠信 不事二君 烈女 不更二夫)'고 절규한 바 있다.
그렇다. 아무리 화가 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고 해도 '은퇴 전후 늙어 힘없는 남편'에게 등을 돌린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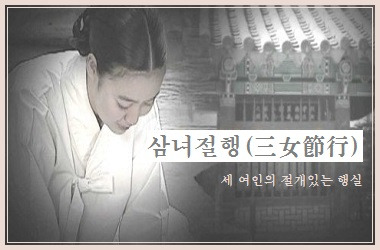
삼녀절행(三女節行)
세 여인의 절개있는 행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제49권 이목구심서 2(耳目口心書二)에서
僇死人李允章妻, 李梧里側室女也, 夫死, 誓死不食哭, 日一啜溢米, 衰麻不去身, 五年而死.
형벌 받다가 죽은 이윤장(李允章)의 아내는 이오리(李梧里; 오리는 이원익의 호)의 소실에서 난 딸이었는데, 남편이 죽자, 죽기로 맹세하여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다가, 하루 쌀 한 줌씩을 먹고 몸에 상복(喪服)을 벗지 않은 채 5년 만에 죽었다.
其妹李時行妻, 丁丑避亂江都, 江都敗, 虜駈子女而歸, 立號曰; 吾完平李相國之女也. 遂自刎.
그의 여동생은 이시행(李時行)의 아내였는데, 정축년(丁丑年)에 강화(江都)로 피난갔다가, 강화가 함락되어 오랑캐들이 자녀(子女)를 몰아가게 되자, 그대로 서서, "나는 완평군(完平君) 이 정승(李相國)의 딸이다"고 부르짖고는 드디어 자결했다.
淑夫人李氏, 梧里長女也, 初聞其妹被擄死, 不哭問故, 然後哭曰; 善乎死也, 不沒其名也.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는 오리의 큰 딸인데, 처음에 여동생이 사로잡히게 되어 죽었다는 것을 듣고도 울지 않다가 까닭을 물어본 다음에 울면서 말하기를, "죽기 잘했다.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열녀는 불경이부(烈女는 不更二夫)
열녀는 불경이부(烈女는 不更二夫)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나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고 죽은 열녀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나병에 걸린 남편을 구하고자 다른 남성을 섬겼던 여성이 남편이 완치된 후 돌아오지만 끝내 자결한다는 이야기이다. 199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노인정에서 최정주(남, 79세)에게 채록한 것으로, 199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간행한 '동작구지'에 수록되어 있다.
옛날에 정승의 아들이 나병에 걸리자 그의 부인이 아들을 막사로 데려온다. 부인이 구걸을 하며 생활하던 중, 부인의 사정을 알게 된 한 남성이 고생하지 않을 터이니 자신과 살자고 하였다. 부인이 남성에게 소고기를 사달라고 하며 또 남편이 괜찮아지면 자신은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나병에 걸린 남편은 고기를 먹고 완치가 되었으며, 남성이 부인의 남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부인을 돌려보냈다. 남편과 집으로 향하던 부인이 자신이 두 남자를 섬긴 것을 문제 삼는데, 남편은 백 남자를 섬겼어도 열부니 괜찮다고 하나 결국 부인이 목을 매 자결하였다.
열녀는 불경이부(烈女는 不更二夫)는 나병에 걸린 남편을 구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설화 가운데에는 아픈 남편을 구하기 위해 훼절(毁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한다. 대개 나병에 걸린 남편을 둔 부인이 부자 남성과 지내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두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편의 죽음을 알고 따라 죽는 이야기, 재산을 받아 남편에게 돌아오는 이야기, 남편을 위해 술을 빚었다가 훗날 이를 마시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 부자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을 죽이고 이를 남편이 먹도록 하여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에서 전해오는 열녀는 불경이부(烈女는 不更二夫)는 나병에 걸린 남편을 둔 부인이 부자 남성과 지내며 소고기를 남편에게 보내 병을 치료하도록 한 후 자결한다는 내용으로 부인 덕분에 병을 치료한 남편과 부인이 개가(改嫁)와 열(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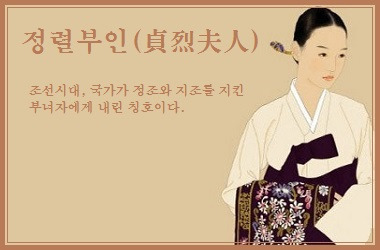
정렬부인(貞烈夫人)
조선시대, 국가가 정조와 지조를 지킨 부녀자에게 내린 칭호이다. 국가에서 특이한 행실을 가진 부인에게 시호로 내린 일도 있다. 충효열(忠孝烈)은 유학을 숭상하는 동양의 근본사상이다. 유학의 발달에 따라 파생한 것이며 공자가 유학을 발전시킬 당시 충과 열의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다.
어느 특정한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충’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것에든지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길이 곧 충이라고 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로 분할된 상태에서 선비는 임금을 가려서 섬겨야 된다고 믿어서 임금을 만나 보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떠나는 것도 곧 충이라 믿었다.
여자도 정조가 강조된 것은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을 때 한해서 여자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공공연하게 개가가 인정되어, 맞이하는데 예만 다한다면 여자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나라가 연나라에 패했을 때 연장(燕將) 악의(樂毅)는 제나라 왕촉(王蠋)의 착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연나라에 출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때 왕촉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거절한 뒤로 충과 효의 개념이 현대와 같이 바뀌었다.
그래서 선비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과 부녀자가 한 남자를 위해 평생 절개를 지키는 것이 긍지가 되었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숭배되었다.
문헌에 나타난 중국의 정렬부인을 보면 위(魏)나라 때 조문숙(曺文叔)의 처 하후문령(夏侯文寧)은 시집이 망하고 남편이 죽자 친정에서 개가시키려는 것을 알고 두 귀와 코를 잘라 처음의 뜻을 관철시켰다.
당나라 봉천두씨(奉天竇氏)의 딸 자매는 도적에게 잡혀가다가 도적들이 후미진 곳에서 겁탈을 하려고 하자 언덕 밑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또한, 당나라 의종(義宗)의 아내 노씨(盧氏)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시어머니를 해치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구해 주었다. 이들은 모두 나라에서 정려의 은전을 받고 정렬부인의 칭호를 얻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때까지는 여자의 정조와 절개가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이 발달하면서 선비의 지조와 여자의 절개가 거론되어 높고 뛰어난 행실로 인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정렬부인을 표창한 것은 1431년(세종 13) 6월이다. 강원감사 고약해(高若海)의 청에 의해 장군 박은덕(朴恩德)의 처 한씨(韓氏), 운산군수 황재(黃載)의 처 김씨(金氏)와 울진군에 거주하는 소장(小莊)이라는 여인, 원주 백성 김준(金俊)의 처, 정선군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처,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처, 평해군에 거주하는 황귀인(黃歸人)의 처 등 7명에게 포상을 내렸다. 이것이 부녀자의 정절을 권장해 포상한 효시가 된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부인의 절개 있는 행동과 높고 뛰어난 행동이 포상되어 마을의 풍속을 제도해 나갔다. 그리고 정절은 부녀자 일개인의 명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문의 명예를 좌우하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 나라 씨족들 가운데 가장 정렬부인이 많이 난 성씨는 현풍곽씨(玄風郭氏)라고 한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부적절(不適切),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나 죽여 없애야 할 원수를 일컫는 말을 불구대천(不俱戴天),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불문가지(不問可知),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사의(不可思議),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일컫는 말을 부정부패(不正腐敗), 지위나 학식이나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두고 이르는 말을 불치하문(不恥下問),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으로 마흔 살을 이르는 말을 불혹지년(不惑之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을 일컫는 말을 불요불급(不要不急),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이르는 말을 불요불굴(不撓不屈),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길인데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감을 이르는 말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등에 쓰인다.
▶️ 更(고칠 경, 다시 갱)은 ❶회의문자로 매를 손에 들고 강제를 뜻하는 攴(복)과 음(音)을 나타내며 동시(同時)에 '분명하다'의 뜻(炳; 병)을 가리키는 丙(병, 경)으로 이루어졌다. 분명한 쪽으로 '향하게 하다'의 뜻이 전(轉)하여, '새롭다, 다시'의 뜻이 있다. ❷회의문자로 更자는 '고치다'나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更자는 '고치다'라 할 때는 '경'이라 하고 '다시'를 뜻할 때는 '갱'으로 발음한다. 更자는 曰(가로 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更자의 갑골문을 보면 탁자 앞에 회초리를 든 손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탁자와 회초리를 그린 것이 '개선하다'와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이것은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들어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更(경, 갱)은 (1)하룻밤 동안을 다섯으로 나눈 그 하나 (2)중국 항해(航海)의 이정. 1경은 60리임, 등의 뜻으로 ①고치다 ②개선(改善)하다 ③변경(變更)되다 ④바뀌다 ⑤갚다, 배상(賠償)하다 ⑥잇다, 계속(繼續)하다 ⑦겪다 ⑧지나가다, 통과(通過)하다 ⑨늙은이 ⑩밤 시각(時刻) ⑪임기(任期) ⑫번갈아, 교대로, 그리고 ⓐ다시(갱) ⓑ더욱(갱) ⓒ도리어, 반대로(갱) ⓓ어찌(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될 화(化)이다. 용례로는 어떤 직위의 사람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임명함을 경질(更迭), 옛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을 경신(更新), 거문고의 줄을 고치어 맴 전하여 해이한 사물을 고치어 긴장하게 함을 경장(更張), 바르게 고침을 경정(更正),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남을 갱생(更生), 다시 생각함을 갱고(更考), 지면이 좀 거칠고 품질이 낮은 종이의 한 가지를 갱지(更紙), 다시 읽음을 갱독(更讀), 다시 논하거나 거론함을 갱론(更論), 다시 어찌 할 수 없음을 갱무(更無), 잘못된 마음을 고침을 갱심(更心), 다시 고쳐 바로 잡음을 갱정(更正), 바꾸어 고침을 변경(變更), 밤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돌아 다님을 순경(巡更), 번갈아 교대함을 천경(踐更), 다시는 어찌할 도리 없음을 일컫는 말을 갱무도리(更無道理),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타파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자력갱생(自力更生), 열녀는 두 번 시집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을 열불이경(烈不二更),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이르는 말을 해현경장(解弦更張) 등에 쓰인다.
▶️ 二(두 이)는 ❶지사문자로 弍(이)는 고자(古字), 弐(이)는 동자(同字)이다. 두 개의 손가락을 펴거나 나무젓가락 두개를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둘을 뜻한다. 수의 둘을 나타내는데 옛 글자 모양은 아래 위가 거의 같은 길이로 썼다. 위를 조금 짧에 쓰면 上(상; 위)이란 글자의 옛 모양이 된다. ❷상형문자로 二자는 '둘'이나 '둘째', '두 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二자는 나무막대기나 대나무를 나열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나무막대기를 일렬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숫자를 표기했다.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 한다. 그러니 二자는 두 개의 나무막대기를 나열하여 '둘'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한자에는 획이 나란히 나열된 글자가 있어서 간혹 二자가 쓰일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모양자 역할만을 할 뿐 뜻은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二(이)는 수(數)의 이름. 둘. 이(貳) 등의 뜻으로 ①두, 둘째 ②두 번 ③버금(으뜸의 바로 아래) ④두 가지 마음 ⑤둘로 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두 겹이나 중복을 이중(二重), 검은 털과 흰 털을 이모(二毛), 벼슬의 둘째 품계를 이품(二品), 재물을 아껴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이간(二慳), 두 사람을 이인(二人), 두 층으로 지은 집을 이층(二層), 다시 없음이나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이중으로 하는 것을 이중적(二重的), 차원의 수가 둘인 것을 이차원(二次元), 기구나 조직 문제 따위를 둘로 함 또는 둘이 됨을 이원화(二元化), 한 가지 사물에 겹쳐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을 이중성(二重性), 군대의 가장 아래 계급의 사병을 이등병(二等兵), 한 경작지에 일 년에 두 가지 농작물을 차례로 심어 거두는 일을 이모작(二毛作),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으로 동일 법전에 포함되는 개개 법문 간의 모순 또는 꼭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 서로 모순되는 명제 즉 정립과 반립이 동등의 권리를 가지고 주장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이율배반(二律背反), 부부 사이의 정을 일컫는 말을 이성지락(二姓之樂),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이성지합(二姓之合), 열여섯 살 전후의 젊은이로 젊은 나이를 일컫는 말을 이팔청춘(二八靑春), 절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 말을 이인동심(二人同心), 센 털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뜻으로 32살을 이르는 말을 이모지년(二毛之年), 때를 놓침으로 절망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을 이십오시(二十五時), 둘 중에서 하나를 가려 잡음을 일컫는 말을 이자택일(二者擇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를 일컫는 말을 이인삼각(二人三脚) 등에 쓰인다.
▶️ 夫(지아비 부)는 ❶회의문자로 一(일)은 여기서 상투의 모양이고, 大(대)는 사람이나 어른 또는 훌륭ㅡ한 사람을 나타낸다. 夫(부)는 상투를 튼 어엿한 장부(丈夫)를 말한다. 장부(丈夫)란 지금의 성인(成人)에 해당하는 말이며, 옛날엔 스무 살이 되면 상투를 틀고 관(冠)을 썼다. ❷상형문자로 夫자는 '지아비'나 '남편',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夫자는 大(큰 대)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夫자를 보면 사람의 머리 부분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남자들이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비녀를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자들도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됐음을 알렸다. 그래서 夫자는 이미 성인식을 치른 남자라는 의미에서 '남편'이나 '사내', '군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夫(부)는 ①지아비 ②남편 ③사내, 장정 ④일군, 노동일을 하는 남자 ⑤군인(軍人), 병정(兵丁) ⑥선생, 사부 ⑦부역(負役) ⑧100묘(畝)의 밭 ⑨저, 3인칭 대명사(代名詞) ⑩대저(大抵; 대체로 보아서), 발어사(發語辭) ⑪~도다, ~구나(감탄사) ⑫다스리다 ⑬많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어른 장(丈),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시어머니 고(姑), 아내 처(妻)이다. 용례로는 남편과 아내를 부부(夫婦), 남의 아내의 높임말을 부인(夫人), 남의 남편의 높임말을 부군(夫君),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의 높임말 또는 남편의 높임말을 부자(夫子), 두 암키와 사이를 어울리 엎어 이는 기와를 부와(夫瓦),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이나 재산 상의 권리를 부권(夫權), 부모의 제삿날을 부일(夫日), 남편의 친족을 부족(夫族), 남편과 아내를 부처(夫妻), 남편과 동성동본인 겨레붙이를 부당(夫黨),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노역을 부역(夫役),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으로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르는 말을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을 이르는 말을 부위부강(夫爲婦綱), 오륜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에는 인륜상 각각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할 구별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의 애정을 일컫는 말을 부부지정(夫婦之情), 혼인을 맺자는 언약을 일컫는 말을 부부지약(夫婦之約), 부부의 화합함이라는 말을 부화부순(夫和婦順)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