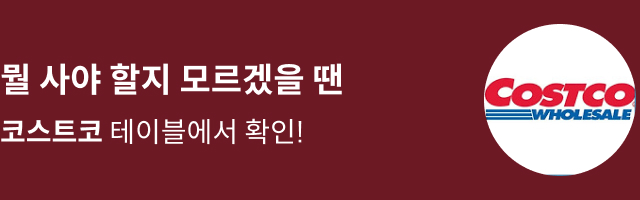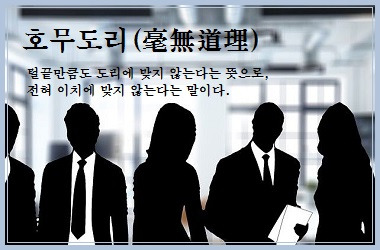
호무도리(毫無道理)
털끝만큼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毫 : 터럭 호(毛/7)
無 : 없을 무(灬/8)
道 : 길 도(辶/10)
理 : 이치 리(王/7)
'우수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교수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라.'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금을 대학에 내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각 대학에서 앞 다투어 지원하여 선정되어 벤처기업을 만들었다. 옛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벤처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난 2007년부터 고교생이라도 우수한 창의력을 지녔으면 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저자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교육부에서 내놓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때 시행한 정책이다.
오래 전, 자신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올렸던 교수 87명이 적발되었다. 논문 숫자가 139건에 이른다. 검찰 조사결과 대부분 부정이거나 부적절한 사례였다. 염치없는 교수는 자기 아들 딸을 자기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좋은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써 먹었다. 조금 수가 높은 교수는 아는 교수와 서로 교환해서 공동저자로 해,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데 써 먹었다.
한창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벤처기업 창업하면 지원금 주겠다는 정책을 낸 교육부의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보다 더 심한 것이, 고등학생을 대학교수의 논문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대학입시에서 가산점을 받게 하는 정책을 만든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고등학생은 각 분야의 기초공부 하기에도 바쁘고, 대학입시에 잠시도 틈이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며 어떻게 논문을 쓰겠는가? 고등학생을 공동저자로 하는 정책은, 몇몇 약삭빠른 교수의 자녀들 좋은 대학 진학하는 데 이용만 되었다. 고교생이 참여하여 쓴 논문이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겠는가?
가령 어떤 고등학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떤 교수와 함께 논문을 쓰고 싶었을 때, 현실적으로 유명대학의 교수들과 연계가 되겠으며, 연계가 된다 해도 그 교수가 자기 시간을 들여 그 학생의 연구를 도와주겠는가? 자기 밑에 딸린 학생 지도하기도 바쁜데, 어떤 모르는 고등학생이 같이 연구하자 한다고 응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으로서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어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였다. 지도한 교수가 “그 학생이 영어를 잘했고, 외국 대학에 유학 간다기에 도와주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의학 분야의 내용을 모르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전문분야의 논문을 쓰겠는가?
그 교수는 누구든지 와서 외국 유학 가고 싶어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고 싶다면, 다 허락하겠는가? 관계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 요청했으면, 틀림없이 거절했을 것이다. 드러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잘 아는 교수나 지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엉터리 공동저자를 만들어 주었는지 모른다. 입학전형은, 학과시험을 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다. 추천이나 특별전형 등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

▶️ 毫(터럭 호)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터럭 모(毛; 털)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高(고, 호)의 생략형(省略形)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길고 뾰족한 가는 털의 뜻이 전(轉)하여 가늘고 작다 또는 붓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毫자는 '가는 털'이나 '붓끝'을 뜻하는 글자이다. 毫자는 高(높을 고)자와 毛(털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高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高자에 毛자를 더한 毫자는 '높게 자란 털'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길게 자란 털일수록 끝이 더 가늘게 보인다. 그래서 毫자는 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가느다란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털끝'이나 '가늘다', '조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毫(호)는 (1)붓의 털끝 (2)무게나 길이의 단위로 곧 이의 1/10에 해당함 등의 뜻으로 ①터럭(몸에 난 길고 굵은 털), 털 ②가는 털, 잔 털 ③붓 ④붓 끝 ⑤호(척도 또는 분량의 단위) ⑥조금 ⑦가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터럭 모(毛), 터럭 발(髮)이다. 용례로는 가느다란 털로 아주 작은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을 호발(毫髮), 가는 털을 호모(毫毛), 전혀 없음이나 조금도 없음을 호무(毫無), 털오리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을 호홀(毫忽), 붓의 끝을 호단(毫端), 매우 적은 분량을 호리(毫釐), 털끝 만한 작은 일 또는 적은 양을 호말(毫末),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미술품으로서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림을 휘호(揮毫), 조금 아주 조금 만큼의 뜻을 이호(釐毫), 몹시 적은 분량이나 아주 작은 정도를 소호(小毫), 매의 꼬리에 달아서 사람의 눈에 잘 띄게 하는 흰 털을 망호(望毫), 토끼의 잔털을 토호(兔毫), 몹시 적은 수량을 사호(絲毫), 부처의 미간에 있는 흰 털을 옥호(玉毫),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붓을 분호(粉毫), 필치가 뛰어남을 일호(逸毫), 종이와 붓을 저호(楮毫), 양털로 촉을 만든 붓을 양호(羊毫), 매우 가는 털 또는 썩 작은 사물을 섬호(纖毫), 가을철에 털을 갈아서 가늘어진 짐승의 털이란 뜻으로 몹시 작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추호(秋毫), 몹시 가늘고 작은 털이란 뜻으로 아주 작은 정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일호(一毫), 썩 적은 것을 분호(分毫), 털을 나누고 실오라기를 쪼갠다는 뜻으로 썰어서 아주 잘게 나눔을 일컫는 말을 호분누석(毫分縷析), 티끌 하나의 차이가 천 리의 차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지만 나중에는 대단한 차가 생김을 이르는 말을 호리천리(毫釐千里), 아주 근소한 차이를 일컫는 말을 호리지차(毫釐之差), 수목을 어릴 때 베지 않으면 마침내 도끼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으로 화는 미세할 때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을 호모부가(毫毛斧柯),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함을 일컫는 말을 호발부동(毫髮不動), 털 끝 만한 이익을 일컫는 말을 호말지리(毫末之利), 서로 얼마 아니 되는 사이를 일컫는 말을 호홀지간(毫忽之間)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을 무원고립(無援孤立),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형용해 이르는 말을 무궁무진(無窮無盡),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엇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무불통지(無不通知), 인공을 가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기를 일컫는 말을 무위자연(無爲自然), 일체의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념무상(無念無想), 아버지도 임금도 없다는 뜻으로 어버이도 임금도 모르는 난신적자 곧 행동이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부무군(無父無君),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또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위도식(無爲徒食), 매우 무지하고 우악스러움을 일컫는 말을 무지막지(無知莫知), 자기에게 관계가 있건 없건 무슨 일이고 함부로 나서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불간섭(無不干涉),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를 얻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을 이르는 말을 무위이치(無爲而治), 몹시 고집을 부려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가내하(無可奈何),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용지물(無用之物) 등에 쓰인다.
▶️ 道(길 도)는 ❶회의문자로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首(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首(수)는 사람 머리와 같이 사물의 끝에 있는 것, 처음, 근거란 뜻을 나타낸다. 道(도)는 한 줄로 통하는 큰 길이다. 사람을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도 길이지만 또 도덕적인 근거도 길이다. ❷회의문자로 道자는 '길'이나 '도리',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道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首자는 '머리'라는 뜻이 있다. 道자는 길을 뜻하는 辶자에 首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다'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寸(마디 촌)자를 더한 導(이끌 도)자가 '인도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道(도)는 (1)우리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예전에 8도이던 것을 고종(高宗) 33(1896)년에 13도로 고쳤고, 다시 대한민국 수립 후에 14도로 정함 (2)우리나라의 최고 지방자치단체 (3)도청 (4)중국 당(唐) 대의 최고 행정 단위. 당초에는 10도로 나누어 각 도마다 안찰사(按察使)를 두었으며 734년에 15도로 늘려 관찰사(觀察使)를 장관(長官)으로 두었음 (5)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6)종교 상으로, 교의에 깊이 통하여 알게 되는 이치, 또는 깊이 깨달은 지경 (7)기예(技藝)나 방술(方術), 무술(武術) 등에서의 방법 (8)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길 ②도리(道理), 이치(理致) ③재주 ④방법(方法), 술책(術策) ⑤근원(根源), 바탕 ⑥기능(機能), 작용(作用) ⑦주의(主義), 사상(思想) ⑧제도(制度) ⑨기예(技藝) ⑩불교(佛敎) ⑪승려(僧侶) ⑫도교(道敎) ⑬도사(道士) ⑭교설(敎說) ⑮~에서, ~부터 ⑯가다 ⑰가르치다 ⑱깨닫다 ⑲다스리다 ⑳따르다 ㉑말하다 ㉒완벽한 글 ㉓의존하다 ㉔이끌다, 인도하다 ㉕정통하다 ㉖통하다, 다니다 ㉗행정구역 단위 ㉘행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길 도(塗), 거리 항(巷), 거리 가(街), 네거리 구(衢), 길 로/노(路), 길 도(途), 길거리 규(逵), 모퉁이 우(隅)이다. 용례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을 도로(道路),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도리(道理),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道德), 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장을 도구(道具), 도를 닦는 사람을 도사(道士),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 상의 의리를 도의(道義), 일반에게 알리는 새로운 소식을 보도(報道),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궤도(軌道),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를 효도(孝道),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정도(正道), 차가 다니도록 마련한 길을 차도(車道), 도를 닦음을 수도(修道), 임금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왕도(王道), 바르지 못한 도리를 사도(邪道),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도(步道), 일에 대한 방법과 도리를 방도(方道),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의 풍속이 돈후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도불습유(道不拾遺),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또는 깊이 생각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함을 일컫는 말을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가에 있는 쓴 자두 열매라는 뜻으로 남에게 버림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도방고리(道傍苦李), 먼 길을 달린 후에야 천리마의 재능을 안다는 뜻으로 난세를 당해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진가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도원지기(道遠知驥), 길에는 오르고 내림이 있다는 뜻으로 천도에는 크게 융성함과 쇠망함의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을 도유승강(道有升降),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일컫는 말을 안빈낙도(安貧樂道), 시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뜻으로 이익이 있으면 서로 합하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지는 시정의 장사꾼과 같은 교제를 일컫는 말을 시도지교(市道之交),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김을 일컫는 말을 청빈낙도(淸貧樂道),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언어도단(言語道斷) 등에 쓰인다.
▶️ 理(다스릴 리/이)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구슬옥변(玉=玉, 玊; 구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里(리)가 합(合)하여 다스리다를 뜻한다. 음(音)을 나타내는 里(리)는 길이 가로 세로로 통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뜻이 갈라져서 사리(事理)가 바르다, 규칙 바르다의 뜻과 속, 속에 숨어 있다의 두 가지 뜻을 나타낸다. 玉(옥)은 중국의 서북에서 나는 보석, 理(리)는 옥의 원석(原石)속에 숨어 있는 고운 결을 갈아내는 일, 나중에 옥에 한한지 않고 일을 다스리다, 사리 따위의 뜻에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理자는 '다스리다'나 '이치'를 뜻하는 글자이다. 理자는 玉(구슬 옥)자와 里(마을 리)가 결합한 모습이다. 里자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理자는 본래 옥에 새겨 넣은 무늬를 뜻했었다. 단단한 옥을 깎아 무늬를 새겨 넣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理자는 후에 간혹 실수로 구멍 낸 곳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메우다'나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일을)처리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理(다스릴 리/이)는 (1)용언(用言)이나 체언(體言) 술어의 어미(語尾) ~ㄹ 다음에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이어 까닭 이치(理致)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숫자 다음에서 이(浬)의 뜻으로 쓰는 말 (3)해리(海里) (4)사물 현상이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法則), 이치(理致), 도리(道理) (5)중국 철학에서 우주(宇宙)의 본체. 만물을 형성하는 정신적(精神的) 시원을 뜻함 (6)이학(理學) (7)이과(理科) 등의 뜻으로 ①다스리다 ②다스려지다 ③깁다(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을 꿰매다) ④수선(修繕)하다 ⑤깨닫다 ⑥의뢰하다 ⑦사리(事理) ⑧도리(道理) ⑨이치(理致) ⑩매개(媒介) ⑪거동(擧動) ⑫나무결 ⑬잔금 ⑭학문(學問), 과목(科目)의 약칭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스릴 리(厘), 다스릴 발(撥), 다스릴 섭(攝), 다스릴 치(治), 간략할 략(略), 지날 경(經), 다스릴 할(轄), 다스릴 리(釐)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어지러울 란(亂)이다. 용례로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을 이해(理解),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의 개념을 이념(理念),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를 이치(理致), 이치에 따라 사리를 분별하는 성품을 이성(理性),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이상(理想), 옳음과 그름을 이비(理非), 머리털을 다듬어 깎음을 이발(理髮),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는 것을 관리(管理), 일을 다스려 치러 감을 처리(處理),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바로잡음을 정리(整理), 옳은 이치에 어그러짐을 비리(非理),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윤리(倫理), 사물이 근거하여 성립하는 근본 법칙을 원리(原理), 말이나 글에서의 짜임새나 갈피를 논리(論理),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도리(道理),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심리(審理),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심리(心理), 좋은 도리를 발견하려고 이모저모 생각함을 궁리(窮理), 도리에 순종함을 순리(順理), 고장난 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을 수리(修理), 말이나 글에서의 짜임새나 갈피를 논리(論理), 사물의 이치나 일의 도리를 사리(事理),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을 의리(義理), 화목한 부부 또는 남녀 사이를 비유하는 말을 연리지(連理枝), 사람이 상상해 낸 이상적이며 완전한 곳을 이르는 말을 이상향(理想鄕), 사물의 이치나 일의 도리가 명백하다는 말을 사리명백(事理明白), 이판과 사판이 붙어서 된 말로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이르는 말을 이판사판(理判事判), 의논이나 언설이 사리에 잘 통하고 정연한 모양을 일컫는 말을 이로정연(理路整然), 비익조와 연리지의 뜻으로 부부의 사이가 썩 화목함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연리비익(連理比翼), 헛된 이치와 논의란 뜻으로사실에 맞지 않은 이론과 실제와 동떨어진 논의를 일컫는 말을 공리공론(空理空論), 모든 문제를 흑이 아니면 백이나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는 논리를 일컫는 말을 흑백논리(黑白論理),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니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의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을 영음찰리(聆音察理), 사물의 이치나 일의 도리가 명백함을 일컫는 말을 사리명백(事理明白), 모든 생물이 생기고 번식하는 자연의 이치를 일컫는 말을 생생지리(生生之理), 성하고 쇠하는 이치라는 뜻으로 끊임없이 도는 성쇠의 이치를 일컫는 말을 성쇠지리(盛衰之理)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