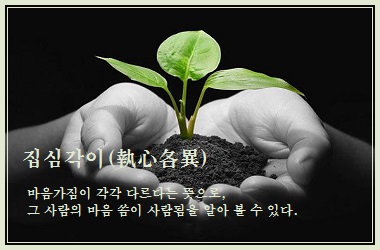
집심각이(執心各異)
마음가짐이 각각 다르다는 뜻으로, 그 사람의 마음 씀이 사람됨을 알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執 : 잡을 집(土/8)
心 : 마음 심(心/0)
各 : 각각 각(口/3)
異 : 다를 이(田/6)
출전 : 사기(史記) 卷81 영파 인상여 조사열전(廉頗藺相如-趙奢列傳)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에 조사(趙奢)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용감하면서 마음가짐이 공정하였다.
그에게 조괄(趙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총명하였다. 특히 어려서부터 병법을 좋아하여 병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가 병법에 능하다는 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났다. 그러나 조사는 아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실전 경험이 없고, 사람됨이 경솔하기 때문이었다.
조사가 죽은 뒤 진(秦)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조나라의 유명한 장수 염파(廉頗)는 진나라를 막아 싸웠는데, 단지 대치하기만 하면서 한 달 이상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왕은 염파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 갔다.
그때 진나라에서는 조나라를 교란하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다. “만약 조괄이 장수로 임명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지”라는 말을 퍼뜨렸다.
조나라 왕은 참지 못하고 염파를 조괄로 교체했다. 이때 조괄의 어머니가 왕을 찾아가 “우리 아들은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왕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의 남편이 대장이었을 때, 그의 녹봉으로 10여 명의 식객(食客)과 100명의 친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재물과 비단을 군사나 관리 사대부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출전 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집안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군사나 관리들에게 접견을 받는데, 군사 가운데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께서 내려주신 재물이나 비단을 집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매일 토지나 건물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가짐이 각자 다릅니다.”
及括將行, 其母上書言於王曰 : 括不可使將. 王曰 : 何以? 對曰 : 始妾事其父, 時為將, 身所奉飯飲而進食者以十數, 所友者以百數, 大王及宗室所賞賜者盡以予軍吏士大夫, 受命之日, 不問家事. 今括一旦為將, 東向而朝, 軍吏無敢仰視之者, 王所賜金帛, 歸藏於家, 而日視便利田宅可買者買之. 王以為何如其父? 父子異心, 原王勿遣.
그러나 왕은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장이 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조괄은 대패를 하여, 40만의 군대를 잃었다. 조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괄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잘 알아보고 그 결점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의 80% 이상을 수시모집을 통해서 뽑는다. 학과 성적 이외의 수상경력, 봉사점수 등이 합격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교생 논문 저자, 인턴활동 등도 등장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각종 상장을 100가지 이상 받은 학생이 있다. 3년이면 대략 1000일쯤 되는데, 3년 동안 상장 100가지를 받으려면 열흘에 한 번꼴로 상을 받아야 한다.
봉사 시간이 400시간 이상이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면 교실에서 수업 들을 시간이 없다. 거의 대부분이 극성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거짓이다.
능력도 안 되는 자녀들을 이렇게 출발부터 속임수로 시작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다면, 그 자녀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정부패가 몸에 익어 자신이 부정부패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될 것이다.
자식의 사람됨이나 능력을 잘 알아본 조괄의 어머니 같은 사람은 오늘날은 없는 것인가?

▶️ 執(잡을 집)은 ❶회의문자이나 형성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执(집)의 본자(本字)이다. 幸(행; 쇠고랑)과 丮(극; 꿇어 앉아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의 합자(合字)이다. 따라서 그 손에 쇠고랑을 채운다는 뜻을 나타낸다. 또는 음(音)을 나타내는 (녑, 집)과 丸(환; 손을 뻗어 잡는다)로 이루어졌다. 죄인(罪人)을 잡다의 뜻이 전(轉)하여 널리 잡다의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執자는 '잡다'나 '가지다', '맡아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執자는 幸(다행 행)자와 丸(알 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의 갑골문을 보면 죄수의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執자는 이렇게 죄수를 붙잡은 모습을 그려 '잡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수갑은 幸자로 팔을 내밀은 모습은 丸자가 대신하면서 지금의 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執(집)은 ①잡다 ②가지다 ③맡아 다스리다 ④처리하다 ⑤두려워 하다 ⑥사귀다 ⑦벗, 동지(同志) ⑧벗하여 사귀는 사람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잡을 액(扼), 잡을 파(把), 잡을 구(拘), 잡을 착(捉), 잡을 포(捕), 잡을 조(操), 잡을 나(拏), 잡을 나(拿), 잡을 지(摯), 잡을 체(逮), 잡을 병(秉)이다. 용례로는 일을 잡아 행함을 집행(執行), 정권을 잡음을 집권(執權),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일을 집착(執着), 고집스럽게 끈질김을 집요(執拗), 마음에 새겨서 움직이지 않는 일념을 집념(執念), 붓을 잡고 작품 등의 글을 씀을 집필(執筆),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메스를 잡음을 집도(執刀), 나라의 정무를 맡아봄 또는 그 관직이나 사람을 집정(執政),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집사(執事), 사무를 봄을 집무(執務), 병의 증세를 살피어 알아냄을 집증(執症), 정의를 굳게 지킴을 집의(執義), 허가 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함을 집경(執耕), 뜻이 맞는 긴밀한 정분을 맺기 위한 계기를 잡음을 집계(執契), 고집이 세어 융통성이 없음을 집니(執泥), 자기의 의견만 굳게 내세움을 고집(固執),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음을 편집(偏執), 굳게 잡음을 견집(堅執), 집착이 없음을 무집(無執), 거짓 문서를 핑계하고 남의 것을 차지하여 돌려보내지 않음을 거집(據執), 남에게 붙잡힘을 견집(見執), 제 말을 고집함을 언집(言執), 어떤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고 굳이 움직이지 아니함을 의집(意執), 서로 옥신각신 다툼을 쟁집(爭執),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일을 망집(妄執),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비리에 집착함을 미집(迷執),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을 확집(確執), 전하여 주는 것을 받아 가짐을 전집(傳執),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할 재물을 혼자서 모두 차지함을 합집(合執), 뜨거운 물건을 쥐고도 물로 씻어 열을 식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은 수고를 아껴 큰 일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집열불탁(執熱不濯), 더우면 서늘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집열원량(執熱願凉), 융통성이 없고 임기응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자막집중(子膜執中), 고집이 세어 조금도 변통성이 없음 또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을 고집불통(固執不通) 등에 쓰인다.
▶️ 心(마음 심)은 ❶상형문자로 忄(심)은 동자(同字)이다. 사람의 심장의 모양, 마음, 물건의 중심의, 뜻으로 옛날 사람은 심장이 몸의 한가운데 있고 사물을 생각하는 곳으로 알았다. 말로서도 心(심)은 身(신; 몸)이나 神(신; 정신)과 관계가 깊다. 부수로 쓸 때는 심방변(忄=心; 마음, 심장)部로 쓰이는 일이 많다. ❷상형문자로 心자는 '마음'이나 '생각', '심장',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心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心자를 보면 심장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심장은 신체의 중앙에 있으므로 心자는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옛사람들은 감정과 관련된 기능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心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참고로 心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 忄자나 㣺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心(심)은 (1)종기(腫氣) 구멍이나 수술한 구멍에 집어넣는 약을 바른 종이나 가제 조각 (2)나무 줄기 한 복판에 있는 연한 부분 (3)무, 배추 따위의 뿌리 속에 박인 질긴 부분 (4)양복(洋服)의 어깨나 깃 따위를 빳빳하게 하려고 받쳐 놓는 헝겊(천) (5)초의 심지 (6)팥죽에 섞인 새알심 (7)촉심(燭心) (8)심성(心星) (9)연필 따위의 한복판에 들어 있는 빛깔을 내는 부분 (10)어떤 명사 다음에 붙이어 그 명사가 뜻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마음, 뜻, 의지(意志) ②생각 ③염통, 심장(心臟) ④가슴 ⑤근본(根本), 본성(本性) ⑥가운데, 중앙(中央), 중심(中心) ⑦도(道)의 본원(本源) ⑧꽃술, 꽃수염 ⑨별자리의 이름 ⑩진수(眞修: 보살이 행하는 관법(觀法) 수행) ⑪고갱이, 알맹이 ⑫생각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물건 물(物), 몸 신(身), 몸 체(體)이다. 용례로는 마음과 몸을 심신(心身),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심리(心理),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을 심정(心情), 마음의 상태를 심경(心境), 마음 속을 심중(心中), 마음속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을 심상(心象), 어떤 일에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심취(心醉), 마음에 관한 것을 심적(心的), 마음의 속을 심리(心裏), 가슴과 배 또는 썩 가까워 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복(心腹),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를 심성(心性), 마음의 본바탕을 심지(心地), 마음으로 사귄 벗을 심우(心友),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으로 묵묵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함을 이르는 말을 심심상인(心心相印),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먹었던 마음을 바꿈을 일컫는 말을 심기일전(心機一轉),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함을 일컫는 말을 심열성복(心悅誠服), 마음이 너그러워서 몸에 살이 오름을 일컫는 말을 심광체반(心廣體胖), 썩 가까워 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심복지인(心腹之人), 높은 산속의 깊은 골짜기를 이르는 말을 심산계곡(心山溪谷), 심술꾸러기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심술거복(心術去福), 마음이 번거롭고 뜻이 어지럽다는 뜻으로 의지가 뒤흔들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심번의란(心煩意亂),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심심풀이로 어떤 일을 함 또는 그 일을 일컫는 말을 심심소일(心心消日),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가 피곤하니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심동신피(心動神疲), 심두 즉 마음을 멸각하면 불 또한 시원하다라는 뜻으로 잡념을 버리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불 속에서도 오히려 시원함을 느낀다는 말을 심두멸각(心頭滅却),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생각을 집중할 수 없다는 말을 심원의마(心猿意馬) 등에 쓰인다.
▶️ 各(각각 각)은 ❶회의문자로 앞에 온 사람과 뒤에 오는 뒤져올 치(夂; 머뭇거림, 뒤져 옴)部와 사람의 말이(口) 서로 다르다는 뜻이 합(合)하여 '각각'을 뜻한다. 뒤져올 치(夂)部는 발의 모양으로 위를 향한 止(지)가 '가다'의 뜻인데 대하여 밑을 향한 뒤져올 치(夂)部는 '내리다, 이르다'의 뜻이다. 口(구)는 어귀, 各(각)은 '어귀까지 가다, 바로 가서 닿다', 箇(개)와 個(개)는 음(音)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뜻으로도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各자는 '각각'이나 '따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各자는 夂(뒤져서 올 치)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口자는 '입 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발을 그린 夂자를 결합한 各자는 사람의 입구에 다다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各자를 보면 夂자가 입구 쪽을 향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各자는 '도착하다'나 '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여럿이 따로 도착한다 하여 '각각'이나 '따로', '제각기'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各(각)은 (1)각각(各各)의. 낱낱의, 따로따로의 (2)여러 (3)윷놀이에서 말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어 서로 마찬가지의 뜻을 나타냄, 등의 뜻으로 ①각각(各各), 각자(各自), 제각기 ②따로따로 ③여러 ④서로, 마찬가지로 ⑤모두, 다, 전부(全部) ⑥다르다, 각각이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여러 가지의 종류 각가지를 각종(各種), 제각기나 따로따로를 각각(各各), 유다름이나 특별함을 각별(各別), 제각각이나 각각의 자기를 각자(各自), 각 나라를 각국(各國), 각 세목에 대한 논설을 각론(各論), 사회의 각 방면을 각계(各界), 각각이나 저마다 또는 저마다의 사람이나 사물을 각기(各其), 여러 등급을 각급(各級), 각각의 사람을 각인(各人), 여러 가지를 각반(各般), 여러 군데를 각소(各所), 따로따로 된 하나하나를 각개(各個), 서로 갈라짐을 각립(各立), 여러 곳이나 모든 곳을 각처(各處), 각각 따로 거처함을 각거(各居), 각 사람의 마음 또는 각기 마음을 달리함을 각심(各心), 여러 가지 종류를 각류(各類), 각각 나오는 것 또는 각각 내놓는 것을 각출(各出), 여러 가지 모양을 각양(各樣), 모양이나 성질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이르는 말을 각양각색(各樣各色), 사람마다 한 가지 재주가 있음을 이르는 말을 각유일능(各有一能), 사람마다 장점이나 장기가 있음을 이르는 말을 각유소장(各有所長), 사람은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함을 이르는 말을 각자도생(各自圖生), 저마다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전체와의 조화나 타인과의 협력을 생각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을 각자위정(各自爲政), 모든 것이 그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됨을 이르는 말을 각득기소(各得其所), 제각각 마음을 다르게 먹음을 이르는 말을 각자위심(各自爲心), 각자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변함이 없는 일을 이르는 말을 각지불이(各知不移),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함을 이르는 말을 동상각몽(同床各夢), 무엇이나 제각기 그 주인이 있다는 뜻으로 무슨 물건이나 그것을 가질 사람은 따로 있음을 이르는 말을 물각유주(物各有主) 등에 쓰인다.
▶️ 異(다를 이/리)는 ❶상형문자로 옛 자형(字形)은 양손을 벌린 사람의 모양이며, 두부(頭部)는 귀신의 탈을 쓴 모양이라든가 바구니를 올려놓은 모양이라고도 생각된다. 나중에 田(전)과 共(공)를 합(合)한 글자로 잘못 보아 지금 자형(字形)으로 되었다. 양손으로 물건을 나누어 줌의 뜻이 전(轉)하여 다름의 뜻이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異자는 '다르다'나 '기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異자는 田(밭 전)자와 共(함께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異자의 갑골문을 보면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양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異자는 얼굴에 이상한 가면을 쓴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니 이상할 법도 하다. 異자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다르다'나 '기이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한자에서 가면을 쓴 사람은 보통 제사장이나 귀신을 뜻하지만 異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異(이)는 성(姓)의 하나로 ①다르다 ②달리하다 ③기이하다 ④뛰어나다 ⑤진귀하다 ⑥특별하게 다루다, 우대하다 ⑦괴이하다, 이상야릇하다 ⑧거스르다, 거역하다 ⑨다른, 딴, 그 밖의 ⑩딴 것 ⑪괴이(怪異)한 일 ⑫재앙(災殃), 천재(天災)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를 타(他), 다를 별(別), 다를 차(差), 괴이할 괴(怪), 다를 수(殊),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한가지 동(同)이다. 용례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견(異見), 정상이 아닌 상태나 현상을 이상(異常), 다른 주장을 이의(異議), 상례를 벗어난 특이한 것을 이례적(異例的), 자기 나라 아닌 딴 나라를 이국(異國), 괴이한 변고를 이변(異變), 평소와는 다른 상태를 이상(異狀), 다른 성질을 이성(異性), 기이한 행적을 이적(異跡), 다른 의견을 이의(異意), 서로 일치하거나 같지 않고 틀려 다름을 차이(差異), 다른 것과는 특별히 다름을 특이(特異), 기묘하고 야릇함을 기이(奇異), 놀랍고 이상함을 경이(驚異), 서로 다름을 상이(相異), 분명하게 아주 다름을 판이(判異), 괴상하고 이상함을 괴이(怪異), 입은 다르지만 하는 말은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을 이구동성(異口同聲), 때는 다르되 가락은 같다는 뜻으로 시대는 달라도 인간 또는 사물에는 각각 상통함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이세동조(異世同調), 시대는 달라도 인간 또는 사물에는 각각 상통하는 분위기와 맛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이대동조(異代同調),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그 절묘함은 거의 같다는 뜻으로 방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음을 이르는 말을 이곡동공(異曲同工),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함 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하는 말이 일치함을 이르는 말을 이구동음(異口同音), 몸은 다르나 마음은 같다는 뜻으로 서로 극히 친밀함을 이르는 말을 이체동심(異體同心), 가는 길은 각각 다르나 닿는 곳은 같다는 뜻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귀착하는 결과는 같음을 이르는 말을 이로동귀(異路同歸), 배다른 형제를 이르는 말을 이모형제(異母兄弟), 아비는 다르고 어미는 같음 또는 그 소생을 이르는 말을 이부동모(異父同母), 한 어머니에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이르는 말을 이부형제(異父兄弟), 타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여행 중의 몸을 일컫는 말을 이향이객(異鄕異客), 배다른 형제를 이르는 말을 이복형제(異腹兄弟), 외국에서 죽어 그곳에 묻힌 사람을 이르는 말을 이역지귀(異域之鬼)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