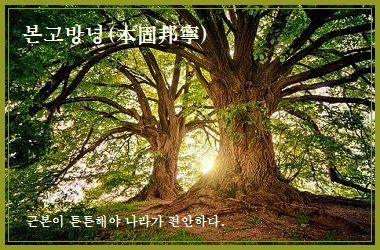
본고방녕(本固邦寧)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이다.
本 : 근본 본(木/1)
固 : 굳을 고(囗/5)
邦 : 나라 방(阝/4)
寧 : 편안할 녕(宀/11)
백성은 국가의 뿌리다. 뿌리 없는 풀이나 나무가 있을 수 없듯 백성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서경(書經)은 강조한다.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
백성이 국가의 뿌리임을 밝히는 민본(民本)사상이다. 그 핵심 덕목은 위민(爲民), 곧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 개국의 설계자이자 조선의 최고법전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편찬한 정도전이 추구했던 사상이기도 하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낙생(樂生)에 있다 했다. 즉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이미 동양에선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민수군주(民水君舟) 사상으로 정립됐다. 백성들이 임금을 받들지만, 잘못 하면 배를 엎을 수 있다는 경책이다.
황위 찬탈을 했다는 비판이 작지 않지만, 재위 23년간 공정한 정치를 펼쳐 정관지치(貞觀之治)라는 찬사를 받는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제왕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가운데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君舟也 人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글귀가 눈길을 끈다.
이미 전국시대 '순자'가 말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는 경책과 궤를 같이한다.
민본의 중요성은 조선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의 산문 '애민의(愛民義)'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매월당은 “민심이 돌아와 붙으면 만세 동안 군주가 될 수 있으나,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가 못 가 필부가 된다(民心歸附則可以萬世而爲君主 民心離散則不待一夕而爲匹夫).”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가족과 친인척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보는 민심 또한 악화하는 등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귀담아들어야겠다.
소통을 강조하며 자신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지도자라도 듣기 좋은 말만을 담게 된다. 반대되는 측의 쓴소리라도 반영해야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임을 되새긴다.

▶️ 本(근본 본)은 ❶지사문자로 木(목; 나무) 아래쪽에 표를 붙여 나무의 뿌리 밑을 나타낸다. 나중에 나무에 한하지 않고 사물의 근본(根本)이란 뜻으로 쓰였다. ❷지사문자로 이미 만들어진 상형문자에 선이나 점을 찍어 추상적인 뜻을 표현하는 것을 지사문자(指事文字)라고 한다. '근본'이나 '뿌리'를 뜻하는 本(근본 본)자는 전형적인 지사문자에 속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木(나무 목)자의 하단에 점을 찍어 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는 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本자는 나무의 뿌리 부분을 가리킨 지사문자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뿌리이듯이 사물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바탕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本(본)은 (1)자신(自身), 이의 뜻으로 쓰는 말 (2)영화(映畫) 필름 등의 한 편(篇)을 세는 단위(單位) 등의 뜻으로 ①근본(根本) ②초목의 뿌리 ③초목의 줄기 ④원래(元來), 본래(本來), 본디 ⑤근원(根源), 원천(源泉) ⑥본원(本源), 시초(始初) ⑦마음, 본성(本性) ⑧주(主)가 되는 것 ⑨바탕 ⑩자기(自己) 자신(自身) ⑪조상(祖上), 부모(父母), 임금 ⑫조국(祖國), 고향(故鄕) ⑬본, 관향(貫鄕: 시조(始祖)가 난 곳) ⑭그루(초목을 세는 단위) ⑮판본(版本) ⑯본(서화를 세는 단위) ⑰책, 서책(書冊) ⑱원금(元金), 본전(本錢) ⑲본가(本家) ⑳농업(農業), 농사(農事) ㉑근거하다, 근거(根據)로 삼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비로소 시(始), 뿌리 근(根),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끝 말(末)이다. 용례로는 사물이나 현상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을 본질(本質), 자기 바로 그 사람을 본인(本人),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나 그 조직이 있는 곳을 본부(本部), 신문 기사에서 일컫는 그 신문 자체를 본보(本報),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신문을 본지(本紙), 잡지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난을 본란(本欄), 시조가 난 땅을 본관(本貫),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본말(本末), 변하여 온 사물의 처음 바탕을 본래(本來), 근본에 맞는 격식이나 규격을 본격(本格), 본디의 마음을 본심(本心), 자기에게 알맞은 신분을 본분(本分), 애당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을 본의(本意),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을 본성(本性), 강이나 내의 원줄기를 본류(本流), 본디 그대로의 것을 본연(本然), 생활의 근본이 되는 주된 사업이나 직업을 본업(本業), 사물의 생겨나는 근원을 근본(根本),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으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쓸 재화를 자본(資本), 사물의 근본을 기본(基本), 무대 모양이나 배우의 대사 따위를 적은 글을 각본(脚本), 금석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그대로 종이에 박아 냄을 탁본(拓本), 나라의 근본을 국본(國本), 원본을 그대로 옮기어 베낌 또는 베낀 책이나 서류를 사본(寫本), 원본의 일부를 베끼거나 발췌한 문서를 초본(抄本), 문서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낌 또는 그런 서류를 등본(謄本), 조각한 판목으로 인쇄한 책을 각본(刻本), 근원을 뽑아버림을 발본(拔本), 자기 집에 편지할 때에 겉봉 표면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쓰는 말을 본제입납(本第入納), 사람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심성이란 뜻으로 지극히 착하고 조금도 사리사욕이 없는 천부 자연의 심성을 일컫는 말을 본연지성(本然之性),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디의 관념을 이르는 말을 본유관념(本有觀念), 일이 처음과 나중이 뒤바뀜을 일컫는 말을 본말전도(本末顚倒), 본디 내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뜻밖으로 얻었던 물건은 잃어 버려도 서운할 것이 없다는 말을 본비아물(本非我物),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심성을 일컫는 말을 본래면목(本來面目), 근본과 갈린 것이 오래 번영한다는 뜻으로 한 가문이 오래도록 영화로움을 이르는 말을 본지백세(本支百世),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말을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 버린다는 뜻으로 사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뿌리째 뽑아 버림을 이르는 말을 발본색원(拔本塞源),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다는 뜻으로 사물의 질서를 일컫는 말을 물유본말(物有本末), 어떠한 것의 근본을 잊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불망기본(不忘其本) 등에 쓰인다.
▶️ 固(굳을 고)는 ❶형성문자로 怘(고)는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큰입구 몸(囗; 에워싼 모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古(고)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古(고; 오래다, 옛날로부터의 습관, 그것을 그대로 지키다, 굳다)와 성벽을 둘러싸서(口; 에워싸는 일) 굳게 지킨다는 뜻이 합(合)하여 '굳다'를 뜻한다. 공격에 대비하여 사방을 경비하다, 굳다, 완고하여 융통성이 없다라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固자는 '굳다'나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固자는 囗(에운담 위)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囗자는 성(城)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그린 것이다. 固자에 쓰인 古자는 '옛날'이나 '오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했다. 固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성벽이 오래도록 견고하다는 의미에서 '굳다'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固(고)는 ①굳다, 단단하다 ②굳어지다, 굳히다 ③완고(頑固)하다, 고루(固陋)하다 ④우기다(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 ⑤독점(獨占)하다 ⑥가두다, 감금(監禁)하다 ⑦진압(鎭壓)하다, 안정시키다 ⑧평온(平穩)하다, 편안하다 ⑨스러지다, 쇠퇴(衰退)하다 ⑩버려지다 ⑪경비(警備), 방비(防備), 수비(守備) ⑫고질병(痼疾病) ⑬거듭, 여러 번, 굳이 ⑭굳게, 단단히, 확고히 ⑮반드시, 틀림없이 ⑯진실로, 참으로 ⑰항상(恒常), 오로지, 한결같이 ⑱처음부터, 원래, 본디 ⑲이미 ⑳이에, 도리어 ㉑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굳을 견(堅), 굳을 경(硬), 굳을 확(確), 굳을 확(碻), 굳을 공(鞏)이다. 용례로는 자기의 의견만 굳게 내세움을 고집(固執), 본디부터 있음을 고유(固有), 한 곳에 움직이지 않게 붙박는 것을 고정(固定), 굳이 사양함을 고사(固辭), 굳게 지킴을 고수(固守), 완고하고 식견이 없음을 고루(固陋),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진 물체를 고체(固體), 굳게 붙음으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을 고착(固着), 튼튼한 성을 고성(固城), 뜻을 굳게 먹음 혹은 그 뜻을 고의(固意), 굳게 지님을 고지(固持), 곤궁한 것을 잘 겪어냄을 고궁(固窮), 바탕이 단단하며 일정한 꼴을 지닌 형체를 고형(固形), 굳어지거나 굳어지게 함을 고화(固化), 튼튼하고 굳음을 확고(確固), 굳세고 단단함을 견고(堅固), 굳고 튼튼함을 공고(鞏固), 엉겨 뭉쳐 딱딱하게 됨을 응고(凝固), 굳세고 튼튼함을 강고(强固), 성질이 완강하고 고루함을 완고(頑固), 완전하고 튼튼함을 완고(完固), 말라서 굳어짐을 건고(乾固), 깨뜨릴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굳음을 뇌고(牢固), 뜻이 독실하고 굳음을 독고(篤固), 어리석고 고집이 셈을 몽고(蒙固), 곤궁을 달게 여기고 학문에 힘쓴다는 말을 고궁독서(固窮讀書), 내 마음의 기둥 곧 신념을 굳게 가지는 일이라는 말을 고아심주(固我心柱), 고집이 세어 조금도 변통성이 없음 또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을 고집불통(固執不通),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을 확고부동(確固不動),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세고 튼튼하다는 말을 강고무비(强固無比), 일의 되어 가는 형세가 본래 그러하다는 말을 사세고연(事勢固然),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을 확고불발(確固不拔), 완고하여 사물을 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을 완미고루(頑迷固陋), 사세가 그렇지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을 세소고연(勢所固然), 이치가 본디 그러하다는 말을 이소고연(理所固然),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을 근고지영(根固枝榮) 등에 쓰인다.
▶️ 邦(나라 방)은 ❶형성문자로 邫(방)의 본자(本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우부방(阝=邑; 마을)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계(境界)를 뜻하는 글자 丯(봉, 방)으로 이루어졌다. 경계를 나타내는 우거진 수목(樹木)으로 이루어졌다. 경계 내(內)의 부족(部族)의 뜻이, 전(轉)하여 나라의 뜻으로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邦자는 '나라'나 '수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邦자는 丰(예쁠 봉)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초목이 무성하게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우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邦자를 보면 田(밭 전)자 위로 풀이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밭에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람들이 '터전을 잡은 곳'이라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田자 대신 邑자가 쓰이게 되었는데, 의미 역시 확대되어 '나라'나 '수도'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邦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한(漢)나라 때는 태조 유방(劉邦)의 이름과 겹치는 것을 피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國(나라 국)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邦(방)은 성(姓)의 하나 ①나라 ②서울, 수도(首都) ③제후(諸侯)의 봉토(封土) ④천하(天下) ⑤형(兄), 윗누이 ⑥제후를 봉하다 ⑦여지(輿地)를 주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나라 국(國)이다. 용례로는 나라의 정치를 방치(邦治),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사회를 방가(邦家),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사회나 나라를 방국(邦國), 서울에 가까운 땅으로 서울 근교를 방기(邦機), 나라와 나라가 사귀는 관계를 방교(邦交), 나라의 근본을 방본(邦本), 나랏말을 방어(邦語), 자기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를 방화(邦畫), 나라에서 금하는 일을 방금(邦禁), 나라의 풍속을 방속(邦俗), 나라의 형률을 방형(邦刑), 나라의 경계를 방경(邦境), 나라의 경사를 방경(邦慶), 나라의 길흉의 의식을 방례(邦禮), 나라의 사업을 방업(邦業), 자기 나라 사람을 방인(邦人), 다른 나라를 수방(殊邦), 동맹을 맺은 나라를 맹방(盟邦), 가까이 사귀는 나라를 우방(友邦), 나라를 합침을 합방(合邦), 모든 나라를 만방(萬邦), 우리 나라를 아방(我邦),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방(東邦), 각 나라 또는 여러 나라를 각방(各邦), 힘이 강한 나라를 강방(强邦),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일컫는 말을 부모지방(父母之邦), 예의를 숭상하며 잘 지키는 나라를 일컫는 말을 예의지방(禮儀之邦),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위방불입(危邦不入),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모로 노력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다난흥방(多難興邦) 등에 쓰인다.
▶️ 寧(편안할 녕/영, 편안할 령/영)은 ❶회의문자로 宁(영)은 간자(簡字), 寗(영)은 동자(同字), 寍(영)은 고자(古字)이다.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皿(명)과 心(심)의 합자(合字)이다. 음식물이 그릇에 수북이 담겨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있음의 뜻한다. 뒤에 음(音)을 나타내는 丁(정)을 더하였다. ❷회의문자로 寧자는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寧자는 宀(집 면)자와 心(마음 심)자, 皿(그릇 명)자,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丁자는 '탁자'를 표현하기 위한 모양자이다. 寧자의 갑골문을 보면 탁자 위에 그릇이 놓여 있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心자가 더해졌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의 寧자는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寧(녕, 령)은 ①편안하다 ②편안히 하다 ③문안하다 ④친정가다 ⑤편안(便安) ⑥차라리 ⑦어찌 그리고 편안할 령의 경우는 ⓐ편안하다(령) ⓑ편안히 하다(령) ⓒ문안하다(령) ⓓ친정가다(령) ⓔ편안(便安)(령) ⓕ차라리(령) ⓖ어찌(령)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편할 편(便), 편안 안(安)이다. 용례로는 수확이 많은 해를 영세(寧歲), 편안한 겨를을 영가(寧暇), 편안하게 삶을 영거(寧居), 무사하고 편안한 날을 영일(寧日), 평안하고 고요함을 영정(寧靜), 편안히 쉼을 영식(寧息),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안녕(安寧), 몸이 건강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강녕(康寧), 천하가 잘 다스려져서 태평함을 안녕(晏寧), 추측컨대 틀림이 없음을 정녕(丁寧),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뵘을 귀녕(歸寧), 어른이 병으로 편하지 못함을 미령(靡寧), 오래 살고 복되며 건강하고 편안함을 일컫는 말을 수복강녕(壽福康寧), 준걸과 재사가 조정에 많으니 국가가 태평함을 일컫는 말을 다사식녕(多士寔寧)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