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반정승(麥飯政丞)
보리밥 정승이라는 뜻으로, 근검절약하는 지도층 인사를 이르는 말이다.
麥 : 보리 맥(麥/0)
飯 : 밥 반(食/4)
政 : 정사 정(攵/5)
丞 : 정승 승(一/5)
보리는 쌀과 함께 주식의 대종이다. 보리밥은 그릇 위로 수북하게 고봉으로 제공하여 장정들에게 힘을 내게 한다. 요즘이야 보리밥은 성인병 예방에 좋다며 건강식으로 대우받지만 식량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이었다.
저장했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보릿고개에 서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고 했다. 이런 보리밥을 나라의 가장 높은 대신인 정승이 즐긴다면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다.
조선 정조때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역임한 김종수(金鍾秀)는 매우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가 '보리밥 정승'이라 불리게 된 이야기가 그의 아호를 딴 몽오집과 왕조실록에 전한다고 한국고사성어에 소개하고 있다.
김종수가 은퇴하여 낙향해 있을 때였다. 당시 관습으로 지방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대신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한다. 인사를 오면 노대신은 허름한 베옷에 나막신을 신고 반가이 맞으며 굳이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
그런데 지방관들이 받는 밥상에는 언제나 꽁보리밥에 김치 한 접시, 막걸리 한 잔이 전부였다. 노재상이 권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상에 앉아도 목에 넘어갈 리 없었다. 겸상하는 정승이 맛있게 먹으니 신임 사또는 고역이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도 곁들인다. '앞으로 부임하면 항상 이 밥상을 생각해야 하네. 앞으로 먹을 진수성찬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일세. 그러니 언제나 그 노고를 잊지 말고 선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야.' 그의 충고를 들은 지방관들은 큰 깨달음을 얻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고 한다.
이런 보리밥 정승은 은퇴한 뒤에도 신임 수령에게 본보기로 청렴을 가르친 반면 반식재상(伴食宰相)이란 것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에 책임은 지지 않고 곁다리 끼어서 밥이나 축내는 무능한 재상이다. 이런 지도자 아래서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없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고위직 인사마다 능력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니 국민만 고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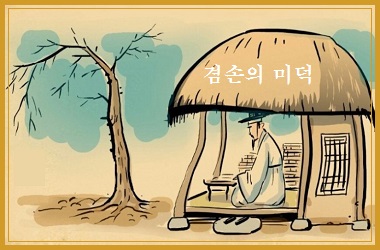
겸손의 미덕
가을의 들판은 풍요로움과 넉넉함 그 자체다. 옛날 손편지를 쓸 때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황금 물결치는 들판…’ 등으로 서두를 장식하곤 하였다. 올해에는 어려운 태풍도 없었기에 더욱 풍년 농사를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겸손의 미덕도 배워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쭉정이가 고개를 든다, 가랑잎이 더 시끄럽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등의 속담들은, 내실 있고 실력을 감추며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일찍이 강태공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 남을 천대하지 말고, 스스로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또 자신의 용맹을 믿고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욥 22:29) 했고, 다윗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라”(시 22:26),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5:33)는 말도 있다.
겸손에 관한 실화 한 토막을 보자. 조선 영조 때 경기도 장단의 오목이라는 동네에 이종성이라는 은퇴한 정승이 살고 있었다. 동네 이름을 따 “오목 이 정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매일 강가에 나가 낚시를 하면서 노후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가 어린 하인을 데리고 낚시를 하다 시장기를 느껴 근처 주막에 방을 잡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고을 신관 사또의 행차가 그 주막에 몰려왔다. 주막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또는 부득불 오목 이 정승이 식사하는 방으로 들어왔다.
신관 사또가 거만하게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아랫목에 앉다 보니 문득 방구석에서 식사하는 촌로(村老)와 어린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밥상을 보니 사또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밥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사또가 물었다. “여보게 늙은이, 지금 자네가 먹는 밥은 대체 뭔가?” “보리밥이오.” “어디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나?” “그러시지요.” 이렇게 해서 노인이 내민 보리밥 한 숟가락을 먹어본 사또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뱉어내더니 소리쳤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음식이란 말인가?”
사또가 노발대발하자 아전들은 냉큼 주모를 시켜 쌀밥과 고깃국을 대령했다. 그러는 사이에 노인과 아이는 잠자코 밖으로 나가버렸다. 바야흐로 사또가 식사를 끝낼 무렵, 이 정승 집 하인이 사또를 찾아왔다.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고관 벼슬을 지낸 어른이 부르자, 사또는 부리나케 정승 집 대문간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섬돌 밑에서 큰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 보니 조금 전에 주막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 아닌가. 비로소 사태를 깨달은 신관 사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대감, 아까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오목 이 정승의 추상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귀를 세차게 때렸다. “그대는 전하의 교지를 받들고 부임한 관리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데도 교만한 위세를 부렸으니,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먹는 보리밥을 입안에 넣었다가 뱉어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목민관으로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어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당장 벼슬 자리를 내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의 뜻을 품고 장단 고을에 부임했던 신관 사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낙향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자신이 귀하게 되자 겸양하지 못하고 교만함을 드러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였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지위가 올라가고 학문이 깊어갈수록 더욱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정3품인 당상관에 이르면 낮은 가마인 평교자를 타도록 법으로 정해 두기까지 했다.
클린턴 버나드는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은 남들을 조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기념하여 탑을 세우겠다고 주장해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당대 과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졌지만,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겸손했다고 한다.
위대함이란 조심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을 자기 입으로 떠벌리지 않는 것이다. 교만과 아집의 샘물을 마신 사람은 자기 삶의 발자취에 오점을 남기기 쉽고, 자기의 공든 탑을 자기 손으로 훼손하게 된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 麥(보리 맥)은 ❶회의문자로 麦(맥)은 통자(通字), 麦(맥)은 간자(簡字)이다. 來(래; 보리)과 뒤져올치(夂; 머뭇거림, 뒤져 옴)部의 발로 밟는 일의 합자(合字)이다. 麥(맥)은 보리 밟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디 來(래)가 보리를 뜻하는 글자였으나 온다는 뜻으로 쓰게 되어 보리의 뜻으론 麥(맥)을 쓰게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麥자는 '보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보리는 선사 시대부터 남동아시아에서 재배되어 기원전 2,000년경에는 중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작물이다. 생육 기간도 90일에 불과하여서 어찌 보면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곡물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麥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 갈래로 늘어진 보리 이삭과 뿌리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麥자는 보리 전체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보리'라는 글자로는 '오다'라는 뜻의 來(올 래)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來자가 '오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夂(뒤져서 올 치)자를 더한 지금의 麥자가 '보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麥(맥)은 ①보리(볏과의 두해살이풀) ②귀리(볏과의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 ③메밀(여뀟과의 한해살이풀) ④작은 매미(매밋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⑤묻다, 매장(埋葬)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보리 모(牟)이다. 용례로는 여물지 못하고 까맣게 병 든 보리 이삭을 맥노(麥奴), 보리를 심었거나 베어 낸 논을 맥답(麥畓), 이삭이 팬 보리나 밀이 바람을 받아서 물결처럼 보이는 모양을 맥랑(麥浪), 보리나 밀이 익을 무렵의 약간 서늘한 날씨를 맥량(麥涼), 보릿 고개를 맥령(麥嶺), 보리 농사를 맥작(麥作), 보리를 심은 밭을 맥전(麥田), 보리쌀로 빚어 담근 막걸리를 맥탁(麥濁), 볶은 보리를 끓여서 만든 숭늉을 맥탕(麥湯), 밀을 빻아서 체로 가루를 내고 남은 무거리를 맥피(麥皮), 보리 흉년을 맥흉(麥凶),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맥추(麥秋), 밀과 보리를 모맥(牟麥), 쌀과 보리를 미맥(米麥), 보리를 거두어 타작함을 타맥(打麥), 보리를 세로 2등분 한 뒤 다듬어 정제한 보리쌀을 할맥(割麥), 외국산의 밀이나 보리를 외맥(外麥), 밀가루 제조의 원료로 하는 밀을 원맥(原麥), 깨끗이 쓿은 보리쌀을 정맥(精麥), 가을 보리를 추맥(秋麥), 봄보리를 춘맥(春麥),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보리를 피맥(皮麥), 보리의 이삭과 기장의 윤기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을 이르는 말을 맥수서유(麥秀黍油),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을 이르는 말을 맥수지탄(麥秀之嘆), 콩인지 보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숙맥불변(菽麥不辨),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얻는다는 뜻으로 인과 응보를 비유해 이르는 말을 종맥득맥(種麥得麥), 아직 밭에 서 있는 보리를 파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입맥선매(立麥先賣), 밀밭을 지나면 밀 냄새만 맡고도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술을 도무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과맥전대취(過麥田大醉) 등에 쓰인다.
▶️ 飯(밥 반)은 ❶형성문자로 飰(반)은 통자(通字), 饭(반)은 간자(簡字), 飯(반)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밥식변(飠=食; 먹다, 음식)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反(반)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反(반)은 위에서 물건을 덮고 아래로부터도 그것을 받는 일, 밥식변(飠=食)部는 먹는 것, 먹는 일, 飯(반)은 입에 머금고 잘 씹어 먹다, 먹는 것, 밥, 본디는 食(식)과 飯(반)은 같은 말이며 먹는데도 먹는 것에도 같이 쓴 것인데 나중에 곡식의 주식(主食)을 가리켜 飯(반)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❷형성문자로 飯자는 '밥'이나 '식사', '먹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飯자는 食(밥 식)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사실 사전상으로 보면 飯자와 食자는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食자가 주로 '먹다'나 '음식' 자체만을 뜻했었다면 飯자는 곡식(穀食) 위주의 식사를 뜻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食자와 飯자는 관습적으로만 구분할 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飯(반)은 반축(飯柷)과 같은 뜻으로 ①밥 ②식사 ③먹다 ④먹이다 ⑤사육하다 ⑥기르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밥 식(食)이다. 용례로는 아침저녁의 끼니를 드리는 일을 반공(飯供), 식후에 먹는 과일을 반과(飯果), 밥그릇 또는 밥을 담는 그릇을 반기(飯器), 중국에서 식단을 이르는 말을 반단(飯單), 수저나 숟가락을 반비(飯匕), 밥 짓는 일을 맡아 보는 계집종을 반비(飯婢), 격식을 갖추어 차린 밥상을 반상(飯床), 밥을 짓거나 하면서 심부름하는 어린 승려를 반승(飯僧), 밥을 담는 그릇이나 밥통을 반우(飯盂), 중국 음식을 하는 음식점을 반점(飯店), 숭늉을 반탕(飯湯), 염습할 때에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과 씻은 쌀을 물리는 일을 반함(飯含), 밥을 지을 수도 있게 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밥 그릇을 반합(飯盒), 밥과 국을 반갱(飯羹), 밥과 과자를 반과(飯菓), 밥알을 반과(飯顆), 밥상을 반대(飯臺), 끼니로 먹는 음식을 반식(飯食), 끼니 때 밥에 곁들여서 한두 잔 마시는 술을 반주(飯酒), 밥에 곁들여 먹는 온갖 음식을 반찬(飯饌), 밥주머니라는 뜻으로 무능하고 하는 일 없이 밥이나 축내는 사람을 조롱하는 반낭(飯囊), 입에 든 밥을 뿜어낸다는 뜻으로 아주 크게 웃음을 반분(飯噴), 거칠고 반찬 없는 밥이라는 뜻으로 안빈낙도함을 일컫는 말을 반소사(飯疏食), 밥을 담는 주머니와 술을 담는 부대라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축내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반낭주대(飯囊酒袋), 식사가 끝난 후에 울리는 종이라는 뜻으로 때가 이미 지났음을 이르는 말을 반후지종(飯後之鐘), 밥이 오면 입을 벌린다는 뜻으로 심한 게으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반래개구(飯來開口), 제사의 제물을 진설할 때 밥은 서쪽 국은 동쪽에 놓음을 이르는 말을 반서갱동(飯西羹東),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을 십시일반(十匙一飯), 집에서 먹는 평소의 식사라는 뜻으로 일상사나 당연지사를 이르는 말을 가상다반(家常茶飯), 술과 밥주머니라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축내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주대반낭(酒袋飯囊), 옷걸이와 밥주머니라는 뜻으로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뿐이지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의가반낭(衣架飯囊), 먼지를 밥이라 하고 진흙을 국이라 하는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을 이르는 말을 진반도갱(塵飯塗羹), 한 끼의 식사에 천금같은 은혜가 들어 있다는 뜻으로 조그만 은혜에 크게 보답함을 이르는 말을 일반천금(一飯千金), 개밥의 도토리라는 속담의 한역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것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구반상실(狗飯橡實), 종에게 흰 밥을 주고 말에게 싱싱한 풀을 준다는 뜻으로 주인의 인심이 넉넉하여 남을 후대함을 이르는 말을 백반청추(白飯靑蒭), 따뜻한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풍족한 생활을 이르는 말을 온의미반(溫衣美飯), 한 술 밥의 덕이라는 뜻으로 보잘것없이 베푼 아주 작은 은덕을 이르는 말을 일반지덕(一飯之德), 여행 길에 하룻밤 묵어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뜻으로 조그마한 은덕을 입음을 이르는 말을 일숙일반(一宿一飯),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이라는 뜻으로 가까스로 살아 가는 가난한 삶을 이르는 말을 조반석죽(朝飯夕粥) 등에 쓰인다.
▶️ 政(정사 정/칠 정)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등글월 문(攵=攴; 일을 하다, 회초리로 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正(정)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등글월 문(攵=攴)部는 막대기를 손에 쥐다, 물건을 치는 일을 뜻하고, 등글월문(攵=攴)部가 붙는 한자는 '~하다', '~시키다'의 뜻을 나타낸다. 음(音)을 나타내는 正(정)은 征(정)과 통하여 적을 치는 일, 政(정)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일, 나중에 正(정)은 바른 일, 政(정)은 부정한 것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정치는 부정을 바로잡고 정치가는 먼저 몸을 바로 가지면 세상도 자연히 다스려진다고 설명된다. ❷회의문자로 政자는 '다스리다'나 '정사(政事)'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政자는 正(바를 정)자와 攵(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正자에 攵자가 결합한 政자는 '바르게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나 '정사'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政(정)은 ①정사(政事), 나라를 다스리는 일 ②구실(온갖 세납을 통틀어 이르던 말), 조세(租稅) ③법(法), 법규(法規), 정사(政事)를 행하는 규칙(規則) ④부역(負役), 노역(勞役) ⑤벼슬아치의 직무(職務)나 관직(官職) ⑥정사(政事)를 행하는 사람, 임금, 관리(官吏) ⑦가르침 ⑧확실히, 틀림없이, 정말로 ⑨바루다, 부정(不正)을 바로잡다 ⑩치다, 정벌(征伐)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스릴 치(治)이다. 용례로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을 정부(政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꾀하는 방법을 정책(政策),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政治), 정치의 국면을 정국(政局), 정치 상으로 의견이 달라 반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정적(政敵), 정치 상의 의견이나 정치에 관한 식견을 정견(政見), 정치 상의 명령 또는 법령을 정령(政令), 정치 상의 사무를 정무(政務), 나라의 정사를 국정(國政), 정치나 사무를 행함을 행정(行政), 헌법에 따라 하는 정치를 헌정(憲政),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를 악정(惡政), 포악한 정치를 폭정(暴政), 가혹한 정치를 가정(苛政), 백성에게 심히 구는 포학한 정치를 학정(虐政), 백성을 잘 다스림 또는 바르고 착하게 다스리는 정치를 선정(善政), 너그럽게 다스리는 정치를 관정(寬政), 둘 이상의 정당 대표들로 조직되는 정부를 연정(聯政), 정치의 방법을 그르침 또는 잘못된 정치를 실정(失政), 나라의 정무를 맡아봄 또는 그 관직이나 사람을 집정(執政), 정치에 참여함을 참정(參政), 두 나라의 정치가 서로 비슷함을 이르는 말을 정여노위(政如魯衛), 정이라는 글자의 본뜻은 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것임을 이르는 말을 정자정야(政者正也), 문외한이 정치에 관하여 아는 체하는 사람이 많음을 이르는 말을 정출다문(政出多門), 코 밑에 닥친 일에 관한 정사라는 뜻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먹고 살아가는 일을 일컫는 말을 비하정사(鼻下政事), 저마다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전체와의 조화나 타인과의 협력을 생각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을 각자위정(各自爲政), 여러 가지 정치 상의 폐단을 말끔히 고쳐 새롭게 한다는 말을 서정쇄신(庶政刷新), 새로운 정치를 베풀어 얼마 되지 아니한 때라는 말을 신정지초(新政之初), 남의 나라 안 정치에 관하여 간섭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내정간섭(內政干涉), 대화합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화합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태화위정(太和爲政) 등에 쓰인다.
▶️ 丞(정승 승/도울 승, 나아갈 증)은 회의문자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두 손으로 떠받들어 올리다의 뜻이다. 승이란 음(音)은 上(상; 올리다)에 유래한다. 전(轉)하여 '돕다, 받들다, 나아가다'의 뜻이 있다. 그래서 丞(승, 증)은 (1)조선시대 말(末) 비서원(秘書院)에 딸렸던 벼슬.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이 있었음 (2)조선시대 초엽(初葉)의 봉상시(奉常寺), 전중시(殿中寺), 사농시(司農寺), 사온서(司醞署), 사선서(司膳署), 풍저창(豊 儲倉), 도염서(都染署), 전옥서(典獄寺) 등에 딸렸던 벼슬. 종5품(從五品)에서 정9품(正九品)까지의 관원이 임명되었음 (3)고려(高麗) 때의 국자감(國子監), 비서성(秘書省), 봉상시(奉常寺), 전중성(殿中省), 위위시(衛尉寺), 대복시(大僕寺), 예빈성(禮賓省), 사온서(司醞署), 사선서(司膳署) 등에 딸렸던 벼슬. 정5품(正五品)에서 정9품(正九品)까지 임명되었음 (4)신라(新羅) 때 사정부(司正府)에 딸렸던 대내마(大柰麻)에서 내마(柰麻)까지의 벼슬. 34대 효성왕(孝成王) 때에 좌(佐)를 고친 이름, 등의 뜻으로 ①정승(政丞) ②벼슬의 이름 ③돕는 사람 ④돕다 ⑤받들다, 이어받다 ⑥잇다 ⑦잠기다, 가라앉다, 그리고 ⓐ나아가다(증) ⓑ구(救)하다(증) ⓒ구제(救濟)하다(증)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은 옛 중국의 벼슬 이름을 승상(丞相), 조선시대 때 의정부의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일컬었던 말을 정승(政丞),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달리 이르던 말을 삼정승(三政丞), 좌의정을 달리 이르는 말을 좌정승(左政丞), 우의정을 달리 이르던 말을 우정승(右政丞), 무인으로서 된 정승을 일컫는 말을 무정승(無政丞), 유생으로서 대번에 정승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을 백의정승(白衣政丞)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