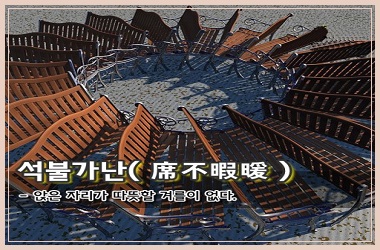
석불가난(席不暇暖)
자주 드나들어 방이 따뜻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자리나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매우 바쁘게 돌아다님을 일컫는 말이다.
席 : 자리 석(巾/7)
不 : 아닐 불(一/3)
暇 : 틈 가(日/9)
暖 : 따뜻할 난(日/9)
(유의어)
공석묵돌(孔席墨突)
묵돌불검(墨突不黔)
석불급난(席不及暖)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체온에 자리가 따뜻해질 텐데 여기저기 옮기면 더워질 틈이 없다. 주소를 자주 바꾸거나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겐 편안한 자리가 언감생심이다.
한시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시거나 진득하게 한 곳에 살지 못하고 휙 떠나는 사람들에 들어맞는 말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방랑벽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가들이 자기의 학설을 전파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집에 머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孔子)가 앉았던 돗자리는 따뜻해질 틈이 없고 묵자(墨子)의 집 굴뚝은 검어질 시간이 없다고 후세 사람들이 표현했다.
孔席不暖 墨突不黔.
공석불난 묵돌불검.
후한(後漢)의 역사가 반고(班固)의 답빈희(答賓戱)라는 글에 소개됐다. 공석묵돌(孔席墨突)이나 묵돌불검(墨突不黔)이라 해도 같은 말이다. 묵자는 겸애설(兼愛說)을 주창한 사상가다.
이런 선인들의 일화 말고 직접 이 성어가 나온 곳은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문학가 유의경(劉義慶)이 쓴 일화집 세설신어(世說新語)에서다.
옛날 한(漢)나라에 선비들의 우러름을 받는 진중거(陳仲擧)라는 곧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예장(豫章)이란 곳의 태수로 좌천되어 갔을 때 먼저 관서보다 그 곳의 유명한 선비 서유자(徐孺子)를 만나 보려 했다.
비서가 관에 먼저 가야 한다며 말리자 진중거가 말했다. '옛날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폭군 주왕(紂王)을 멸한 뒤 상용(商容)을 찾아 다니느라 자리가 따뜻해질 틈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현자를 찾아뵙는 것이 어떻게 안 된다는 말인고?'
武王式商容之閭 席不暇煖 吾之禮賢 有何不可.
무왕식상용지려 석불가난 오지례현 유하불가.
자신이 일가를 이룬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든 아니면 어진 사람을 찾아 가르침을 받든 이러한 바쁨은 좋은 일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갈 곳 없어 먼 산만 바라보는 노년층에겐 오히려 부러운 일이다.
오그라드는 경제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을 바쁘게 오가게 할 수 있는지 정책 당국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모두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난망이다.

▶️ 席(자리 석)은 ❶형성문자로 蓆(석)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수건 건(巾; 옷감, 헝겊)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서(석)가 합(合)하여 자리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席자는 '자리'나 '돗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席자는 广(집 엄)자와 廿(스물 입)자,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席자는 단순히 돗자리 하나만이 그려져 있었다. 고문(古文)에서는 여기에 厂(기슭 엄)자가 더해져 있었는데, 그늘진 곳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厂자가 广(집 엄)자로 바뀌었고 돗자리는 廿자와 巾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席자는 고문에 나타나 형식이 변화된 것으로 '자리'나 '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席(석)은 성(姓)의 하나로 ①자리 ②앉을 자리 ③여럿이 모인 자리 ④돗자리 ⑤앉음새(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 자리에 앉는 법(法) ⑥돛, 배에 다는 돛 ⑦깔다, 자리를 깔다 ⑧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벌이다, 벌여 놓다 ⑨의뢰하다, 믿고 의지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자리 좌(座), 대자리 연(筵)이다. 용례로는 자리의 차례나 성적의 차례를 석차(席次), 굉장한 기세로 영토를 남김없이 차지하여 세력 범위를 넓히는 것을 석권(席卷),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를 석상(席上), 어떤 자리에서 주문에 응하여 즉석에서 그림을 그림 또는 그렇게 그린 그림을 석화(席畫), 집회 석상 등에서 즉흥적으로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림을 석서(席書), 빈자리로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비어 있는 자리를 공석(空席), 자리를 함께하여 앉음을 합석(合席), 자리에 참여함을 참석(參席), 맨 윗자리로 시험 등에서 순위가 첫째인 상태를 수석(首席), 앉는 자리를 좌석(座席), 어떤 자리에 참석함을 출석(出席), 주가 되는 자리로 단체나 합의체의 통솔자를 주석(主席), 서서 타거나 구경하는 자리를 입석(立席), 회의하는 자리를 의석(議席), 자리에 앉음을 착석(着席), 손님의 자리를 객석(客席),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를 즌석(卽席), 사사로이 만나는 자리를 사석(私席), 어떤 자리에 윗사람이나 상관을 받들거나 모셔 함께 참석하는 것을 배석(陪席), 수석의 다음 자리 또는 그 사람을 차석(次席), 병자가 앓아 누워 있는 자리를 병석(病席),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과에 대한 처분을 기다림을 일컫는 말을 석고대죄(席藁待罪), 자주 드나들어 방이 따뜻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자리나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매우 바쁘게 돌아다님을 일컫는 말을 석불가난(席不暇暖), 앉은 그 자리에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림을 일컫는 말을 석상휘호(席上揮毫), 자리에 편안히 앉지 못한다는 뜻으로 마음에 불안이나 근심 등이 있어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좌불안석(坐不安席), 공자의 자리는 따스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한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왔다갔다함을 이르는 말을 공석불가난(孔席不暇暖), 묵자 집의 굴뚝엔 그을음이 낄 새가 없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일컫는 말을 공석묵돌(孔席墨突), 하늘을 장막으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는다는 뜻으로 천지를 자기의 거처로 할 정도로 지기志氣가 웅대함을 이르는 말을 막천석지(幕天席地), 주인의 자리에는 예의 상 손이 앉지 않는 법이라는 말을 불탈주인석(不奪主人席), 사귐을 끊어서 자리를 같이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할석분좌(割席分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몹시 불안함을 일컫는 말을 여좌침석(如坐針席), 이부자리 위에서 죽음을 뜻하여 제 수명에 죽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와석종신(臥席終身), 늘 길거리에 모여 있으면서 뜬 벌이를 하는 막벌이꾼을 일컫는 말을 장석친구(長席親舊), 걱정이 많아서 편안히 자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침불안석(寢不安席) 등에 쓰인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부적절(不適切), 부당한 일을 부당지사(不當之事),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부정부패(不正腐敗), 그 수를 알지 못한다는 부지기수(不知其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달시변(不達時變) 등에 쓰인다.
▶️ 暇(틈 가/겨를 가)는 형성문자로 睱(가)는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날 일(日; 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叚(가; 함께 있다)로 이루어졌다. 하루 편안히 집에 있다의 뜻이다. 그래서 暇(가)는 ①틈, 틈새 ②겨를 ③틈이 있는 날 ④한가히 놀다 ⑤한가하다 ⑥크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틈이나 겨를을 가극(暇隙), 틈이 있는 날이나 한가한 날을 가일(暇日), 한가히 놂을 가일(暇逸), 할 일이 없어 몸과 틈이 있음을 한가(閑暇), 학교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을 휴가(休暇), 남은 시간이나 겨를을 틈을 여가(餘暇),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年暇), 구해 벌어옴이나 휴가를 원함을 구가(求暇), 휴가를 얻음을 걸가(乞暇), 편안한 겨를을 영가(寧暇),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를 병가(病暇), 일을 정리하고 난 뒤의 여가를 정가(整暇), 틈을 얻음이나 겨를을 얻음을 득가(得暇), 일정한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방가(放暇), 말미를 청함을 청가(請暇), 휴가를 얻음 또는 휴가해 달라고 말함을 고가(告暇), 잠깐 동안의 겨를이나 얼마 안 되는 짧은 겨를을 소가(小暇), 타고 있어도 그것을 떨쳐버릴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매우 바쁨을 소불가귀(燒不暇撌), 부산하게 바빠서 겨를이 없음을 분주불가(奔走不暇), 하나하나 인사할 틈이 없이 매우 바쁨을 응접무가(應接無暇), 할 일이 많아 시일이 부족함을 일불가급(日不暇給), 인사할 틈도 없다는 뜻으로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몹시 바쁜 것을 응접불가(應接不暇) 등에 쓰인다.
▶️ 暖(따뜻할 난, 부드러울 훤)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날 일(日; 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爰(원, 난)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爰(원)은 직접이 아니고 사이에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남의 손을 끄는 일, 여기에서는 援(원), 緩(완) 따위와 함께 한가롭다는 뜻을 나타낸다. 爛(난)은 불에 데운 미지근한 물과 같이 따뜻한 것, 옛날에는 불 화(火=灬; 불꽃)部와 같이 日(날일변)이 같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글자도 나중에 暖(난)으로 쓰였다. 그래서 暖(난, 훤)은 ①따뜻하다 ②따뜻이 하다 ③따뜻해지다 ④따뜻한 기운 그리고 ⓐ부드럽다(훤) ⓑ유순한 모양(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따뜻할 온(溫), 더울 서(暑), 불꽃 염(炎), 더울 열(熱),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찰 냉(冷), 찰 랭(冷), 찰 한(寒), 서늘할 량(涼)이다. 용례로는 방을 덥게 함을 난방(暖房), 따뜻한 봄을 난춘(暖春), 따뜻한 겨울을 난동(暖冬), 따뜻한 느낌을 나타내는 색을 난색(暖色), 따뜻한 열을 난열(暖熱), 대기 속에서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어 나가는 흐름을 난파(暖波), 따뜻한 나라를 난국(暖國), 따뜻한 기운을 난기(暖氣), 뜨뜻하게 만든 옷을 난의(暖衣), 따뜻한 바다를 난해(暖海),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러움을 난화(暖和), 따뜻한 곳을 난지(暖地), 따뜻한 바람을 난풍(暖風), 몸이나 방안을 덥게 하는 난방 기구를 난로(暖爐), 솜을 두어 만든 휘장을 난장(暖帳), 날씨가 따뜻함을 온난(溫暖), 추움과 따뜻함을 한난(寒暖), 차가움과 따뜻함을 냉난(冷暖), 봄철의 따뜻한 기운을 춘난(春暖), 화창하고 따뜻함을 화난(和暖),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함을 융난(融暖), 부드럽고 따뜻함을 연난(軟暖), 가볍고 따뜻함을 경난(輕暖), 옷을 따뜻이 입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으로 의식 걱정이 없는 편한 생활을 난의포식(暖衣飽食), 자주 드나들어 방이 따뜻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자리나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매우 바쁘게 돌아다님을 석불가난(席不暇暖),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는 그 물을 마신 자만이 안다는 뜻으로 자기 일은 남이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안다는 냉난자지(冷暖自知)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