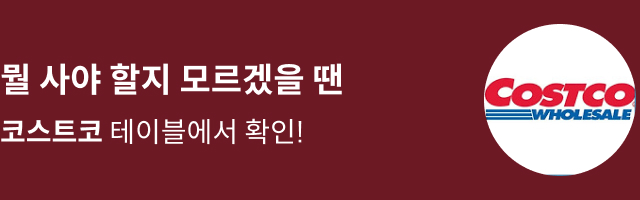고려 토지 제도는 대개 당나라 제도를 본땄다.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고, 문무 관리 군인 한인에게 등급에 따라 모두 땅을 나누어 주었다. 또 등급에 따라 시지를 주었다.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반납하였다. 군인은 나이 20세가 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였다.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땅을 물려 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성문을 지키는 부대)에 소속되었다.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반환하였다.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자와 전사한 자의 아내에게도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이밖에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또 공해 전시가 있어 왕실, 궁궐, 여러 관청과 역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다. 뒤에 관리의 녹봉이 부족해지자 경기도 고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
해설 고려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문무 관리, 국역을 담당한 군인, 한인(벼슬할 수 있는 신분이면서도 벼슬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논밭)과 시지(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때 지급된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다. 그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었다. 수조권을 지급 받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바칠 조세를 대신 받아 간다. 수조권은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 그래야만 신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할 토지가 모자라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유가족에게 생계 유지를 위하여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특히, 문벌 귀족에게 지급되는 공음전과 공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런 우대 조처는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