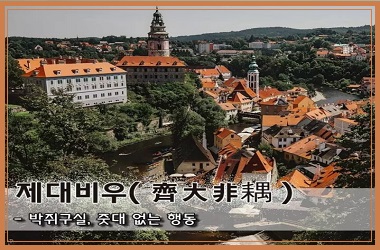
제대비우(齊大非耦)
제(齊)나라는 큰 나라 이어서 나의 짝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혼인 상대의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배우자로 맞이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齊 : 제나라 제(齊/0)
大 : 큰 대(大/0)
非 : 아닐 비(非/0)
耦 : 짝 우(耒/9)
출전 : 좌씨전(左氏傳) 환공(桓公) 6年
이 성어는 춘추시대 작은 나라인 정(鄭)나라 태자의 일화에서에 유래되었다. 중국 춘추시대에 제(齊)나라는 큰 나라가 이었다. 그런데 북쪽의 융족(北戎)이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나라 군주 희공(僖公)은 정(鄭)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니, 정나라는 태자 홀(忽)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제나라를 구원하였다.
태자 홀(忽)은 북쪽의 융족(北戎)를 대패시키고 나서 북융의 장수 대량(大良). 소량(少良)과 병사 3백을 베어 제나라에 바쳤다.
(...)
노나라 환공이 제나라와 혼인(文姜)하기 전에 제나라 군주 희공(僖公)은 자기 딸 문강(文姜)을 정나라 태자 홀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태자 홀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태자 홀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각각 합당한 짝이 있는 것이다. 제나라는 강대하니 강대한 나라의 딸은 나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人各有耦, 齊大, 非吾耦也).
시경(詩經)에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自求多福)’고 하였으니,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 대국(大國)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자신을 위한 계책은 훌륭하였다(善自為謀).”
정나라 태자 홀이 북융의 군대를 격파함에 감격하여 제나라 희공(僖公)이 또 사위 삼기를 청하였는데(문강은 이미 노환공과 결혼 함), 태자 홀이 굳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태자 홀이 말하기를, “제나라에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감히 아내를 취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임금의 명령을 받고 제나라의 위급함을 구원하러 왔다가 아내를 얻어 돌아간다면, 이는 전쟁을 이용하여 혼인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今以君命, 奔齊之急, 而受室以歸, 是以師昏也, 民其謂我何).”라 하고 마침내 정나라 군주에게 고하여 사절하게 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제대비우는 결혼 상대의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감히 배우자로 맞이할 엄두를 내지 못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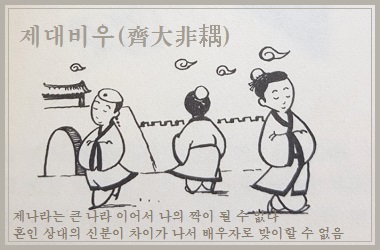
제대비우(齊大非耦)
결혼은 자기와 동등한 자와 할 일이다. 자기보다 뛰어난 상대는 반려가 아니고 주인을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서양격언이다. 결혼에 대한 숱한 조언 중에서 상대를 잘 택해야 행복하다는 것이 많다.
야서지혼(野鼠之婚)이 잘 말해준다. 두더지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해와 달, 바람과 비에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역시 종족인 두더지가 제일이라고 깨닫는다.
제(齊)나라는 대국이어서(齊大) 자신의 짝이 될 수 없다(非耦)는 이 성어는 상대방과 너무 신분의 차이가 커서 감히 배우자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耦는 쟁기 또는 가지런할 우인데 짝이라는 뜻도 있어 제대비우(齊大非偶)라 쓰기도 한다.
춘추(春秋)의 주석서 중에 좌구명(左丘明)이 역사적 실증적 해석을 중심으로 지은 좌씨전(左氏傳)에 내력이 실려 있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는 강국이었음에도 북융(北戎)의 잦은 침범에 골머리를 앓았다.
어느 해 또다시 침공을 당하자 제의 희공(僖公)이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했다. 정(鄭)나라에서 파견한 젊고 용감한 태자 홀(忽)은 단번에 적의 대장을 사로잡는 등 큰 전공을 세웠다.
이전에도 희공이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려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혼사를 꺼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홀 왕자는 대답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짝이 있는데 제나라는 대국이어서 짝이 될 수 없소(人各有耦 齊大 非吾耦也)'.
그러면서 시경(詩經)에도 스스로 다복을 구하라고 했는데 행복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큰 나라가 무슨 이점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대국의 사위가 될 기회를 소국의 왕자가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환공(桓公) 6년 조에 나온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 딸과 결혼했던 그룹 평사원이 이혼 소송문제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평범한 중산층의 총각이 반대를 무릅쓰고 재벌가의 똑똑하기도 한 딸과 부부로 골인하자 '남성 신데렐라'라 부르며 선망과 질시를 함께 받았었다.
하지만 결혼 17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의견이 갈려 항소까지 올라가 공방중이다.
끝까지 잘 살았으면 정나라 왕자 홀의 이야기가 잘못된 성어로 남겠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배필은 비슷한 혈통, 비슷한 재산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다.

▶️ 齊(가지런할 제, 재계할 재, 옷자락 자, 자를 전)는 ❶상형문자로 斉(제)의 본자(本字), 䶒(재)와 동자(同字)이고, 齐(제)는 간자(簡字), 亝(제)는 고자(古字)이다. 곡물의 이삭이 가지런히 돋은 모양을 본떴다. ❷상형문자로 齊자는 '가지런하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齊자는 亠(돼지해머리 두)자와 刀(칼 도)자와 같은 다양한 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의 齊자는 매우 단순했었다. 齊자의 갑골문을 보면 곡식의 이삭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곡식이 가지런히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글자의 획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갑골문에서는 곡식을 가지런히 그려 '가지런하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齊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이 가지런함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齊(제)는 중국 춘추시대에 산둥성(山東省) 일대에 있던 나라의 뜻으로 가지런할 제의 경우 ①가지런하다(제) ②단정하다(제) ③질서 정연하다(가지런하고 질서가 있다)(제) ④재빠르다, 민첩하다(제) ⑤오르다(제) ⑥같다, 동등하다(제) ⑦좋다, 순탄하다(제) ⑧다스리다(제) ⑨경계하다(제) ⑩지혜롭다(제) ⑪분별하다(제) ⑫이루다, 성취하다(제) ⑬섞다, 배합하다(제) ⑭약제(藥劑)(제) ⑮배꼽(제) ⑯한계(限界)(제) ⑰삼가는 모양(제) ⑱제나라(제) ⑲가운데(제) ⑳일제히, 다 같이(제) 그리고 재계할 재의 경우 ⓐ재계하다(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재) ⓑ공손하다(재) ⓒ엄숙하다(재) ⓓ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재) 그리고 옷자락 자의 경우 ㉠옷자락(자) ㉡상복(上服: 윗옷. 위에 입는 옷)(자) ㉢제사에 쓰이는 곡식(자) ㉣꿰매다(자) ㉤예리하다(자) 그리고 자를 전의 경우 ㊀자르다(전) ㊁깎다(전)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을 제가(齊家),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소리를 질러 부름을 제창(齊唱),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일제히 함을 제거(齊擧),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바침을 제납(齊納), 반열을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을 제반(齊班),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분개함을 제분(齊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정성을 바침을 제성(齊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호소함을 제유(齊籲), 큰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앉음을 제좌(齊坐), 여럿이 일제히 떨쳐 일어남을 제진(齊振), 여럿이 한 자리에 모임을 제회(齊會), 한결같이 가지런함을 제균(齊均), 금전이나 물건 등을 균등하게 나누어 줌을 제급(齊給), 일제히 길을 떠남을 제발(齊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제히 소리를 지름을 제성(齊聲), 마음을 한 가지로 함을 제심(齊心), 가지런히 열을 지음을 제열(齊列), 남편과 한 몸이라는 뜻으로 아내를 이르는 말을 제체(齊體), 음식을 눈썹 있는데까지 받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깊이 경애함을 일컫는 말을 제미(齊眉),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공손히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깍듯이 공경함을 일컫는 말을 거안제미(擧案齊眉), 자기의 몸을 닦고 집안 일을 잘 다스림을 이르는 말을 수신제가(修身齊家),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라는 뜻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들 사이에 끼여 괴로움을 받음을 이르는 말을 간어제초(間於齊楚), 제나라를 공격하나 이름만 있다는 뜻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체하면서 사실은 다른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을 벌제위명(伐齊爲名), 온갖 꽃이 일시에 핀다는 뜻으로 갖가지 학문이나 예술이 함께 성함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백화제방(百花齊放), 듣고 본 것이 아주 좁고 고루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자성제인(子誠齊人),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일제히 꾸짖음을 이르는 말을 제성토죄(齊聲討罪), 중국의 제나라 동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말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뜻으로 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골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제동야인(齊東野人), 두 마리의 봉황이 나란히 날아간다는 뜻으로 형제가 함께 영달함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양봉제비(兩鳳齊飛), 토지의 크기나 덕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으로 서로 조건이 비슷함을 이르는 말을 지추덕제(地醜德齊), 제나라도 섬기고 초나라도 섬긴다는 뜻으로 양쪽 사이에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도 못하여 난감한 상황을 이르는 말을 사제사초(事齊事楚), 월나라와 제나라에서 미인이 많이 나온 데서 미인을 이르는 말을 월녀제희(越女齊姬) 등에 쓰인다.
▶️ 大(클 대/큰 대, 클 대, 클 다)는 ❶상형문자로 亣(대)는 동자(同字)이다. 大(대)는 서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본 모양으로, 처음에는 옆에서 본 모양인 人(인)과 匕(비) 따위와 같이, 다만 인간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나중에 구분하여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 크다의 뜻으로 쓰였다. ❷상형문자로 大자는 ‘크다’나 ‘높다’, ‘많다’, ‘심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大자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大자는 기본적으로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에서 ‘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 大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大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크다’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大자가 본래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대)는 (1)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 큰, 으뜸가는, 뛰어난, 위대한, 광대한, 대단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존경(尊敬) 또는 찬미(讚美)의 뜻도 나타냄 (3)큼. 큰 것 (4)큰 달. 양력으로 31일, 음력으로 30일인 달 (5)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대) ②높다, 존귀하다(대) ③훌륭하다, 뛰어나다(대) ④자랑하다, 뽐내다, 교만하다(대) ⑤많다, 수효(數爻)가 많다(대) ⑥중(重)히 여기다, 중요시하다(대) ⑦지나다, 일정한 정도를 넘다(대) ⑧거칠다, 성기다(물건의 사이가 뜨다)(대) ⑨낫다(대) ⑩늙다, 나이를 먹다(대) ⑪대강(大綱), 대략(大略)(대) ⑫크게, 성(盛)하게(대) ⑬하늘(대) ⑭존경하거나 찬미(讚美)할 때 쓰는 말(대) 그리고 클 태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태) ⓑ지나치게(태) 그리고 클 다의 경우는 ㉠크다, 심하다(다) ㉡극치(極致), 극도(極度)(다) ㉢지나치게(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클 위(偉), 클 굉(宏), 클 거(巨),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작을 소(小), 가늘 세(細)이다. 용례로는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큰 일을 대사(大事), 크게 구분함을 대구분(大區分), 일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형세를 대세(大勢), 크게 길함을 대길(大吉),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같음을 대동(大同),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큰 규격이나 규모를 대형(大型), 크게 어지러움을 대란(大亂), 사물의 큼과 작음을 대소(大小), 크게 이루어짐을 대성(大成), 크게 웃음을 대소(大笑), 넓고 큰 땅을 대지(大地), 넓혀서 크게 함을 확대(廓大), 가장 큼을 최대(最大), 몹시 크거나 많음을 막대(莫大), 뛰어나고 훌륭함을 위대(偉大),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중대(重大), 마음이 너그럽고 큼을 관대(寬大), 엄청나게 큼을 거대(巨大), 형상이나 부피가 엄청나게 많고도 큼을 방대(厖大), 더 보태어 크게 함을 증대(增大),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대기만성(大器晩成), 거의 같고 조금 다르다는 대동소이(大同小異), 바라던 것이 아주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함을 대실소망(大失所望), 큰 글자로 뚜렷이 드러나게 쓰다라는 대자특서(大字特書), 매우 밝은 세상이라는 대명천지(大明天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 등에 쓰인다.
▶️ 非(아닐 비, 비방할 비)는 ❶상형문자로 새의 좌우로 벌린 날개 모양으로, 나중에 배반하다, ~은 아니다 따위의 뜻으로 쓰인다. ❷상형문자로 非자는 ‘아니다’나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非자를 보면 새의 양 날개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非자의 본래 의미는 ‘날다’였다. 하지만 후에 새의 날개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에서 ‘등지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배반하다’나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飛(날 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非(비)는 (1)잘못, 그름 (2)한자로 된 명사(名詞) 앞에 붙이어 잘못, 아님, 그름 따위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그르다 ③나쁘다, 옳지 않다 ④등지다, 배반하다 ⑤어긋나다 ⑥벌(罰)하다 ⑦나무라다, 꾸짖다 ⑧비방(誹謗)하다 ⑨헐뜯다 ⑩아닌가, 아니한가 ⑪없다 ⑫원망(怨望)하다 ⑬숨다 ⑭거짓 ⑮허물, 잘못 ⑯사악(邪惡)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不),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을 비난(非難), 옳은 이치에 어그러짐을 비리(非理), 예사롭지 않고 특별함을 비상(非常), 부정의 뜻을 가진 문맥 속에서 다만 또는 오직의 뜻을 나타냄을 비단(非但),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목숨을 비명(非命), 보통이 아니고 아주 뛰어남을 비범(非凡), 법이나 도리에 어긋남을 비법(非法), 번을 설 차례가 아님을 비번(非番), 사람답지 아니한 사람을 비인(非人),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를 비행(非行), 불편함 또는 거북함을 비편(非便), 결정하지 아니함을 비결(非決),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정이 없음을 비정(非情),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을 시비(是非), 옳음과 그름을 이비(理非), 간사하고 나쁨을 간비(姦非), 아닌게 아니라를 막비(莫非), 그릇된 것을 뉘우침을 회비(悔非),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선비(先非), 교묘한 말과 수단으로 잘못을 얼버무리는 일을 식비(飾非), 음란하고 바르지 아니함을 음비(淫非),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비일비재(非一非再),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는 비승비속(非僧非俗),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한 상태를 비몽사몽(非夢似夢),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는 말을 비례물시(非禮勿視), 모든 법의 실상은 있지도 없지도 아니함을 비유비공(非有非空) 등에 쓰인다.
▶️ 耦(짝 우)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가래 뢰(耒; 쟁기, 경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禺(옹, 우)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耦(우)는 ①나란히 가다 ②마주서다 ③짝짓다 ④우수(偶數; 짝수) ⑤짝 ⑥한 자 넓이 ⑦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두 사람이 쟁기를 나란히 하여 함께 땅을 갊을 우경(耦耕), 짝을 지어 활을 쏨을 우사(耦射), 두 사람이 서로 맞찔러서 죽음을 우자(耦刺), 짝을 지음을 작우(作耦), 농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짝을 이루어 농사를 도움을 조우(助耦), 제나라는 큰 나라 이어서 나의 짝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혼인 상대의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배우자로 맞이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을 제대비우(齊大非耦)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