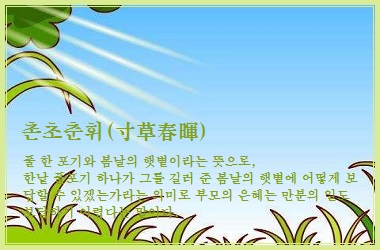
촌초춘휘(寸草春暉)
풀 한 포기와 봄날의 햇볕이라는 뜻으로, 한낱 풀포기 하나가 그를 길러 준 봄날의 햇볕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로 부모의 은혜는 만분의 일도 보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寸 : 마디 촌(寸/0)
草 : 풀 초(艹/6)
春 : 봄 춘(日/5)
暉 : 빛 휘(日/9)
출전 :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
이 성어는 당(唐)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에서 유래한다.
맹교(孟郊)는 46세에 첫 관직에 오르고도 성격이 강직하여 하급관리만 맡았기에 일생을 곤궁하게 보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민중들에 대한 동정심과 고난, 불평이 담긴 것이 많다고 한다.
유자(遊子)의 노래는 길을 나선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이다.
유자음(遊子吟)
멀리 가는 아들을 읊다
(한시작가작품사전의 해석)
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인자하신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들고, 먼 길 떠나는 아들이 입을 옷에,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떠날 때 한 땀 한 땀 꼼꼼히 기움은, 이 아들이 어쩌다 더디 올까 두려워서라.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누가 말했던가, 저 조그만 풀이, 따뜻한 봄빛 은혜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안병화의 해석)
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자애로운 어머님 손에 실 들고, 길 떠날 아들 위해 옷을 지으시네.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떠나기 전에 촘촘히 꿰매시며, 돌아올 날 늦어질까 염려하시네.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뉘라서 한 치 풀 같은 마음을 갖고서, 한 봄의 햇빛 같은 어머님 은혜 보답하리.
(또 다른 해석)
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옷은, 바로 유자가 몸에 걸칠 옷이로세.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떠날 임시에 촘촘히 꿰매신 것은, 더디게 돌아올까 염려해서라오.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한 치 풀의 마음을 가지고서, 삼춘의 햇볕을 어떻게 보답하리오.
자식을 객지로 내보내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정이 묘사되어 있다. 풀 한 포기는 자식을 가리키며 석 달 봄볕은 어버이의 은혜를 비유한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풀은 잘 자라지만 그 아래 돋아나는 풀은 너무나 미력하여 은혜를 갚으려 해도 다 보답할 수 없다. 늦게 벼슬자리에 오른 맹교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한 것으로 해석한다.
🔘 세종실록 좌의정 허조(許稠)의 졸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처음에 그 어머니가 손수 고치를 켜서 실을 뽑아 겹옷을 지어 조(稠)에게 주었으므로, 매양 기일(忌日)을 당하거나 시제(時祭) 때에는 반드시 속에다 입고, 반드시 맹교(孟郊)의 ‘자모수중선(慈母手中線)’ 이라는 시(詩)를 외었으며, 일찍이 자손에게 명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 옷으로 염습하라.”하였다.

▶️ 寸(마디 촌)은 ❶지사문자로 吋(촌)과 동자(同字)이다. 又(우)는 손의 모양이고, 一(일)은 표시(表示)이고, 寸(촌)은 손가락 하나의 너비로, 나중에 寸(촌)은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를 가리켜서 한 치의 마디를 뜻한다. 손목의 맥을 짚는 자리, 손목에서 맥 짚는 곳까지의 길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길이나 저울눈은 사람의 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 것이 많았다. ❷지사문자로 寸자는 '마디'나 '촌수'를 뜻하는 글자이다. 寸자는 又(또 우)자에 점을 찍은 지사문자(指事文字)로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를 뜻하고 있다. 그러니 寸자에 있는 '마디'라는 뜻은 손가락 마디가 아닌 손목까지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寸자가 길이의 기준으로 쓰였다. 길이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寸자는 '법도'나 '규칙'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寸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단순히 '손'과 관련된 의미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寸(촌)은 친족(親族) 상호(相互) 간(間)의 혈통(血統) 연결(連結)의 원근 관계(關係)를 나타내는 단위의 뜻으로 ①마디 ②치(길이의 단위) ③촌수(혈족의 세수를 세는 말) ④마음 ⑤근소(僅少) ⑥조금, 약간 ⑦작다 ⑧적다 ⑨헤아리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마디 절(節)이다. 용례로는 친족 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체계를 촌수(寸數), 아주 짧은 단편적인 연극을 촌극(寸劇), 매우 짧은 동안의 시간을 촌구(寸晷), 얼마 안 되는 시간이나 썩 짧은 시간을 촌음(寸陰), 퍽 좁은 논밭을 촌토(寸土), 매우 짧은 시각을 촌각(寸刻),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나 무기를 촌철(寸鐵), 매우 적은 녹봉을 촌름(寸廩), 마디마디 구멍이 뚫린다는 뜻으로 몹시 괴로움을 형용하여 이르는 말을 촌착(寸鑿), 몇 발자국의 걸음을 촌보(寸步), 얼마 안 되는 착한 일 또는 좋은 일을 촌선(寸善), 얼마 안 되는 성의를 촌성(寸誠), 속으로 품은 작은 뜻을 촌심(寸心), 아주 조그마한 공로를 촌공(寸功), 짤막한 말로 짧기는 하지만 의미가 깊은 말을 촌언(寸言), 간단하고 짧은 해석을 촌해(寸解),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촌벽(寸碧), 마디마디의 창자를 촌장(寸腸), 매우 짧게 비평함 또는 그 비평을 촌평(寸評), 얼마 안 되거나 짧은 겨를을 촌극(寸隙), 자그마한 뜻을 나타낸 적은 선물이나 약간의 성의를 촌지(寸志), 네 치 곧 한 자의 10분의 4 또는 어버이의 친형제 자매의 아들이나 딸을 사촌(四寸), 촌수를 따짐을 계촌(計寸), 가까운 촌수를 근촌(近寸), 속으로 품은 자그마한 뜻을 심촌(心寸), 실물과 같은 치수를 원촌(原寸),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한 마디나 한 토막을 일촌(一寸), 한 치밖에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간단한 경구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킴을 일컫는 말을 촌철살인(寸鐵殺人), 자그마한 붓과 종이라는 뜻으로 간략한 문장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촌관척지(寸管尺紙), 짧은 실 한 토막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음을 이르는 말을 촌사불괘(寸絲不掛), 부모의 은혜는 일만분의 일도 갚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을 촌초춘휘(寸草春暉), 한 치의 선과 한 자의 마라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른다는 말을 촌선척마(寸善尺魔), 앞으로 한 치 나아가고 뒤로 한 자 물러선다는 뜻으로 얻은 것은 적고 잃은 것만 많음을 이르는 말을 촌진척퇴(寸進尺退), 한 자 되는 구슬보다도 잠깐의 시간이 더욱 귀중하니 시간을 아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촌음시경(寸陰是競), 사돈의 팔촌으로 일가붙이가 되나 마나 할 정도로 아주 먼 친척을 이르는 말을 사돈팔촌(査頓八寸), 수중에 한 치의 쇠붙이도 없다는 뜻으로 흉기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수무촌철(手無寸鐵), 한 자짜리 산과 한 치의 내라는 뜻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산수를 바라볼 때에 작게 보임을 이르는 말을 척산촌수(尺山寸水) 등에 쓰인다.
▶️ 草(풀 초)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艹=艸; 풀, 풀의 싹)部와 음을 나타내는 早(조, 초)가 합하여 이루어졌다. 풀의 뜻으로는 처음에는 艸(초)라고 썼지만 나중에 음을 나타내는 早(조, 초)를 곁들여 草(초)로 쓰게 되었다. ❷형성문자로 草자는 '풀'이나 '황야', '초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草자는 艹(풀 초)자와 早(일찍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미 풀을 뜻하는 글자로는 艸(풀 초)자가 있지만 주로 부수 역할로만 쓰이고 草자는 단독으로 '풀'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다. 草자에 쓰인 早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조, 초'로의 발음 역할만을 한다. 草자가 흔해 빠진 '풀'을 뜻하다 보니 '엉성하다'나 '보잘것 없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래서 草(초)는 (1)기초(超草) (2)초서(草書) (3)건초(乾草) (4)갈초 등의 뜻으로 ①풀 ②거친 풀, 잡초(雜草) ③황야(荒野) ④풀숲, 초원(草原) ⑤시초(始初) ⑥초고(草稿), 초안(草案) ⑦초서(草書: 서체의 하나) ⑧암컷 ⑨풀을 베다 ⑩시작하다, 창조하다 ⑪엉성하다, 거칠다 ⑫초고(草稿)를 쓰다 ⑬천하다, 미천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풀이 나 있는 땅을 초지(草地), 풀이 난 들을 초원(草原), 사업을 일으켜 시작함을 초창(草創), 볏짚이나 밀짚 또는 갈대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초가(草家), 풀과 나무를 초목(草木), 서체의 하나인 초서(草書), 문장이나 시 따위를 초잡음을 초안(草案), 시문의 초벌로 쓴 원고를 초고(草稿), 녹색보다 조금 더 푸른색을 띤 색깔인 초록(草綠), 푸성귀로만 만든 음식을 초식(草食), 풀과 티끌이라는 초개(草芥), 꽃이 피는 풀과 나무를 화초(花草), 무덤에 떼를 입히고 다듬음을 사초(莎草), 무덤의 잡초를 베는 일을 벌초(伐草), 바다 속에서 나는 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해초(海草), 약이 되는 풀을 약초(藥草), 베어서 말린 풀을 건초(乾草), 시들어 마른 풀을 고초(苦草), 백성을 달리 일컫는 말로 민초(民草), 세 칸짜리 초가라는 뜻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초가를 이르는 말을 초가삼간(草家三間), 풀 사이 곧 민간에서 삶을 구한다는 뜻으로 욕되게 한갓 삶을 탐냄을 이르는 말을 초간구활(草間求活),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란 뜻으로 곡식이 없어 산나물 따위로 만든 험한 음식을 이르는 말을 초근목피(草根木皮), 풀잎 끝의 이슬 같은 천자라는 뜻으로 덧없는 대장으로 강도의 수령을 이르는 말을 초두천자(草頭天子),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마음 씀을 이르는 말을 초려삼고(草廬三顧), 초목과 함께 썩어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르는 말을 초목동부(草木同腐), 초목의 잎이 누렇게 물들어 떨어진다는 뜻으로 가을철을 이르는 말을 초목황락(草木黃落), 길 없는 초원을 걷고 들에서 잠잔다는 뜻으로 산야에서 노숙하면서 여행함을 이르는 말을 초행노숙(草行露宿),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우는 것을 이르는 말을 초록동색(草綠同色), 온 산의 풀과 나무까지도 모두 적병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적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찮은 것에도 겁냄을 이르는 말을 초목개병(草木皆兵), 풀을 베고 뿌리를 캐내다는 뜻으로 즉 미리 폐단의 근본을 없애 버린다는 말을 전초제근(剪草除根),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꽃다운 풀이라는 뜻으로 여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르는 말을 녹음방초(綠陰芳草),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乙을 징계하여 甲을 경계함을 이르는 말을 타초경사(打草驚蛇) 등에 쓰인다.
▶️ 春(봄 춘, 움직일 준)은 ❶회의문자로 旾(춘)이 고자(古字), 㫩(춘)은 동자(同字)이다. 艸(초; 풀)와 屯(둔; 싹 틈)과 날일(日; 해)部의 합자(合字)이다 屯(둔)은 풀이 지상에 나오려고 하나 추위 때문에 지중에 웅크리고 있는 모양으로, 따뜻해져 가기는 하나 완전히 따뜻하지 못한 계절(季節)의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春자는 ‘봄’이나 ‘젊은 나이’,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春자는 日(해 일)자와 艸(풀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春자의 갑골문을 보면 艸자와 日자, 屯(진칠 둔)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屯자는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갑골문에서의 春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고 올라오는 새싹과 초목을 함께 그린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습이 크게 바뀌면서 지금의 春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春자는 단순히 ‘봄’이라는 뜻 외에도 사람을 계절에 빗대어 ‘젊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이나 ‘성(性)’과 관련된 뜻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春(춘, 준)은 ①봄 ②동녘 ③술의 별칭 ④남녀(男女)의 정 ⑤젊은 나이 ⑥정욕(情慾) ⑦성(姓)의 하나 그리고 ⓐ움직이다(준) ⓑ진작(振作)하다(떨쳐 일어나다)(준) ⓒ분발하다(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다)(준)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가을 추(秋)이다. 용례로는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氣運)의 증세를 춘곤증(春困症), 봄이 옴을 춘래(春來), 봄의 짧은 밤에 꾸는 꿈을 춘몽(春夢), 봄의 시기를 춘기(春期), 봄에 피는 매화나무를 춘매(春梅), 봄철에 입는 옷을 춘복(春服), 봄철에 어는 얼음을 춘빙(春氷), 봄에 입는 홑옷을 춘삼(春衫), 따뜻한 봄을 난춘(暖春), 봄이 돌아옴으로 늙은이의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회복함이나 다시 젊어짐을 회춘(回春), 꽃이 한창 핀 아름다운 봄으로 꽃다운 나이를 방춘(芳春), 다시 돌아온 봄 새해를 개춘(改春), 봄을 맞아 기림 또는 봄의 경치를 보고 즐김을 상춘(賞春), 봄을 즐겁게 누림을 향춘(享春), 성숙기에 이른 여자가 춘정을 느낌을 회춘(懷春), 몸파는 일을 매춘(賣春),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 시절을 청춘(靑春),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각각 특색이 있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춘란추국(春蘭秋菊), 봄철 개구리와 가을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무용한 언론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와추선(春蛙秋蟬), 봄철의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어 화를 자초함을 이르는 말을 춘치자명(春雉自鳴),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을 이르는 말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 추위와 노인의 건강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물이 오래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춘한노건(春寒老健), 봄에는 꽃이고 가을에는 달이라는 뜻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화추월(春花秋月), 봄 잠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는 뜻으로 좋은 분위기에 취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을 춘면불각효(春眠不覺曉), 봄철의 지렁이와 가을 철의 뱀이라는 뜻으로 매우 치졸한 글씨를 두고 이르는 말을 춘인추사(春蚓秋蛇), 봄바람이 온화하게 분다는 뜻으로 인품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여유가 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풍태탕(春風駘蕩), 얼굴에 봄바람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춘풍만면(春風滿面), 봄철에 부는 바람과 가을 들어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지나가는 세월을 이르는 말을 춘풍추우(春風秋雨), 이르는 곳마다 봄바람이란 뜻으로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처신하는 사람 또는 가는 곳마다 기분 좋은 일을 이르는 말을 도처춘풍(到處春風), 사면이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낯으로만 남을 대함을 이르는 말을 사면춘풍(四面春風),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란 뜻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일장춘몽(一場春夢), 입춘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는 글을 이르는 말을 입춘대길(立春大吉), 다리가 있는 양춘이라는 뜻으로 널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유각양춘(有脚陽春), 범의 꼬리와 봄에 어는 얼음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호미춘빙(虎尾春氷), 가을 달과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이르는 말을 추월춘풍(秋月春風) 등에 쓰인다.
▶️ 暉(빛 휘)는 형성문자로 晖(휘)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날 일(日; 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軍(군, 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暉(휘)는 ①빛, 광채(光彩) ②빛나다, 광채(光彩)가 나다 ③밝다 ④금휘(琴徽: 기러기발. 거문고, 가야금, 아쟁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빛 광(光), 빛 경(耿), 빛 색(色)이다. 용례로는 태양이라는 뜻으로 왕자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휘륜(暉輪), 아침의 햇빛을 조휘(朝暉), 다 져가는 저녁 햇살을 낙휘(落暉), 해 질 무렵의 햇빛을 만휘(晩暉), 해를 달리 이르는 말을 태휘(太暉), 맑은 날의 햇빛을 청휘(晴暉), 저녁녘에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을 사휘(斜暉), 밝은 햇빛이라는 뜻으로 덕이 높음을 이르는 말을 경휘(耿暉), 부모의 은혜는 일만분의 일도 갚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을 촌초춘휘(寸草春暉), 태양빛과 달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만물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을 희휘낭요(曦暉朗耀)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