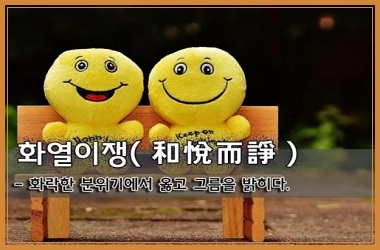
화열이쟁(和悅而諍)
화기애애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和 : 화할 화(口/5)
悅 : 기쁠 열(忄/7)
而 : 말 이을 이(而/0)
諍 : 간할 쟁(言/6)
출전 : 논어(論語) 향당(鄕黨)
이 성어는 공자의 공사 생활 태도를 이야기한 논어(論語) 향당(鄕黨)편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을 주자(朱子; 朱熹)가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자가 고향마을에서 생활 때는 공손하고 겸손하여(恂恂)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으셨다.
孔子於鄉黨, 恂恂如也, 似不能言者.
그러나 종묘와 조정에 계실 적에는 말을 잘 하시되 매우 삼가 하셨다.
其在宗廟朝廷, 便便言, 唯謹爾.
조정에서 동급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화목하고 즐거웠으며, 상대부와 이야기할 때는 온화하고 공손하였다.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군주가 계시면 공경하여 편안하지 못한 듯하였고 태도가 엄숙하셨다.
君在, 踧踖如也, 與與如也.
논어집주(論語集注)
순순(恂恂)은 미덥고 성실한 모양이오, 간간(侃侃)은 강직함이오, 은은(誾誾)은 화(和)하고 즐겁게 간함이라.
恂恂, 信實之貌。
侃侃, 剛直也。
誾誾, 和悅而諍也。
與與, 不忘向君也。
한자 간(侃)은 ‘화락하다’와 ‘강직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간간(侃侃)만 쓰면 말투가 강직함을, 간간여(侃侃如)는 화락함을 뜻한다. 주자(朱子)는 설문해자(說文解字)를 근거로 ‘강직함’으로 풀었지만 좀 어색한 설명이다.
고위직과 만날 때 은은(誾誾)했다는 것을 주자는 화열이쟁(和悅而諍)으로 풀이했다. 평화롭고 기쁜 자세로도 정직하게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간쟁(諫諍)했음이다.
화열이쟁(和悅而諍)의 대표 사례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와 임연(任延)의 대화가 꼽힌다.
임연을 서쪽의 교통요지 무위(武威) 태수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광무제는 “상관을 잘 섬기어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하라(善事上官 無失名譽)”고 당부했다.
임연의 대답이 걸작이다. 임연은 “충신(忠臣)은 사정(私情)에 얽매이지 않고, 사정에 매이는 신하는 불충(不忠)이며, 바른 것을 이행하고 공정함을 받드는 것(履正奉公)이 신하의 도리요, 상관과 부하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은 폐하의 복이 아니오니, 상관을 잘 섬기라는 분부를 신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며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광무제는 탄식하며 “그대의 말이 옳소”라고 수긍했다.
帝以睢陽令任延為武威太守, 帝親見, 戒之曰; 善事上官, 無失名譽.
延對曰; 臣聞忠臣不和, 和臣不忠.
履正奉公, 臣子之節, 上下雷同, 非陛下之福. 善事上官, 臣不敢奉詔.
帝歎息曰; 卿言是也.
서슬퍼런 황제 앞이라도 거슬리지 않게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화열이쟁이다.
제왕은 간쟁을 중시했다. 중국 황제는 해마다 동지(冬至)에 베이징 천단(天壇)을 찾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루 전 목욕재계 한 뒤 재궁(齋宮)에 머물렀다.
재궁에는 재계동인정(齋戒銅人亭)이란 정자를 세웠다. 간언하는 신하의 동상을 모시던 곳이다. 당(唐) 위징(魏徵)을 본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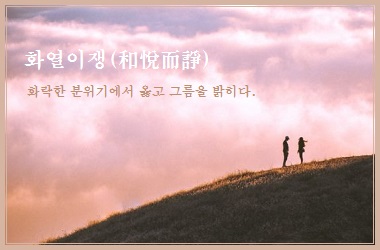
화열이쟁(和悅而諍)
화락한 분위기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다.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자기 의견이 옳다고 우기기만 하면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이 되어 그 단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항우는 고집으로 망하고 조조는 꾀로 망한다’는 말대로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한다면 결정은 하자세월이다. 남과 토론할 때 격렬한 언사를 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논리가 박약함을 나타내는 증좌라 했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항상 싱글벙글 웃음 띤 얼굴로 타인의 반대 의견을 경청했다고 한다. 유학의 원조 공자(孔子)는 어땠을까. 화기애애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和悅) 옳고 그름을 밝혀 사리를 밝혔다(而諍)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자.
(論語)의 향당(鄕黨)편은 공자의 의식주와 언행, 성격에서 음주까지 생각과 행동을 그려 놓은 10번째 편이다.
향(鄕)은 주(周)나라 제도로 1만2500호로 구성되고, 당(黨)은 500호로 이뤄진 공동체단위라는데 여기선 부형친족이 있는 일반 마을로 사용됐다.
공자의 말하는 태도가 제일 첫 머리에 나온다. 마을에 계실 때에는 겸손하고 과묵하여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았지만 종묘나 조정에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펼치되 신중하게 했다고 했다.
여기서 온화하고 공손한 모습을 순순(恂恂)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편편(便便)으로 표현했다. 恂은 정성 순, 편할 편(便)은 말을 잘 한다는 뜻도 있고, 분명하게 말한다고 분별할 변(辨)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할 때의 자세가 나온다. ‘조정에서 하대부와 의논할 때는 강직한 모습으로(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상대부와는 부드러우면서도 주장을 분명히 했다(與上大夫言 誾誾如也).’
공자가 노(魯)나라에서 벼슬할 때 법률을 담당하는 소사구(小司寇)란 직책을 맡아 경(卿) 이상인 상대부에 비해 낮은 하대부였다.
강직할 간(侃)은 ‘화락하다‘의 뜻도 있고, 향기 은(誾)은 ’온화하다, 화기애애 하다’란 뜻이 함축돼 있다.
이 부분을 송(宋)의 주희(朱熹)가 해설한 ‘논어집주(論語集注)’에 성어가 등장한다. ‘간간은 강직함이요, 은은은 화락한 분위기에서 간쟁한다(侃侃剛直也 誾誾和悅而諍也).’
‘바보와 죽은 사람만이 결코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옳은 의견일 때는 바보가 되더라도 관철해야 할 일이 있다. 높은 사람 앞이라도 할 말은 하는 의지를 높인다. 우리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어디에 해당할까.
상대방 의견은 수적으로 밀어붙여 묵살하고, 자기편은 무조건 지지 아니면 반대 의견 있어도 입 다문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설득하고 안 되면 절충하는 등 받아들일 줄 안다. 화락한 가운데서 의지를 관철하는 토론의 분위기는 구경하기 힘들다.

▶️ 和(화할 화)는 ❶형성문자로 惒(화)는 통자(通字), 咊(화)는 고자(古字), 訸(화)와 龢(화)는 동자(同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禾(화)와 수확한 벼를 여럿이 나누어 먹는다는(口) 뜻을 합(合)하여 '화목하다'를 뜻한다. ❷형성문자로 和자는 '화목하다'나 '온화하다'하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和자는 禾(벼 화)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禾자가 '벼'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口자가 더해진 和자는 먹고살 만하니 '화목하다'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龠(피리 약)자가 들어간 龢(화할 화)자가 쓰였었다. 龢자는 피리를 그린 龠자를 응용한 글자로 피리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조화롭다'를 뜻했었다. 여기서 禾자는 발음역할만을 했었다. 하지만 금문에서 부터는 소리의 조화를 口자가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의 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和(화)는 (1)관악기(管樂器)의 한 가지. 모양의 생(笙)과 같이 생겼는데, 십삼관(十三管)으로 되었음 (2)합(合)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화하다(서로 뜻이 맞아 사이 좋은 상태가 되다) ②화목하다 ③온화하다 ④순하다 ⑤화해하다 ⑥같다 ⑦서로 응하다 ⑧합치다 ⑨허가하다 ⑩모이다 ⑪화답하다 ⑫양념하다 ⑬나라의 이름(일본) ⑭합계 ⑮악기(樂器)의 한 가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화합할 협(協), 화목할 목(睦),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싸움 전(戰)이다. 용례로는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풂을 화해(和解),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화목(和睦), 화목하여 잘 합하여 짐을 화합(和合), 시나 노래에 서로 응하여 대답함을 화답(和答), 온화하고 순함을 화순(和順), 날씨가 바람이 온화하고 맑음을 화창(和暢),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을 화평(和平), 급박하거나 긴장된 상태를 느슨하게 함을 완화(緩和), 평온하고 화목함을 평화(平和), 서로 잘 어울림을 조화(調和),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러움을 온화(溫和), 교전국끼리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화해함을 강화(講和), 서로 어울려 화목하게 됨을 융화(融和), 성질이 부드럽고 온화함을 유화(柔和), 서로 친해 화합함을 친화(親和), 화창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이란 뜻으로 따뜻한 봄날씨를 이르는 말을 화풍난양(和風暖陽), 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義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화이부동(和而不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넘쳐 흐름을 이르는 말을 화기애애(和氣靄靄),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단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날씨가 고름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화풍감우(和風甘雨),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하면 그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상서를 냄을 일컫는 말을 화기치상(和氣致祥),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여 일컫는 말을 부화뇌동(附和雷同), 거문고와 비파 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화목함을 이르는 말을 금슬상화(琴瑟相和),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충돌 또는 둘 이상의 음이 같이 울릴 때 서로 어울리지 않고 탁하게 들리는 음을 일컫는 말을 불협화음(不協和音), 겉으로는 동의를 표시하면서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동이불화(同而不和), 곡이 높으면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으로 사람의 재능이 너무 높으면 따르는 무리들이 적어진다는 말을 곡고화과(曲高和寡), 국민의 화합과 나아가 인류의 화합을 지향한다는 뜻을 일컫는 말을 조민유화(兆民有和) 등에 쓰인다.
▶️ 悅(기쁠 열)은 ❶형성문자로 恱(열), 悦(열)의 본자(本字)이고 說(열), 兌(열)과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심방변(忄=心, ; 마음, 심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 없애다, 열)로 이루어졌다. 마음의 바르지 않음을 없애다의 뜻이 전(轉)하여 기뻐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悅자는 '기쁘다'나 '기뻐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悅자는 心(마음 심)자와 兌(빛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兄(맏 형)자 위로 八(여덟 팔)자를 그린 것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兌자에 心자가 더해진 悅자는 매우 기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悅(열)은 ①기쁘다 ②기뻐하다 ③심복하다 ④사랑하다 ⑤손쉽다 ⑥기쁨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기쁠 희(僖), 기쁠 희(喜), 즐길 오(娛), 기쁠 이(怡), 즐거울 유(愉), 기쁠 희(憘), 즐길 낙/락(樂), 기쁠 흔(欣), 기쁠 환(歡), 달 감(甘), 즐길 탐(耽)이다. 용례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열락(悅樂), 즐거이 사랑함을 열애(悅愛), 기쁘게 여기어 사모함을 열모(悅慕), 음식이 입에 맞음을 열구(悅口),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을 열복(悅服), 기뻐하는 얼굴빛을 열색(悅色), 어버이를 기쁘게 함을 열친(悅親),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열예(悅豫), 좋아하여 반함을 열미(悅美), 눈을 즐겁게 함을 열안(悅眼), 입에 맞는 음식을 일컫는 말을 열구지물(悅口之物), 이상以上과 같이 마음 편히 즐기고 살면 단란한 가정임을 일컫는 말을 열예차강(悅豫且康),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먼 곳의 사람들이 흠모하여 모여든다는 뜻으로 덕이 널리 미침을 이르는 말을 근열원래(近悅遠來),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송무백열(松茂柏悅), 남녀가 좋아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화락함을 이르는 말을 남흔여열(男欣女悅),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함을 일컫는 말을 심열성복(心悅誠服),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함을 이르는 말을 매인열지(每人悅之), 선정으로써 심신을 도우며 침식마저 잊고 즐겁게 생활함을 일컫는 말을 선열위식(禪悅爲食) 등에 쓰인다.
▶️ 而(말 이을 이, 능히 능)는 ❶상형문자로 턱 수염의 모양으로, 구레나룻 즉,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을 말한다. 음(音)을 빌어 어조사로도 쓰인다. ❷상형문자로 而자는 ‘말을 잇다’나 ‘자네’, ‘~로서’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而자의 갑골문을 보면 턱 아래에 길게 드리워진 수염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而자는 본래 ‘턱수염’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而자는 ‘자네’나 ‘그대’처럼 인칭대명사로 쓰이거나 ‘~로써’나 ‘~하면서’와 같은 접속사로 가차(假借)되어 있다. 하지만 而자가 부수 역할을 할 때는 여전히 ‘턱수염’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而(이, 능)는 ①말을 잇다 ②같다 ③너, 자네, 그대 ④구레나룻(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⑤만약(萬若), 만일 ⑥뿐, 따름 ⑦그리고 ⑧~로서, ~에 ⑨~하면서 ⑩그러나, 그런데도, 그리고 ⓐ능(能)히(능) ⓑ재능(才能), 능력(能力)(능)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30세를 일컬는 이립(而立), 이제 와서를 이금(而今), 지금부터를 이후(而後), 그러나 또는 그러고 나서를 연이(然而), 이로부터 앞으로 차후라는 이금이후(而今以後), 온화한 낯빛을 이강지색(而康之色) 등에 쓰인다.
▶️ 諍(간할 쟁)은 형성문자로 诤(쟁)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爭(쟁)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諍(쟁)은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서로 의논(議論), 언쟁하는 일 언쟁(言諍), 멱쟁(覓諍), 범쟁(犯諍), 사쟁(事諍) 등의 뜻으로 ①간(諫)하다(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 ②송사(訟事)하다 ③다투다 ④멈추다 ⑤간하는 말이나 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간할 간(諫)이다. 용례로는 친구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극력 충고하는 벗을 쟁우(諍友), 임금의 잘못에 대하여 바른말로 간하는 신하를 쟁신(諍臣), 어버이의 잘못을 바로 잡아 간하는 아들을 쟁자(諍子), 화기애애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는 것을 이르는 말을 화열이쟁(和悅而諍) 등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