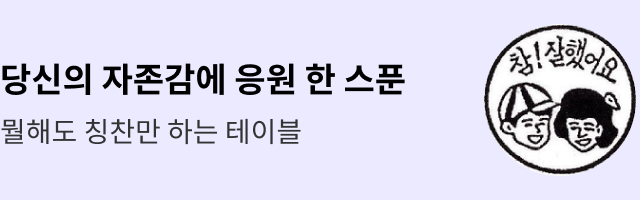쓰임은 없음에 있다
<도덕경道德經> 11장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양의洋醫과 구별되는 한의학韓醫學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삼십복공일三十輻共一 , 당기무當其無, 유차지용有車之用
치이위기埴以爲器, 당기무當其無, 유기지용有器之用
착호상이위실鑿戶爽以爲室, 당기무當其無, 유실지용有室之用
고유지이위리故有之以爲利, 무지이위용無之以爲用
서른개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머리에 모이니 그 바퀴머리의 빔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니 그 그릇의 빔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니 그 방의 빔에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용됨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컵'이라 이름지우면 그것이 물 마시는 데에 쓰임이
있음을 규정짓는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컵의 쓰임은 어디에서 나오는 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두가지 대답이 동양의학東洋醫學과 서양의학西洋醫學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즉 서양의학西洋醫學은 그 쓰임을 컵의 있음(컵의 물질적 구성)에서 찾았고, 동양의학東洋醫學은 없음(컵의 빈 공간)에서 찾았다. 여기서 있음(有)과 없음(無)은 서로 별개가 아니니 있음(有)이 있음에 없음(無)이 있고, 없음(無)이 있음에 있음(有)이 있는 것이나 이것을 쓰임(用)의 관점에서 보면 있음(有)과 없음(無)의 관념 차이는 엄청나다.
있음에만 그 쓰임을 둔다면 없음에서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원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없음에만 그 쓰임을 둔다면 있음에 대한 분석적이고 치밀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서의학東西醫學을 동시에 배우는 짬뽕 한의대 덕분에 우리는 동서의학東西醫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으리으리한 기계장치로 중무장되어 질환에 대한 원인분석과 병의 진행과정 그리고 예후를 거의 완벽하게 말해주는 서양의학西洋醫學과 매우 단순한 바늘과 풀뿌리 가지고 양방洋方에선 손도 못대는 질환을 깨끗이 낫게 하는 동양의학東洋醫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있는 한의대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러한 갈등은 나에게도 있었으나 동서양東西洋의 허실이 느껴지면서,“있음이 이용됨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이 이해되면서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방韓方의 가장 큰 부러움인 철저한 진단체계를 가진 양방洋方. 그러나 그 치료에 있어선 정말 초라하다.
어떤 질병을 두고 그 원인을 수십가지로 분류하고, 그 진단방법을 수십단계로 세밀하게 설정해 놓고서
가장 중요한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 없음(나을 때까지 내버려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직접 그들 입으로 현재 서양의학西洋醫學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전체의 10%도 않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90%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환자 앞에서 당신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진단해 보니 수십가지의 원인 중 몇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임이 틀림없는데 그 치료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겠소 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럴싸하게 말이라도 길게 하지 않았으면 밉지나 않지. 이러한 양방洋方의 현실은 바로 그 쓰임(用)을 있음(有)에서만 찾았기에 비롯되었다. 즉 물을 마신다는 쓰임에 있어서 컵의 외형적인 형태에만 집착한 결과 그 컵의 비어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컵의 색깔은 무엇이고, 컵의 재질은 무엇이고, 컵의 형태는 어떻고,
컵의 경도는 어떻고, 컵에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 등등 있음(有)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정말 세밀하게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실제 물 마시는 쓰임에 있어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
컵에 큰 금이 가서 세지만 않는다면 컵이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서,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
서 못마시실 이유는 전혀 없다. 이처럼 서양의학西洋醫學은 컵의 없음(無)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물 마시는 쓰임(用)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동양의학東洋醫學은 그 쓰임에 있어서 없음(無)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한방韓方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비과학非科學, 미신迷信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있음(有)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으로 진단의 객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없음(無)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한방韓方의 초보자로 하여금 매우 난처하게 만든다. 그래서 없음(無)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망진望診이나 맥진脈診이 좋게 표현하면 신비롭고, 나쁘게 표현하면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것이다.
학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명正名, 즉 용어의 올바른 정의 내림인데 바로 여기에 한의학韓醫學의 학문적 어려움이 있으니 한의학韓醫學에선 정명正名하기 힘든 수준을 떠나 정명正名이 완전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명가명名可名,비상명非常名
이름을 이름지우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컵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이미 '컵'이라 이름지우면 물 마시는 쓰임으로만 한정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한방韓方에서는 애당초 그것을 컵이라 명名하질 않는다. 물 마실 경우엔 그것이 컵이 되지만 거기에 꽃을 꼿으면 꽃병, 붓을 꼿으면 붓통,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등 그 쓰임(用)에 따라
이름(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쓰임에 따라 名이 달라지는 것은 없음(無)을 중요시 하기에
가능하였다. 그릇의 형태에 구애받음 없이 오직 그 빈 자리만 보기에 한가지를 두고도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正名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릇의 외형적인 있음(有)에 중점을 두는 양방洋方에서는 한방韓方과는 정반대로 그 명名에 따라 쓰임이 결정되었으니 물 마시는 컵 따로, 꽃 꼿는 꽃병 따로, 붓 꼿는 붓통 따로 등등 그 명名에 따라 쓰임이 따로따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선 정명正名의 중요성이 무척이나 강조된다. 그래서 서양西洋에선 천문학자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지질학자가 태양과 별이 운행하는 법칙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의사에 있어서도 외과外科 전문의는 내과內科에 대해 자신 없는것이 서양의 특성이다. 이 모두가 있음(有)의 자리만 바라 본 결과이고, 명名에 따라 쓰임이 결정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西洋은 언뜻 보면 매우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쓰임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는 없음(無)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무궁무진한 쓰임의 변화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동양東洋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동양東洋에선 천문학자니 풍수학자니 의학자니 하는 구분이 크게 엄격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의사에 있어서 내과의內科醫, 외과의外科醫로 나누는 그 자체가 우수웠고, 특히 인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양과 별이 운행하는 법칙과 물과 땅의 기운이 돌아가는 형세, 그리고 사람들의 길흉화복 또한 내다볼 수 있었으니 이 모두가 가능한 것은 무궁한 쓰임의 변화를 바로 볼 수 있는 없음(無)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여러분은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너무 관념적이네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그 없음의 자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더욱 관념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없음의 자리란 우리가 애타게 찾아온 기氣의 자리,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