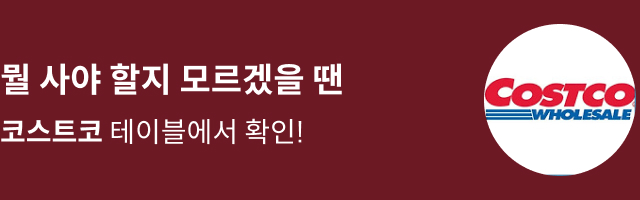언어 24
적的이라 함은“......같다”는 의미로서 “......이다”와는 다른 표현. 따라서 ‘한의학적的’은 순수 ‘한의학’과 거리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이충열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대로 현 한의학계에서 한의학 연구, 한의학 임상, 한의학 진단, 한의학 관점에 대한 고민보다 한의학적的 연구, 한의학적的 임상, 한의학적的 진단, 한의학적的 관점을 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의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본인은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을 한의학으로 재 포장하려는 ‘한의학적的’ 노력에 안타까움을 떠나 안쓰러움까지 느끼니 이는 순수 우리말에도 익숙치 못한 아이가 외래어부터 손수 만들려는 꼴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의 외래어가 우리 언어로 자리잡기까지에는 대중적인 문화공감대가 요구되었던 바 수입 의학을 한의학 언어로 해석하여 우리의 의료 영역에 귀속시키려면 ‘한의학적的’ 이전에 ‘한의학’ 자체의 충실한 이해가 먼저 요구되니 본인은 한의학적的이란 표현을 가능케 하는 잣대를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규정하며 특히 임상에서는 팔강八綱 (포리表裏, 음양陰陽, 한열寒熱, 허실虛實)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모든 이론과 팔강八綱의 언어를 벗어나는 모든 임상은 ‘한의학적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음양오행陰陽五行이나 팔강八綱도 하나의 언어일 뿐이기에 임상학술 언어로서 이것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음양오행陰陽五行 이외에도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학’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한의학 고유언어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틀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우리에겐 오랜 역사 속에 이어져온 한의학 언어를 부정할 권리가 없다. 기존의 양의兩儀, 음양陰陽이 아닌 음陰과 양陽 그리고 불음불양不陰不陽의 삼상三象을 나누든지, 오행五行 대신에 육행六行, 칠행七行으로 변화變化를 강조하든지, 비토脾土가 아닌 심토心土의 이론을 펼쳐 몸을 분석하든지, 팔강八綱에서 나아가 십육강十六綱으로 진단을 하든지 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재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된 것을 한의학적的이라고 말할 순 없다.
애당초 우리 언어가 적용될 수 없는 것에 ‘한의학적的’이라는 명칭을 억지로 붙이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자. 그냥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한의학적的 의학’이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적的의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한의학이면 한의학, 대체의학이면 대체의학, 서양의학이면 서양의학으로 순수하게 인정하자. 한의사로서 대체의학을 한다고, 서양의학의 관점을 가진다고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의 임상이 순수 한의학이 아님을 인정하여 적的이란 접미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이라는 주장으로 대체의학을 한의학의 한 부류로 억지 인식시키지 말아야 한다.
술과 물 모두가 좋다고 마구 섞으면 진작 물이나 술이 필요할 때엔 어느 것도 먹을 수 없으니 물과 술, 그리고 두 가지를 섞은 것 ... 이상 3가지의 공존이 요구된다. 전통 한의학, 서양의학, 그리고 대체의학(동서의결합東西醫結合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