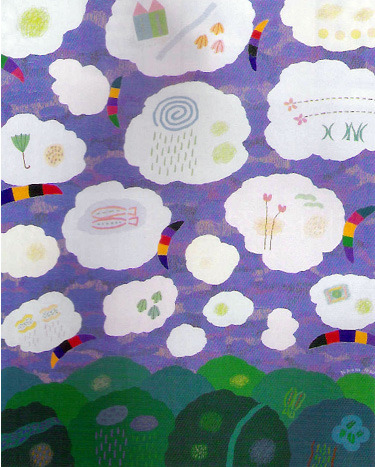봄소식 봄노래(16)
봄의 여름의 길목에서 느끼는 찬란한 슬픔
'에드바르 그리그'의 <마지막 봄>
크로커스
이 성 준
좋은 것은 빛날 때에 버려라.
그리고 땅 속에서 새로워져라.
어느 벌 어떤 나비가
다음 해까지 생을 기약하던가.
종다리도 샘을 내던 그대 맵시
자랑과 교만 넘쳐 사뭇 거룩했다.
숱한 질투와 시기 속에서
많은 화초 고개 숙여 눈물 훔쳤다.
봄이 다하면 잔치는 끝난 것.
그대 돌보던 이 떨쳐 가버리고
곱던 얼굴 발아래 떨어져 뒹굴 때
가녀린 弔問(조문) 인사 들려오지 않으리.
그대, 찬란한 시절과 헤어져라.
영원은 죽음과 함께 오는 것
유월의 바람이 들판 채우기 전
舞蹈(무도)의 몸짓 풀고 夜會服(야회복)을 거두어라.
望鄕旅人逢春雨(망향여인봉춘우)
金一路(김일로)
산기슭 물굽이 도는 나그네
지팡이 자국마다 고이는 봄비.
5월의 봄비는 그리움의 무늬를 꽃밭에 새기며 계절을 보낸다. 일제강점기 한학자이면서 시조시인이었던 김일로 선생은 떠도는 나그네의 처지에서 길가는 도중에 봄을 작별한다. 옛 중국시인이 읊었다는 계절 싯구, 馬上逢寒食 途中送暮春(마상봉한식 도중송모춘), "말 위에서 한식철을 맞으니, 길 위에서 저무는 봄을 전송한다"는 대목과 겹쳐진다. 김일로 선생의 제목을 풀면 "고향 그리는 나그네가 봄비를 만났을 때"이다. 지팡이가 흙 위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봄비가 그 속에 고여든다. 봄비가 고인 자국에 고향이 비친다. 이 정황을 한시 연구가 정민(鄭珉) 님은 "자신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의 무늬"라고 평하였다. 한가한 오후 나그네가 고향을 생각하는데, 그 옆을 종종걸음으로 봄철이 지나간다.
금동원 작, 사유의 숲
봄은 조바심으로 다가왔으나 미련없이 사라진다. 소설에서처럼 심사를 어질러 놓고 떠난다. 분분히 꽃비 날리는 언덕에 야생화 가득 피었고, 들판마다 청보리는 소록소록 익어가는데, 그 찬란한 꽃의 성찬과 신록의 축전을 그대로 두고 야멸차게 떠나 버린다.
사실, 봄과 여름의 경계는 나뉘지 않고 이어진다. 꽃샘 추위가 사라지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우리는 네 계절을 하루에 겪는다. 동장군이 물러나며 진득한 남녘바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십 도를 웃도는 일교차로 인해 대지와 초목도 몸살을 앓는다. 결국 봄나들이 옷을 꺼내 보지도 못한 채 계절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뀐다.
그러나 도회지를 떠나 사는 농부들에게 봄이 떠나가는 모습은 분명하고 또 당당하다. 너른 들녘을 작은 꽃들이 붐볐다가 이내 키 큰 화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건장한 나무마다 소복하게 아기잎이 달리면 온갖 넝쿨과 잡초들이 나무 그림자에서 뒤엉키며 키 자랑을 한다. 송화 향화 꽃가루가 날리고 옻나무 순이 달리며, 개울가에 달개비가 푸른 입술을 내밀고 둔덕 가장자리에 뻐꾹채와 엉겅퀴가 무성할 때 즈음이면 이제 봄이 물러날 때가 된 것이다. 동요에서는 봄이 가는 소리를 복사꽃 떨어지는 소리에 비했다. 뻐꾸기가 계속 울어대면 봄이 간다고도 했다. 도시에서는 겪어 보지 못하는 ,계절이 바뀌는 정경이다.
봄은 꿈과 함께 사라진다. 나른한 늦봄, 일상의 번잡함을 흩트리며 어름어름 낮잠이 찾아온다. '호접몽(胡蝶夢)'이라 하여 '장자(莊子)'에 나오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가 꿈을 통해 실현된다. 달콤한 봄 꿈 속에서 도원경(桃源境)이 떠다니고 천년 세월이 지나간다. 모든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가는 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망연(茫然)하게 봄을 떠나 보내며 그 아쉬움과 미련을 음악으로 풀어본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서정적 가곡들은 단순한 선율과 반주부로 되어 있으며, '로망스(Romance)'라고 불리웠는데, 특히 노르웨이의 예술가곡은 독일의 낭만주의적 기초 위에 노르웨이 민속무용과 풍부한 문학적 요 소를 넣어 19세기 후반 많은 발전을 보였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1843-1907)은 다수의 성악곡을 남겼다. 그는 하이네(Heinrich Heine),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입센(Henrik Ibsen),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등 독일과 북구권 문인들의 시를 통해 가곡 작품들을 썼다. 그리그의 대표적 연가곡 집으로 <산골 소녀:Haugtussa>, 작품 67이 있으며, 그 외에도 <그대를 사랑해>가 유명하다. 그의 가곡들 대부분은 뚜렷한 선율성 위에서 낭만적 정한이 가득 배어 있다.
작곡가의 나이 38세 때인 1881년에 작곡된 <마지막 봄:Varen>은 모두 열 두 곡의 가곡집(Tolv melodier til Digte) 작품 33번 중 두 번째에 등장하는 노래이다. 연가곡의 원시(原詩)를 지은 이는 노르웨이의 시인 비녜(Aasmund Olavsson Vinje:1818-1870)로, 메조 소프라노, 혹은 소프라노에 의해 불려 지도록 되어 있는데, 작곡가가 후일 <두 개의 슬픈 멜로디-가슴의 상처/지나간 봄>으로 편곡하여 오늘날에는 관현악이나 피아노 연주곡으로 더 많이 연주되고 있다. 시와 악곡의 제목인 '바아렌(Varen)'은 '봄(Spring)'을 뜻하는 노르웨이어 이나,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감흥을 고려하여 <지나간 봄/마지막 봄:The Last Spring>, 또는 <늦은 봄:The Late Springtide>`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사랑과 청춘의 고뇌로 고통받는 한 청년이 봄의 영광과 기쁨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버린 봄>이라는 것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지방에서) 짧게 지나가는 봄(과 여름)을 아쉬워하며 겨우 내내 봄을 그리워하면서 초록으로 뒤덮힌 봄철의 초원과 화사한 꽃밭을 상상하고 있다. '비녜'와 '그리그'가 노래한 이 곡이 우리와 사뭇 계절의 정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봄을 전송하며 느끼는 아쉬운 감흥은 똑같으리라 여겨진다.
|
Varen
Enno ein Gong fekk eg Vetren a sja
Eingong eg sjølv i den varlege Eim, |
마지막 봄
그래요, 나는 봄의 영광이 쇠락하여
다시 한 번 나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
곡의 선율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여운과 정한이 서려 있다.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담담하게 선율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나 그 안에 사무치는 격정의 맥락이 숨어 꿈틀댄다.
바바라 보니의 노래는 내면적인 서정성이 가득하고, 크로스오버계열인 시셀의 노래는 맑고 애처롭다. 관현악으로 편곡된 <마지막 봄>은 유려하고 비장감이 감돈다. 우수에 차면서 아름다운 서정성이 녹아 있는 이 곡을 들으며 올 봄을 처연(悽然)히 떠나 보내고자 한다. (*)
이숙자 작, 청보리
연주자 소개
01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Barbara Bonney)
02 소프라노 키켸보 시셀(Kikjebo Sissel) * 크로스오버 계열
03 르네 라이보비츠(Rene Leibowitz) 지휘, 필하모니아 관현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