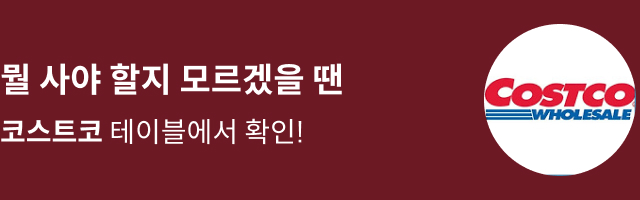언어 19
“그건 토생금土生金이야.” 류희영 스승님과의 첫 만남에서 들은 스승님의 첫 말씀. 일중사 사장님의 소개로 찾아뵌 스승님의 인상은 엄하고 무뚝뚝. 어디 아프냐는 문진問診 없이 망진望診과 절진切診을 하시고는 무표정으로 그냥 침鍼만 꼽고 나가시니... 그 황당함이란...
그러나 당혹스러움은 침鍼을 맞은 후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부터 신기함으로 바뀌었다. 손수 직접 침鍼을 뽑으시는 스승님께 침 고임을 말씀드리니 스승님의 무표정한 모습이 금새 밝게 변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었다. “그것이 바로 토생금土生金이야.”
토생금土生金. 그 한마디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김은하 선생님의 흔들리는 손에서 느꼈던 충격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그 토생금土生金엔 지난 10년간 본인을 괴롭혀온 병리病理가 담겨 있었고, 금화교역金火交易을 임상에서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었다. 이처럼 스승님과의 인연은 “토생금土生金”이라는 한마디를 통해 이루어졌다.
토생금土生金 ... 어찌 보면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문장. 한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공감하는, 기본회화에 있어서 초보문법에 해당되는 그 용어에 “뻥”하고 풍선 터짐은 고민을 통한 나름대로의 관觀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제師弟의 인연 맺은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스승님은 말씀을 무척 아끼신다. 본인을 포함한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스스로 고민한 흔적이 없으면 단호히 말씀하신다. “책 찾아봐!”
그 “책 찾아봐!”라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고개를 흔들고 돌아갔는지 모른다. 제자들이 고민한 만큼만 답변하시는 독특한 가르침은 주위에서 평가하는 스승님의 괴팍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다. 묻고 답하는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언어가 통해야 가능한 법.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입만 수고로울 뿐이기에 언어 익히기를 거치지 않은 이에겐 긴말이 소용없다.
따라서 제자된 이는 먼저 스승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비컨대 스승이 국수를 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 ‘국시’라 말한다면 사투리를 파악한 이는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스승이 사용하는 언어조차 생소한 사람은 국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국시’라는 낯선 용어에만 매달리므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에 “국시가 뭐죠?” 라는 질문에 따라 “국시란 밀가리로 만든 것인데...”라는 답변을 얻으면 설상가상으로 밀가루의 사투리인 ‘밀가리’마저도 이해가 어렵게 된다. 즉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나”라는 명언에서 스승의 가르침(손가락)을 통해 한의학(달)을 배우려면 스승의 손가락 생김새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제자로 처음 입문했을 때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세한 내용은 손원장이 진단학 책 100번을 읽고 난 후에 이야기하자구.”